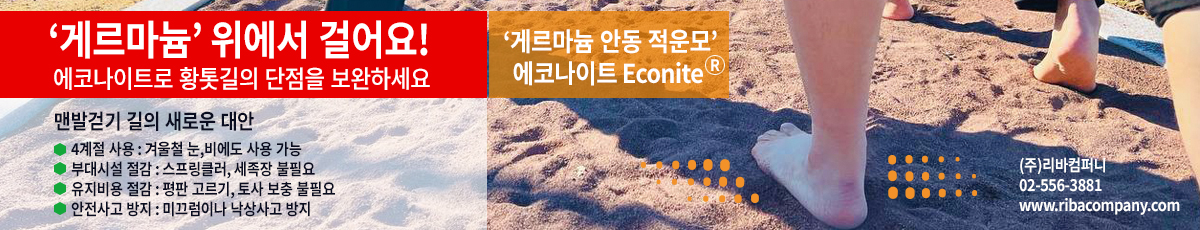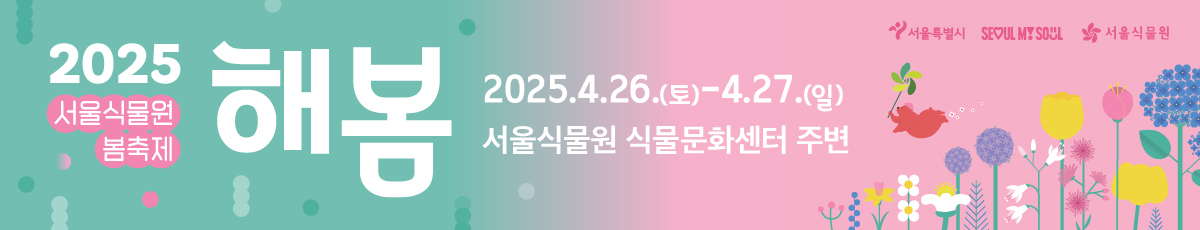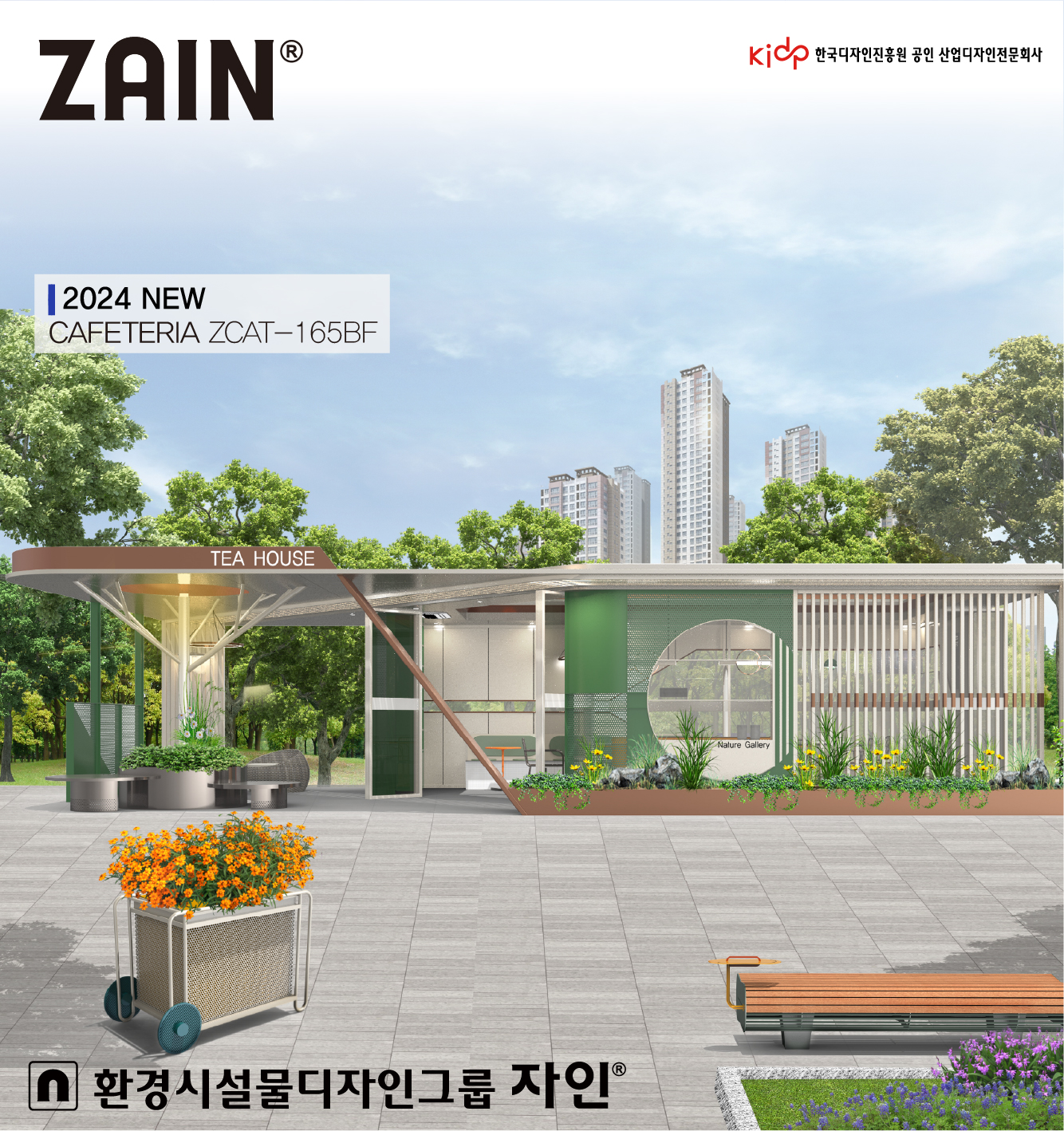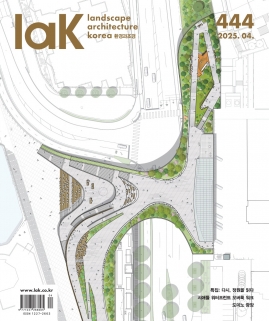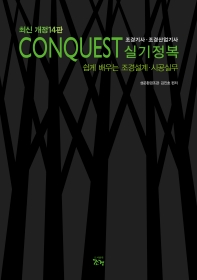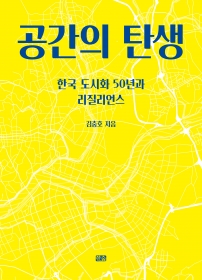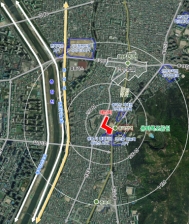- 박경복 가든프로젝트 대표 ([email protected])
1. 지방소멸, 농촌소멸 위기의 해법
산업화 이후,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집중 현상이 발생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인구분산 정책으로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시작했다. 혁신도시의 계획인구는 약 2만~5만 명으로 계획되었으며, 1단계(2007~2014, 이전공공기관 정착단계), 2단계(2015~2020, 산·학·연 정착단계), 3단계(2021~2030, 혁신확산단계)로 진행되었다.
2005년 6월 이전대상 공공기관 확정, 2005년 8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전담조직 설치, 2005년 12월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 2007년 4월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2007년 5월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2007년 9월 혁신도시 기반조성 착공, 2012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개시, 2019년 12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등을 진행하여 2025년 현재, 10개 광역권에 혁신도시가 건립되었다(innocity.molit.go.kr).
한국은 경제·일자리·인구 등의 ‘수도권 집중도’ 1위 국가다. 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이 가입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에서 한국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유독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50.9%, 일자리의 58.5% 역시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일자리 4.9%, 인구는 4.7%로 수도권 집중도는 한국의 10% 미만이다(김시덕, 중앙일보, 2024.10).
2030년 혁신도시 3단계가 완료되면 혁신도시당 계획인구는 최소 5100명(제주 서귀포)~최대 5만 명(광주, 전남)으로 혁신도시의 총 계획인구는 최대 27만3583명이다. 이는 2025년 인구통계 5168만4564명 기준 0.53% 정도다(kosis.kr). 지방 및 농촌소멸 위기의 해결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구분산정책이 모범답안이다. 그러나 혁신도시와 같은 단일 사업만으로 일자리의 58.5%, 전 국민의 50.7%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정부 주도의 정주(定住) 인구 분산정책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체류형 생활인구 분산정책으로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월 24일부터 농촌 생활인구 확산으로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지(農地)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내건 슬로건이 ‘4도(都) 3촌(村)’이다. 주 7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한다는 개념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일상의 57%는 도시에서 정주(定住)하고, 43%는 농촌에서 체류하는 생활인구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주말·체험 영농’ 활동을 위한 임시숙소를 말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규모는 33㎡까지 가능하며, 부속시설로 데크, 주차장,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핵심은 이러한 가설건축물 면적과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두 배 이상 농지를 확보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 이전에는 농막(農幕)이 있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창고로서 원두막이 진화한 형태이다. 초기에는 비닐하우스에 차광막(遮光幕)을 덮는 형태가 주류였으나 최근 도시민의 여가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동식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농막으로 이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도시민의 수요와 이동식 주택시장의 공급에 따라 방, 화장실, 거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이동식 주택이 소비자에게 농막으로 보급되었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숙박이 금지된 농막에서 사실상 숙박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불법 농막을 양성화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소비자 요구에 맞춘 실행계획이 수립되었다.

농막 이전에는 원두막(園頭幕)이 있었다. ‘원두막’이란, 오이, 참외, 수박, 호박 따위를 심은 밭을 지키기 위하여 밭머리에 지은 막(幕)이다. 사각 정자 형태로 자연스러운 원목을 기둥 삼고, 볏짚 또는 나무판자로 지붕을 덮어 비와 햇빛을 차단해 줌으로써 농작물 임시보관이나 작업자의 휴식 공간 기능을 한다.
원두막을 생각하면 연상되는 행위가 있다. 바로 서리다. ‘서리’는 군것질을 위한 먹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에 아이들이 과수원에 몰래 들어가서 주인 몰래 참외나 수박 등을 장난스럽게 훔쳐먹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원두막에서 졸고 있던 과수원 주인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깨어나서 ‘이놈들 잡아라’ 소리치며 쫓아가는 풍경, 그리고 품에 몇 개의 과일을 품에 안고 도망가는 아이들 모습이 연상된다. 이렇듯 원두막, 과수원, 과일, 주인, 동네 꼬마 녀석들이 어울려 배경, 소품, 등장인물이 되면서 한 편의 연극, 또는 한 컷의 사진 속 장면으로 연출되어 유년 시설의 기억 저편에 자리한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세대를 달리하여 추억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성인이 된 동네 꼬마 녀석들은 다시 그 장소를 찾는다.

중요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소멸위기 해결을 위해 진행한 ‘혁신도시사업’은 정부 주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과 연계되어 정주(定住)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정부 주도정책은 티베트 종교 및 민족지도자의 환생을 검증하듯 단계적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반면, ‘농촌체류형 쉼터’ 사업은 농촌소멸위기 해결을 위해 민간주도의 생활 · 문화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은 불사조의 빠른 성장, 운반, 치유력 같은 세부적인 실행계획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사업’은 건축물의 규모, 부속시설, 농지 면적 등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세부실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검증된 정체성과 추동력,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갖춘 대안을 모색하던 중 한국 정원문화 ‘별서(別墅)’를 주목하게 되었다.
3. 별서논담(別墅論談)
조선시대에는 별서(別墅)가 있었다. ‘별서’의 한자를 직역(直譯)하면, 따로 떨어지다_별(別), 농막_서(墅)로서 ‘따로 떨어져 있는 농막’을 의미하며, 의역(意譯)하면 ‘선비들이 세속을 떠나 자연에 귀의하여 은거 생활을 하기 위한 곳으로, 본가(本家)에서 떨어진 산수가 빼어난 장소에서 지어진 별저(別邸)’를 말한다. 별서는 단순히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정원(庭苑) 그리고 주변 자연경관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별서로는 담양 소쇄원, 보길도 부용동정원, 강진 백운동원림을 들 수 있다.
별서의 주요 건축물로는 정(亭), 누(樓), 각(閣), 대(臺), 사(榭), 당(堂), 헌(軒) 등이 있다. 채소를 심은 곳을 포(圃)라 하고, 과실수를 심은 곳을 원(園)이라 하고, 새와 짐승을 기르는 곳을 유(囿)라고 한다. 또 담장이 있는 것을 원(園)이라 하고, 담장이 없는 것을 유(囿)라고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정원(庭園)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정원(庭苑), 원유(園囿), 원림(園林) 등의 용어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담장 안의 정원뿐 아니라, 담장 밖의 자연경관까지 확대하여 정원으로 생각한 것을 잘 보여준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동산바치’라 불렸다.
소쇄원(瀟灑園)의 조영자인 양산보(1503~1557)는 당쟁으로 스승 조광조가 사사(賜死) 되자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전라남도 담양으로 내려와 소쇄원을 짓고 은거하며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소쇄(瀟灑)의 의미는 ‘깨끗하고 시원함’을 의미하며, 양산보는 이 별서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자신을 ‘소쇄옹’(瀟灑翁)이라 하였다. 주요 건축물로는 광풍각, 제월당, 대봉대, 고암정사 등이 있다. 광풍(光風)과 제월(霽月)은 북송의 시인이 쓴 글에서 인용되었는데, 주돈이(周敦頤)의 인품이 심히 고명하며 마음결이 시원하고 깨끗함이 마치 ‘맑은 날의 바람(光風)과 비 갠 뒤의 달(霽月)과 같다’라는 글에서 인용되었다. 제월당은 주인이 거처하며 조용히 독서하던 곳이었다. 광풍각은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문인들과 교류하며 차를 마시며, 학문을 논하고, 계류를 흐르는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정원을 감상하던 장소다.

‘소쇄원 48영’은 1548년에 김인후가 지은 오언절구 시(詩)다. 20자의 한자로 구성되어 소쇄원의 내원(內苑)을 표현한다. 그중 제 2영(詠) ‘침계문방(枕溪文房)’은 광풍각을 소재로 한 것으로 ‘머리맡에서 개울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비의 방’이라는 뜻이다.

부용동정원(芙蓉洞庭苑)의 조영자인 윤선도(1587~1671)는 조선시대 문인이다.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서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보길도에 별서를 짓고 생활하며 ‘어부사시사’ 등 문학작품을 남겼다.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는 1651년 윤선도(尹善道)가 자신을 어부에 비견하여 보길도(甫吉島)를 배경으로 지은 40수의 단가(短歌)로, ‘고산유고(孤山遺稿)’에 실려 전한다.
정원은 크게 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처하는 살림집이 있는 낙서재(樂書齋) 주변, 휴식과 독서를 위해 건너편 산허리의 바위 위에 집을 마련한 동천석실(洞天石室) 주변, 그리고 동리 입구의 세연정(洗然亭) 주변이다. 낙서재는 서실(書室)을 갖춘 살림집으로 북향하고 있으며, 옆으로 낭음계(朗吟溪)라는 작은 시내가 흐르고, 낭음계의 양편에 곡수당(曲水堂)과 무민당(無憫堂)의 두 건물을 지었다. 이 두 건물의 곁에는 넓고 네모진 연못이 있다.
동천석실(洞天石室)은 중국 도교(道敎)에서 ‘신선이 산다는 곳’이란 의미인 ‘동천복지(洞天福地)’를 따라서 이름 지어진 곳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세연정 부근은 이 정원에서 가장 공들여 꾸민 곳으로, 해변에 바로 인접한 동구(洞口)에 인공으로 물길을 조성하면서 연못들을 만들고 정자와 대(臺)를 지어 경관을 즐기도록 하였다. 연못은 곡지(曲池)와 방지(方池)로 구성되는데 동구를 흐르는 내를 돌로 된 보로 막아 만든 곡지에는 큰 바위들을 점점이 노출했으며, 방지에는 한 쪽에 네모난 섬을 만들고 그 섬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방지의 동쪽 물가에는 돌로 된 네모진 단 두 개를 나란히 꾸며놓았는데, 이곳은 무희가 춤을 추고 악사가 풍악을 울리던 자리다(encykorea.aks.ac.kr).

백운동원림(白雲洞園林)은 처사 이담로(1627~1701)가 조성한 별서이다. ‘처사’란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草野)에 묻혀 사는 선비를 말한다. 백운동 원림은 후손들에 의해 계승되었고, 특히 백운첩에는 다산 정약용의 ‘백운동 12경’ 시(詩)와 초의선사가 그린 ‘백운동도(白雲洞圖)’가 있어 당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월출산을 배경으로 원림을 조영한 문헌 자료가 다수 확인되고, 유상곡수(流觴曲水) 시설 도입과 수목 식재 등 경관처리기법이 우수하며, 백운동 12경의 구성요소가 잘 남아 있다. 예로부터 많은 선비와 문인들이 원림의 경관을 예찬한 옛 시문과 그림들이 현재까지 잘 남아 있어 조경사적 가치가 탁월하며, 이담로의 6대손인 이시헌이 정약용, 초의선사와 교류하며 차를 만들고 즐긴 기록 등이 남아 있어 국내 차 문화의 산실로서 가치를 더하고 있다. 정약용은 백운동원림에 반해 초의선사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옥판봉·산다경(山茶徑)·백매오(百梅塢) 등 아름다운 경치 12개를 칭송하는 시를 지었다. 다산과 초의선사가 남긴 작품은 ‘백운첩’에 전하며, 이시헌은 선대 문집·행록·필묵을 엮은 ‘백운세수첩(白雲世手帖)’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3대 별서의 사례를 살펴서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한 결과, 집 짓고, 정원 가꾸고, 농사짓고, 밥 짓고, 글 읽고, 시 쓰고,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마시고, 음악 듣고, 차 마시는 등의 유유자적한 생활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농촌체류형 쉼터, ‘별서_1621’
‘별서(別墅)’는 16세기 이후, 선비, 처사, 문인들이 자발적으로 귀향(歸鄕)하여 자연과 더불어 문학(文), 역사(史), 철학(哲)을 논하면서 시(詩), 서(書), 화(畵)를 짓고 음주(飮酒) · 가무(歌舞)와 다도(茶道)를 즐겼던 공간이다. 이후, 후손들에 의해 대를 이어 유지, 보완되며 수백 년을 지나 21세기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 중 1차산업(농·산·어촌생산물) 중심에서 2차산업(제조업) 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농촌인구가 대거 일자리를 찾아 도시 및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또한 도시에 집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3차산업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인구의 수도권 및 도시의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 되었다. 이로 인해 주택, 환경, 교육, 교통문제 등이 심화 되어 혁신적인 인구분산정책 도입이 요구되었다. 주된 원인이 된 일자리의 분산정책이 선행되지 않고는 인구분산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는다. 그러나 수십 년간 안정화된 수도권 기반시설의 편리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방에 머물다가 주중 또는 근무하는 동안만 머물러 있고, 주말 또는 이직 기회가 되면 도시나 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기려는 현상이 반복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제도’나 ‘정책’에 있지 않다. 시민의 ‘자발성’에 있다. 4차산업(지식산업) 발달, 자동차 보급, 도로 및 대중교통의 확충으로 농촌, 산촌, 어촌을 향해 떠나는 5차산업 (레저·휴양문화)이 발달하면서, 원산지에서 1차 생산, 2차 제조, 3차 판매 및 서비스가 융·복합되어 이루어지는 6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이로써 자발적 생활공간 이동이라는 인구분산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만한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정교한 제도, 정책,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별, 연령대, 직업군, 구성원, 주거형태, 교통수단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정주(定住), 생활(生活), 문화(文化)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별서’는 16세기 당시 이미 6차산업 거점이었다. 농(農)·림(林)·수산물(水産物)을 생산, 수확, 가공하여, 전국에서 찾아오는 시인(詩人) 묵객(墨客)들에게 5차 산업 서비스를 제공했던 현대판 6차산업의 중심공간이었다. 21세기 ‘농촌체류형 쉼터’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주인이 머무는 공간, 손님맞이 공간, 생산, 가공, 휴양시설 등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이웃과 함께 생활하며 문화를 공유하는 자연 속의 정원(庭苑)이자 문화경관(文化景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별서_1621’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본캐(本 character)다. 16세기 한국정원문화의 21세기 ‘환생(還生)’이자 ‘부활(復活)’이다. ‘별서_1622’, ‘별서_1623’, ‘별서_1624’, ‘별서_1625’… 한국정원문화 ‘별서(別墅)’의 미래다.

박경복 / 가든프로젝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