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장소, 조경(7)
소통+장소, 조경(7)
소통의 노하우: 관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조경가가 최종 결과물을 제시하는 해결자에서 벗어나 촉진자, 해석자,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전 글에서는 소통과 조경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조경가의 역할을 위와 같이 제시했었다.
이번 호부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1. 소통의 노하우
소통은 의욕만으로, 진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내 의도를 전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듣고 그러면서 상호 공통의 지평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신학기면 대학교 교정에 걸린 ‘교수법’을 알려주겠다는 플랜카드가,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 면담을 잘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는 인터넷상의 정보들이 말해 주고 있듯이 말이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 다루기 위해 매뉴얼이 필요한 것처럼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다.
대안기업 (주)상상공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신식품부와 함께 진행한 ‘문화이모작 시범 사업’의 최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마을 조사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다.
-
 지옥의 향연: 보마르초의 성스러운 숲, 괴물들의 공원
지옥의 향연: 보마르초의 성스러운 숲, 괴물들의 공원
Il Sacro Bosco di Bomarzo - Parco dei mostri 위치 _ Bomarzo (VT) Italia 보마르초, 비테르보, 이탈리아조성 시기 _ 1500년경
산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힘은 그 크기와 형태 등에서 인간과 각별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거대한 티베트의 신성한 카일라쉬산(Kailash)에서부터 임금의 터를 감싸고 있는 북악산(北岳), 일본인들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후지산(富士), 신들이 산다는 올림포스산(Olympus), 폼페이시(Pompei)를 삼켜버린 베수비오산(Vesuvio), 단군의 혼이 깃든 강화도 마니산, 로마의 나지막한 7개의 유서 깊은 언덕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 또한 다양하다. 인간은 산을 오르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전경을 즐기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위를 타고 올라가 살기도 하고 병풍처럼 두르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산이 자취를 감춘 곳에선 피라미드(Pyramid)나 지구라트(Giggurat), 신바빌로니아의 공중 정원(hanging gardens)처럼 산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인공적인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 의미가 어찌됐건 말이다. 깊숙한 산중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절과 같이 자유로운 사상을 보호하고 무더운 평지를 떠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린 잉카인들의 거주지도 산이었다.
-
 특별한 미래 선물, 하이라인 2공구를 가다
특별한 미래 선물, 하이라인 2공구를 가다
2009년 6월 뉴욕 맨해튼 서부에 하이라인(High Line) 공원이 문을 열었다. 30년간 도심의 흉물로 전락됐던 고가 철로가 아름다운 공원과 멋진 산책로로 다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 공원의 개장은 성공적이었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 뉴욕에는 또 다른 명물이 탄생되었고, 나아가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어 새로운 세수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해밀턴 라비노비츠 애슐러(Hamilton, Rabinovitz and Alschuler, Inc, HR&A)의 하이라인 재생의 가치를 따지는 경제보고서는 멋진 예언서가 되어버렸다.
이런 하이라인이 2009년 1공구의 개장 후 2년 만에 2공구를 개장하게 되었다. 2011년 6월 그 매력적인 공간이 뉴욕의 시민과 영성적인 방문객들에게 화려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1구간에 비해 2구간은 지난 작업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다채로워졌으며 지난 작업과 계획에 비해 성숙해 보였다. 확실히 경험은 중요하다.시설물 디자인은 과거보다 불필요한 힘을 뺏고 그로인해 현실적이 되었고, 통로들은 초기 계획대로 입체감이 넘쳤으며 지난 수년간 변한 주변의 경관과 시설 그리고 건축물과의 관계는 유연해졌다. 또한 결정적으로 조경은 훨씬 깊이가 있고 지혜롭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이라인의 거버넌스는 자신감과 충만감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가지게 된 것 같았다.
확실히 하이라인은 감동적이다. 일단 지상이 아닌 10m에 육박하는 높이에서 평소에 보기 힘든 도시 경관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다. 또한 철길이라 접근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기억이 묘한 흥분감을 안겨준다. 그리고 건물 사이로 난 좁은 철길 통로는 보행자를 심리적으로 대단히 압박하지만 사이사이 개방된 시각 통로들은 멋진 허드슨강을 그리고 뉴욕의 새로운 조망을 하늘 길로 연결해 놀라운 감흥을 전달해 준다. 이런 감흥은 꼭 낮이 아니라도 유효하다. 공식적으로 오전 7시에서 11시까지 개방하는 공원으로 석양을 등진 시간에도 번화가와는 다른 고즈넉한 풍광을 연출하는 웨스트 맨해튼의 밤 시간에도 묘한 감흥의 상승감은 여전하다.
필자의 하이라인에 대한 관심은 문화부에 근대 산업 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자문하던 때로 군산시의 구조선은행 재생과 옥구선, 아산시의 장항선과 도고온천역 활용 등 우리나라의 폐철도에 관한 문제로 한참 고민할 때였다. 이 폐철도 문제로 지역은 철거냐 보존이냐란 이슈로, 전문가들은 보존하되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로, 정부는 혹 예산 확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문제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할 때였다.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같은 문제로 이처럼 다른 고민과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쓴 웃음을 짓게 된다.
그러던 중 태평양을 건너 지역 갈등을 극복한 폐철도의 성공적 사례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이라인이었다. 이 하이라인에 대한 여러 보고서와 계획 그리고 10년간의 갈등 해소 과정에 자문단과 동료 교수 그리고 연구원들은 술렁댔고 최선을 다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찾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나와 하이라인의 첫 인연이었다. 사실 2009년 후 공개된 홈페이지와 마스터플랜 수많은 저널들의 자료 사진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왔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1차로는 하이라인의 정체성과 배경에 관한 문제였고, 둘째는 10년간 진행해온 거버넌스의 문제요. 셋째는 설계를 추진한 설계팀의 역량과 프로세스를 그리고 혹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요소는 없는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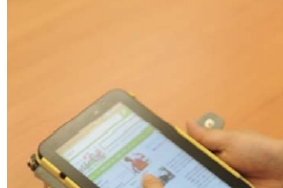 라펜트의 스마트 워킹 데이
라펜트의 스마트 워킹 데이
새로운 업무 환경에 직원들 간의 신뢰도 더욱 높아져미국 애플사에서 출시된 아이폰의 등장으로 스마트 워킹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아이폰을 국내 처음으로 출시한 KT는‘스마트 워킹 센터’를 개관하면서 지정된 부서를 대상으로 이미지 시범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워킹(smart Working)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성 있게 노트북,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로 많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오늘날 직장인들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조경 분야에서는 조경전문포털 사이트 라펜트(www.lafent.com)가‘스마트 워킹’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라펜트는 우선 매주 수요일을 스마트 워킹 데이로 정해 자신들의 업무를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유동적으로 처리하는 기존과 다른 업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업무 시스템이 가져다 주는 장점을 비롯해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알아보자. 편집자주
-
 2011년 시안(西安)세계원예박람회
2011년 시안(西安)세계원예박람회
중국 시안(西安)은 3,100여 년이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은 도시다. 그곳에서 마침 세계원예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지난 5월 경남과학기술대 강호철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함께 역사도시 기행을 겸하여 다녀왔다. 강교수는 “말이 원예박람회이지 내용적으로는 조경 분야에 더 가깝고 알찬 행사였다”며 사진과 함께 간략한 소식을 전해왔다.
시안 세계원예박람회는 일본과 같은 정교함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방대한 규모와 자국민들의 참여와 호응은 대단한 수준임을 느낄 수 있었다.우리나라도 지난 세기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1993년 대전 엑스포,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제적 행사를 통하여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한편 이 과정에 조경 분야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혼란스럽고 헝클어진 도시들은 이런 행사를 통하여 새롭게 정비되고 시민의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중국은 우리보다 후발 주자로 뛰어들어 발 빠르게 일련의 국제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소화해내는 중이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와 관람 인원이란 진기록을 남긴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 이어 올해는 ‘2011년 시안 세계원예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보유한 문화적 잠재력과 경제적 역동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사건이자 계기가 될 것이다.
박람회 개요·주제 _천인장안(天人長安), 창의자연(創意自然):인간 본위의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운 상생·엠블럼과 마스코트 _ 시화(市花)인 석류꽃을 형상화한 장안화(長安花)·행사 기간 _ 2011년 4월 28일~10월 22일(178일간)·규모 _ 410ha(약 126만 평, 호수 면적 57만 평 포함)·총 예산 _ 20억 위안(한화 약 3,300억 원)·관람 인원 _ 약 1,200만 명 추정·테마 전시원 _ 110개소·참여 국가 _�34개국·상징적 건축물 _ 장안탑(長安塔, 높이 99m)·5대 테마- 장안화곡(長安花谷)_ 다양한 초화류를 이용한 대규모 꽃동산- 오채종남(五彩終南)_ 중국의 중앙공원격인 진령(秦嶺)의 모형- 해외대관(海外大觀)_ 해외 전시관- 패상채홍(覇上彩虹)_ 수변에 어울리는 디자인(Waterfront 등)- 사로화우(絲路花雨)_ 꽃과 녹색으로 연출한 예술(토피아리 등)
-
 건축 분야의 조경공정 시나리오 읽기
건축 분야의 조경공정 시나리오 읽기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중국 동북부 변방의 역사를 연구한다면서 내심으로는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변방 역사에 편입시키려 하는 중국의 국가 차원적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중국에 편입시키겠다는 전략의 전초전으로 역사·문화적 선제공격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이른 바, 힘 있는 대국 중국이 상대적으로 힘 약한 한국을 왜곡된 역사·문화적 토대 구축을 근거로 종국엔 영토 이익 확보 차원의 국가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기에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건축기본법에 의거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위원회의 힘을 배경으로 건축 분야가 조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영역을 흡수하겠다는 이른 바, ‘건축 분야의 조경공정 프로젝트’가 지속적이며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년이면 조경학과가 개설된 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국에 45개 대학․대학원에 조경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매년 대학에서 약 2,000명 정도의 조경가들이 배출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학에서의 조경전문인 배출 인력이 세계 제 2위의 조경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한민국 조경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조선일보 보도 사건은 건축 분야의 외연적 확산을 위한 여론화 작업6월 28일자 조선일보 2면에 게재된 베스트 & 워스트 기사에서 건축가들의 건축물 평가는 현재 조경 전문 분야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 우리의 젊은 조경가들이 www.chosun.com에 엄청난 댓글을 남기고 있다. 이 젊은 피들이 몇몇 건축가들과 전면전을 치루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분히 가소롭다는 감정 차원을 넘어 울분을 토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겐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왜 그들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이용해 남의 이름을 가로채는 부도덕한 일을, 그렇게 한 푼의 도덕적 가책도 없이 당연하듯이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 얼마 전 어떤 한 건축물 준공식에 건축설계가를 초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계 전체가 나서서 성토하는 등 난리를 친 적이 있다. 건축 영역에 대한 나름대로 건축가의 전문 분야적 크레딧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2010년 조경기본법을 발의하자, 조경 등 관련 분야가 건축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조경의 건축 영역화를 시도했다. 또 근자엔 도시 공간의 옥상 녹화 사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아닌 건축법에 규정하려 하고 있다. 이번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선유도 공원을 평가함에 있어 마치 공원이 건축 분야의 일부라는 뉘앙스로 보도되고 있으며, 나아가 결론적으로 청계천, 광화문광장 등 외부 공간을 건축가가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일과성의 주장이 아니라, 다분히 조경 분야에 대해 무언가를 은밀하게 시도하는 매우 전략적 시나리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
 제 48회 세계조경가협회 총회
제 48회 세계조경가협회 총회
48th IFLA World Congress 2010, Zurich, Switzerland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제 48회 세계조경가협회 총회는 ‘From Urban Landscapes to Alpine Gardens(도시조경부터 알프스 정원까지)’ 라는 부주제가 설명해주 듯 갈 수록 다양해져가는 현 조경의 스케일과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개최되었다. 스위스 조경가협회(BSLA: Bund Shweizer Landschaftsarchitekten und Landschaftsarchitektinnen)와 녹색 도시 취리히(Gr?n Stadt Z?rich)의 주최로 열린 이번 총회는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35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조경가, 도시계획가, 학자, 미디어 및 정부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에서는8명의 기조 연설자를 토대로 100여 개의 워크샵 및 논문 발표와 36곳의 조경 공간 현장 답사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취리히 시장 Corine Mauch과 IFLA 회장 Desiree Martinez의 환영사, 그리고 총회 참석자를 위해 조경과 녹지, 자연 경관에 포커스되어 자세히 소개된 취리히와 스위스 관광책자 역시 눈에 띄였으며, 세계2차대전 이후 1956년 이미 제 4회 총회를 주최한 도시로서 IFLA와 취리히의 긴 역사적 관계 또한 맛볼 수 있는 자리였다.
올해의 주제가 자연의 다양한 스케일인만큼 총회 기간 3일이 각각 Urban(도심), Peri-urban (도심 외곽), 그리고 Rural(지방/시골)이라는 테마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 세가지 지리적 경계선이 경제 문화 등 많은 면에서 서로 겹치는 점을 감안할때 강연과 워크샵 구조에 확연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듯 싶다. 하지만 많은 조경 담론이 도심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지방과 농촌, 시골 등 도시 외 영역의 조경을 탐색하고자 하는 취지가 신선하였으며, Peri-urban과 Rural은 앞으로 더 주목받아야 할 토픽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기조연설은 건축과 조경, 어바니즘의 경험을 두루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8팀이 참여했으며, 정원과 기후 변화에서부터 최근 이집트 시위가 일어난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 Tahrir Square등 역사, 현대 정치에 이르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조경의 의의를 다시한 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스위스 취리히 Hager Landschaftsarchitektur 조경사무소의 디렉터 Guido Hager, 미국 뉴욕대에서 건축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Mohamed Elshahed, 스위스 Meili Peter Architekten 건축사무소의 디렉터 및 ETH Zurich 교수 Marcel Meili, 스위스와 독일의 yellow z 어바니즘 사무소 디렉터 Michael Koch와 Maresa Schumacher, 중국 베이징 Turenscape의 Kongjian Yu, 스위스 자연보존재단의 상무이사 Raimund Rodewald, 스위스의 환경과학 및 기후변화 전문가 Andreas Spiegel와 미국 미시간대 조경학과 교수 Joan Iverson Nassauer로 이루어졌고, 네덜란드 MVRDV의 Winy Maas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토크샵과 논문 발표 주제들도 다양했는데, 도시농업, 도심 녹지의 밀도화, 미래의 레저 옵션, 임시 오픈스페이스, 정원 보존, 푸드 어바니즘, 도시의 수경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랜드스케이프 세션들이 특히 인기가 많았고, 각 토크샵마다 각국에서 온 3~5명의 디자이너와 조경학자의 발표가 있었다. 또한 ETH Zurich와 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스위스 국가과학재단) 등 스위스의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리서치 토픽들을 워크샵을 통해 방문할 수 있었고, Topos가 마련한 ‘Open Space, Freedom and Communication’의 오픈 토론회는 민주주의와 공공 장소의 관계,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인터넷 매체가 공공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재조명하였다. 학생작품공모전은 올해 38개국에서 총 361 작품이 출품되었고 이 중 반이 넘는 203작품이 중국에서 나왔으나 한국은 3작품에 그쳤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도시 내부 조경에 관한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도시와 농촌의 접점에 대한 창의적인 작품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생태 문제에 관련된 기술적인 접근 방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분석과 디자인이 골고루 이루어진 작품들 역시 부족했다는 충고 또한 들을 수 있었다. 1등상인 Group Han Prize는 그리스 아테네 공대 학생 3명의 작품 Layers of Time이 수상하였다.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중요한 생태계 중 하나인 Kotchi 석호가 자연적으로 진화해가는 과정과 현재 개발 패턴의 문제점을 지적, 시간이라는 렌즈를 통해 석호 주변 동식물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움직임을 서서히 늘려가는 시적이면서 최소 개입이 가능했던 방안이다. 2등상 Zvi Miller Prize는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생 2명의 작품인 Vibrant Land가 수상하였는데, 미국 노스캐롤라이주 해안에 방벽섬 역할이 가능한 레크리에이션 목재 구조를 디자인함으로써 바다로부터 거주 지역을 보호하며 거주와 놀이가 동시에 가능한 해안 공간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3등상인 BSLA Merit Award는 미국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생 3명이 출품한 Vertical Densities로, 3개의 교외 지역이 만나는 전 군기지 사이트에 홍수 제지와 담수 보충 능력을 키우고 풍력 에너지 기술을 시험할 수 공간을 조성, 주변의 지역 환경과 경제 발전을 둘 다 고려한 작품으로 채택되었다. 이 외에도 중국, 덴마크, 미국, 독일의7팀에게 Jury Awards가 주어졌다.
Topos조경상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Institute for Landscape Planning and Ecology의 디렉터이자 교수로 있는 Antje Stokman에게 주어졌다. 지난 몇 년간 Chris Reed의 Stoss LU같은 젊은 회사들을 중심으로 주어지고 있는 이 조경상은 올해에는 처음으로 회사가 아닌 개인(여성) 조경가에게 주어져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Stokman은 수역 지구와 생태계 관리에 관한 리서치를 통해 도시와 지역간의 조경 관련 문제점을 조사하고 여러 학문 분야의 활발한 협력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음으로써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IFLA가 조경가에게 주는 최고 영예의 상인 Geoffrey Jellicoe Award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활동하는 Cornelia Hahn Oberlander(b. 1924)에게 돌아갔다. 지난 2004년 처음 설립되어 매 4년마다 주어지는 제프리젤리코 상은 평생 조경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사회와 환경의 복지뿐만 아니라 조경 전 분야에 걸쳐 기여한 업적이 큰 조경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47년 하버드에서 조경을 전공한 Oberlander는 초기 시절 주로 캐나다 민간 임대 주택 커뮤니티와 아이들 놀이터 공간의 프로젝트를 맡았고, 이 중 1967년 몬트리올 Expo에 디자인한 Children’s Creative Center가 잘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미국 뉴욕의 뉴욕타임즈 빌딩의 정원, 캐나다 밴쿠버의 롭슨광장 Robson Square과 UBC대학 인류학 박물관 등 지난 60년간 수많은 조경 프로젝트에 몸담아 왔다.
Korea, FLA World Congress 2018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다. 2018년 세계조경가협회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992년에 이어 다시 한번 영광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특히 2018년에는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여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
 창경궁
창경궁
Changgyeonggung창경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1번지에 위치하며, 성종 14년(1483)에 세조비 정희왕후, 예종비 안순왕후, 덕종비 소혜왕후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옛 수강궁터에 창건한 궁이다. 창덕궁과 연결되어 동궐이라는 하나의 궁역을 형성하면서, 독립적인 궁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창덕궁의 모자란 주거 공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 61,500㎡(20,100여 평)일원에 명정전, 홍화문, 명정문 및 행각, 옥천교, 통명전 등에서 자연과 인공이 화합하는 순응의 미학을 공간적, 지형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1963년 1월 18일 사적 제123호로 지정되었다.
-
 제21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
제21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
어제와 같은 오늘, 조경의 미래는 없다어느덧 성인의 나이를 넘겨 21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가 지난 5월 20일 (금) 광나루 한강공원 제3축구장에서 열렸다. 이날은 눈부신 하늘을 가지진 못했지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내리는 비로 참가자들의 친목이 더욱 빛이 난 대회였다.
제21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금년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는 간간히 내리는 비로 입장식은 생략하고 국민의례와 김은성 수석부회장((주)한국조경사회)의 내·외빈 소개로 시작되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주)한국조경사회의 김윤제, 권오준, 유의열, 윤성수, 김기성, 강인철, 유길종, 이용훈, 이유경 고문과, 김경윤 명예회장, 그리고 전문건설조경협의회 김충일 회장, 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이세근 회장, 공원시설협동조합 노영일 이사장,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지회 강완수 부회장, 상명대 이재근 부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해 체육대회를 빛내주었다.
이민우 회장((주)한국조경사회)은 개회사를 통해 업계에 몰아닥친 불황의 그림자로 참여 회원사가 적으리라는 생각과 다르게 많은 회원사가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김윤제 고문은 조경인 체육대회의 자취를 살피며 앞으로도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대한민국 조경이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최종필 부회장의 개회 선언과 지난해 우승자 최웅재(서안알앤디) 씨의 선수단 선서를 마친 후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본 경기가시작되었다.
<중략>넓은 시야를 가지고 변화 모색할 때초기의 체육대회는 단순하게 친목을 다지는 친선경기였다. 이것이 모태가 되어 점차 참여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결속을 다지거나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조경인들의 큰 행사로 자리 잡게 됐다. 초창기에는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아 교류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큰 의미를 가졌다.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게임을 하면서 협동과 친목으로 조경인으로서의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점차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기보다는 동일한 경기 운영으로 형식적인만남을 가지는 등 일차적인 기능만을 해왔다. 이제는 조경인 체육대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를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조경인 체육대회는 조경 분야 종사자들의 하나 된 마음을 확인하고 이를 확대시켜 한국 조경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재충전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단지 하루 잘 놀다가 오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경인 체육대회의 취지와 의미를 한국 조경이라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조경을 포함한 모든 분야는 인류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원대한 목표와 행동에 동참하는 계획과 도전을 가진다면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경, 건축, 도시 분야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업을 도모하는 장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제 조경 분야도 내부 결속을 위한 친목 도모를 뛰어 넘어 타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밥그릇 차지를 위한 배타적인 결속 및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타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힘과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 주길 기대해 본다.
-
 덕수궁
덕수궁
Deoksugung造營_ 덕수궁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집이었으나, 선조가 임진왜란으로 피난을 갔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궁이 모두 불타버려 이곳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게 되면서 정릉동 행궁이라 불리었다. 선조가 죽은 후 광해군이 이 행궁의 즉조당卽祚堂에서 즉위하고, 1611년 행궁을 궁궐로 높이며, 경운궁慶運宮이라는 궁호를 붙였다. 그러나 광해군은 창덕궁이 모두 중건된 1615년 4월 창덕궁으로 다시 옮겨갔고, 선조의 계비인 인목 대비(1584~1632)를 한 때 이곳에 유폐시켰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인조 역시 이곳 즉조당에서 즉위한 후 창덕궁으로 옮겨갔다. 그 후 270여 년 동안 경운궁은 궁궐로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왕실에서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영조가 선조의 환도 삼주갑三周甲을 맞아 이곳에 찾아와 배례를 행한 일 정도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 덕수궁이 다시 왕궁으로 부각된 것은 고종 때이며, 재위 말년에 약 10여 년 동안 정치적 혼란의 주 무대였다. 고종은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이듬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면서(아관파천俄館播遷) 러시아 공관 옆에 있던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때를 전후하여 궁 안에 많은 건물들이 지어졌고, 그제야 덕수궁은 궁궐다운 장대한 전각을 갖추게 되었다. 역대 임금의 영정을 모신 진전眞殿과 궁의 정전인 중화전中和殿등이 이때 세워졌으며, 정관헌靜觀軒, 돈덕전 등 서양식 건물도 일부 들어섰다. 고종이 경운궁에 머무르고 있던 1904년 궁에 큰 불이 나, 전각이 대부분 타버렸으며, 곧 복구에 착수하여 이듬해인 1905년에 즉조당, 석어당, 경효전, 준명전, 흠문각, 함녕전 등을 중건하고, 중화문 등을 세웠다. 1906년에는 정전인 중화전을 완성하고 대안문大安門도 수리했는데, 이 문은 그때부터 대한문大漢門으로 이름을 바꾸고 궁의 정문으로 사용했다.
 소통+장소, 조경(7)
소통의 노하우: 관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조경가가 최종 결과물을 제시하는 해결자에서 벗어나 촉진자, 해석자,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전 글에서는 소통과 조경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조경가의 역할을 위와 같이 제시했었다. 이번 호부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1. 소통의 노하우 소통은 의욕만으로, 진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내 의도를 전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듣고 그러면서 상호 공통의 지평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신학기면 대학교 교정에 걸린 ‘교수법’을 알려주겠다는 플랜카드가,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 면담을 잘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는 인터넷상의 정보들이 말해 주고 있듯이 말이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 다루기 위해 매뉴얼이 필요한 것처럼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다. 대안기업 (주)상상공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신식품부와 함께 진행한 ‘문화이모작 시범 사업’의 최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마을 조사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다.
소통+장소, 조경(7)
소통의 노하우: 관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조경가가 최종 결과물을 제시하는 해결자에서 벗어나 촉진자, 해석자,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전 글에서는 소통과 조경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조경가의 역할을 위와 같이 제시했었다. 이번 호부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1. 소통의 노하우 소통은 의욕만으로, 진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내 의도를 전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듣고 그러면서 상호 공통의 지평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신학기면 대학교 교정에 걸린 ‘교수법’을 알려주겠다는 플랜카드가,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 면담을 잘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는 인터넷상의 정보들이 말해 주고 있듯이 말이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 다루기 위해 매뉴얼이 필요한 것처럼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다. 대안기업 (주)상상공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신식품부와 함께 진행한 ‘문화이모작 시범 사업’의 최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마을 조사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다. 지옥의 향연: 보마르초의 성스러운 숲, 괴물들의 공원
Il Sacro Bosco di Bomarzo - Parco dei mostri 위치 _ Bomarzo (VT) Italia 보마르초, 비테르보, 이탈리아조성 시기 _ 1500년경 산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힘은 그 크기와 형태 등에서 인간과 각별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거대한 티베트의 신성한 카일라쉬산(Kailash)에서부터 임금의 터를 감싸고 있는 북악산(北岳), 일본인들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후지산(富士), 신들이 산다는 올림포스산(Olympus), 폼페이시(Pompei)를 삼켜버린 베수비오산(Vesuvio), 단군의 혼이 깃든 강화도 마니산, 로마의 나지막한 7개의 유서 깊은 언덕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 또한 다양하다. 인간은 산을 오르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전경을 즐기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위를 타고 올라가 살기도 하고 병풍처럼 두르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산이 자취를 감춘 곳에선 피라미드(Pyramid)나 지구라트(Giggurat), 신바빌로니아의 공중 정원(hanging gardens)처럼 산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인공적인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 의미가 어찌됐건 말이다. 깊숙한 산중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절과 같이 자유로운 사상을 보호하고 무더운 평지를 떠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린 잉카인들의 거주지도 산이었다.
지옥의 향연: 보마르초의 성스러운 숲, 괴물들의 공원
Il Sacro Bosco di Bomarzo - Parco dei mostri 위치 _ Bomarzo (VT) Italia 보마르초, 비테르보, 이탈리아조성 시기 _ 1500년경 산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힘은 그 크기와 형태 등에서 인간과 각별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거대한 티베트의 신성한 카일라쉬산(Kailash)에서부터 임금의 터를 감싸고 있는 북악산(北岳), 일본인들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후지산(富士), 신들이 산다는 올림포스산(Olympus), 폼페이시(Pompei)를 삼켜버린 베수비오산(Vesuvio), 단군의 혼이 깃든 강화도 마니산, 로마의 나지막한 7개의 유서 깊은 언덕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 또한 다양하다. 인간은 산을 오르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전경을 즐기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위를 타고 올라가 살기도 하고 병풍처럼 두르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산이 자취를 감춘 곳에선 피라미드(Pyramid)나 지구라트(Giggurat), 신바빌로니아의 공중 정원(hanging gardens)처럼 산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인공적인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 의미가 어찌됐건 말이다. 깊숙한 산중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절과 같이 자유로운 사상을 보호하고 무더운 평지를 떠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린 잉카인들의 거주지도 산이었다. 특별한 미래 선물, 하이라인 2공구를 가다
2009년 6월 뉴욕 맨해튼 서부에 하이라인(High Line) 공원이 문을 열었다. 30년간 도심의 흉물로 전락됐던 고가 철로가 아름다운 공원과 멋진 산책로로 다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 공원의 개장은 성공적이었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 뉴욕에는 또 다른 명물이 탄생되었고, 나아가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어 새로운 세수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해밀턴 라비노비츠 애슐러(Hamilton, Rabinovitz and Alschuler, Inc, HR&A)의 하이라인 재생의 가치를 따지는 경제보고서는 멋진 예언서가 되어버렸다. 이런 하이라인이 2009년 1공구의 개장 후 2년 만에 2공구를 개장하게 되었다. 2011년 6월 그 매력적인 공간이 뉴욕의 시민과 영성적인 방문객들에게 화려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1구간에 비해 2구간은 지난 작업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다채로워졌으며 지난 작업과 계획에 비해 성숙해 보였다. 확실히 경험은 중요하다.시설물 디자인은 과거보다 불필요한 힘을 뺏고 그로인해 현실적이 되었고, 통로들은 초기 계획대로 입체감이 넘쳤으며 지난 수년간 변한 주변의 경관과 시설 그리고 건축물과의 관계는 유연해졌다. 또한 결정적으로 조경은 훨씬 깊이가 있고 지혜롭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이라인의 거버넌스는 자신감과 충만감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가지게 된 것 같았다. 확실히 하이라인은 감동적이다. 일단 지상이 아닌 10m에 육박하는 높이에서 평소에 보기 힘든 도시 경관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다. 또한 철길이라 접근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기억이 묘한 흥분감을 안겨준다. 그리고 건물 사이로 난 좁은 철길 통로는 보행자를 심리적으로 대단히 압박하지만 사이사이 개방된 시각 통로들은 멋진 허드슨강을 그리고 뉴욕의 새로운 조망을 하늘 길로 연결해 놀라운 감흥을 전달해 준다. 이런 감흥은 꼭 낮이 아니라도 유효하다. 공식적으로 오전 7시에서 11시까지 개방하는 공원으로 석양을 등진 시간에도 번화가와는 다른 고즈넉한 풍광을 연출하는 웨스트 맨해튼의 밤 시간에도 묘한 감흥의 상승감은 여전하다. 필자의 하이라인에 대한 관심은 문화부에 근대 산업 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자문하던 때로 군산시의 구조선은행 재생과 옥구선, 아산시의 장항선과 도고온천역 활용 등 우리나라의 폐철도에 관한 문제로 한참 고민할 때였다. 이 폐철도 문제로 지역은 철거냐 보존이냐란 이슈로, 전문가들은 보존하되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로, 정부는 혹 예산 확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문제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할 때였다.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같은 문제로 이처럼 다른 고민과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쓴 웃음을 짓게 된다. 그러던 중 태평양을 건너 지역 갈등을 극복한 폐철도의 성공적 사례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이라인이었다. 이 하이라인에 대한 여러 보고서와 계획 그리고 10년간의 갈등 해소 과정에 자문단과 동료 교수 그리고 연구원들은 술렁댔고 최선을 다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찾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나와 하이라인의 첫 인연이었다. 사실 2009년 후 공개된 홈페이지와 마스터플랜 수많은 저널들의 자료 사진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왔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1차로는 하이라인의 정체성과 배경에 관한 문제였고, 둘째는 10년간 진행해온 거버넌스의 문제요. 셋째는 설계를 추진한 설계팀의 역량과 프로세스를 그리고 혹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요소는 없는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미래 선물, 하이라인 2공구를 가다
2009년 6월 뉴욕 맨해튼 서부에 하이라인(High Line) 공원이 문을 열었다. 30년간 도심의 흉물로 전락됐던 고가 철로가 아름다운 공원과 멋진 산책로로 다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 공원의 개장은 성공적이었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 뉴욕에는 또 다른 명물이 탄생되었고, 나아가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어 새로운 세수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해밀턴 라비노비츠 애슐러(Hamilton, Rabinovitz and Alschuler, Inc, HR&A)의 하이라인 재생의 가치를 따지는 경제보고서는 멋진 예언서가 되어버렸다. 이런 하이라인이 2009년 1공구의 개장 후 2년 만에 2공구를 개장하게 되었다. 2011년 6월 그 매력적인 공간이 뉴욕의 시민과 영성적인 방문객들에게 화려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1구간에 비해 2구간은 지난 작업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다채로워졌으며 지난 작업과 계획에 비해 성숙해 보였다. 확실히 경험은 중요하다.시설물 디자인은 과거보다 불필요한 힘을 뺏고 그로인해 현실적이 되었고, 통로들은 초기 계획대로 입체감이 넘쳤으며 지난 수년간 변한 주변의 경관과 시설 그리고 건축물과의 관계는 유연해졌다. 또한 결정적으로 조경은 훨씬 깊이가 있고 지혜롭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이라인의 거버넌스는 자신감과 충만감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가지게 된 것 같았다. 확실히 하이라인은 감동적이다. 일단 지상이 아닌 10m에 육박하는 높이에서 평소에 보기 힘든 도시 경관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다. 또한 철길이라 접근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기억이 묘한 흥분감을 안겨준다. 그리고 건물 사이로 난 좁은 철길 통로는 보행자를 심리적으로 대단히 압박하지만 사이사이 개방된 시각 통로들은 멋진 허드슨강을 그리고 뉴욕의 새로운 조망을 하늘 길로 연결해 놀라운 감흥을 전달해 준다. 이런 감흥은 꼭 낮이 아니라도 유효하다. 공식적으로 오전 7시에서 11시까지 개방하는 공원으로 석양을 등진 시간에도 번화가와는 다른 고즈넉한 풍광을 연출하는 웨스트 맨해튼의 밤 시간에도 묘한 감흥의 상승감은 여전하다. 필자의 하이라인에 대한 관심은 문화부에 근대 산업 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자문하던 때로 군산시의 구조선은행 재생과 옥구선, 아산시의 장항선과 도고온천역 활용 등 우리나라의 폐철도에 관한 문제로 한참 고민할 때였다. 이 폐철도 문제로 지역은 철거냐 보존이냐란 이슈로, 전문가들은 보존하되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로, 정부는 혹 예산 확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문제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할 때였다.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같은 문제로 이처럼 다른 고민과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쓴 웃음을 짓게 된다. 그러던 중 태평양을 건너 지역 갈등을 극복한 폐철도의 성공적 사례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이라인이었다. 이 하이라인에 대한 여러 보고서와 계획 그리고 10년간의 갈등 해소 과정에 자문단과 동료 교수 그리고 연구원들은 술렁댔고 최선을 다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찾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나와 하이라인의 첫 인연이었다. 사실 2009년 후 공개된 홈페이지와 마스터플랜 수많은 저널들의 자료 사진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왔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1차로는 하이라인의 정체성과 배경에 관한 문제였고, 둘째는 10년간 진행해온 거버넌스의 문제요. 셋째는 설계를 추진한 설계팀의 역량과 프로세스를 그리고 혹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요소는 없는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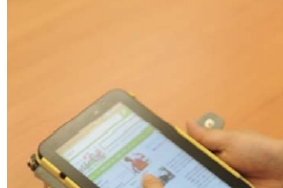 라펜트의 스마트 워킹 데이
새로운 업무 환경에 직원들 간의 신뢰도 더욱 높아져미국 애플사에서 출시된 아이폰의 등장으로 스마트 워킹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아이폰을 국내 처음으로 출시한 KT는‘스마트 워킹 센터’를 개관하면서 지정된 부서를 대상으로 이미지 시범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워킹(smart Working)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성 있게 노트북,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로 많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오늘날 직장인들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조경 분야에서는 조경전문포털 사이트 라펜트(www.lafent.com)가‘스마트 워킹’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라펜트는 우선 매주 수요일을 스마트 워킹 데이로 정해 자신들의 업무를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유동적으로 처리하는 기존과 다른 업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업무 시스템이 가져다 주는 장점을 비롯해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알아보자. 편집자주
라펜트의 스마트 워킹 데이
새로운 업무 환경에 직원들 간의 신뢰도 더욱 높아져미국 애플사에서 출시된 아이폰의 등장으로 스마트 워킹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아이폰을 국내 처음으로 출시한 KT는‘스마트 워킹 센터’를 개관하면서 지정된 부서를 대상으로 이미지 시범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워킹(smart Working)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성 있게 노트북,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로 많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오늘날 직장인들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조경 분야에서는 조경전문포털 사이트 라펜트(www.lafent.com)가‘스마트 워킹’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라펜트는 우선 매주 수요일을 스마트 워킹 데이로 정해 자신들의 업무를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유동적으로 처리하는 기존과 다른 업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업무 시스템이 가져다 주는 장점을 비롯해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알아보자. 편집자주 2011년 시안(西安)세계원예박람회
중국 시안(西安)은 3,100여 년이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은 도시다. 그곳에서 마침 세계원예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지난 5월 경남과학기술대 강호철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함께 역사도시 기행을 겸하여 다녀왔다. 강교수는 “말이 원예박람회이지 내용적으로는 조경 분야에 더 가깝고 알찬 행사였다”며 사진과 함께 간략한 소식을 전해왔다. 시안 세계원예박람회는 일본과 같은 정교함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방대한 규모와 자국민들의 참여와 호응은 대단한 수준임을 느낄 수 있었다.우리나라도 지난 세기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1993년 대전 엑스포,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제적 행사를 통하여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한편 이 과정에 조경 분야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혼란스럽고 헝클어진 도시들은 이런 행사를 통하여 새롭게 정비되고 시민의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중국은 우리보다 후발 주자로 뛰어들어 발 빠르게 일련의 국제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소화해내는 중이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와 관람 인원이란 진기록을 남긴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 이어 올해는 ‘2011년 시안 세계원예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보유한 문화적 잠재력과 경제적 역동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사건이자 계기가 될 것이다. 박람회 개요·주제 _천인장안(天人長安), 창의자연(創意自然):인간 본위의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운 상생·엠블럼과 마스코트 _ 시화(市花)인 석류꽃을 형상화한 장안화(長安花)·행사 기간 _ 2011년 4월 28일~10월 22일(178일간)·규모 _ 410ha(약 126만 평, 호수 면적 57만 평 포함)·총 예산 _ 20억 위안(한화 약 3,300억 원)·관람 인원 _ 약 1,200만 명 추정·테마 전시원 _ 110개소·참여 국가 _�34개국·상징적 건축물 _ 장안탑(長安塔, 높이 99m)·5대 테마- 장안화곡(長安花谷)_ 다양한 초화류를 이용한 대규모 꽃동산- 오채종남(五彩終南)_ 중국의 중앙공원격인 진령(秦嶺)의 모형- 해외대관(海外大觀)_ 해외 전시관- 패상채홍(覇上彩虹)_ 수변에 어울리는 디자인(Waterfront 등)- 사로화우(絲路花雨)_ 꽃과 녹색으로 연출한 예술(토피아리 등)
2011년 시안(西安)세계원예박람회
중국 시안(西安)은 3,100여 년이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은 도시다. 그곳에서 마침 세계원예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지난 5월 경남과학기술대 강호철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함께 역사도시 기행을 겸하여 다녀왔다. 강교수는 “말이 원예박람회이지 내용적으로는 조경 분야에 더 가깝고 알찬 행사였다”며 사진과 함께 간략한 소식을 전해왔다. 시안 세계원예박람회는 일본과 같은 정교함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방대한 규모와 자국민들의 참여와 호응은 대단한 수준임을 느낄 수 있었다.우리나라도 지난 세기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1993년 대전 엑스포,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제적 행사를 통하여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한편 이 과정에 조경 분야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혼란스럽고 헝클어진 도시들은 이런 행사를 통하여 새롭게 정비되고 시민의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중국은 우리보다 후발 주자로 뛰어들어 발 빠르게 일련의 국제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소화해내는 중이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와 관람 인원이란 진기록을 남긴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 이어 올해는 ‘2011년 시안 세계원예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보유한 문화적 잠재력과 경제적 역동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사건이자 계기가 될 것이다. 박람회 개요·주제 _천인장안(天人長安), 창의자연(創意自然):인간 본위의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운 상생·엠블럼과 마스코트 _ 시화(市花)인 석류꽃을 형상화한 장안화(長安花)·행사 기간 _ 2011년 4월 28일~10월 22일(178일간)·규모 _ 410ha(약 126만 평, 호수 면적 57만 평 포함)·총 예산 _ 20억 위안(한화 약 3,300억 원)·관람 인원 _ 약 1,200만 명 추정·테마 전시원 _ 110개소·참여 국가 _�34개국·상징적 건축물 _ 장안탑(長安塔, 높이 99m)·5대 테마- 장안화곡(長安花谷)_ 다양한 초화류를 이용한 대규모 꽃동산- 오채종남(五彩終南)_ 중국의 중앙공원격인 진령(秦嶺)의 모형- 해외대관(海外大觀)_ 해외 전시관- 패상채홍(覇上彩虹)_ 수변에 어울리는 디자인(Waterfront 등)- 사로화우(絲路花雨)_ 꽃과 녹색으로 연출한 예술(토피아리 등) 건축 분야의 조경공정 시나리오 읽기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중국 동북부 변방의 역사를 연구한다면서 내심으로는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변방 역사에 편입시키려 하는 중국의 국가 차원적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중국에 편입시키겠다는 전략의 전초전으로 역사·문화적 선제공격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이른 바, 힘 있는 대국 중국이 상대적으로 힘 약한 한국을 왜곡된 역사·문화적 토대 구축을 근거로 종국엔 영토 이익 확보 차원의 국가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기에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건축기본법에 의거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위원회의 힘을 배경으로 건축 분야가 조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영역을 흡수하겠다는 이른 바, ‘건축 분야의 조경공정 프로젝트’가 지속적이며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년이면 조경학과가 개설된 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국에 45개 대학․대학원에 조경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매년 대학에서 약 2,000명 정도의 조경가들이 배출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학에서의 조경전문인 배출 인력이 세계 제 2위의 조경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한민국 조경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조선일보 보도 사건은 건축 분야의 외연적 확산을 위한 여론화 작업6월 28일자 조선일보 2면에 게재된 베스트 & 워스트 기사에서 건축가들의 건축물 평가는 현재 조경 전문 분야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 우리의 젊은 조경가들이 www.chosun.com에 엄청난 댓글을 남기고 있다. 이 젊은 피들이 몇몇 건축가들과 전면전을 치루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분히 가소롭다는 감정 차원을 넘어 울분을 토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겐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왜 그들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이용해 남의 이름을 가로채는 부도덕한 일을, 그렇게 한 푼의 도덕적 가책도 없이 당연하듯이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 얼마 전 어떤 한 건축물 준공식에 건축설계가를 초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계 전체가 나서서 성토하는 등 난리를 친 적이 있다. 건축 영역에 대한 나름대로 건축가의 전문 분야적 크레딧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2010년 조경기본법을 발의하자, 조경 등 관련 분야가 건축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조경의 건축 영역화를 시도했다. 또 근자엔 도시 공간의 옥상 녹화 사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아닌 건축법에 규정하려 하고 있다. 이번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선유도 공원을 평가함에 있어 마치 공원이 건축 분야의 일부라는 뉘앙스로 보도되고 있으며, 나아가 결론적으로 청계천, 광화문광장 등 외부 공간을 건축가가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일과성의 주장이 아니라, 다분히 조경 분야에 대해 무언가를 은밀하게 시도하는 매우 전략적 시나리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건축 분야의 조경공정 시나리오 읽기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중국 동북부 변방의 역사를 연구한다면서 내심으로는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변방 역사에 편입시키려 하는 중국의 국가 차원적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중국에 편입시키겠다는 전략의 전초전으로 역사·문화적 선제공격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이른 바, 힘 있는 대국 중국이 상대적으로 힘 약한 한국을 왜곡된 역사·문화적 토대 구축을 근거로 종국엔 영토 이익 확보 차원의 국가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기에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건축기본법에 의거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위원회의 힘을 배경으로 건축 분야가 조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영역을 흡수하겠다는 이른 바, ‘건축 분야의 조경공정 프로젝트’가 지속적이며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년이면 조경학과가 개설된 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국에 45개 대학․대학원에 조경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매년 대학에서 약 2,000명 정도의 조경가들이 배출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학에서의 조경전문인 배출 인력이 세계 제 2위의 조경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한민국 조경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조선일보 보도 사건은 건축 분야의 외연적 확산을 위한 여론화 작업6월 28일자 조선일보 2면에 게재된 베스트 & 워스트 기사에서 건축가들의 건축물 평가는 현재 조경 전문 분야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 우리의 젊은 조경가들이 www.chosun.com에 엄청난 댓글을 남기고 있다. 이 젊은 피들이 몇몇 건축가들과 전면전을 치루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분히 가소롭다는 감정 차원을 넘어 울분을 토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겐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왜 그들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이용해 남의 이름을 가로채는 부도덕한 일을, 그렇게 한 푼의 도덕적 가책도 없이 당연하듯이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 얼마 전 어떤 한 건축물 준공식에 건축설계가를 초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계 전체가 나서서 성토하는 등 난리를 친 적이 있다. 건축 영역에 대한 나름대로 건축가의 전문 분야적 크레딧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2010년 조경기본법을 발의하자, 조경 등 관련 분야가 건축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조경의 건축 영역화를 시도했다. 또 근자엔 도시 공간의 옥상 녹화 사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아닌 건축법에 규정하려 하고 있다. 이번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선유도 공원을 평가함에 있어 마치 공원이 건축 분야의 일부라는 뉘앙스로 보도되고 있으며, 나아가 결론적으로 청계천, 광화문광장 등 외부 공간을 건축가가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일과성의 주장이 아니라, 다분히 조경 분야에 대해 무언가를 은밀하게 시도하는 매우 전략적 시나리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제 48회 세계조경가협회 총회
48th IFLA World Congress 2010, Zurich, Switzerland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제 48회 세계조경가협회 총회는 ‘From Urban Landscapes to Alpine Gardens(도시조경부터 알프스 정원까지)’ 라는 부주제가 설명해주 듯 갈 수록 다양해져가는 현 조경의 스케일과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개최되었다. 스위스 조경가협회(BSLA: Bund Shweizer Landschaftsarchitekten und Landschaftsarchitektinnen)와 녹색 도시 취리히(Gr?n Stadt Z?rich)의 주최로 열린 이번 총회는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35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조경가, 도시계획가, 학자, 미디어 및 정부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에서는8명의 기조 연설자를 토대로 100여 개의 워크샵 및 논문 발표와 36곳의 조경 공간 현장 답사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취리히 시장 Corine Mauch과 IFLA 회장 Desiree Martinez의 환영사, 그리고 총회 참석자를 위해 조경과 녹지, 자연 경관에 포커스되어 자세히 소개된 취리히와 스위스 관광책자 역시 눈에 띄였으며, 세계2차대전 이후 1956년 이미 제 4회 총회를 주최한 도시로서 IFLA와 취리히의 긴 역사적 관계 또한 맛볼 수 있는 자리였다. 올해의 주제가 자연의 다양한 스케일인만큼 총회 기간 3일이 각각 Urban(도심), Peri-urban (도심 외곽), 그리고 Rural(지방/시골)이라는 테마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 세가지 지리적 경계선이 경제 문화 등 많은 면에서 서로 겹치는 점을 감안할때 강연과 워크샵 구조에 확연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듯 싶다. 하지만 많은 조경 담론이 도심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지방과 농촌, 시골 등 도시 외 영역의 조경을 탐색하고자 하는 취지가 신선하였으며, Peri-urban과 Rural은 앞으로 더 주목받아야 할 토픽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기조연설은 건축과 조경, 어바니즘의 경험을 두루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8팀이 참여했으며, 정원과 기후 변화에서부터 최근 이집트 시위가 일어난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 Tahrir Square등 역사, 현대 정치에 이르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조경의 의의를 다시한 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스위스 취리히 Hager Landschaftsarchitektur 조경사무소의 디렉터 Guido Hager, 미국 뉴욕대에서 건축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Mohamed Elshahed, 스위스 Meili Peter Architekten 건축사무소의 디렉터 및 ETH Zurich 교수 Marcel Meili, 스위스와 독일의 yellow z 어바니즘 사무소 디렉터 Michael Koch와 Maresa Schumacher, 중국 베이징 Turenscape의 Kongjian Yu, 스위스 자연보존재단의 상무이사 Raimund Rodewald, 스위스의 환경과학 및 기후변화 전문가 Andreas Spiegel와 미국 미시간대 조경학과 교수 Joan Iverson Nassauer로 이루어졌고, 네덜란드 MVRDV의 Winy Maas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토크샵과 논문 발표 주제들도 다양했는데, 도시농업, 도심 녹지의 밀도화, 미래의 레저 옵션, 임시 오픈스페이스, 정원 보존, 푸드 어바니즘, 도시의 수경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랜드스케이프 세션들이 특히 인기가 많았고, 각 토크샵마다 각국에서 온 3~5명의 디자이너와 조경학자의 발표가 있었다. 또한 ETH Zurich와 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스위스 국가과학재단) 등 스위스의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리서치 토픽들을 워크샵을 통해 방문할 수 있었고, Topos가 마련한 ‘Open Space, Freedom and Communication’의 오픈 토론회는 민주주의와 공공 장소의 관계,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인터넷 매체가 공공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재조명하였다. 학생작품공모전은 올해 38개국에서 총 361 작품이 출품되었고 이 중 반이 넘는 203작품이 중국에서 나왔으나 한국은 3작품에 그쳤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도시 내부 조경에 관한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도시와 농촌의 접점에 대한 창의적인 작품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생태 문제에 관련된 기술적인 접근 방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분석과 디자인이 골고루 이루어진 작품들 역시 부족했다는 충고 또한 들을 수 있었다. 1등상인 Group Han Prize는 그리스 아테네 공대 학생 3명의 작품 Layers of Time이 수상하였다.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중요한 생태계 중 하나인 Kotchi 석호가 자연적으로 진화해가는 과정과 현재 개발 패턴의 문제점을 지적, 시간이라는 렌즈를 통해 석호 주변 동식물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움직임을 서서히 늘려가는 시적이면서 최소 개입이 가능했던 방안이다. 2등상 Zvi Miller Prize는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생 2명의 작품인 Vibrant Land가 수상하였는데, 미국 노스캐롤라이주 해안에 방벽섬 역할이 가능한 레크리에이션 목재 구조를 디자인함으로써 바다로부터 거주 지역을 보호하며 거주와 놀이가 동시에 가능한 해안 공간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3등상인 BSLA Merit Award는 미국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생 3명이 출품한 Vertical Densities로, 3개의 교외 지역이 만나는 전 군기지 사이트에 홍수 제지와 담수 보충 능력을 키우고 풍력 에너지 기술을 시험할 수 공간을 조성, 주변의 지역 환경과 경제 발전을 둘 다 고려한 작품으로 채택되었다. 이 외에도 중국, 덴마크, 미국, 독일의7팀에게 Jury Awards가 주어졌다. Topos조경상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Institute for Landscape Planning and Ecology의 디렉터이자 교수로 있는 Antje Stokman에게 주어졌다. 지난 몇 년간 Chris Reed의 Stoss LU같은 젊은 회사들을 중심으로 주어지고 있는 이 조경상은 올해에는 처음으로 회사가 아닌 개인(여성) 조경가에게 주어져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Stokman은 수역 지구와 생태계 관리에 관한 리서치를 통해 도시와 지역간의 조경 관련 문제점을 조사하고 여러 학문 분야의 활발한 협력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음으로써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IFLA가 조경가에게 주는 최고 영예의 상인 Geoffrey Jellicoe Award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활동하는 Cornelia Hahn Oberlander(b. 1924)에게 돌아갔다. 지난 2004년 처음 설립되어 매 4년마다 주어지는 제프리젤리코 상은 평생 조경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사회와 환경의 복지뿐만 아니라 조경 전 분야에 걸쳐 기여한 업적이 큰 조경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47년 하버드에서 조경을 전공한 Oberlander는 초기 시절 주로 캐나다 민간 임대 주택 커뮤니티와 아이들 놀이터 공간의 프로젝트를 맡았고, 이 중 1967년 몬트리올 Expo에 디자인한 Children’s Creative Center가 잘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미국 뉴욕의 뉴욕타임즈 빌딩의 정원, 캐나다 밴쿠버의 롭슨광장 Robson Square과 UBC대학 인류학 박물관 등 지난 60년간 수많은 조경 프로젝트에 몸담아 왔다. Korea, FLA World Congress 2018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다. 2018년 세계조경가협회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992년에 이어 다시 한번 영광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특히 2018년에는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여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제 48회 세계조경가협회 총회
48th IFLA World Congress 2010, Zurich, Switzerland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제 48회 세계조경가협회 총회는 ‘From Urban Landscapes to Alpine Gardens(도시조경부터 알프스 정원까지)’ 라는 부주제가 설명해주 듯 갈 수록 다양해져가는 현 조경의 스케일과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개최되었다. 스위스 조경가협회(BSLA: Bund Shweizer Landschaftsarchitekten und Landschaftsarchitektinnen)와 녹색 도시 취리히(Gr?n Stadt Z?rich)의 주최로 열린 이번 총회는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35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조경가, 도시계획가, 학자, 미디어 및 정부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에서는8명의 기조 연설자를 토대로 100여 개의 워크샵 및 논문 발표와 36곳의 조경 공간 현장 답사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취리히 시장 Corine Mauch과 IFLA 회장 Desiree Martinez의 환영사, 그리고 총회 참석자를 위해 조경과 녹지, 자연 경관에 포커스되어 자세히 소개된 취리히와 스위스 관광책자 역시 눈에 띄였으며, 세계2차대전 이후 1956년 이미 제 4회 총회를 주최한 도시로서 IFLA와 취리히의 긴 역사적 관계 또한 맛볼 수 있는 자리였다. 올해의 주제가 자연의 다양한 스케일인만큼 총회 기간 3일이 각각 Urban(도심), Peri-urban (도심 외곽), 그리고 Rural(지방/시골)이라는 테마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 세가지 지리적 경계선이 경제 문화 등 많은 면에서 서로 겹치는 점을 감안할때 강연과 워크샵 구조에 확연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듯 싶다. 하지만 많은 조경 담론이 도심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지방과 농촌, 시골 등 도시 외 영역의 조경을 탐색하고자 하는 취지가 신선하였으며, Peri-urban과 Rural은 앞으로 더 주목받아야 할 토픽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기조연설은 건축과 조경, 어바니즘의 경험을 두루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8팀이 참여했으며, 정원과 기후 변화에서부터 최근 이집트 시위가 일어난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 Tahrir Square등 역사, 현대 정치에 이르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조경의 의의를 다시한 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스위스 취리히 Hager Landschaftsarchitektur 조경사무소의 디렉터 Guido Hager, 미국 뉴욕대에서 건축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Mohamed Elshahed, 스위스 Meili Peter Architekten 건축사무소의 디렉터 및 ETH Zurich 교수 Marcel Meili, 스위스와 독일의 yellow z 어바니즘 사무소 디렉터 Michael Koch와 Maresa Schumacher, 중국 베이징 Turenscape의 Kongjian Yu, 스위스 자연보존재단의 상무이사 Raimund Rodewald, 스위스의 환경과학 및 기후변화 전문가 Andreas Spiegel와 미국 미시간대 조경학과 교수 Joan Iverson Nassauer로 이루어졌고, 네덜란드 MVRDV의 Winy Maas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토크샵과 논문 발표 주제들도 다양했는데, 도시농업, 도심 녹지의 밀도화, 미래의 레저 옵션, 임시 오픈스페이스, 정원 보존, 푸드 어바니즘, 도시의 수경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랜드스케이프 세션들이 특히 인기가 많았고, 각 토크샵마다 각국에서 온 3~5명의 디자이너와 조경학자의 발표가 있었다. 또한 ETH Zurich와 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스위스 국가과학재단) 등 스위스의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리서치 토픽들을 워크샵을 통해 방문할 수 있었고, Topos가 마련한 ‘Open Space, Freedom and Communication’의 오픈 토론회는 민주주의와 공공 장소의 관계,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인터넷 매체가 공공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재조명하였다. 학생작품공모전은 올해 38개국에서 총 361 작품이 출품되었고 이 중 반이 넘는 203작품이 중국에서 나왔으나 한국은 3작품에 그쳤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도시 내부 조경에 관한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도시와 농촌의 접점에 대한 창의적인 작품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생태 문제에 관련된 기술적인 접근 방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분석과 디자인이 골고루 이루어진 작품들 역시 부족했다는 충고 또한 들을 수 있었다. 1등상인 Group Han Prize는 그리스 아테네 공대 학생 3명의 작품 Layers of Time이 수상하였다.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중요한 생태계 중 하나인 Kotchi 석호가 자연적으로 진화해가는 과정과 현재 개발 패턴의 문제점을 지적, 시간이라는 렌즈를 통해 석호 주변 동식물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움직임을 서서히 늘려가는 시적이면서 최소 개입이 가능했던 방안이다. 2등상 Zvi Miller Prize는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생 2명의 작품인 Vibrant Land가 수상하였는데, 미국 노스캐롤라이주 해안에 방벽섬 역할이 가능한 레크리에이션 목재 구조를 디자인함으로써 바다로부터 거주 지역을 보호하며 거주와 놀이가 동시에 가능한 해안 공간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3등상인 BSLA Merit Award는 미국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생 3명이 출품한 Vertical Densities로, 3개의 교외 지역이 만나는 전 군기지 사이트에 홍수 제지와 담수 보충 능력을 키우고 풍력 에너지 기술을 시험할 수 공간을 조성, 주변의 지역 환경과 경제 발전을 둘 다 고려한 작품으로 채택되었다. 이 외에도 중국, 덴마크, 미국, 독일의7팀에게 Jury Awards가 주어졌다. Topos조경상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Institute for Landscape Planning and Ecology의 디렉터이자 교수로 있는 Antje Stokman에게 주어졌다. 지난 몇 년간 Chris Reed의 Stoss LU같은 젊은 회사들을 중심으로 주어지고 있는 이 조경상은 올해에는 처음으로 회사가 아닌 개인(여성) 조경가에게 주어져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Stokman은 수역 지구와 생태계 관리에 관한 리서치를 통해 도시와 지역간의 조경 관련 문제점을 조사하고 여러 학문 분야의 활발한 협력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음으로써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IFLA가 조경가에게 주는 최고 영예의 상인 Geoffrey Jellicoe Award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활동하는 Cornelia Hahn Oberlander(b. 1924)에게 돌아갔다. 지난 2004년 처음 설립되어 매 4년마다 주어지는 제프리젤리코 상은 평생 조경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사회와 환경의 복지뿐만 아니라 조경 전 분야에 걸쳐 기여한 업적이 큰 조경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47년 하버드에서 조경을 전공한 Oberlander는 초기 시절 주로 캐나다 민간 임대 주택 커뮤니티와 아이들 놀이터 공간의 프로젝트를 맡았고, 이 중 1967년 몬트리올 Expo에 디자인한 Children’s Creative Center가 잘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미국 뉴욕의 뉴욕타임즈 빌딩의 정원, 캐나다 밴쿠버의 롭슨광장 Robson Square과 UBC대학 인류학 박물관 등 지난 60년간 수많은 조경 프로젝트에 몸담아 왔다. Korea, FLA World Congress 2018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다. 2018년 세계조경가협회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992년에 이어 다시 한번 영광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특히 2018년에는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여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창경궁
Changgyeonggung창경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1번지에 위치하며, 성종 14년(1483)에 세조비 정희왕후, 예종비 안순왕후, 덕종비 소혜왕후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옛 수강궁터에 창건한 궁이다. 창덕궁과 연결되어 동궐이라는 하나의 궁역을 형성하면서, 독립적인 궁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창덕궁의 모자란 주거 공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 61,500㎡(20,100여 평)일원에 명정전, 홍화문, 명정문 및 행각, 옥천교, 통명전 등에서 자연과 인공이 화합하는 순응의 미학을 공간적, 지형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1963년 1월 18일 사적 제123호로 지정되었다.
창경궁
Changgyeonggung창경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1번지에 위치하며, 성종 14년(1483)에 세조비 정희왕후, 예종비 안순왕후, 덕종비 소혜왕후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옛 수강궁터에 창건한 궁이다. 창덕궁과 연결되어 동궐이라는 하나의 궁역을 형성하면서, 독립적인 궁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창덕궁의 모자란 주거 공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 61,500㎡(20,100여 평)일원에 명정전, 홍화문, 명정문 및 행각, 옥천교, 통명전 등에서 자연과 인공이 화합하는 순응의 미학을 공간적, 지형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1963년 1월 18일 사적 제123호로 지정되었다. 제21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
어제와 같은 오늘, 조경의 미래는 없다어느덧 성인의 나이를 넘겨 21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가 지난 5월 20일 (금) 광나루 한강공원 제3축구장에서 열렸다. 이날은 눈부신 하늘을 가지진 못했지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내리는 비로 참가자들의 친목이 더욱 빛이 난 대회였다. 제21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금년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는 간간히 내리는 비로 입장식은 생략하고 국민의례와 김은성 수석부회장((주)한국조경사회)의 내·외빈 소개로 시작되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주)한국조경사회의 김윤제, 권오준, 유의열, 윤성수, 김기성, 강인철, 유길종, 이용훈, 이유경 고문과, 김경윤 명예회장, 그리고 전문건설조경협의회 김충일 회장, 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이세근 회장, 공원시설협동조합 노영일 이사장,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지회 강완수 부회장, 상명대 이재근 부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해 체육대회를 빛내주었다. 이민우 회장((주)한국조경사회)은 개회사를 통해 업계에 몰아닥친 불황의 그림자로 참여 회원사가 적으리라는 생각과 다르게 많은 회원사가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김윤제 고문은 조경인 체육대회의 자취를 살피며 앞으로도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대한민국 조경이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최종필 부회장의 개회 선언과 지난해 우승자 최웅재(서안알앤디) 씨의 선수단 선서를 마친 후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본 경기가시작되었다. <중략>넓은 시야를 가지고 변화 모색할 때초기의 체육대회는 단순하게 친목을 다지는 친선경기였다. 이것이 모태가 되어 점차 참여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결속을 다지거나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조경인들의 큰 행사로 자리 잡게 됐다. 초창기에는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아 교류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큰 의미를 가졌다.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게임을 하면서 협동과 친목으로 조경인으로서의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점차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기보다는 동일한 경기 운영으로 형식적인만남을 가지는 등 일차적인 기능만을 해왔다. 이제는 조경인 체육대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를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조경인 체육대회는 조경 분야 종사자들의 하나 된 마음을 확인하고 이를 확대시켜 한국 조경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재충전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단지 하루 잘 놀다가 오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경인 체육대회의 취지와 의미를 한국 조경이라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조경을 포함한 모든 분야는 인류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원대한 목표와 행동에 동참하는 계획과 도전을 가진다면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경, 건축, 도시 분야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업을 도모하는 장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제 조경 분야도 내부 결속을 위한 친목 도모를 뛰어 넘어 타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밥그릇 차지를 위한 배타적인 결속 및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타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힘과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 주길 기대해 본다.
제21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
어제와 같은 오늘, 조경의 미래는 없다어느덧 성인의 나이를 넘겨 21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가 지난 5월 20일 (금) 광나루 한강공원 제3축구장에서 열렸다. 이날은 눈부신 하늘을 가지진 못했지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내리는 비로 참가자들의 친목이 더욱 빛이 난 대회였다. 제21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금년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는 간간히 내리는 비로 입장식은 생략하고 국민의례와 김은성 수석부회장((주)한국조경사회)의 내·외빈 소개로 시작되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주)한국조경사회의 김윤제, 권오준, 유의열, 윤성수, 김기성, 강인철, 유길종, 이용훈, 이유경 고문과, 김경윤 명예회장, 그리고 전문건설조경협의회 김충일 회장, 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이세근 회장, 공원시설협동조합 노영일 이사장,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지회 강완수 부회장, 상명대 이재근 부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해 체육대회를 빛내주었다. 이민우 회장((주)한국조경사회)은 개회사를 통해 업계에 몰아닥친 불황의 그림자로 참여 회원사가 적으리라는 생각과 다르게 많은 회원사가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김윤제 고문은 조경인 체육대회의 자취를 살피며 앞으로도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대한민국 조경이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최종필 부회장의 개회 선언과 지난해 우승자 최웅재(서안알앤디) 씨의 선수단 선서를 마친 후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본 경기가시작되었다. <중략>넓은 시야를 가지고 변화 모색할 때초기의 체육대회는 단순하게 친목을 다지는 친선경기였다. 이것이 모태가 되어 점차 참여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결속을 다지거나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조경인들의 큰 행사로 자리 잡게 됐다. 초창기에는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아 교류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큰 의미를 가졌다.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게임을 하면서 협동과 친목으로 조경인으로서의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점차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기보다는 동일한 경기 운영으로 형식적인만남을 가지는 등 일차적인 기능만을 해왔다. 이제는 조경인 체육대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를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조경인 체육대회는 조경 분야 종사자들의 하나 된 마음을 확인하고 이를 확대시켜 한국 조경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재충전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단지 하루 잘 놀다가 오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경인 체육대회의 취지와 의미를 한국 조경이라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조경을 포함한 모든 분야는 인류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원대한 목표와 행동에 동참하는 계획과 도전을 가진다면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경, 건축, 도시 분야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업을 도모하는 장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제 조경 분야도 내부 결속을 위한 친목 도모를 뛰어 넘어 타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밥그릇 차지를 위한 배타적인 결속 및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타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힘과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 주길 기대해 본다. 덕수궁
Deoksugung造營_ 덕수궁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집이었으나, 선조가 임진왜란으로 피난을 갔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궁이 모두 불타버려 이곳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게 되면서 정릉동 행궁이라 불리었다. 선조가 죽은 후 광해군이 이 행궁의 즉조당卽祚堂에서 즉위하고, 1611년 행궁을 궁궐로 높이며, 경운궁慶運宮이라는 궁호를 붙였다. 그러나 광해군은 창덕궁이 모두 중건된 1615년 4월 창덕궁으로 다시 옮겨갔고, 선조의 계비인 인목 대비(1584~1632)를 한 때 이곳에 유폐시켰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인조 역시 이곳 즉조당에서 즉위한 후 창덕궁으로 옮겨갔다. 그 후 270여 년 동안 경운궁은 궁궐로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왕실에서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영조가 선조의 환도 삼주갑三周甲을 맞아 이곳에 찾아와 배례를 행한 일 정도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 덕수궁이 다시 왕궁으로 부각된 것은 고종 때이며, 재위 말년에 약 10여 년 동안 정치적 혼란의 주 무대였다. 고종은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이듬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면서(아관파천俄館播遷) 러시아 공관 옆에 있던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때를 전후하여 궁 안에 많은 건물들이 지어졌고, 그제야 덕수궁은 궁궐다운 장대한 전각을 갖추게 되었다. 역대 임금의 영정을 모신 진전眞殿과 궁의 정전인 중화전中和殿등이 이때 세워졌으며, 정관헌靜觀軒, 돈덕전 등 서양식 건물도 일부 들어섰다. 고종이 경운궁에 머무르고 있던 1904년 궁에 큰 불이 나, 전각이 대부분 타버렸으며, 곧 복구에 착수하여 이듬해인 1905년에 즉조당, 석어당, 경효전, 준명전, 흠문각, 함녕전 등을 중건하고, 중화문 등을 세웠다. 1906년에는 정전인 중화전을 완성하고 대안문大安門도 수리했는데, 이 문은 그때부터 대한문大漢門으로 이름을 바꾸고 궁의 정문으로 사용했다.
덕수궁
Deoksugung造營_ 덕수궁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집이었으나, 선조가 임진왜란으로 피난을 갔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궁이 모두 불타버려 이곳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게 되면서 정릉동 행궁이라 불리었다. 선조가 죽은 후 광해군이 이 행궁의 즉조당卽祚堂에서 즉위하고, 1611년 행궁을 궁궐로 높이며, 경운궁慶運宮이라는 궁호를 붙였다. 그러나 광해군은 창덕궁이 모두 중건된 1615년 4월 창덕궁으로 다시 옮겨갔고, 선조의 계비인 인목 대비(1584~1632)를 한 때 이곳에 유폐시켰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인조 역시 이곳 즉조당에서 즉위한 후 창덕궁으로 옮겨갔다. 그 후 270여 년 동안 경운궁은 궁궐로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왕실에서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영조가 선조의 환도 삼주갑三周甲을 맞아 이곳에 찾아와 배례를 행한 일 정도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 덕수궁이 다시 왕궁으로 부각된 것은 고종 때이며, 재위 말년에 약 10여 년 동안 정치적 혼란의 주 무대였다. 고종은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이듬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면서(아관파천俄館播遷) 러시아 공관 옆에 있던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때를 전후하여 궁 안에 많은 건물들이 지어졌고, 그제야 덕수궁은 궁궐다운 장대한 전각을 갖추게 되었다. 역대 임금의 영정을 모신 진전眞殿과 궁의 정전인 중화전中和殿등이 이때 세워졌으며, 정관헌靜觀軒, 돈덕전 등 서양식 건물도 일부 들어섰다. 고종이 경운궁에 머무르고 있던 1904년 궁에 큰 불이 나, 전각이 대부분 타버렸으며, 곧 복구에 착수하여 이듬해인 1905년에 즉조당, 석어당, 경효전, 준명전, 흠문각, 함녕전 등을 중건하고, 중화문 등을 세웠다. 1906년에는 정전인 중화전을 완성하고 대안문大安門도 수리했는데, 이 문은 그때부터 대한문大漢門으로 이름을 바꾸고 궁의 정문으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