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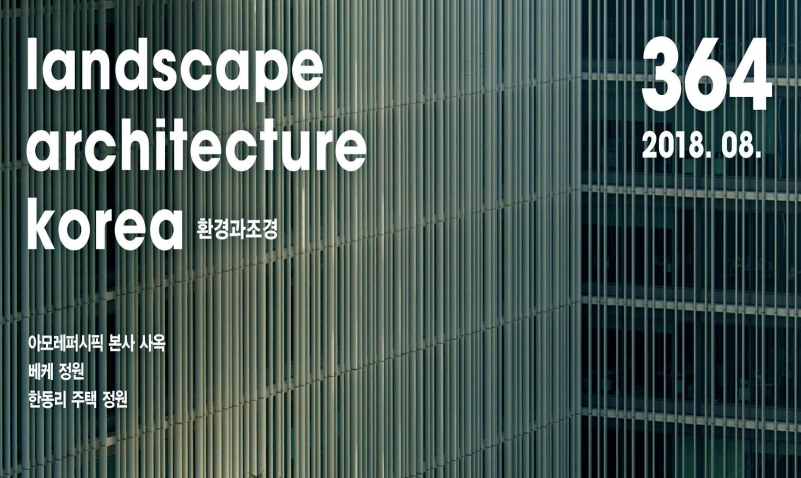 [에디토리얼] 소통과 연대의 건축
[에디토리얼] 소통과 연대의 건축
불벼락 뙤약볕, 독자 여러분은 이 여름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궁금하다. 잠시나마 불볕더위를 피하며 일상의 도시 경험을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번 8월호에 소개하는 아모레퍼시픽 신사 옥을 권한다. 대기업 본사 건물이라고 미리 위압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공항 못지않은 검색을 거쳐야 할 거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다. 반바지 입고 샌들 신었다고 주저할 이유도 없다.
4호선 신용산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지하층에서 에스컬레이터 한번만 타면 외부인에게 개방된 이 건물의 넓고 높은 아트리움이 나온다. 특별한 정문 없이 사방의 가로 어디에서든 문만 열면 이 아트리 움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 1층부터 3층까지 하나로 트인 공용 공간이다. 한강로 쪽 출구 옆 갤러리에 전시 중인 ‘아모레퍼시픽과 건축가들’에서는 이 건물의 설계자 데이비드 치퍼필드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의 건축과 조경 프로젝트를 맡아 온 알바로 시자, 김종규, 정영선 등의 작업을 영상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미술관과 박물관의 전시 도록과 자료, 포스터가 2층 구조의 서가에 빼곡한 도서관 apLAP 에서는 시간 가는줄 모르고 미술 아카이브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다. 유료이기는 하지만 지하층의 미술관 APMA 에서는 양질의 현대 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지금은 개관 기념으로 라파엘 로자노-헤머의 인터렉티브 작업이 전시되고 있다.
이 초대형 보이드 공간에서 꼭 교양 있는 문화인인 척해야 하는 건 아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층과 3층 사이의 아트리움은 일종의 광장이다. 다양한 색의 나일론을 엮어 만든 1층의 대형 벤치 ‘집착’(이광호 작)은 친구를 기다리는 약속 장소로 이미 자리 잡았다. 아모레 스토어를 구경하다가 2층과 3층에 널려 있는 세련된 디자인의 테이블과 의자(윤여범, 최형문 작)에서 마음껏 책을 보거나 졸아도 된다. 독서와 휴식에 지치면 고개를 들어 천장을 감상하면 된다. 아트리움의 유리 천장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5층 공중 정원의 연못 바닥이 겹쳐 빛과 물이 협연한다. 실내의 광장을 충분히 즐겼다면 건물 밖으로 나와 거대한 금속 원판과 얕은 연못이 서로를 비추는 올라퍼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 ‘오버디프닝overdeepening ’의 환영을 둘러보고, 키 큰 백합나무 100주가 심긴 야외 정원을 산책하면 된다. 이면 도로로 몇 걸음 옮기면 이른바 ‘용리단길’ 이다. 신사옥 입주 이후 ‘아모레 효과’에 힘입어 수십 년째 멈춰 있던 한강로2가와 용산 우체국 주변 골목이 변하고 있다. 여느 ‘뜨는 길’들이 그렇듯 하루가 다르게 ‘힙’한 카페들이 들어서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은 민간 기업의 사옥이나 업무 공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교류와 연대의 철학이 시도된 건축이다. 설계자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말하는 “직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소통과 유대의 건축” 은 듣기에만 그럴듯한 레토릭이 아니다. 메트로폴리스 한복판에서 초고층 거대 건축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속이 텅 빈 건축을, 개방형 공유 공간을 존중한 건축주의 철학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건물에 담긴 공공적 가치의 핵심은 마치 광장과도 같은 초대형 아트리움이지만, 더 큰 매력은또 다른 텅 빈 공간 세 곳에 있다. 5층, 11층, 17층에 과감하게 배치한 세 개의 공중 정원은 도시 건축의 백미다. 각각의 공중 정원에는 조경가 박승진의 단순하면서도 섬세하고 정갈하면서도 강한 디자인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다. 본문에 싣는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조경 설계와 이명준 박사의 비평 에서 그 면모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박승진 소장이 그간 추구해 온 “콘텍스트와 패턴 사이”의 조경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세 개의 공중 정원이 숭고한 감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상상의 한계 그 이상으로 다가오는 도시의 풍광 때문이다. 5층 정원 에서 조감할 수 있는 용산 미군 기지의 풍경에 용산공원의 미래가 오버랩된다. 지난 이십 년간 그려온 여러 버전의 용산공원 계획안보다 훨씬 감동적 이다. 11층 정원에서 마주하는 용산과 한강 경관은 다큐멘터리보다 더 생생하게 도시 서울의 민낯과 속살을 보여준다. 북쪽으로 열린 17층 정원의 풍광은 글로 표현하기에 역부족이다. 남산이 왜 서울의 랜드마크인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매우 아쉽게도, 우리는 이 공중 정원들에 오를 수 없다. 홍보팀의 협조와 안내를 받는 취재나 공식 행사가 아닌 이상, 전망대가 아니라 기업의 업무 공간이자 직원의 휴식 공간인 곳을 개방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환경과조경』 이름으로 취재차 방문했을 때 경험한 감동을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간 답사에서는 전달할 수 없어서 몹시 안타까웠다. 소통과 연대의 건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한 아모레퍼시픽이라면, 조금 더 섬세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요일의 특정한 시간대에 한해 제한적으로라도 공중 정원을 개방하면 어떨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어떨까.
-
 아모레퍼시픽 본사 신사옥
Amorepacific New Headquarter
아모레퍼시픽 본사 신사옥
Amorepacific New Headquarter
아모레퍼시픽 본사 신사옥이 건축된 장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본사 사옥이 있던 곳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으로 새 부지가 조성되었고, 때마침 주변 도시 공간에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장소의 잠재력이 크게 드러난 곳이기도 하다. 부지의 동측은 향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용산 미군 기지와 접해 있고, 북측은 가까이에서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2010년에 진행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설계자로 선정된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DCA)의 계획안은 이러한 부지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주변의 여타 신축 건물과는 확연하게 차이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건물의 몸체 그 자체가 전체 부지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었다. 건축 대지는 연접한 가로 공원과 맞닿아 있으므로 실제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두 영역이 하나의 옥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보행자 또는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조경 설계 조경설계 서안(정영선 + 박승진)
조경 설계 진행 디자인 스튜디오 loci(박승진, 강영걸, 윤일빈, 김수민, 장수연)
건축 설계DCA(해외), 해안건축(국내)
조경 감리(상주) 이병욱
조경 감리(비상주) 정영선, 박승진, 강병현, 최상민, 구보배, 오지훈
공사 감독 총괄 아모레퍼시픽 사옥건설팀
조경 공사 감독 아모레퍼시픽 비전지원팀(한권영)
조경 시공 총괄 현대건설(박성욱, 오인석)
시공 감리 총괄 건원
조경 시공 감리(비상주) 건원(한경환)
조경 식재 정한조경(배상민, 한동명)
조경 시설물 대화조경(김충래, 김석호, 양효성)
위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대지 면적 14,525.7m 2
조경 면적2,746.7m 2
설계 기간2011~2015
공사 기간2016~2017
준공2017. 12.
사진 양해남
-
 비평: 정원섬, 보이는 정원
비평: 정원섬, 보이는 정원
조금 우회하여 이렇게 시작하자. 지금까지의 조경은 보이지 않았다고. 피터 워커와 멜라니 시모는 『보이지 않는 정원들(Invisible Gardens)』에서 동시대의 조경 작품들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반해 조형성이 두드러진 작품을 내놓았던 모더니즘 계열의 조경가들을 탐구한 바 있다.1 조경 이론가 엘리자베스 마이어는 이러한 논의를 좀 더 정교한 담론으로 진화시켰다. 마이어는 조경을 크게 ‘환경적 혹은 생태적 조경’과 경관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예술로서의 조경’으로 분류하고,2 두 가지 조경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생태적 성능을 탑재하면서도 예술로 인식되는, 말하자면 지속의 미(sustaining beauty)를 지향하는 조경 설계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3
조경이 ‘보이지 않는다(invisible)’고 할 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는다. 하나는 설계한 경관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하여 대중에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간 예술로 인식되면서 동시에 생태적 성능을 지닌 경관을 만들기 위한 조경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대지 예술에 영감을 받은 조지 하그리브스는 생태적 성능을 탑재한 유려한 랜드폼(landform)을 설계해 왔고, 마이클 반 발켄버 그는 자연의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하면서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설계 작품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근래의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은 재활용한 건축물과 구조물 덕택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쉬웠다. 마이어의 논의는 밀레니엄을 갓 넘긴 시점에 시작되었지만, 그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랜드폼을 디자인하는 실험이 빈 번하지 않은 국내에서 아직 조경은 시각적으로, 그리고 인식적으로 충분히 보이지 않았다. 조경은 좀 더 보일(visible)필요가 있다....(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이명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경 설계와 계획, 역사와 이론, 비평에 두루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박사 논문에서는 조경 드로잉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현대 조경 설계의 실무와 교육 에서 디지털 드로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고, 현재는 조경 설계에서 산업 폐허의 활용 양상과 20세기 전후의 한국 조경사를 보다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조경비평 봄’과 ‘조경연구회 보라(BoLA)’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베케 정원
Veke Garden
베케 정원
Veke Garden
우연한 발견, 제주의 풍경
‘베케’는 ‘밭의 경계에 아무렇게나 두텁게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의미하는 제주말이다. 예부터 제주 사람들은 밭을 일구며 나온 돌로 밭담 ―제주도에서 밭의 가장자리에 돌을 쌓아 만든 둑―을 쌓아 경계를 만들었다. 끊임없이 나오는 돌을 계속 쌓아 올리다 보니 일반적인 담보다 높고 두꺼운 형태가 만들어졌다. 베케의 성근 돌 틈 사이로 풀과 나무가 자라나고, 건조한 바람을 막아주는 돌담과 나무 그늘은 이끼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다.
‘베케 정원’은 더가든이 관리하는 조경수 농장 인근의 귤 밭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베케를 활용해 제주의 풍광이 느껴지도록 연출한 정원이다. 크게 입구정원, 카페, 돌담정원, 고사리정원, 이끼정원과 빗물정원, 그늘정원, 목련-만병초정원, 폐허정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적인 정원에 대한 고민 ‘치밀하게 엉성하게’
김봉찬 대표(더가든)는 제주다운 모습을 간직하면서 한국적인 느낌이 드는 정원을 연출하고자 했다. 건축 공간에 대해 자문해준 최정화 작가 또한 건물과 정원에서 한국적 아름다움이 묻어나기를 기대했다. ‘치밀하게 엉성하게’는 투박하지만 고결하고, 거칠지만 따뜻한 한국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은 콘셉트다.
베케는 제주인들이 오랫동안 척박한 농토를 일구며 고단한 일상 안에서 만들어낸 구조물이다. 여기에 시간과 생명을 더해 베케 정원의 초석을 만들었다. 거친 돌담과 이끼는 극단의 대비이자 최상의 조화로 마음을 울리는 힘을 지닌다. 이 대비와 조화의 줄다리기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베케에서 느낀 설렘을 전하고자 했다. ....(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조경 설계 및 시공 더가든
기획 최정화
건축 설계 차재
건축 시공 내츄럴시퀀스
조경 시설 예건, 영재기업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효돈로 48
면적 8,420m2
준공2018. 6.
더가든은 2007년 설립된 조경 회사로 생태학을 바탕으로 한 암석원, 고층습원 조성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 김봉찬은 제주대학교에서 식물생태학을 전공하고, 제주여미지식물원 식물과장을 거쳐 평강식물원 연구소장으로 일했다. 뿐만 아니라 식물원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왔다. 현재 한국 식물원수목원협회 이사, 제주도 문화재전문위원, 제주여미지식물원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평강식물원 암석원 및 습지원(2003), 제주도 비오토피아 생태공원(2006), 상남수목원 암석원 (2009), 국립수목원 희귀·특산식물원(201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암석원(2012) 및 고층습원(2014) 등이 있으며, 마곡 서울식물원 조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
 한동리 주택 정원
Handongri House Garden
한동리 주택 정원
Handongri House Garden
건축이 만드는 조경, 조경이 만드는 건축
한동리 주택 정원은 얼라이브어스ALIVEUS의 시작과 정체성을 바라보고 확인한, 일종의 전주곡 같은 프로젝트다. 편견 없는 관계 속에서 건축과 조경, 주거와 정원에 대한 담론이 오가고 여과 없는 논쟁이 이어졌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생각이 평등하게 오가다 파도처럼 부서지고 다시 읽히기를 반복, 마침내 생각에서 언어와 그림으로, 그리고 실제 풍경으로 만들어졌다.
건축가에 의해 조경의 모습이 달라지고 조경가에 의해 건축의 모양이 달라졌다. 익숙하지 않은 생각의 교환이 이루어졌고, 서로가 아쉽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그 과정을 겪은 후에야 탄력 있는 그림의 바탕이 만들어 졌다. 조경가와 건축가는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 각자 상상하기 시작했다. 건축은 조경의 캔버스가 되고, 조경은 건축의 경험으로 차용되었다. ....(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건축·조경 설계ALIVEUS(강한솔, 오승환, 김태경, 나성진, 김진아)
조경 시공ALIVEUS, 그린팜, 차용준
위치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903-1
대지 면적 625m2
건축 면적152m2
바닥 면적 180m2
조경 면적 473m2
건축 준공2017. 3.
완공2018. 7.
얼라이브어스(ALIVEUS)는 현대 도시를 만들어가는 건축, 조경, 도시재 생, 문화 기획에 기반을 둔 디자이너 그룹이며, 평등한 커뮤니케이션과 유연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학제간 디자인을 추구한다. 이러한 방식이 도시의 다양한 문맥에 더 좋은 디자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노바셈 메모리얼
Novasem Memorial
노바셈 메모리얼
Novasem Memorial
거대한 공장 단지 속 정원
노바셈(Novasem)은 멕시코 서부 할리스코(Jalisco)주 교외에 위치한 옥수수 생산·가공 공장이다. 87만 제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에 공장 단지를 총2단계에 걸쳐 조성했다.저장고,생산 타워,연구소,메모리얼 정원,공장 입구를 먼저 조성했으며,향후 사무실,옥수수 건조 작업장,근로자 임시 주거 공간,카페,휴게 소가 마련될 예정이다.공장 단지 한가운데 자리한‘노 바셈 메모리얼(Novasem Memorial)’은 공장 설립자를 추모하기 위한 정원이다.추수,분류,포장,저장 등의 기능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갖춘 건물 사이에 놓인 정원은 작지만 핵심적인 공간으로 기능한다....(중략)...
*환경과조경364호(2018년8월호)수록본 일부
ArchitectAlejandro Guerrero, Andrea Soto (Atelier Ars)
CollaboratorsAndrea Álvarez, Juan Carlos Pérez Albo, Alexis Castillo Location Acatlán De Juárez, Jalisco, México
Completion
Novasem: 2017(first phase), 2020(second phase)
Novasem Memorial: 2016
PhotographyAndrea Soto, Daniel Maldonado, Onnis Luque
아텔리에르 아르스(Atelier Ars)는 알레한드로 게레로(Alejandro Guerrero)와 안드레아 소토(Andrea Soto)가 이끄는 멕시코 건축설 계사무소다. 두 사람은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의 기술 고등 연구소(ITESO)를 졸업했으며, 하버드 GSD를 비롯해 보스턴 건축 대학,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 등 여러 주요 대학에서 강의한 바 있다. 주거 공간부터 복합 고층 빌딩, 전시 파빌리온까지 다양한 건축물의 설계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다수의 건축상을 받았다.
-
 모내시 대학교 어스 사이언스 가든
Earth Sciences Garden, Monash University
모내시 대학교 어스 사이언스 가든
Earth Sciences Garden, Monash University
모내시 대학교(Monash University)의 어스 사이언스 가든(Earth Sciences Garden)은 호주 빅토리아(Victoria)주의 지질학 및 지형학적 특징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이자, 지구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야외 실험실이다. 이 정원은 지구과학과 조경, 예술 작품을 하나로 통합하며 독창적이고 반자연적인(seminatural)경관을 연출한다. 또한 정원을 지리학을 가르치는 데 혁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 과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경관
빅토리아 주는 암석이 많은 깁슬랜드(Gippsland)와 오트 웨이(Otway)해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서부의 평원, 위머라 말리(Wimmera Mallee)의 사구 지역이 특징 적인 곳이다. 이러한 지리 및 지질학적 특징을 형상화한 지형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일련의 암석을 배치했 다. 독특한 형태의 인공 지형에서 야라 Yarra 강이 굽이친 흔적과 탈리 캉Talli Karng호수의 형상을 발견할 수있다. 비가 오면 이 인공 지형에 떨어진 빗물이 중앙의 금이 간 진흙 판을 향해 흘러 들어가 호수를 형성하게 된다....(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Landscape Architects Rush Wright Associates
Project Management TSA Management(Stephen Lindsay)
Planting Design Collaborator Paul Thompson
Civil, Structural, Hydraulic and Electrical Engineer Wood and Grieve Engineers Lighting NDY Light
Art Open Spatial Workshop
Cost Planning Donald Cant Watts Corke
Contractor Australian Native Landscape Constructions
Stone Supply Pyrenees Quarries
Client Monash University
Location Monash University, Clayton Campus, Melbourne, Australia Area 4,000m2
Design 2016
Completion 2016
Photograghs Michael Wright, John Gollings, Julie Boyce
호주 멜버른에 기반을 둔 러시 라이트 어소시에이츠(Rush Wright Associates)는 조경 설계, 도시계획, 생태 설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계사무소다. 러시 라이트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이자 공동 대표인 캐서린 러시(Catherine Rush)와 마이클 라이트(Michael Wright)의 풍부한 설계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결합해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의 사무소와 협력해 국제적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디자인을 통해 지속 가능성, 공동 체의 가치, 새로운 환경 의제 등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포용하고자 힘쓰고 있다.
-
 기흥역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기흥역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용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선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는 미술관, 민속촌 등 문화·관광 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해 풍부한 문화 자원을 자랑하는 주거 단지 다. 사거리와 면한 단지의 외곽부는 상가로 계획했으며, 입구성을 강조하고자 각 단지의 주출입구에 키가 크고 수형이 아름다운 소나무를 일렬로 식재했다.
센트럴 푸르지오는 여섯 동 1,316세대, 파크 푸르지오는 다섯 동 768세대 규모로 약 2,000세대 이상을 수용하는 단지다. 조경 면적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효율 적인 공간 구성을 통해 넉넉한 외부 공간을 확보하고 각 단지의 여건에 따라 특색 있는 조경 공간을 계획했 다. 비교적 규모가 큰 센트럴 푸르지오의 조경 공간은 모던하고 개방감 있게 연출했으며, 센트럴 푸르지오에 비해 규모가 작은 파크 푸르지오는 단지를 하나의 정원처럼 구성했다. 두 단지가 맞닿은 곳에는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의 동일한 수종을 식재해 단지의 경계를 완화하고 동질감을 주었다....(중략)...
*환경과조경364호(2018년8월호)수록본 일부
조경 설계
센트럴: (주)예서림
파크: (주)기술사사무소 아텍플러스
건축 설계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주)대우건설
조경 식재(시설 포함) 영산조경(주)
조경 시설
센트럴: 유경건설(주)
휴게 시설 (주)에코밸리 놀이 시설
센트럴: (주)청우펀스테이션
파크: (주)원앤티에스
위치 경기도 용인시 구갈동 234 일대
대지 면적
센트럴: 38,896.2m 2
파크: 22,687.9m 2
조경 면적
센트럴: 11,535.08m 2
파크: 6,833.02m 2
준공
센트럴: 2018. 6.
파크: 2018. 7.
-
 [그들이 설계하는 법] 스케일
[그들이 설계하는 법] 스케일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고르는 차원에서 본 연재의 흐름을 다시 짚어 보자. 나는 설계의 구성 요소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세 차례의 연재를 통해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요소에 대한 나의 설계 관점을 공유하고자 한다.1첫 번째 범주에는 분위기, 맥락, 주제와 같이 개념적인 요소가 속한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요소는 스케일, 형태, 비례, 색, 질감과 같이 개념적인 동시에 실재성을 갖는 것들이다.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요소는 식물, 빛, 온도, 습도, 바람 등과 같이 공간을 구성하는 실재적 재료다. 공간을 짓는 일은 종종 글을 쓰는 일에 비유되곤 하는 데, 앞서 예시한 요소 중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것은 글을 구성하는 어휘(단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요소는 어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문법 내지는 어투라고 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아직 설계가로서의 독창적인 어투를 만들지 못했다. 아마도 많은 젊은 설계가가 나와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스타일2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연재에서는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요소 중 최근에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케일’에 대해 집중하여 다루고자 한다.
스케일
‘이 드로잉은 스케일이 안 맞다’ 또는 ‘이 공간은 스케일이 잘 맞다’. 설계 수업을 들은 적 있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이와 비슷한 코멘트를 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이란 무엇일까? 흔히 우리는 스케일을 ‘크기나 치수’라고 이해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스케일은 모든 공간 구성 요소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작은 정원을 예로 들면, 정원의 규모, 그 안에 놓인 나무와 꽃의 크기, 산책로의 폭, 그것을 포장 하는 재료의 크기와 패턴, 산책로 옆에 놓인 벤치의 적절한 높이 등을 결정하는 일이 모두 스케일 이슈에 해당한다.
그런데 과연 스케일을 단순히 크기나 치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까? 건축가 페터 춤토르(Peter Zumthor)는 이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한다. 그는 스케일 이라는 표현 대신“친밀함의 수준”3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의 표현은 크기나 치수에 집중하는 기존의 스케일에 대한 관점을 확장시킨다. 이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크기뿐만 아니라 공간이 나와 떨어진 거리, 근접성, 공간이 나에게 전달하는 감정적 요소(편안함, 압도감, 친밀함 등)를 포함한다....(중략)...
**각주 정리
1.논의의 자세한 취지와 방향은 연재 1회차(『환경과조경』 2018년 7월호, pp.94~101)를 참고 바란다.
2.문학 작품에서 작가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이나 구성의 특질,
『표준국어대사전』, 2018.
3.Peter Zumthor, 장택수 역, 『분위기』, 나무생각, 2013, p. 49.
*환경과조경364호(2018년8월호)수록본 일부
최재혁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동대학원에서 조경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KnL 환경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정원과 조경 설계 실무를 익혔다. 수상 경력으로 제8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대상, 제3회 대한 민국 신진조경가 대상 설계공모전 대상, 2017 코리아가든쇼 대상 등이 있다. 2017년 한강예술공원 시범사업의 참여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스튜디오 오픈니스(Studio Openness)를 창업하여 생태적 관점을 바탕으로 정원, 공공예술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
 [다른 생각, 새로운 공간]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축제호텔대학원장
축제의 정석
[다른 생각, 새로운 공간]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축제호텔대학원장
축제의 정석
지난 5월, 대전 둔산에서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 열렸다. 주말을 낀 사흘간의 이 축제는 올해로 3회를 맞은, 미술을 주제로 한 보기 드문 지방 축제다. 전국적으로 아트×페스티벌 형태의 행사가 무수히 많은데 무슨 소리인가라는 의문에는 약간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대부분의 아트 페스티벌은 공연 위주다. 음악, 무용, 연극 등 사실상 시각 예술보다 훨씬 흡인력이 강한 장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미술은 관람객 스스로 다가가야 하고 작품의 뜻과 선호에 대한 꽤나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요구한다. 지금 시대에도 대중화되기 어려운 까닭이다. 밥 한 끼 값만 지불하면 장영주든 카라얀이든 내게 편한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에 비해 미술은 아무래도 기본 단위가 크고 상당히 번거롭다. 그래서 여느 미술 축제나 엘리트주의로 흐르기 마련이다. 예술 감독을 중심으로 작가를 선정하고 대형 설치 위주로 진행된다.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은 지역의 명망 있는 예술가 80여 명이 도심 공원 내 작은 천막에 각자의 갤러리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콜렉터에게 익숙한 아트 페어가 거리로 나온 셈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부담 없이 관람하고 구입할 수 있는 소품을 출품하는 원칙을 세웠다. 알아먹지도 못할 거대한 조형물이 아니라 중년 여성층이 선호하는 공예 작품, 맘먹으면 살 수도 있는 눈높이 예술이 주가 됐다. 고객이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한 덕분이다. 단지 관람객만이 아니다. 작가 또한 주민이고 고객이다. 축제는 그동안 만날 일이 없었던 두 고객층의 직접적 대화의 장을 이끌어냈다. 지역민이 보지 못하는 지역의 핵심 자산, 즉 집약화된 예술인 인구를 발굴하고 그들을 산업화하려는 노력이 곧 축제였기 때문이다.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은 배재대학교 정강환 교수의 근작이고, 소품에 가깝다. 그에 대한 세간의 평판은 심플하다. 성공하는 축제를 만드는 마이다스의 손.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대표 축제들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보령머드축제, 서울정동야행, 고령대가야체험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광주7080충장축제, 감천마을골목 축제 등을 개발했고, 금산인삼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함평나비 축제 등 장기간 컨설팅을 해 오며 육성한 축제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덕분에 그는 보령시, 금산군, 진주시, 고령군, 서울시 중구, 김제시 등 전국 여섯 곳의 명예 시민, 군민, 구민이기도 하다. 관광의 약한 고리였던 야간, 겨울, 골목에 축제를 결합시킨 혁신을 이끌어왔으며 우리나라 축제의 패러다임을 바꾼 장본인이다.
도시 디자인과 재생에서 축제와 관광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다. 건강하고 매력적인 도시가 되려면 특정 시간대에만 이용된 후 나머지 시간엔 공동화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선망하는 글로벌 도시는 대부분 소위 말하는 24시간 도시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과 새벽까지 도시는 여러 종류의 사람에 의해 사용되고 즐겨진다. 24시간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축제와 관광의 역할은 막대하다. 관광객은 단지 도시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주체가 된다....(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최이규는 1976년 부산 생으로 뉴욕에서 10여 년간 실무와 실험적 작업을 병행하며 저서 『시티오브뉴욕』을 펴냈고, 북미와 유럽의 공모전에서 수차례 우승했다.UNKNP.com의 공동 창업자로서 뉴욕시립미술관, 센트럴 파크, 소호와 대구, 두바이, 올랜도, 런던, 위니펙 등에서 개인전 및 공동 전시를 가졌다.울산 원도심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로 일했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도시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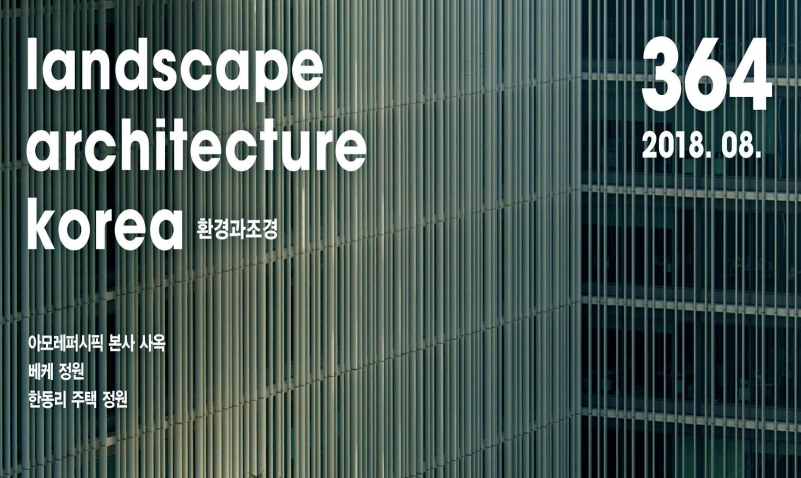 [에디토리얼] 소통과 연대의 건축
불벼락 뙤약볕, 독자 여러분은 이 여름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궁금하다. 잠시나마 불볕더위를 피하며 일상의 도시 경험을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번 8월호에 소개하는 아모레퍼시픽 신사 옥을 권한다. 대기업 본사 건물이라고 미리 위압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공항 못지않은 검색을 거쳐야 할 거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다. 반바지 입고 샌들 신었다고 주저할 이유도 없다. 4호선 신용산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지하층에서 에스컬레이터 한번만 타면 외부인에게 개방된 이 건물의 넓고 높은 아트리움이 나온다. 특별한 정문 없이 사방의 가로 어디에서든 문만 열면 이 아트리 움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 1층부터 3층까지 하나로 트인 공용 공간이다. 한강로 쪽 출구 옆 갤러리에 전시 중인 ‘아모레퍼시픽과 건축가들’에서는 이 건물의 설계자 데이비드 치퍼필드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의 건축과 조경 프로젝트를 맡아 온 알바로 시자, 김종규, 정영선 등의 작업을 영상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미술관과 박물관의 전시 도록과 자료, 포스터가 2층 구조의 서가에 빼곡한 도서관 apLAP 에서는 시간 가는줄 모르고 미술 아카이브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다. 유료이기는 하지만 지하층의 미술관 APMA 에서는 양질의 현대 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지금은 개관 기념으로 라파엘 로자노-헤머의 인터렉티브 작업이 전시되고 있다. 이 초대형 보이드 공간에서 꼭 교양 있는 문화인인 척해야 하는 건 아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층과 3층 사이의 아트리움은 일종의 광장이다. 다양한 색의 나일론을 엮어 만든 1층의 대형 벤치 ‘집착’(이광호 작)은 친구를 기다리는 약속 장소로 이미 자리 잡았다. 아모레 스토어를 구경하다가 2층과 3층에 널려 있는 세련된 디자인의 테이블과 의자(윤여범, 최형문 작)에서 마음껏 책을 보거나 졸아도 된다. 독서와 휴식에 지치면 고개를 들어 천장을 감상하면 된다. 아트리움의 유리 천장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5층 공중 정원의 연못 바닥이 겹쳐 빛과 물이 협연한다. 실내의 광장을 충분히 즐겼다면 건물 밖으로 나와 거대한 금속 원판과 얕은 연못이 서로를 비추는 올라퍼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 ‘오버디프닝overdeepening ’의 환영을 둘러보고, 키 큰 백합나무 100주가 심긴 야외 정원을 산책하면 된다. 이면 도로로 몇 걸음 옮기면 이른바 ‘용리단길’ 이다. 신사옥 입주 이후 ‘아모레 효과’에 힘입어 수십 년째 멈춰 있던 한강로2가와 용산 우체국 주변 골목이 변하고 있다. 여느 ‘뜨는 길’들이 그렇듯 하루가 다르게 ‘힙’한 카페들이 들어서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은 민간 기업의 사옥이나 업무 공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교류와 연대의 철학이 시도된 건축이다. 설계자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말하는 “직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소통과 유대의 건축” 은 듣기에만 그럴듯한 레토릭이 아니다. 메트로폴리스 한복판에서 초고층 거대 건축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속이 텅 빈 건축을, 개방형 공유 공간을 존중한 건축주의 철학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건물에 담긴 공공적 가치의 핵심은 마치 광장과도 같은 초대형 아트리움이지만, 더 큰 매력은또 다른 텅 빈 공간 세 곳에 있다. 5층, 11층, 17층에 과감하게 배치한 세 개의 공중 정원은 도시 건축의 백미다. 각각의 공중 정원에는 조경가 박승진의 단순하면서도 섬세하고 정갈하면서도 강한 디자인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다. 본문에 싣는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조경 설계와 이명준 박사의 비평 에서 그 면모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박승진 소장이 그간 추구해 온 “콘텍스트와 패턴 사이”의 조경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세 개의 공중 정원이 숭고한 감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상상의 한계 그 이상으로 다가오는 도시의 풍광 때문이다. 5층 정원 에서 조감할 수 있는 용산 미군 기지의 풍경에 용산공원의 미래가 오버랩된다. 지난 이십 년간 그려온 여러 버전의 용산공원 계획안보다 훨씬 감동적 이다. 11층 정원에서 마주하는 용산과 한강 경관은 다큐멘터리보다 더 생생하게 도시 서울의 민낯과 속살을 보여준다. 북쪽으로 열린 17층 정원의 풍광은 글로 표현하기에 역부족이다. 남산이 왜 서울의 랜드마크인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매우 아쉽게도, 우리는 이 공중 정원들에 오를 수 없다. 홍보팀의 협조와 안내를 받는 취재나 공식 행사가 아닌 이상, 전망대가 아니라 기업의 업무 공간이자 직원의 휴식 공간인 곳을 개방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환경과조경』 이름으로 취재차 방문했을 때 경험한 감동을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간 답사에서는 전달할 수 없어서 몹시 안타까웠다. 소통과 연대의 건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한 아모레퍼시픽이라면, 조금 더 섬세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요일의 특정한 시간대에 한해 제한적으로라도 공중 정원을 개방하면 어떨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어떨까.
[에디토리얼] 소통과 연대의 건축
불벼락 뙤약볕, 독자 여러분은 이 여름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궁금하다. 잠시나마 불볕더위를 피하며 일상의 도시 경험을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번 8월호에 소개하는 아모레퍼시픽 신사 옥을 권한다. 대기업 본사 건물이라고 미리 위압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공항 못지않은 검색을 거쳐야 할 거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다. 반바지 입고 샌들 신었다고 주저할 이유도 없다. 4호선 신용산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지하층에서 에스컬레이터 한번만 타면 외부인에게 개방된 이 건물의 넓고 높은 아트리움이 나온다. 특별한 정문 없이 사방의 가로 어디에서든 문만 열면 이 아트리 움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 1층부터 3층까지 하나로 트인 공용 공간이다. 한강로 쪽 출구 옆 갤러리에 전시 중인 ‘아모레퍼시픽과 건축가들’에서는 이 건물의 설계자 데이비드 치퍼필드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의 건축과 조경 프로젝트를 맡아 온 알바로 시자, 김종규, 정영선 등의 작업을 영상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미술관과 박물관의 전시 도록과 자료, 포스터가 2층 구조의 서가에 빼곡한 도서관 apLAP 에서는 시간 가는줄 모르고 미술 아카이브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다. 유료이기는 하지만 지하층의 미술관 APMA 에서는 양질의 현대 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지금은 개관 기념으로 라파엘 로자노-헤머의 인터렉티브 작업이 전시되고 있다. 이 초대형 보이드 공간에서 꼭 교양 있는 문화인인 척해야 하는 건 아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층과 3층 사이의 아트리움은 일종의 광장이다. 다양한 색의 나일론을 엮어 만든 1층의 대형 벤치 ‘집착’(이광호 작)은 친구를 기다리는 약속 장소로 이미 자리 잡았다. 아모레 스토어를 구경하다가 2층과 3층에 널려 있는 세련된 디자인의 테이블과 의자(윤여범, 최형문 작)에서 마음껏 책을 보거나 졸아도 된다. 독서와 휴식에 지치면 고개를 들어 천장을 감상하면 된다. 아트리움의 유리 천장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5층 공중 정원의 연못 바닥이 겹쳐 빛과 물이 협연한다. 실내의 광장을 충분히 즐겼다면 건물 밖으로 나와 거대한 금속 원판과 얕은 연못이 서로를 비추는 올라퍼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 ‘오버디프닝overdeepening ’의 환영을 둘러보고, 키 큰 백합나무 100주가 심긴 야외 정원을 산책하면 된다. 이면 도로로 몇 걸음 옮기면 이른바 ‘용리단길’ 이다. 신사옥 입주 이후 ‘아모레 효과’에 힘입어 수십 년째 멈춰 있던 한강로2가와 용산 우체국 주변 골목이 변하고 있다. 여느 ‘뜨는 길’들이 그렇듯 하루가 다르게 ‘힙’한 카페들이 들어서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은 민간 기업의 사옥이나 업무 공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교류와 연대의 철학이 시도된 건축이다. 설계자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말하는 “직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소통과 유대의 건축” 은 듣기에만 그럴듯한 레토릭이 아니다. 메트로폴리스 한복판에서 초고층 거대 건축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속이 텅 빈 건축을, 개방형 공유 공간을 존중한 건축주의 철학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건물에 담긴 공공적 가치의 핵심은 마치 광장과도 같은 초대형 아트리움이지만, 더 큰 매력은또 다른 텅 빈 공간 세 곳에 있다. 5층, 11층, 17층에 과감하게 배치한 세 개의 공중 정원은 도시 건축의 백미다. 각각의 공중 정원에는 조경가 박승진의 단순하면서도 섬세하고 정갈하면서도 강한 디자인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다. 본문에 싣는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조경 설계와 이명준 박사의 비평 에서 그 면모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박승진 소장이 그간 추구해 온 “콘텍스트와 패턴 사이”의 조경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세 개의 공중 정원이 숭고한 감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상상의 한계 그 이상으로 다가오는 도시의 풍광 때문이다. 5층 정원 에서 조감할 수 있는 용산 미군 기지의 풍경에 용산공원의 미래가 오버랩된다. 지난 이십 년간 그려온 여러 버전의 용산공원 계획안보다 훨씬 감동적 이다. 11층 정원에서 마주하는 용산과 한강 경관은 다큐멘터리보다 더 생생하게 도시 서울의 민낯과 속살을 보여준다. 북쪽으로 열린 17층 정원의 풍광은 글로 표현하기에 역부족이다. 남산이 왜 서울의 랜드마크인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매우 아쉽게도, 우리는 이 공중 정원들에 오를 수 없다. 홍보팀의 협조와 안내를 받는 취재나 공식 행사가 아닌 이상, 전망대가 아니라 기업의 업무 공간이자 직원의 휴식 공간인 곳을 개방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환경과조경』 이름으로 취재차 방문했을 때 경험한 감동을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간 답사에서는 전달할 수 없어서 몹시 안타까웠다. 소통과 연대의 건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한 아모레퍼시픽이라면, 조금 더 섬세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요일의 특정한 시간대에 한해 제한적으로라도 공중 정원을 개방하면 어떨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어떨까. 아모레퍼시픽 본사 신사옥
Amorepacific New Headquarter
아모레퍼시픽 본사 신사옥이 건축된 장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본사 사옥이 있던 곳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으로 새 부지가 조성되었고, 때마침 주변 도시 공간에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장소의 잠재력이 크게 드러난 곳이기도 하다. 부지의 동측은 향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용산 미군 기지와 접해 있고, 북측은 가까이에서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2010년에 진행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설계자로 선정된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DCA)의 계획안은 이러한 부지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주변의 여타 신축 건물과는 확연하게 차이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건물의 몸체 그 자체가 전체 부지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었다. 건축 대지는 연접한 가로 공원과 맞닿아 있으므로 실제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두 영역이 하나의 옥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보행자 또는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조경 설계 조경설계 서안(정영선 + 박승진) 조경 설계 진행 디자인 스튜디오 loci(박승진, 강영걸, 윤일빈, 김수민, 장수연) 건축 설계DCA(해외), 해안건축(국내) 조경 감리(상주) 이병욱 조경 감리(비상주) 정영선, 박승진, 강병현, 최상민, 구보배, 오지훈 공사 감독 총괄 아모레퍼시픽 사옥건설팀 조경 공사 감독 아모레퍼시픽 비전지원팀(한권영) 조경 시공 총괄 현대건설(박성욱, 오인석) 시공 감리 총괄 건원 조경 시공 감리(비상주) 건원(한경환) 조경 식재 정한조경(배상민, 한동명) 조경 시설물 대화조경(김충래, 김석호, 양효성) 위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대지 면적 14,525.7m 2 조경 면적2,746.7m 2 설계 기간2011~2015 공사 기간2016~2017 준공2017. 12. 사진 양해남
아모레퍼시픽 본사 신사옥
Amorepacific New Headquarter
아모레퍼시픽 본사 신사옥이 건축된 장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본사 사옥이 있던 곳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으로 새 부지가 조성되었고, 때마침 주변 도시 공간에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장소의 잠재력이 크게 드러난 곳이기도 하다. 부지의 동측은 향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용산 미군 기지와 접해 있고, 북측은 가까이에서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2010년에 진행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설계자로 선정된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DCA)의 계획안은 이러한 부지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주변의 여타 신축 건물과는 확연하게 차이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건물의 몸체 그 자체가 전체 부지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었다. 건축 대지는 연접한 가로 공원과 맞닿아 있으므로 실제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두 영역이 하나의 옥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보행자 또는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조경 설계 조경설계 서안(정영선 + 박승진) 조경 설계 진행 디자인 스튜디오 loci(박승진, 강영걸, 윤일빈, 김수민, 장수연) 건축 설계DCA(해외), 해안건축(국내) 조경 감리(상주) 이병욱 조경 감리(비상주) 정영선, 박승진, 강병현, 최상민, 구보배, 오지훈 공사 감독 총괄 아모레퍼시픽 사옥건설팀 조경 공사 감독 아모레퍼시픽 비전지원팀(한권영) 조경 시공 총괄 현대건설(박성욱, 오인석) 시공 감리 총괄 건원 조경 시공 감리(비상주) 건원(한경환) 조경 식재 정한조경(배상민, 한동명) 조경 시설물 대화조경(김충래, 김석호, 양효성) 위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대지 면적 14,525.7m 2 조경 면적2,746.7m 2 설계 기간2011~2015 공사 기간2016~2017 준공2017. 12. 사진 양해남 비평: 정원섬, 보이는 정원
조금 우회하여 이렇게 시작하자. 지금까지의 조경은 보이지 않았다고. 피터 워커와 멜라니 시모는 『보이지 않는 정원들(Invisible Gardens)』에서 동시대의 조경 작품들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반해 조형성이 두드러진 작품을 내놓았던 모더니즘 계열의 조경가들을 탐구한 바 있다.1 조경 이론가 엘리자베스 마이어는 이러한 논의를 좀 더 정교한 담론으로 진화시켰다. 마이어는 조경을 크게 ‘환경적 혹은 생태적 조경’과 경관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예술로서의 조경’으로 분류하고,2 두 가지 조경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생태적 성능을 탑재하면서도 예술로 인식되는, 말하자면 지속의 미(sustaining beauty)를 지향하는 조경 설계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3 조경이 ‘보이지 않는다(invisible)’고 할 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는다. 하나는 설계한 경관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하여 대중에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간 예술로 인식되면서 동시에 생태적 성능을 지닌 경관을 만들기 위한 조경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대지 예술에 영감을 받은 조지 하그리브스는 생태적 성능을 탑재한 유려한 랜드폼(landform)을 설계해 왔고, 마이클 반 발켄버 그는 자연의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하면서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설계 작품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근래의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은 재활용한 건축물과 구조물 덕택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쉬웠다. 마이어의 논의는 밀레니엄을 갓 넘긴 시점에 시작되었지만, 그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랜드폼을 디자인하는 실험이 빈 번하지 않은 국내에서 아직 조경은 시각적으로, 그리고 인식적으로 충분히 보이지 않았다. 조경은 좀 더 보일(visible)필요가 있다....(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이명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경 설계와 계획, 역사와 이론, 비평에 두루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박사 논문에서는 조경 드로잉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현대 조경 설계의 실무와 교육 에서 디지털 드로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고, 현재는 조경 설계에서 산업 폐허의 활용 양상과 20세기 전후의 한국 조경사를 보다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조경비평 봄’과 ‘조경연구회 보라(BoLA)’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비평: 정원섬, 보이는 정원
조금 우회하여 이렇게 시작하자. 지금까지의 조경은 보이지 않았다고. 피터 워커와 멜라니 시모는 『보이지 않는 정원들(Invisible Gardens)』에서 동시대의 조경 작품들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반해 조형성이 두드러진 작품을 내놓았던 모더니즘 계열의 조경가들을 탐구한 바 있다.1 조경 이론가 엘리자베스 마이어는 이러한 논의를 좀 더 정교한 담론으로 진화시켰다. 마이어는 조경을 크게 ‘환경적 혹은 생태적 조경’과 경관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예술로서의 조경’으로 분류하고,2 두 가지 조경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생태적 성능을 탑재하면서도 예술로 인식되는, 말하자면 지속의 미(sustaining beauty)를 지향하는 조경 설계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3 조경이 ‘보이지 않는다(invisible)’고 할 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는다. 하나는 설계한 경관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하여 대중에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간 예술로 인식되면서 동시에 생태적 성능을 지닌 경관을 만들기 위한 조경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대지 예술에 영감을 받은 조지 하그리브스는 생태적 성능을 탑재한 유려한 랜드폼(landform)을 설계해 왔고, 마이클 반 발켄버 그는 자연의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하면서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설계 작품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근래의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은 재활용한 건축물과 구조물 덕택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쉬웠다. 마이어의 논의는 밀레니엄을 갓 넘긴 시점에 시작되었지만, 그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랜드폼을 디자인하는 실험이 빈 번하지 않은 국내에서 아직 조경은 시각적으로, 그리고 인식적으로 충분히 보이지 않았다. 조경은 좀 더 보일(visible)필요가 있다....(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이명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경 설계와 계획, 역사와 이론, 비평에 두루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박사 논문에서는 조경 드로잉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현대 조경 설계의 실무와 교육 에서 디지털 드로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고, 현재는 조경 설계에서 산업 폐허의 활용 양상과 20세기 전후의 한국 조경사를 보다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조경비평 봄’과 ‘조경연구회 보라(BoLA)’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베케 정원
Veke Garden
우연한 발견, 제주의 풍경 ‘베케’는 ‘밭의 경계에 아무렇게나 두텁게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의미하는 제주말이다. 예부터 제주 사람들은 밭을 일구며 나온 돌로 밭담 ―제주도에서 밭의 가장자리에 돌을 쌓아 만든 둑―을 쌓아 경계를 만들었다. 끊임없이 나오는 돌을 계속 쌓아 올리다 보니 일반적인 담보다 높고 두꺼운 형태가 만들어졌다. 베케의 성근 돌 틈 사이로 풀과 나무가 자라나고, 건조한 바람을 막아주는 돌담과 나무 그늘은 이끼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다. ‘베케 정원’은 더가든이 관리하는 조경수 농장 인근의 귤 밭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베케를 활용해 제주의 풍광이 느껴지도록 연출한 정원이다. 크게 입구정원, 카페, 돌담정원, 고사리정원, 이끼정원과 빗물정원, 그늘정원, 목련-만병초정원, 폐허정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적인 정원에 대한 고민 ‘치밀하게 엉성하게’ 김봉찬 대표(더가든)는 제주다운 모습을 간직하면서 한국적인 느낌이 드는 정원을 연출하고자 했다. 건축 공간에 대해 자문해준 최정화 작가 또한 건물과 정원에서 한국적 아름다움이 묻어나기를 기대했다. ‘치밀하게 엉성하게’는 투박하지만 고결하고, 거칠지만 따뜻한 한국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은 콘셉트다. 베케는 제주인들이 오랫동안 척박한 농토를 일구며 고단한 일상 안에서 만들어낸 구조물이다. 여기에 시간과 생명을 더해 베케 정원의 초석을 만들었다. 거친 돌담과 이끼는 극단의 대비이자 최상의 조화로 마음을 울리는 힘을 지닌다. 이 대비와 조화의 줄다리기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베케에서 느낀 설렘을 전하고자 했다. ....(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조경 설계 및 시공 더가든 기획 최정화 건축 설계 차재 건축 시공 내츄럴시퀀스 조경 시설 예건, 영재기업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효돈로 48 면적 8,420m2 준공2018. 6. 더가든은 2007년 설립된 조경 회사로 생태학을 바탕으로 한 암석원, 고층습원 조성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 김봉찬은 제주대학교에서 식물생태학을 전공하고, 제주여미지식물원 식물과장을 거쳐 평강식물원 연구소장으로 일했다. 뿐만 아니라 식물원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왔다. 현재 한국 식물원수목원협회 이사, 제주도 문화재전문위원, 제주여미지식물원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평강식물원 암석원 및 습지원(2003), 제주도 비오토피아 생태공원(2006), 상남수목원 암석원 (2009), 국립수목원 희귀·특산식물원(201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암석원(2012) 및 고층습원(2014) 등이 있으며, 마곡 서울식물원 조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베케 정원
Veke Garden
우연한 발견, 제주의 풍경 ‘베케’는 ‘밭의 경계에 아무렇게나 두텁게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의미하는 제주말이다. 예부터 제주 사람들은 밭을 일구며 나온 돌로 밭담 ―제주도에서 밭의 가장자리에 돌을 쌓아 만든 둑―을 쌓아 경계를 만들었다. 끊임없이 나오는 돌을 계속 쌓아 올리다 보니 일반적인 담보다 높고 두꺼운 형태가 만들어졌다. 베케의 성근 돌 틈 사이로 풀과 나무가 자라나고, 건조한 바람을 막아주는 돌담과 나무 그늘은 이끼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다. ‘베케 정원’은 더가든이 관리하는 조경수 농장 인근의 귤 밭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베케를 활용해 제주의 풍광이 느껴지도록 연출한 정원이다. 크게 입구정원, 카페, 돌담정원, 고사리정원, 이끼정원과 빗물정원, 그늘정원, 목련-만병초정원, 폐허정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적인 정원에 대한 고민 ‘치밀하게 엉성하게’ 김봉찬 대표(더가든)는 제주다운 모습을 간직하면서 한국적인 느낌이 드는 정원을 연출하고자 했다. 건축 공간에 대해 자문해준 최정화 작가 또한 건물과 정원에서 한국적 아름다움이 묻어나기를 기대했다. ‘치밀하게 엉성하게’는 투박하지만 고결하고, 거칠지만 따뜻한 한국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은 콘셉트다. 베케는 제주인들이 오랫동안 척박한 농토를 일구며 고단한 일상 안에서 만들어낸 구조물이다. 여기에 시간과 생명을 더해 베케 정원의 초석을 만들었다. 거친 돌담과 이끼는 극단의 대비이자 최상의 조화로 마음을 울리는 힘을 지닌다. 이 대비와 조화의 줄다리기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베케에서 느낀 설렘을 전하고자 했다. ....(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조경 설계 및 시공 더가든 기획 최정화 건축 설계 차재 건축 시공 내츄럴시퀀스 조경 시설 예건, 영재기업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효돈로 48 면적 8,420m2 준공2018. 6. 더가든은 2007년 설립된 조경 회사로 생태학을 바탕으로 한 암석원, 고층습원 조성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 김봉찬은 제주대학교에서 식물생태학을 전공하고, 제주여미지식물원 식물과장을 거쳐 평강식물원 연구소장으로 일했다. 뿐만 아니라 식물원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왔다. 현재 한국 식물원수목원협회 이사, 제주도 문화재전문위원, 제주여미지식물원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평강식물원 암석원 및 습지원(2003), 제주도 비오토피아 생태공원(2006), 상남수목원 암석원 (2009), 국립수목원 희귀·특산식물원(201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암석원(2012) 및 고층습원(2014) 등이 있으며, 마곡 서울식물원 조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동리 주택 정원
Handongri House Garden
건축이 만드는 조경, 조경이 만드는 건축 한동리 주택 정원은 얼라이브어스ALIVEUS의 시작과 정체성을 바라보고 확인한, 일종의 전주곡 같은 프로젝트다. 편견 없는 관계 속에서 건축과 조경, 주거와 정원에 대한 담론이 오가고 여과 없는 논쟁이 이어졌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생각이 평등하게 오가다 파도처럼 부서지고 다시 읽히기를 반복, 마침내 생각에서 언어와 그림으로, 그리고 실제 풍경으로 만들어졌다. 건축가에 의해 조경의 모습이 달라지고 조경가에 의해 건축의 모양이 달라졌다. 익숙하지 않은 생각의 교환이 이루어졌고, 서로가 아쉽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그 과정을 겪은 후에야 탄력 있는 그림의 바탕이 만들어 졌다. 조경가와 건축가는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 각자 상상하기 시작했다. 건축은 조경의 캔버스가 되고, 조경은 건축의 경험으로 차용되었다. ....(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건축·조경 설계ALIVEUS(강한솔, 오승환, 김태경, 나성진, 김진아) 조경 시공ALIVEUS, 그린팜, 차용준 위치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903-1 대지 면적 625m2 건축 면적152m2 바닥 면적 180m2 조경 면적 473m2 건축 준공2017. 3. 완공2018. 7. 얼라이브어스(ALIVEUS)는 현대 도시를 만들어가는 건축, 조경, 도시재 생, 문화 기획에 기반을 둔 디자이너 그룹이며, 평등한 커뮤니케이션과 유연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학제간 디자인을 추구한다. 이러한 방식이 도시의 다양한 문맥에 더 좋은 디자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동리 주택 정원
Handongri House Garden
건축이 만드는 조경, 조경이 만드는 건축 한동리 주택 정원은 얼라이브어스ALIVEUS의 시작과 정체성을 바라보고 확인한, 일종의 전주곡 같은 프로젝트다. 편견 없는 관계 속에서 건축과 조경, 주거와 정원에 대한 담론이 오가고 여과 없는 논쟁이 이어졌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생각이 평등하게 오가다 파도처럼 부서지고 다시 읽히기를 반복, 마침내 생각에서 언어와 그림으로, 그리고 실제 풍경으로 만들어졌다. 건축가에 의해 조경의 모습이 달라지고 조경가에 의해 건축의 모양이 달라졌다. 익숙하지 않은 생각의 교환이 이루어졌고, 서로가 아쉽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그 과정을 겪은 후에야 탄력 있는 그림의 바탕이 만들어 졌다. 조경가와 건축가는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 각자 상상하기 시작했다. 건축은 조경의 캔버스가 되고, 조경은 건축의 경험으로 차용되었다. ....(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건축·조경 설계ALIVEUS(강한솔, 오승환, 김태경, 나성진, 김진아) 조경 시공ALIVEUS, 그린팜, 차용준 위치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903-1 대지 면적 625m2 건축 면적152m2 바닥 면적 180m2 조경 면적 473m2 건축 준공2017. 3. 완공2018. 7. 얼라이브어스(ALIVEUS)는 현대 도시를 만들어가는 건축, 조경, 도시재 생, 문화 기획에 기반을 둔 디자이너 그룹이며, 평등한 커뮤니케이션과 유연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학제간 디자인을 추구한다. 이러한 방식이 도시의 다양한 문맥에 더 좋은 디자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노바셈 메모리얼
Novasem Memorial
거대한 공장 단지 속 정원 노바셈(Novasem)은 멕시코 서부 할리스코(Jalisco)주 교외에 위치한 옥수수 생산·가공 공장이다. 87만 제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에 공장 단지를 총2단계에 걸쳐 조성했다.저장고,생산 타워,연구소,메모리얼 정원,공장 입구를 먼저 조성했으며,향후 사무실,옥수수 건조 작업장,근로자 임시 주거 공간,카페,휴게 소가 마련될 예정이다.공장 단지 한가운데 자리한‘노 바셈 메모리얼(Novasem Memorial)’은 공장 설립자를 추모하기 위한 정원이다.추수,분류,포장,저장 등의 기능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갖춘 건물 사이에 놓인 정원은 작지만 핵심적인 공간으로 기능한다....(중략)... *환경과조경364호(2018년8월호)수록본 일부 ArchitectAlejandro Guerrero, Andrea Soto (Atelier Ars) CollaboratorsAndrea Álvarez, Juan Carlos Pérez Albo, Alexis Castillo Location Acatlán De Juárez, Jalisco, México Completion Novasem: 2017(first phase), 2020(second phase) Novasem Memorial: 2016 PhotographyAndrea Soto, Daniel Maldonado, Onnis Luque 아텔리에르 아르스(Atelier Ars)는 알레한드로 게레로(Alejandro Guerrero)와 안드레아 소토(Andrea Soto)가 이끄는 멕시코 건축설 계사무소다. 두 사람은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의 기술 고등 연구소(ITESO)를 졸업했으며, 하버드 GSD를 비롯해 보스턴 건축 대학,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 등 여러 주요 대학에서 강의한 바 있다. 주거 공간부터 복합 고층 빌딩, 전시 파빌리온까지 다양한 건축물의 설계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다수의 건축상을 받았다.
노바셈 메모리얼
Novasem Memorial
거대한 공장 단지 속 정원 노바셈(Novasem)은 멕시코 서부 할리스코(Jalisco)주 교외에 위치한 옥수수 생산·가공 공장이다. 87만 제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에 공장 단지를 총2단계에 걸쳐 조성했다.저장고,생산 타워,연구소,메모리얼 정원,공장 입구를 먼저 조성했으며,향후 사무실,옥수수 건조 작업장,근로자 임시 주거 공간,카페,휴게 소가 마련될 예정이다.공장 단지 한가운데 자리한‘노 바셈 메모리얼(Novasem Memorial)’은 공장 설립자를 추모하기 위한 정원이다.추수,분류,포장,저장 등의 기능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갖춘 건물 사이에 놓인 정원은 작지만 핵심적인 공간으로 기능한다....(중략)... *환경과조경364호(2018년8월호)수록본 일부 ArchitectAlejandro Guerrero, Andrea Soto (Atelier Ars) CollaboratorsAndrea Álvarez, Juan Carlos Pérez Albo, Alexis Castillo Location Acatlán De Juárez, Jalisco, México Completion Novasem: 2017(first phase), 2020(second phase) Novasem Memorial: 2016 PhotographyAndrea Soto, Daniel Maldonado, Onnis Luque 아텔리에르 아르스(Atelier Ars)는 알레한드로 게레로(Alejandro Guerrero)와 안드레아 소토(Andrea Soto)가 이끄는 멕시코 건축설 계사무소다. 두 사람은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의 기술 고등 연구소(ITESO)를 졸업했으며, 하버드 GSD를 비롯해 보스턴 건축 대학,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 등 여러 주요 대학에서 강의한 바 있다. 주거 공간부터 복합 고층 빌딩, 전시 파빌리온까지 다양한 건축물의 설계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다수의 건축상을 받았다. 모내시 대학교 어스 사이언스 가든
Earth Sciences Garden, Monash University
모내시 대학교(Monash University)의 어스 사이언스 가든(Earth Sciences Garden)은 호주 빅토리아(Victoria)주의 지질학 및 지형학적 특징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이자, 지구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야외 실험실이다. 이 정원은 지구과학과 조경, 예술 작품을 하나로 통합하며 독창적이고 반자연적인(seminatural)경관을 연출한다. 또한 정원을 지리학을 가르치는 데 혁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 과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경관 빅토리아 주는 암석이 많은 깁슬랜드(Gippsland)와 오트 웨이(Otway)해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서부의 평원, 위머라 말리(Wimmera Mallee)의 사구 지역이 특징 적인 곳이다. 이러한 지리 및 지질학적 특징을 형상화한 지형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일련의 암석을 배치했 다. 독특한 형태의 인공 지형에서 야라 Yarra 강이 굽이친 흔적과 탈리 캉Talli Karng호수의 형상을 발견할 수있다. 비가 오면 이 인공 지형에 떨어진 빗물이 중앙의 금이 간 진흙 판을 향해 흘러 들어가 호수를 형성하게 된다....(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Landscape Architects Rush Wright Associates Project Management TSA Management(Stephen Lindsay) Planting Design Collaborator Paul Thompson Civil, Structural, Hydraulic and Electrical Engineer Wood and Grieve Engineers Lighting NDY Light Art Open Spatial Workshop Cost Planning Donald Cant Watts Corke Contractor Australian Native Landscape Constructions Stone Supply Pyrenees Quarries Client Monash University Location Monash University, Clayton Campus, Melbourne, Australia Area 4,000m2 Design 2016 Completion 2016 Photograghs Michael Wright, John Gollings, Julie Boyce 호주 멜버른에 기반을 둔 러시 라이트 어소시에이츠(Rush Wright Associates)는 조경 설계, 도시계획, 생태 설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계사무소다. 러시 라이트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이자 공동 대표인 캐서린 러시(Catherine Rush)와 마이클 라이트(Michael Wright)의 풍부한 설계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결합해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의 사무소와 협력해 국제적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디자인을 통해 지속 가능성, 공동 체의 가치, 새로운 환경 의제 등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포용하고자 힘쓰고 있다.
모내시 대학교 어스 사이언스 가든
Earth Sciences Garden, Monash University
모내시 대학교(Monash University)의 어스 사이언스 가든(Earth Sciences Garden)은 호주 빅토리아(Victoria)주의 지질학 및 지형학적 특징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이자, 지구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야외 실험실이다. 이 정원은 지구과학과 조경, 예술 작품을 하나로 통합하며 독창적이고 반자연적인(seminatural)경관을 연출한다. 또한 정원을 지리학을 가르치는 데 혁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 과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경관 빅토리아 주는 암석이 많은 깁슬랜드(Gippsland)와 오트 웨이(Otway)해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서부의 평원, 위머라 말리(Wimmera Mallee)의 사구 지역이 특징 적인 곳이다. 이러한 지리 및 지질학적 특징을 형상화한 지형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일련의 암석을 배치했 다. 독특한 형태의 인공 지형에서 야라 Yarra 강이 굽이친 흔적과 탈리 캉Talli Karng호수의 형상을 발견할 수있다. 비가 오면 이 인공 지형에 떨어진 빗물이 중앙의 금이 간 진흙 판을 향해 흘러 들어가 호수를 형성하게 된다....(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Landscape Architects Rush Wright Associates Project Management TSA Management(Stephen Lindsay) Planting Design Collaborator Paul Thompson Civil, Structural, Hydraulic and Electrical Engineer Wood and Grieve Engineers Lighting NDY Light Art Open Spatial Workshop Cost Planning Donald Cant Watts Corke Contractor Australian Native Landscape Constructions Stone Supply Pyrenees Quarries Client Monash University Location Monash University, Clayton Campus, Melbourne, Australia Area 4,000m2 Design 2016 Completion 2016 Photograghs Michael Wright, John Gollings, Julie Boyce 호주 멜버른에 기반을 둔 러시 라이트 어소시에이츠(Rush Wright Associates)는 조경 설계, 도시계획, 생태 설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계사무소다. 러시 라이트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이자 공동 대표인 캐서린 러시(Catherine Rush)와 마이클 라이트(Michael Wright)의 풍부한 설계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결합해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의 사무소와 협력해 국제적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디자인을 통해 지속 가능성, 공동 체의 가치, 새로운 환경 의제 등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포용하고자 힘쓰고 있다. 기흥역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용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선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는 미술관, 민속촌 등 문화·관광 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해 풍부한 문화 자원을 자랑하는 주거 단지 다. 사거리와 면한 단지의 외곽부는 상가로 계획했으며, 입구성을 강조하고자 각 단지의 주출입구에 키가 크고 수형이 아름다운 소나무를 일렬로 식재했다. 센트럴 푸르지오는 여섯 동 1,316세대, 파크 푸르지오는 다섯 동 768세대 규모로 약 2,000세대 이상을 수용하는 단지다. 조경 면적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효율 적인 공간 구성을 통해 넉넉한 외부 공간을 확보하고 각 단지의 여건에 따라 특색 있는 조경 공간을 계획했 다. 비교적 규모가 큰 센트럴 푸르지오의 조경 공간은 모던하고 개방감 있게 연출했으며, 센트럴 푸르지오에 비해 규모가 작은 파크 푸르지오는 단지를 하나의 정원처럼 구성했다. 두 단지가 맞닿은 곳에는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의 동일한 수종을 식재해 단지의 경계를 완화하고 동질감을 주었다....(중략)... *환경과조경364호(2018년8월호)수록본 일부 조경 설계 센트럴: (주)예서림 파크: (주)기술사사무소 아텍플러스 건축 설계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주)대우건설 조경 식재(시설 포함) 영산조경(주) 조경 시설 센트럴: 유경건설(주) 휴게 시설 (주)에코밸리 놀이 시설 센트럴: (주)청우펀스테이션 파크: (주)원앤티에스 위치 경기도 용인시 구갈동 234 일대 대지 면적 센트럴: 38,896.2m 2 파크: 22,687.9m 2 조경 면적 센트럴: 11,535.08m 2 파크: 6,833.02m 2 준공 센트럴: 2018. 6. 파크: 2018. 7.
기흥역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용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선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는 미술관, 민속촌 등 문화·관광 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해 풍부한 문화 자원을 자랑하는 주거 단지 다. 사거리와 면한 단지의 외곽부는 상가로 계획했으며, 입구성을 강조하고자 각 단지의 주출입구에 키가 크고 수형이 아름다운 소나무를 일렬로 식재했다. 센트럴 푸르지오는 여섯 동 1,316세대, 파크 푸르지오는 다섯 동 768세대 규모로 약 2,000세대 이상을 수용하는 단지다. 조경 면적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효율 적인 공간 구성을 통해 넉넉한 외부 공간을 확보하고 각 단지의 여건에 따라 특색 있는 조경 공간을 계획했 다. 비교적 규모가 큰 센트럴 푸르지오의 조경 공간은 모던하고 개방감 있게 연출했으며, 센트럴 푸르지오에 비해 규모가 작은 파크 푸르지오는 단지를 하나의 정원처럼 구성했다. 두 단지가 맞닿은 곳에는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의 동일한 수종을 식재해 단지의 경계를 완화하고 동질감을 주었다....(중략)... *환경과조경364호(2018년8월호)수록본 일부 조경 설계 센트럴: (주)예서림 파크: (주)기술사사무소 아텍플러스 건축 설계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주)대우건설 조경 식재(시설 포함) 영산조경(주) 조경 시설 센트럴: 유경건설(주) 휴게 시설 (주)에코밸리 놀이 시설 센트럴: (주)청우펀스테이션 파크: (주)원앤티에스 위치 경기도 용인시 구갈동 234 일대 대지 면적 센트럴: 38,896.2m 2 파크: 22,687.9m 2 조경 면적 센트럴: 11,535.08m 2 파크: 6,833.02m 2 준공 센트럴: 2018. 6. 파크: 2018. 7. [그들이 설계하는 법] 스케일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고르는 차원에서 본 연재의 흐름을 다시 짚어 보자. 나는 설계의 구성 요소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세 차례의 연재를 통해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요소에 대한 나의 설계 관점을 공유하고자 한다.1첫 번째 범주에는 분위기, 맥락, 주제와 같이 개념적인 요소가 속한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요소는 스케일, 형태, 비례, 색, 질감과 같이 개념적인 동시에 실재성을 갖는 것들이다.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요소는 식물, 빛, 온도, 습도, 바람 등과 같이 공간을 구성하는 실재적 재료다. 공간을 짓는 일은 종종 글을 쓰는 일에 비유되곤 하는 데, 앞서 예시한 요소 중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것은 글을 구성하는 어휘(단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요소는 어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문법 내지는 어투라고 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아직 설계가로서의 독창적인 어투를 만들지 못했다. 아마도 많은 젊은 설계가가 나와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스타일2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연재에서는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요소 중 최근에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케일’에 대해 집중하여 다루고자 한다. 스케일 ‘이 드로잉은 스케일이 안 맞다’ 또는 ‘이 공간은 스케일이 잘 맞다’. 설계 수업을 들은 적 있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이와 비슷한 코멘트를 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이란 무엇일까? 흔히 우리는 스케일을 ‘크기나 치수’라고 이해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스케일은 모든 공간 구성 요소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작은 정원을 예로 들면, 정원의 규모, 그 안에 놓인 나무와 꽃의 크기, 산책로의 폭, 그것을 포장 하는 재료의 크기와 패턴, 산책로 옆에 놓인 벤치의 적절한 높이 등을 결정하는 일이 모두 스케일 이슈에 해당한다. 그런데 과연 스케일을 단순히 크기나 치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까? 건축가 페터 춤토르(Peter Zumthor)는 이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한다. 그는 스케일 이라는 표현 대신“친밀함의 수준”3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의 표현은 크기나 치수에 집중하는 기존의 스케일에 대한 관점을 확장시킨다. 이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크기뿐만 아니라 공간이 나와 떨어진 거리, 근접성, 공간이 나에게 전달하는 감정적 요소(편안함, 압도감, 친밀함 등)를 포함한다....(중략)... **각주 정리 1.논의의 자세한 취지와 방향은 연재 1회차(『환경과조경』 2018년 7월호, pp.94~101)를 참고 바란다. 2.문학 작품에서 작가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이나 구성의 특질, 『표준국어대사전』, 2018. 3.Peter Zumthor, 장택수 역, 『분위기』, 나무생각, 2013, p. 49. *환경과조경364호(2018년8월호)수록본 일부 최재혁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동대학원에서 조경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KnL 환경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정원과 조경 설계 실무를 익혔다. 수상 경력으로 제8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대상, 제3회 대한 민국 신진조경가 대상 설계공모전 대상, 2017 코리아가든쇼 대상 등이 있다. 2017년 한강예술공원 시범사업의 참여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스튜디오 오픈니스(Studio Openness)를 창업하여 생태적 관점을 바탕으로 정원, 공공예술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이 설계하는 법] 스케일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고르는 차원에서 본 연재의 흐름을 다시 짚어 보자. 나는 설계의 구성 요소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세 차례의 연재를 통해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요소에 대한 나의 설계 관점을 공유하고자 한다.1첫 번째 범주에는 분위기, 맥락, 주제와 같이 개념적인 요소가 속한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요소는 스케일, 형태, 비례, 색, 질감과 같이 개념적인 동시에 실재성을 갖는 것들이다.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요소는 식물, 빛, 온도, 습도, 바람 등과 같이 공간을 구성하는 실재적 재료다. 공간을 짓는 일은 종종 글을 쓰는 일에 비유되곤 하는 데, 앞서 예시한 요소 중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것은 글을 구성하는 어휘(단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요소는 어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문법 내지는 어투라고 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아직 설계가로서의 독창적인 어투를 만들지 못했다. 아마도 많은 젊은 설계가가 나와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스타일2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연재에서는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요소 중 최근에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케일’에 대해 집중하여 다루고자 한다. 스케일 ‘이 드로잉은 스케일이 안 맞다’ 또는 ‘이 공간은 스케일이 잘 맞다’. 설계 수업을 들은 적 있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이와 비슷한 코멘트를 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이란 무엇일까? 흔히 우리는 스케일을 ‘크기나 치수’라고 이해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스케일은 모든 공간 구성 요소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작은 정원을 예로 들면, 정원의 규모, 그 안에 놓인 나무와 꽃의 크기, 산책로의 폭, 그것을 포장 하는 재료의 크기와 패턴, 산책로 옆에 놓인 벤치의 적절한 높이 등을 결정하는 일이 모두 스케일 이슈에 해당한다. 그런데 과연 스케일을 단순히 크기나 치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까? 건축가 페터 춤토르(Peter Zumthor)는 이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한다. 그는 스케일 이라는 표현 대신“친밀함의 수준”3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의 표현은 크기나 치수에 집중하는 기존의 스케일에 대한 관점을 확장시킨다. 이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크기뿐만 아니라 공간이 나와 떨어진 거리, 근접성, 공간이 나에게 전달하는 감정적 요소(편안함, 압도감, 친밀함 등)를 포함한다....(중략)... **각주 정리 1.논의의 자세한 취지와 방향은 연재 1회차(『환경과조경』 2018년 7월호, pp.94~101)를 참고 바란다. 2.문학 작품에서 작가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이나 구성의 특질, 『표준국어대사전』, 2018. 3.Peter Zumthor, 장택수 역, 『분위기』, 나무생각, 2013, p. 49. *환경과조경364호(2018년8월호)수록본 일부 최재혁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동대학원에서 조경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KnL 환경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정원과 조경 설계 실무를 익혔다. 수상 경력으로 제8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대상, 제3회 대한 민국 신진조경가 대상 설계공모전 대상, 2017 코리아가든쇼 대상 등이 있다. 2017년 한강예술공원 시범사업의 참여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스튜디오 오픈니스(Studio Openness)를 창업하여 생태적 관점을 바탕으로 정원, 공공예술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생각, 새로운 공간]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축제호텔대학원장
축제의 정석
지난 5월, 대전 둔산에서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 열렸다. 주말을 낀 사흘간의 이 축제는 올해로 3회를 맞은, 미술을 주제로 한 보기 드문 지방 축제다. 전국적으로 아트×페스티벌 형태의 행사가 무수히 많은데 무슨 소리인가라는 의문에는 약간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대부분의 아트 페스티벌은 공연 위주다. 음악, 무용, 연극 등 사실상 시각 예술보다 훨씬 흡인력이 강한 장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미술은 관람객 스스로 다가가야 하고 작품의 뜻과 선호에 대한 꽤나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요구한다. 지금 시대에도 대중화되기 어려운 까닭이다. 밥 한 끼 값만 지불하면 장영주든 카라얀이든 내게 편한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에 비해 미술은 아무래도 기본 단위가 크고 상당히 번거롭다. 그래서 여느 미술 축제나 엘리트주의로 흐르기 마련이다. 예술 감독을 중심으로 작가를 선정하고 대형 설치 위주로 진행된다.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은 지역의 명망 있는 예술가 80여 명이 도심 공원 내 작은 천막에 각자의 갤러리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콜렉터에게 익숙한 아트 페어가 거리로 나온 셈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부담 없이 관람하고 구입할 수 있는 소품을 출품하는 원칙을 세웠다. 알아먹지도 못할 거대한 조형물이 아니라 중년 여성층이 선호하는 공예 작품, 맘먹으면 살 수도 있는 눈높이 예술이 주가 됐다. 고객이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한 덕분이다. 단지 관람객만이 아니다. 작가 또한 주민이고 고객이다. 축제는 그동안 만날 일이 없었던 두 고객층의 직접적 대화의 장을 이끌어냈다. 지역민이 보지 못하는 지역의 핵심 자산, 즉 집약화된 예술인 인구를 발굴하고 그들을 산업화하려는 노력이 곧 축제였기 때문이다.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은 배재대학교 정강환 교수의 근작이고, 소품에 가깝다. 그에 대한 세간의 평판은 심플하다. 성공하는 축제를 만드는 마이다스의 손.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대표 축제들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보령머드축제, 서울정동야행, 고령대가야체험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광주7080충장축제, 감천마을골목 축제 등을 개발했고, 금산인삼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함평나비 축제 등 장기간 컨설팅을 해 오며 육성한 축제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덕분에 그는 보령시, 금산군, 진주시, 고령군, 서울시 중구, 김제시 등 전국 여섯 곳의 명예 시민, 군민, 구민이기도 하다. 관광의 약한 고리였던 야간, 겨울, 골목에 축제를 결합시킨 혁신을 이끌어왔으며 우리나라 축제의 패러다임을 바꾼 장본인이다. 도시 디자인과 재생에서 축제와 관광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다. 건강하고 매력적인 도시가 되려면 특정 시간대에만 이용된 후 나머지 시간엔 공동화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선망하는 글로벌 도시는 대부분 소위 말하는 24시간 도시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과 새벽까지 도시는 여러 종류의 사람에 의해 사용되고 즐겨진다. 24시간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축제와 관광의 역할은 막대하다. 관광객은 단지 도시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주체가 된다....(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최이규는 1976년 부산 생으로 뉴욕에서 10여 년간 실무와 실험적 작업을 병행하며 저서 『시티오브뉴욕』을 펴냈고, 북미와 유럽의 공모전에서 수차례 우승했다.UNKNP.com의 공동 창업자로서 뉴욕시립미술관, 센트럴 파크, 소호와 대구, 두바이, 올랜도, 런던, 위니펙 등에서 개인전 및 공동 전시를 가졌다.울산 원도심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로 일했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도시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다른 생각, 새로운 공간]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축제호텔대학원장
축제의 정석
지난 5월, 대전 둔산에서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 열렸다. 주말을 낀 사흘간의 이 축제는 올해로 3회를 맞은, 미술을 주제로 한 보기 드문 지방 축제다. 전국적으로 아트×페스티벌 형태의 행사가 무수히 많은데 무슨 소리인가라는 의문에는 약간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대부분의 아트 페스티벌은 공연 위주다. 음악, 무용, 연극 등 사실상 시각 예술보다 훨씬 흡인력이 강한 장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미술은 관람객 스스로 다가가야 하고 작품의 뜻과 선호에 대한 꽤나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요구한다. 지금 시대에도 대중화되기 어려운 까닭이다. 밥 한 끼 값만 지불하면 장영주든 카라얀이든 내게 편한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에 비해 미술은 아무래도 기본 단위가 크고 상당히 번거롭다. 그래서 여느 미술 축제나 엘리트주의로 흐르기 마련이다. 예술 감독을 중심으로 작가를 선정하고 대형 설치 위주로 진행된다.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은 지역의 명망 있는 예술가 80여 명이 도심 공원 내 작은 천막에 각자의 갤러리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콜렉터에게 익숙한 아트 페어가 거리로 나온 셈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부담 없이 관람하고 구입할 수 있는 소품을 출품하는 원칙을 세웠다. 알아먹지도 못할 거대한 조형물이 아니라 중년 여성층이 선호하는 공예 작품, 맘먹으면 살 수도 있는 눈높이 예술이 주가 됐다. 고객이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한 덕분이다. 단지 관람객만이 아니다. 작가 또한 주민이고 고객이다. 축제는 그동안 만날 일이 없었던 두 고객층의 직접적 대화의 장을 이끌어냈다. 지역민이 보지 못하는 지역의 핵심 자산, 즉 집약화된 예술인 인구를 발굴하고 그들을 산업화하려는 노력이 곧 축제였기 때문이다.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은 배재대학교 정강환 교수의 근작이고, 소품에 가깝다. 그에 대한 세간의 평판은 심플하다. 성공하는 축제를 만드는 마이다스의 손.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대표 축제들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보령머드축제, 서울정동야행, 고령대가야체험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광주7080충장축제, 감천마을골목 축제 등을 개발했고, 금산인삼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함평나비 축제 등 장기간 컨설팅을 해 오며 육성한 축제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덕분에 그는 보령시, 금산군, 진주시, 고령군, 서울시 중구, 김제시 등 전국 여섯 곳의 명예 시민, 군민, 구민이기도 하다. 관광의 약한 고리였던 야간, 겨울, 골목에 축제를 결합시킨 혁신을 이끌어왔으며 우리나라 축제의 패러다임을 바꾼 장본인이다. 도시 디자인과 재생에서 축제와 관광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다. 건강하고 매력적인 도시가 되려면 특정 시간대에만 이용된 후 나머지 시간엔 공동화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선망하는 글로벌 도시는 대부분 소위 말하는 24시간 도시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과 새벽까지 도시는 여러 종류의 사람에 의해 사용되고 즐겨진다. 24시간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축제와 관광의 역할은 막대하다. 관광객은 단지 도시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주체가 된다....(중략)... * 환경과조경 364호(2018년 8월호) 수록본 일부 최이규는 1976년 부산 생으로 뉴욕에서 10여 년간 실무와 실험적 작업을 병행하며 저서 『시티오브뉴욕』을 펴냈고, 북미와 유럽의 공모전에서 수차례 우승했다.UNKNP.com의 공동 창업자로서 뉴욕시립미술관, 센트럴 파크, 소호와 대구, 두바이, 올랜도, 런던, 위니펙 등에서 개인전 및 공동 전시를 가졌다.울산 원도심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로 일했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도시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