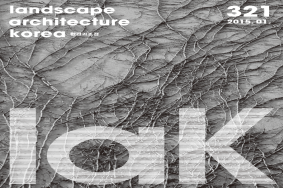 [에디토리얼] 아름다운 잡지
[에디토리얼] 아름다운 잡지
2015년 편집 계획서의 표지에 ‘아름다운 잡지’라는 여섯 글자를 크게 써놓았다. ‘아름다운 잡지’는 『환경과조경』의 비전인 ‘조경 문화의 발전소’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할 지향점이다. 내용과 형식이 적절하게 호응하는, 텍스트의 메시지와 이미지의 효과가 하나로 움직이는, 디자인이 콘텐츠를 지배하지 않고 콘텐츠의 본질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잡지’에 한걸음씩 다가서기 위해 늘 연구하고 실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올해에는 조경 담론과 사회적이슈의 생생한 교점을 찾고, 도시설계의 이론적·실천적 쟁점을 포괄하며, 신진 조경가와 필자를 발굴하는 일에 지면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린다.
엄동설한은 게으른 발걸음을 모처럼 도서관으로 향하게 한다. 잡지 편집에 참여한 이후로는 도서관에 가면 무조건 한 잡지의 십 년 치 과월호를 훑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근사하게 말하자면 사례 연구다.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패션, 여행, 시사, 교양에 이르기까지 한 시절을 풍미했던 전문지와 대중지의 옛 지면을 다시 읽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다. 이번 겨울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 책장에서 구경했던 기억이 어렴풋한 『뿌리깊은나무』를 다시 만났다.
1976년 3월 고 한창기 선생이 창간했고 1980년 8월호를 마지막으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된 『뿌리깊은나무』는 한글 전용주의와 가로쓰기 편집의 시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토박이 문화’를 발굴하고 ‘민중’을 동시대 문화의 전면에 올려놓음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에 질문을 제기한 잡지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잡지가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감동을 주는 것은 지향하는 바를 계몽이나 설교의 방식으로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뿌리깊은나무』는 도덕적 우월감을 앞세우는 대신 세련된 포장으로 지향하는 알맹이의 값어치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편집’과 ‘디자인’이 지니는 힘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여준, 아름다운 잡지의 한 모델이라 할 만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강준만은 “한국 잡지사는 뿌리깊은나무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고 평가하기까지 한다. “편집은 … 원고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눈으로 미리 읽어 저자나 필자나 역자의 눈에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였던 원고의 흠을 그들과 의논하여 가려내서, 독자가 참된 뜻에서 ‘편집된’ 책을 읽도록 거드는 일이어야 합니다”(창간 1주년 발행인의 글)라는 구절에서 여실히 나타나듯, 『뿌리깊은나무』는 편집의 기능과 편집자의 역할에 대한 신념을 지닌 잡지였다. 당대의 석학이나 문인의 글이더라도 철저하게 손질했다고 한다.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뿌리깊은나무』는 또한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에서도 전설로 남아 있다. 감각적인 스타일만을 추구하는 잡지에 익숙한 요즘 세대가 보면 이 잡지가 아무것도 디자인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너무나 단순하고 정연하여 건조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뿌리깊은나무』는 논리적인 시각적 원칙으로 책 전체의 체계를 세운, 즉 아트 디렉션을 처음 시도한 ‘아름다운 잡지’다. 수작업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활판과 사진 식자의 허술한 자간을 해결하기 위해 인화지 위의 글자를 칼로 한자씩 도려내고 조정해서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가독성을 높인 것이다. 컴퓨터 모니터와 마우스만으로 모든 디자인 작업이 쉽게 조정되는 오늘날에도 『뿌리깊은나무』처럼 유려한 시각적 질서를 갖춘 잡지를 찾기 쉽지 않다.
‘아름다운 잡지’라는 『환경과조경』의 화두는 보기예쁘거나 화려한 스타일에 대한 갈망이 아니다. 콘텐츠를 적절한 틀에 담아낼 수 있을 때 그 콘텐츠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며 그러할 때 이 작은 잡지가 조경의 문화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다. 이제는 도서관에 파묻힌 오래된 미래 『뿌리깊은나무』의 창간사 끝 부분을 옮겨 적는다.
“잡지의 구실은 작으나마 창조이겠습니다. 창조는 역사의 물줄기에 휘말려들지 않고 도랑을 파기도하고 보를 막기도 해서 그 흐름에 조금이라도 새로움을 주는 일이겠습니다. … 새로움의 가지를 뻗는 잡지가 되고자 합니다.”
새해부터는 에디토리얼을 한 달씩 번갈아가며 쓰자고 남기준 편집장과 두 달째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지고 말았다. 민망하게도, 또 과분하게도, 1년은 더 잡지 첫 쪽에서 독자 여러분을 만나야 할 운명이다. 이 신년호가 과연 아름다운지, 마지막까지 망설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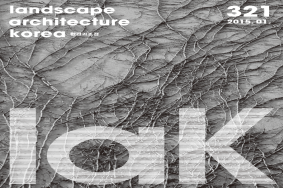 [에디토리얼] 아름다운 잡지
2015년 편집 계획서의 표지에 ‘아름다운 잡지’라는 여섯 글자를 크게 써놓았다. ‘아름다운 잡지’는 『환경과조경』의 비전인 ‘조경 문화의 발전소’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할 지향점이다. 내용과 형식이 적절하게 호응하는, 텍스트의 메시지와 이미지의 효과가 하나로 움직이는, 디자인이 콘텐츠를 지배하지 않고 콘텐츠의 본질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잡지’에 한걸음씩 다가서기 위해 늘 연구하고 실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올해에는 조경 담론과 사회적이슈의 생생한 교점을 찾고, 도시설계의 이론적·실천적 쟁점을 포괄하며, 신진 조경가와 필자를 발굴하는 일에 지면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린다. 엄동설한은 게으른 발걸음을 모처럼 도서관으로 향하게 한다. 잡지 편집에 참여한 이후로는 도서관에 가면 무조건 한 잡지의 십 년 치 과월호를 훑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근사하게 말하자면 사례 연구다.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패션, 여행, 시사, 교양에 이르기까지 한 시절을 풍미했던 전문지와 대중지의 옛 지면을 다시 읽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다. 이번 겨울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 책장에서 구경했던 기억이 어렴풋한 『뿌리깊은나무』를 다시 만났다. 1976년 3월 고 한창기 선생이 창간했고 1980년 8월호를 마지막으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된 『뿌리깊은나무』는 한글 전용주의와 가로쓰기 편집의 시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토박이 문화’를 발굴하고 ‘민중’을 동시대 문화의 전면에 올려놓음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에 질문을 제기한 잡지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잡지가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감동을 주는 것은 지향하는 바를 계몽이나 설교의 방식으로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뿌리깊은나무』는 도덕적 우월감을 앞세우는 대신 세련된 포장으로 지향하는 알맹이의 값어치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편집’과 ‘디자인’이 지니는 힘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여준, 아름다운 잡지의 한 모델이라 할 만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강준만은 “한국 잡지사는 뿌리깊은나무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고 평가하기까지 한다. “편집은 … 원고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눈으로 미리 읽어 저자나 필자나 역자의 눈에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였던 원고의 흠을 그들과 의논하여 가려내서, 독자가 참된 뜻에서 ‘편집된’ 책을 읽도록 거드는 일이어야 합니다”(창간 1주년 발행인의 글)라는 구절에서 여실히 나타나듯, 『뿌리깊은나무』는 편집의 기능과 편집자의 역할에 대한 신념을 지닌 잡지였다. 당대의 석학이나 문인의 글이더라도 철저하게 손질했다고 한다.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뿌리깊은나무』는 또한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에서도 전설로 남아 있다. 감각적인 스타일만을 추구하는 잡지에 익숙한 요즘 세대가 보면 이 잡지가 아무것도 디자인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너무나 단순하고 정연하여 건조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뿌리깊은나무』는 논리적인 시각적 원칙으로 책 전체의 체계를 세운, 즉 아트 디렉션을 처음 시도한 ‘아름다운 잡지’다. 수작업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활판과 사진 식자의 허술한 자간을 해결하기 위해 인화지 위의 글자를 칼로 한자씩 도려내고 조정해서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가독성을 높인 것이다. 컴퓨터 모니터와 마우스만으로 모든 디자인 작업이 쉽게 조정되는 오늘날에도 『뿌리깊은나무』처럼 유려한 시각적 질서를 갖춘 잡지를 찾기 쉽지 않다. ‘아름다운 잡지’라는 『환경과조경』의 화두는 보기예쁘거나 화려한 스타일에 대한 갈망이 아니다. 콘텐츠를 적절한 틀에 담아낼 수 있을 때 그 콘텐츠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며 그러할 때 이 작은 잡지가 조경의 문화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다. 이제는 도서관에 파묻힌 오래된 미래 『뿌리깊은나무』의 창간사 끝 부분을 옮겨 적는다. “잡지의 구실은 작으나마 창조이겠습니다. 창조는 역사의 물줄기에 휘말려들지 않고 도랑을 파기도하고 보를 막기도 해서 그 흐름에 조금이라도 새로움을 주는 일이겠습니다. … 새로움의 가지를 뻗는 잡지가 되고자 합니다.” 새해부터는 에디토리얼을 한 달씩 번갈아가며 쓰자고 남기준 편집장과 두 달째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지고 말았다. 민망하게도, 또 과분하게도, 1년은 더 잡지 첫 쪽에서 독자 여러분을 만나야 할 운명이다. 이 신년호가 과연 아름다운지, 마지막까지 망설여진다.
[에디토리얼] 아름다운 잡지
2015년 편집 계획서의 표지에 ‘아름다운 잡지’라는 여섯 글자를 크게 써놓았다. ‘아름다운 잡지’는 『환경과조경』의 비전인 ‘조경 문화의 발전소’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할 지향점이다. 내용과 형식이 적절하게 호응하는, 텍스트의 메시지와 이미지의 효과가 하나로 움직이는, 디자인이 콘텐츠를 지배하지 않고 콘텐츠의 본질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잡지’에 한걸음씩 다가서기 위해 늘 연구하고 실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올해에는 조경 담론과 사회적이슈의 생생한 교점을 찾고, 도시설계의 이론적·실천적 쟁점을 포괄하며, 신진 조경가와 필자를 발굴하는 일에 지면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린다. 엄동설한은 게으른 발걸음을 모처럼 도서관으로 향하게 한다. 잡지 편집에 참여한 이후로는 도서관에 가면 무조건 한 잡지의 십 년 치 과월호를 훑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근사하게 말하자면 사례 연구다.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패션, 여행, 시사, 교양에 이르기까지 한 시절을 풍미했던 전문지와 대중지의 옛 지면을 다시 읽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다. 이번 겨울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 책장에서 구경했던 기억이 어렴풋한 『뿌리깊은나무』를 다시 만났다. 1976년 3월 고 한창기 선생이 창간했고 1980년 8월호를 마지막으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된 『뿌리깊은나무』는 한글 전용주의와 가로쓰기 편집의 시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토박이 문화’를 발굴하고 ‘민중’을 동시대 문화의 전면에 올려놓음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에 질문을 제기한 잡지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잡지가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감동을 주는 것은 지향하는 바를 계몽이나 설교의 방식으로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뿌리깊은나무』는 도덕적 우월감을 앞세우는 대신 세련된 포장으로 지향하는 알맹이의 값어치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편집’과 ‘디자인’이 지니는 힘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여준, 아름다운 잡지의 한 모델이라 할 만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강준만은 “한국 잡지사는 뿌리깊은나무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고 평가하기까지 한다. “편집은 … 원고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눈으로 미리 읽어 저자나 필자나 역자의 눈에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였던 원고의 흠을 그들과 의논하여 가려내서, 독자가 참된 뜻에서 ‘편집된’ 책을 읽도록 거드는 일이어야 합니다”(창간 1주년 발행인의 글)라는 구절에서 여실히 나타나듯, 『뿌리깊은나무』는 편집의 기능과 편집자의 역할에 대한 신념을 지닌 잡지였다. 당대의 석학이나 문인의 글이더라도 철저하게 손질했다고 한다.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뿌리깊은나무』는 또한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에서도 전설로 남아 있다. 감각적인 스타일만을 추구하는 잡지에 익숙한 요즘 세대가 보면 이 잡지가 아무것도 디자인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너무나 단순하고 정연하여 건조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뿌리깊은나무』는 논리적인 시각적 원칙으로 책 전체의 체계를 세운, 즉 아트 디렉션을 처음 시도한 ‘아름다운 잡지’다. 수작업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활판과 사진 식자의 허술한 자간을 해결하기 위해 인화지 위의 글자를 칼로 한자씩 도려내고 조정해서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가독성을 높인 것이다. 컴퓨터 모니터와 마우스만으로 모든 디자인 작업이 쉽게 조정되는 오늘날에도 『뿌리깊은나무』처럼 유려한 시각적 질서를 갖춘 잡지를 찾기 쉽지 않다. ‘아름다운 잡지’라는 『환경과조경』의 화두는 보기예쁘거나 화려한 스타일에 대한 갈망이 아니다. 콘텐츠를 적절한 틀에 담아낼 수 있을 때 그 콘텐츠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며 그러할 때 이 작은 잡지가 조경의 문화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다. 이제는 도서관에 파묻힌 오래된 미래 『뿌리깊은나무』의 창간사 끝 부분을 옮겨 적는다. “잡지의 구실은 작으나마 창조이겠습니다. 창조는 역사의 물줄기에 휘말려들지 않고 도랑을 파기도하고 보를 막기도 해서 그 흐름에 조금이라도 새로움을 주는 일이겠습니다. … 새로움의 가지를 뻗는 잡지가 되고자 합니다.” 새해부터는 에디토리얼을 한 달씩 번갈아가며 쓰자고 남기준 편집장과 두 달째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지고 말았다. 민망하게도, 또 과분하게도, 1년은 더 잡지 첫 쪽에서 독자 여러분을 만나야 할 운명이다. 이 신년호가 과연 아름다운지, 마지막까지 망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