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 얽힌 우리의 삶
아파트 인생 展 2014.3.6.~2014.5.6.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아파트에 얽힌 우리의 삶
아파트 인생 展 2014.3.6.~2014.5.6.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아파트는 급작스럽게 우리 삶에 녹아들었다. 1950년대 서울에 초창기 아파트가 출현한 후 불과 30여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사람들은 각자 삶의 위치에 따라 아파트를 다르게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펼쳐진 다층적인 삶의 모습은 길지 않은 아파트 발달사 속에 촘촘하게얽혀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이를 전시로 엮어냈다.기획을 맡은 정수인 학예사는 “아파트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며 “아파트가 담고 있는 삶의 여러 모습을 통해, 주로 비판의 대상이었던 아파트를 ‘우리 것’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전시 의도를 밝혔다.
“아파트 인생” 展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뉜다. 우선 중산층의 표상이 된 ‘아파트를 좇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아파트 개발로 ‘쫓겨나는 사람들’의 삶이 이어진다. 마지막 ‘내 고향 아파트’에서는 차가운 콘크리트를 따듯한 고향으로 여기는 아파트 키드를 묘사한다.
세대와 계층의 차이로 다르게 펼쳐진 세 가지 ‘아파트인생’인 셈이다.연계 전시로 열리는 “프로젝트 APT” 展도 눈여겨볼만하다. 아파트를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현대 작가17인이 참여하여 아파트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했다.아파트의 탄생과 소멸, 아파트에 내재된 욕망, 아파트에 관한 추억과 환상이 담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아파트를 좇는 사람들: 아파트와 중산층의 역사
‘아파트를 좇는 사람들’에서는 해방 이후 최초로 건설된 종암아파트부터 오늘날의 타워팰리스로 이어지는, 아파트 공급과 중산층 양산의 역사가 전개된다. 각 시대별 아파트가 탄생한 배경과 아파트를 ‘좇는’ 중산층의 삶을 당시의 사진과 분양 홍보물, 아파트 지구도 등다양한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아파트의 발달로 인해 변화하는 어머니들의 삶과 복부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풀어냈다. 생활양식의 변화를 다룬 전시 가운데 서초삼호아파트의 내부를 구현한부분이 흥미롭다. 서초삼호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철거될 예정인데, 그곳에 살던 한 가구의 집(111m2, 33평)을 전시장에 옮겨 놓았다. 분양 당시의 모습을 거의 변형 없이 유지하기 위해 라디에이터, 붙박이형 거실장식장 등을 고스란히 전시했다. 아파트 내장재와 함께 옮겨온 생활용품과 가구는 시대에 맞게 추가 보완하여 1980년대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는데 이용했다. 관람객은 현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30년 전 아파트 생활 공간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거스르는 독특한 체험이다.
쫓겨나는 사람들: 철거민들의 이야기
아파트를 좇는 사람들이 중산층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아파트로부터 쫓겨나 삶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다. 영화 “홀리데이”(2006)의 철거 반대 운동 장면을 편집한 영상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코너는 이러한 철거민들의 삶을 다룬다. 아파트 개발은 서울의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터전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았다. 1960년대 서울 도심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은 상계, 목동 등지의 외곽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1971년에는 광주 대단지 이주 사건이 일어나면서 도시빈민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1980년대는 상계, 목동개발로 촉발된 철거민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난 시기다. 전시된 사진과 언론 출판물 등은 이러한 철거민들의 삶을 오롯이 담고 있다. 특히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 “상계동 올림픽”(1988)은 1980년대 철거민들이 마주한 처절한 현실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한다.
내 고향 아파트: 아파트 키드
세 번째 코너에 들어서면 동요 “고향의 봄”이 들려온다. 노랫말 속 ‘꽃피는 산골’을 고향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중년들에게 콘크리트로 포장된 아파트는 어색한 타향일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를 전후로 태어난 ‘아파트 키드’에게 아파트는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고향이다. 아파트가 품고 있는 그들의 다양한 추억을 보여주기 위해 약 한 달간 시민 사진 공모가 진행되었다. 전시에는 『윤미네 집』으로 유명한 고 전몽각 작가 등 총 10인의 사진이 공개된다.
재건축으로 철거를 앞둔 둔촌주공아파트를 주제로 하는 전시도 볼 수 있다. 이인규 시민큐레이터의 주도로, 둔촌주공아파트를 고향으로 여기는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모았다. 이 사진들은 전시장의 ‘기억의 지도’ 위에 놓여졌다. 사진 속에는 삭막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눈썰매를 타는 언덕, 코끼리 모양의 미끄럼틀 등 즐거움이 깃든 장소가 담겨 있다. 둔촌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키드’의 고향은 오늘날에도 재건축을 위해 허물어지고 있다. 무너진 아파트 잔해에는 이들의 따듯한 기억이 서려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우리 곁에 언제나 익숙하게 서 있는 아파트를 ‘삶’이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본다. 렌즈에 비친 아파트는 단조로운 회색 블록이 아니다. 살아있는 중산층의 역사이고, 철거민들의 삶을 누른 흔적이며, 아파트 키드의 아늑한 고향이다. 이러한 삶의 단면들은 결코 낯선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파트로 빚어진 도시 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시는 더욱 친근하게 다가온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안내하는 아파트 인생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아파트 인생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
 양질의 공원 조성으로 구도심 활성화 모색
안동시 도심소공원 설계 공모
양질의 공원 조성으로 구도심 활성화 모색
안동시 도심소공원 설계 공모
지난 2월 ‘안동 도심소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의 당선작이 발표됐다. 당선작은 해동기술개발공사가 제출한 작품으로 ‘한국의 선비 정신’을 콘셉트로 하여 안동 구도심의 소공원을 특화 공간으로 설계했다.
안동시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48억 원을 들여 ‘안동 중앙문화의거리 사업’을 시행한 바 있는 데, 이 사업은 신한은행~대구도료, 안동관~대구은행(510m) 구간의 가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공동화 되어 가는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며 사람들이 찾아들자 부족한 녹지와 야외 쉼터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시는 구도심의 부족한 녹지 해결을 위해 중앙문화의거리 시점부에 방치된 공터를 매입했고, 이를 소공원으로 조성해 중앙문화의거리와 연계된 녹지를마련하고자 했다.
공모전의 대상지는 안동시 운흥동 소공원(가칭) 외 2개소(옥야동 소공원, 태화동 소공원) 약 3,000m2로, 안동 중앙문화의거리와 연접해 있는 공간이다. 각각 안동 구시장과 신시장, 서부시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데, 방문객뿐만 아니라 시장의 상인과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겸하고 안동시에서 공 들인 ‘안동 중앙문화의거리 사업’의 연장선에 있어 소공원 대상지의 입지적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시에서는 입찰 방식이 아닌 설계공모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대부분의 소공원 조성은 입찰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에 많은 소공원들이 저가 설계 입찰이나 입찰 후의 하도와 재하도, 하급 공무원과 시공/시설물 업체의 유착 등으로 공사 결과물이 허술해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결국 재공사를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3월 7일 서울시설공단 주관으로 열린 ‘조경공사전문가 합동 토론회’에서도 설계 원안의 품질이 조경공사 품질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현장의 상황과 크게 다른 설계도면도 다수 생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발주처가 설계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길 당부하기도 했다. 조경공사 발주 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는 한 회사 기술진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로 두세 가지 안을 만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공원은 한 번 조성하면, 몇 십 년은 유지해야 하므로,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생각했다”며, 설계공모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학술회의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학술회의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
한국 인구의 1/5이 서울에 산다. 그만큼 한국의 도시 중 가장 번화하고 활성화되어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도시 곳곳에 과거의 흔적들이 스며있고, 일상에서 유구한 역사의 맥락과 닿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형과 하나 된 한양도성 성곽 유적이 서울을 가로지르고있기 때문인데,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치며 파괴되었음에도 상당 부분 그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대도시 속에서 원형을 잘 유지한 성곽 유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몇 년간 한양도성 성곽의 멸실된 구간에 대해 복원 작업과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 몇 년 사이 한양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지난해 11월 14일에는 한양도성의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그 후1년간 ‘진정성’과 ‘완전성’을 인정받으면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확정된다. 여기서 짚어볼 부분이 있다. 바로 성곽마을이다.
확장되는 유산의 개념
그동안 한양도성의 가치는 성곽 자체에만 중점을 두어 문화재라는 단편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한된 시각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한양도성 성곽과 연접한 곳에는 20여개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대개 성곽마을은 노후화된 마을로 개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왔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기점으로, 이제 그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서울연구원과 온공간연구소는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양도성 주변에 위치한 성곽마을에 대한 학술회의(서울시 후원)를 개최했다. 한양도성이 아닌, 성곽마을을 주제로 한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박소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따르면 유산의 개념과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제 장소와 경관까지도 유산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양도성의 진정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 단일 건축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서울의 장소성과 도시 경관으로서 가치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박 교수는 “단일 건축물일 때의 보존 방식과 장소 및 경관일 때의 보존 방식은 다르다”면서, “살아있는 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요인의 하나로 지역공동체의 지속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양도성 성곽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성곽마을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재개발에 발목 잡힌 주거 환경 개선
성곽마을은 계획된 마을이 아니다. 전후 피난민들이 한양도성 주변으로 모이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때문에 주거를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은데, 박학룡 대표(동네목수)는 ‘장수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곽마을의 실태를 전했다.
“장수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과 갈라진 콘크리트 벽, 깨진 골목길 계단이 눈에 들어왔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투자수익을 위해서는 동네가 더 낡고 위험해야 한다고 여기는 집주인들이 많았다. 집주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세입자들은 언제 헐릴지 모르는 남의 집을 굳이 돈을 들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재개발예정구역이 된 순간부터 전혀 관리되지 않는 동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개발 계획이 성곽마을 주민들의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꺾어놓고 있었다. 다른 마을도 이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이혜경 교수(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북정마을의 최대 화두도 재개발이었다.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마을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그렇지 않은 주민은 환경이 더욱 열악한 곳으로 밀려났다. 성곽의 보존 그리고 재개발. 환경적 제한과 개발 논리 사이에서 성곽마을 사람들은 소외되어 왔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받아들이고 살아온 것이다.
장소와 사람의 내밀한 대화
아파트 재건축이나 대규모 공사를 통한 정비가 주거환경 개선의 최선으로 여겨지던 과거의 방식은 이제 시민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정도 이러한 개발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심부 관리계획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존 장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재조명해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박학룡 대표는 주민 간의 관계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 장수마을 경관 개선 가능성을 일깨웠고, 이혜경 교수는 관官, 학學, 예藝, 민民 파트너십을 통해 북정마을을 예술의 무대로서 기능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의지를 불어넣었다. 기존과다른 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 성공적인 성곽마을 개선 사례로 꼽히며 장수마을과 북정마을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양도성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치는 사람이다. 학술회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 사이에 거듭 강조된 내용은 사람들과 장소가 가진 이야기다.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경관 향상과 한양도성 성곽의 물리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살아있는 장소가 되어야 그 가치가 배가 된다는 것이다. 송경용 이사장(나눔과 미래)은 “과거의 도시 개발방식은 개발의 희생자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해왔지만, 이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과 그들이 사는 장소의 내밀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양도성의 성곽이 살아있는 생물로서, 사람과 성이 대화하는 성곽마을로 살아 숨쉬기를기대했다.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대화. 이는 성곽마을을 넘어 도시에 대규모 개발만이 주거 환경과 경관 개선의 정답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제11회 조경의 날
제11회 조경의 날
지난 3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경학회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의 주최로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3월 3일을 조경의 날로 제정하여 갖는 첫 번째 행사인 만큼 많은 조경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1부 양병이 이사장(한국내셔널트러스트, 서울그린트러스트)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2부 조경의 날 기념식, 3부는 서울광장에서 시민참여 정원만들기 행사로 진행되었다.
양병이 이사장은 “조경의 날로 정한 3월 3일은 공원법의 제정일이며 경주 안압지의 축조일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조경을 알리고 조경인 서로 결속을 다지며, 분야를 자가진단,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경의 날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이어 새로운 조경의 키워드로 시민참여와 융합, 문화, 건강과 힐링, 기후변화, 사이버 공간 등을 언급하며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배 회장(한국조경학회,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올해부터는 범조경계의 공동주관으로 바뀌면서 조경계 통합의 새로운 잔치로 큰 의의가 있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더불어 조경계 발전을 위한 상설연구기관의 전 단계로 두 가지의 연구센터 ‘정원학연구센터’와 조경학회내 ‘조경정책연구센터’를 발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은 “특정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그 분야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 될 때 상징적 의미도 가질 수 있고, 일도 추진력 있게 진행된다.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조경 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조경의 날을 기념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국토교통 부장관 표창은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조경진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장대수 대표이사(청경엔지니어링), 정복현 대표이사(삼흥엘앤씨), 김정식 대표이사(온유조경), 정길균 대표이사(케이엘에스), 한국수자원공사, 류기혁 주무관(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이 수상하였다.
자랑스러운 조경인상은 진상철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안승홍 교수(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김인수 소장(환경조형연구소 그륀바우), 신현돈 대표이사(서안알앤디조경디자인), 양기방 편집국장(한국건설신문), 전승범 대표이사(이우환경디자인), 허남태 대표이사(신정조경), 조성학 대표이사(예진조경건설),김득일 대표(명산), 조영철 부장(GS건설)이, 공로상은 노영일 대표이사(예건)가 수상하였다.
공로상을 수상한 노영일 대표이사는 “요즘 조경산업진흥법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민생과 관련된 법률들의 추진이 폐기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국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빠른 시일 안에 조경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켜 우리 업계 독립법률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
 캐나다 ‘2014 국제 가든 페스티벌’
여섯 개의 당선작
캐나다 ‘2014 국제 가든 페스티벌’
여섯 개의 당선작
지난 1월 28일, 캐나다 퀘벡의 그랜드 메티스Grand-Métis에서 열릴 국제 가든 페스티벌 당선작들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이 가든 페스티벌은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였고, 당선작들은 이후 6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레포드 정원Reford Garden에 전시된다. 이번 공모에는 35개국의 700명이 넘는 건축가, 조경가, 디자이너 및 예술가들이 293개에 달하는 현대적 정원 설계안을 제출했다.
이번 공모의 주인공이 된 6개의 당선작은 캐나다, 한국, 스페인, 스위스, 미국 등 5개국의 설계가들에게 돌아갔다. 당선작 외에 “Bal àla villa”, “sPOTs” 2개의 프로젝트는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 공모전의 6명의 심사위원은 드니 부셰Denis Boucher(프로젝트 담당자, 퀘벡 종교유산위원회conseil du patrimoine religieux 소속), 세실 콤벨Cécile Combelle(아틀리에 바르다Barda의 건축가, 2013 가든 페스티벌에서 “he SacréPotager Garden신성한 정원”을 설계), 조경가 빈센트 르메이Vincent Lemay, 마테이 파퀸Matei Paquin(모멘트 팩토리Moment Factory의 프로젝트 개발 이사), 안 웨브Ann Webb(전 캐나다 예술 재단 운영이사이자 발행인), 그리고 알렉산더 레포드Alexander Reford(국제 가든 페스티벌과 메티스/레포드 정원jardins de Métis/Reford의 책임자)였다.
국제 가든 페스티벌과 레포드 정원
국제 가든 페스티벌은 북미 대륙에서 열리는 동시대 가든 페스티벌의 대표격이며, 가스페 반도Gaspé Peninsula의 초입에 있는 메티스 정원에서 진행된다. 엘시 레포드Elsie Reford가 조성한 역사적 장소인 메티스 정원과 인접한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역사와 현대성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보존과 전통 그리고 혁신 사이의 대화를 만들어 나간다. 매년 페스티벌에서는 세인트로렌스 강St. Lawrence River 둑 자연 환경에 대해 각자 다양한 원칙을 가지고 설계한 60명 이상의 건축가, 조경가, 디자이너들의 개념적 정원Conceptual Garden을 전시한다. 2000년도에 페스티벌이 시작된 이후, 140개 이상의 정원이 그랜드 메티스Grand-Métis에서, 그리고 캐나다 및 세계 전역에서 야외 설치 프로젝트를 통해 전시되었다.
문화 공간이자 관광지의 기능을 50년 이상 해온 레포드 정원은 오늘날 퀘벡 동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한 곳으로, 방문객들에게 감각적인 모든 경험을 제공한다. 역사적 정원 및 에스테반의 여름 별장Estevan Lodge이 있는 이 국가적 사적지는 최근 퀘벡 주정부에의해 문화 유적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참고로 레포드정원은 올해 5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휴일 없이 개장한다.
국제 가든 페스티벌은 많은 공공 및 민간 파트너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개최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경제발전은 그 자체로 경관의 실험적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도 한다. 하이드로 퀘벡Hydro-Québec은 1999년 이후부터 레포드 정원의 주요 스폰서가 되어 페스티벌을 지원하고 있다.
Afterburn
작품 “에프터번Afterburn”이 제공하는 종말 이후적postapocalyptic 체험을 통해 방문객들은 화재를 겪은 자연이 어떻게 스스로 재생하는지, 그리고 상처 입은 경관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설계자는 크세니아 캐그너Ksenia Kagner와 니코 엘리엇Nicko Elliott으로 구성된 ‘시빌리안 프로젝트 Civilian Projects’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나고 브루클린에 기반을 둔 이들의 예술과 건축은 경관과 물성이 가진 사회적 가능성에 강조점을 두며 작동한다. 이들은 세부설계 및 정원의 구조를 통해 정원 내에서 인간화된 시스템과 자연 환경 시스템 간의 상호 의존성을 읽어낼 수 있게 했다. 크세니아 캐그너는 제임스 코너의 필드오퍼레이션스 소속 PA프로젝트 건축가며, 니코 엘리엇은 창조적인 부동산 개발사 매크로 시Macro Sea의 설계 디렉터를 맡고 있다.
Cone Garden
이 정원은 오렌지색의 원형 콘cone 구조물들로 이루어진 팝업 정원이다. 정원의 콘 구조물은 건설 현장의 상징적 심벌이며,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인공물의 구축, 해체, 재구축을 상징한다. 콘 구조물은 방문객들과 이곳을 지나가는 이들을 위한 플랜터이자 의자가 되며,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이 된다. 이 작품의 설계자는 한국 서울에 소재한 ‘라이브스케이프’의 건축가이자 조경가인 유승종, 조경가 심병준, 식물 전문가 조혜령, 조경 설계가 조용철, 정일태, 김진환, 윤수정,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 권병준이다. 라이브스케이프는 살아 있는 자연적 재료를 이용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내러티브가 있는 공간을 창출한다. 이들은 다양한 스케일의 여러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으며, 예술적 측면의 접근 방식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합의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ine Garden
대상지의 자연 환경 속에 빽빽하게 정렬된 안전용 보안 테이프로 만들어진 이 현대판 미로는 이곳에 방문하고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스위스 바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캐나다 출신의 미술가 겸 디자이너인 줄리아 잠로지크Julia Jamrozik와 코린켐스터Coryn Kempster가 설계했다. 이들은 설치, 드로잉, 비디오, 건축을 통해 도시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살펴보고 이 현상들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재현한다. 잠로지크와 켐스터는 공공 영역에 대해 호기심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과 집단이 공간의 내부와 외부를 이용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은 2003년 이후부터 함께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Méristème
식물 세포 시스템을 육안으로 보이는 구조체로 재현하는 이 작품은 인류 사회의 미래를 보장해줄 식물의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떠올리게 한다. 이 정원은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의 디자이너인 캐롤라인 마가Caloline Magar, 마리 조제 가뇽Marie Josée Gagnon,프랑소와 라블랑Francois Lablanc으로 이루어진 ‘샤시CHÂSSI’가 설계했다. 샤시는 건축, 조경, 도시계획, 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변적 형태의 디자이너 그룹이다. 구성원들은 공동으로 단기간의 일시적 설치 작업을 함으로써 건축적 특징을 부각시키며, 개별 부지의 오너십을 유쾌한 방식으로 강화하기 위해 미술, 문화, 디자인 작업을 촉진시키고 있다.
Orange Secret
“오렌지 시크릿Orange Secret”은 위요된 공간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과 그 지각으로 작동된다. 이 정원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 지각을 완성하도록 해주는 수많은 자극 중에서 시각적 특징을 분리시켜 정원의 오렌지색 차원orange dimension을 탐험할 수 있게 한다.
이 작품은 미국 뉴욕의 조경가 및 도시설계가인 윌리엄 로버트William E. Roberts, 농공학자이자 조경가인 로라 산틴Laura Santin으로 구성된 ‘노마드 스튜디오NomadStudio’가 설계했다. 노마드 스튜디오는 조경 분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각 프로젝트마다 적합한 팀을 편성하여 운용한다. 이 같은 방식은 각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유연성, 동기 부여,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Rotunda
물이 담긴 원형 접시 형태의 “로툰다Rotunda”는 새와 곤충의 식량인 꽃가루와 잎사귀를 매일 모아주어 정원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작품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에 소재한 ‘시티래버러토리Citylaboratory’의 건축가 오로라 아르멘탈 루이즈Aurora Armental Ruiz와 스테파노 시울로 워커Stefano Ciurlo Walker가 설계했다. 협력적 건축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은 역사적·문화적·자연적 가치를 지닌 지역과 도시에 적합한 설계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의 진취적인 계획은 다양한 프로젝트, 워크숍, 이벤트, 출판등의 실현을 위해 모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자, 학생들을 하나로 묶어준다.
-
 The Connected City
댈러스와 트리니티 강을 연결하다
The Connected City
댈러스와 트리니티 강을 연결하다
지난 2013년 4월, 댈러스 도심과 트리니티 강을 연결하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모색하는 ‘The Connected City Design Challenge’가 시작되었다. 이 설계 공모전은 지역적·국제적으로 재능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세 개의 팀을 지명초청했다. 동시에 전문가, 비전문가, 예술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에 23개국과 21개의 디자인 스쿨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107가지의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6개월간 이 아이디어들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초청 전문 팀들의 강연, 작품 전시, 온라인 전시 등이 펼쳐졌다. 네쉬어 조각 센터Nasher Sculpture Center와 댈러스 미술관DMA, Dallas Museum of Art에서 진행된 4개의 행사에는 1,200명이 넘는 관객이 참석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마음에 드는 설계안을 직접 골랐다.
대상지는 댈러스의 핵심적인 도시 자산인 다운타운과 트리니티 강으로, 이곳은 이 도시의 삶의 질과 장소성을 높여 활기찬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될 것이다. 댈러스 다운타운의 서쪽 부분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도시 설계 문제를 대표하는 도전적 사례에 해당한다. 리버프론트, 리유니온/유니온 역Reunion/ Union Station, 댈러스 시민 센터Dallas Civic Center, 웨스트 엔드West End를 포함하는 여러 다운타운 지구로 구성된 이곳은, 사우
스사이드Southside·시더스Cedars·디자인 지구·빅토리아 공원 지역과 트리니티 강 사이에 독특하게 위치해있다. 그러나 이 지역들 중 일관성 있게 연결된 곳은 아무 곳도 없다.
지명 초청 부문에서는 Stoss+SHoP, Ricardo Bofill Taller de Arquitectura, OMA*AMO의 작품이 초청되었고, 일반 공모 부문에서는 Kohki Hiranuma Architect & Assoc., Bogdan Chipara, Raik Thoning & Marius Kreft, Mclain Clutter의 제출작이 당선되었다. 지명 초청 부문과 일반 공모 부문의 제출작을 통해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주요 테마를 도출했다. 1. 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근린의 존중과 특별 지정 ; 2. 장소를 통합하기 위한 경관의 이용 ; 3. 장애물 극복하고 공익을 더하기 위한 물의 활용 가능성 ; 4. 파편화된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잘 디자인된 가로의 필요성 ; 5. 도시의 재통합을 위한 지역 자동차 인프라스트럭처의 잠재력 ; 6. 비전의 실천을 위한 임시 법률 제정 다음에서는 지명 초청작 세 작품을 소개한다.
Hyper Density Hyper Landscape
Stoss+SHoP
고밀도의 집약적 경관은 댈러스의 미래에 대한 전략이자 비전이다. 이는 도시와 강을 재통합시키고 변화의 시작 단계를 마련해 준다. HDHLHyper Density Hyper Landscape을 통해 댈러스의 기존 도시 경관과 자연 경관의 질을 더욱 높여, 이 지역의 개발 기회와 경제적 번영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한다. HDHL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역할을 다양하게 수행하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한 경관을 활용한 도시 구역에 대한 전략이다. 그것은 댈러스의 기업, 자연 자원, 비즈니스 활동, 다양한 도시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한다. HDHL은다시 꿈꾸는 특유의 댈러스 그 자체다.
이 접근의 핵심은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진 프로그램화된 지속가능한 경관 내에 배치되는 세 개의 새롭고 역동적이고 혼합적인 근린주구다. 도시 그리드와 도시녹지의 확장은 서로 유익한 영향을 주어, 댈러스를 보다 생기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활기차고 경쟁력 있게 한다. 이러한 경관의 중심에 기존의 트리니티 강이 있다. 수질 여과와 홍수 유역으로서의 기능을 두 배로 증가시키고, 공공 공간, 습지, 정원의 생기를 획기적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 새로운 공간들은 강변 도로에 새로 설치되는 경전철과 유료 도로를 따라 확장되는 보행로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트리니티 범람원을 텍사스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공 공간으로 바뀌게 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놀 수 있는 댈러스의 중심에 성장 에너지와 활기를 넘치게 하고, 자발적이고 예기치 않은 상호 작용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집 근처에서 직접 자연을 경험하게 되어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도시와 경관의 체험을누릴 수 있게 되고, 도시 개발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공간 통행권을 성취한다. 높은 밀도, 집약적 경관, 고도의 연결성을 통해 댈러스가 새로워진다.
Dallas Trinity and Downtown The Connected City
Ricardo Bofill Taller de Arquitectura
우리는 이번 전략적 계획이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로부터 동시대의 문화에 이르는 꿈의 일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댈러스가 궁극적으로 생태, 교통, 토지 이용, 사회적 경제의 통합을 통해 다운타운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도시의 연속성은 예술지구에서부터 시작되어 보행로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과학·자연·에너지 공원, 레저 트리니티 공원Leisure Trinity Park, 그리고 새로운 선셋 프롬나드Sunset Promenade로 확장된다. ‘D 워크D walk’는 댈러스 미술관을 페롯 자연과학박물관The Perot Museum of Nature and Science까지 연결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존 F. 케네디 메모리얼 광장JFK Memorial과 새로 지은 다리를 가로질러, 강가 대로변, 바이오 돔Bio Dome, 공원, 새로운 호수로 확산된다.
고유의 흑토blackland 대초원은, 모든 가로변에 식재된 가로 레벨의 소프트/하드 조경 설계의 생태적 바탕이 된다. 또한 지역적·국제적 바이오 미메시스bio-mimesis를 통해 자연을 재생하는 +E 박물관과 공원, 야외 시장 등을 네트워크화 하는 거점이 된다.
우리의 마스터플랜은 유료 도로와 고속도로를 통합시켜 네 개의 새로운 강변 구역을 댈러스 다운타운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도시계획이다. 이는 다면적인 교통계획을 통해 가능하다. 즉 시민들이 자동차 하나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 셰어링,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BRT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다. 이는 일련의 인터체인지 거점 주변의 개발을 촉진시켜 교통체계를 완벽하게 연결하고 집과 직장 및 일상생활 공간 사이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가로를 보장해 준다. 구역별 설계와 도시 간 연결은 장소성과 정체성, 즉 ‘장소의 혼genius-loci’을 생성시킨다. 트리니티 강변 산책로는 매력적인 도시와 자연의 축이 되어, 건물 내부와 외부 거리가 연결되는 1층을 활성화시키며, 트리니티호수와 공원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다층 데크로 이어진다.
2 Rivers / 2 Cities
OMA*AMO
댈러스와 트리니티 강 코리도corridor 사이에는 현재 고속도로와 미개발 토지가 가득하다. 이 구역은 댈러스 주변에 일종의 해자를 형성하고 있어, 딜리 플라자Dealey Plaza에 면해 있는 다운타운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고 워터프론트와 도시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 우리의 비전은 댈러스 다운타운과 트리니티 강을 연결하고 이들 사이에 있는 구역을 개발하여 활력 있는 새로운 선형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자연 채광과 필터링 기능을 갖춘 강변 유역과 배수로는 오래된 트리니티 강을 재구성하여 리버프론트 대로를 따라 새로운 생태계의 축을 형성한다. 이 새로운 생태계는 개발에 기초가 되는 요소를 제공하여 다운타운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며 새롭고 또렷한 어메니티 구역을 만들어낸다.
I-35고속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위 아래로 개입시킨다. 북쪽과 남쪽에 보행자를 위해 새로 만든 다리는 주요 DART 역으로의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다운타운에 근접해있는 딜리 플라자와 휴스턴과 제퍼슨의 고가교는,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입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형된다. 이 지역의 발전을 확실히 나타내는 대상지 내에 있는 원호 형태의 두 개의 고리는 댈러스 다운타운과 트리니티 강 사이를 새롭게 잇고 새로운 강을 만든다. 두개의 원호가 활기를 되찾은 수로와 리버프론트 대로를 가로지른다. 이곳의 일련의 문화적 장소와 야외 어메니티 지역은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중심축을 형성한다.
이 축을 따라, 남쪽의 록 아일랜드Rock Island부터 북쪽의 디자인 지구Design District까지 다도해처럼 밀집된 도시섬들을 늘어놓는다. 각 섬은 그 주변의 특유한 프로그램에 따라 전략적으로 혼합되고 연결된다.
-
 [100 장면으로 재구성한 조경사] 조경의 상대성 이론
[100 장면으로 재구성한 조경사] 조경의 상대성 이론
#9
에리히 멘델존, 내 건축에 녹색 레이스를 입혀다오
미국 유타에 가면 로버트 스미스슨이 만든 달팽이 방파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막 한복판에 소위 저먼 빌리지German Village라고 하는 것이 있다. 독일인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독일식 다세대주택을 재현해 놓은 일종의 세트장이다. 세트장이지만 영화를 찍으려고 만든 것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베를린 폭격을 연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1943년부터 연합군들이 전면전에 돌입하며 카셀, 함부르크와 드레스덴 등의 다른 도시들은 불바다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베를린의 집들은 어찌 된 일인지 소이탄 공격이 별 효과가 없었다. 특히 19세기 후반부에 노동자들을 위해 튼튼하게 지은 다세대주택들이 폭격에 강했다. 그 시대에 이미 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건축 기법을 모색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연합군들이 미처 모르고 있었다. 집과 집 사이의 벽에는 창문 없는 맨 벽에 돌, 벽돌, 콘크리트 등 비연소성 소재만을 사용했고 최소한 24cm 두께로 지었으며 건축 소재뿐 아니라 건물 배치에서도 불이 서로 옮겨붙지 않도록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세심한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다.
궁리 끝에 미국 국방성의 화학전戰 담당자가 당시 미국에 망명 와 있던 독일 출신의 유대인 건축가 에리히 멘델존Eric Mendelsohn(1887~1953)에게 비밀리에 자문을 요청했다. 멘델존은 이에 응했고 거의 원본과 똑같이 건물을 만들어 주었다. 독일식의 튼튼한 가구도 만들어 넣고 침대 시트, 커튼까지 그대로 재현했다고 한다. 유타는 공기가 건조하여 발화 양상이 베를린과 달랐으므로 오일의 성질을 조정한 후, 비 내리는 베를린마냥 물을 뿌려가며 폭격 연습을 했다고 한다. 결국 폭격에 성공했고 모두 세 번을 재건하여 연습을 반복한 후 마지막에 남은 건물 두 채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어쩌면 다가올 3차 세계대전을 대비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파괴되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건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저먼 빌리지가 한때 널리 명성을 떨쳤던 스타 건축가 멘델존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당시 그는 56세였으니 원숙한 경지에 들어 왕성히 활동할 나이였지만 베를린을 떠난 뒤 운도 그를 떠났는지 별로 이렇다 할 작품을 남기지 못했다. 한때 뜻을 같이 했던 미스 반 데어 로에나 발터 그로피우스와는 달리 망명 후에 일이 썩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한창 시절은 1920년대였다. 독일 뿐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축가 중 하나였으며 소위 말하는 ‘유선형 건축Streamline Architecture’의 대표자였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포츠담에 있는 태양관측소 ‘아인슈타인 타워’다. 1919년부터 1922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아인슈타인은 여러 번 활동 무대를 옮겼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개발할 당시에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었으며 베를린의 천문학자들에게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한번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때 천문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던 프로인틀리히 교수는 첼로를 연주하는 천문학자로서 멘델존과 친한 사이였다. 멘델존의 아내도 첼리스트였으므로 서로 잘 알고 지냈다. 프로인틀리히 교수가 어느 날 멘델존에게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태양관측소를 한 번 지어볼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아인슈타인 타워였다.
완성된 관측소를 보고 아인슈타인은 “건물이 상당히 유기적이네”라고 평했다고 한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뿐 아니라 ‘유기적인 건축’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낸 셈이다. 이렇게 상대성 이론이 유기적인 건축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자 베를린과 포츠담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천문대가 준공되었던 1922년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탔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아인슈타인에게 별장을 하나 선사했는데 그 별장이 바로 포츠담근처에 있었다. 그러니 베를린과 포츠담의 시민들이 마치 자신들이 노벨상을 탄 것처럼 흥분했던 것이다. 아인슈타인 타워는 구경거리가 되었고 상대성 이론은 화젯거리가 되었다. 후에 포츠담의 칼 푀르스터 설계실에서 근무하던 헤르타 함머바허1는 상대성 이론을 정원의 형태로 한번 풀어보겠다고 기염을 토했으며 그 결과물을 1936년 드레스덴의 정원 박람회에 출품했다. 물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아인슈타인 타워로 일약 유명해진 멘델존은 곧 스타 건축가가 되었고 한창 때에는 직원 40명을 둔 큰 사무실을 운영했다. 일이 너무 많아 비명을 질렀으며 리하르트 노이트라Richard Neutra, 율리우스 포제너Julius Posener 등의 쟁쟁한 인물들이 그의 사무실에서 견습생으로 일했다. 건축학 외에 경영학도 전공한 덕분인지 멘델존은 경제적으로도 승승가 도를 달려 동료들의 시기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물론 그의 집과 재산은 나중에 나치에게 남김없이 몰수당하고 만다.
그러나 지금 에리히 멘델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까닭은 단지 그가 모더니즘의 대표 건축가 중 하나로서 고찰의 대상이 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반복해서 표현했던 그의 정원관 때문이다. 그는 자연과 정원을 사랑한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다. 건축의 단단함과 뾰족함, 직선과 모남을 식물이 부드럽게 감싸주어야 한다고 거듭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개인 주택도 다수 설계했는데 대부분 정원을 직접 만들었다. 짐작컨대 그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미국의 프랭크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유선형이라고는 하나 그의 건축은 다른 모더니즘 건축들과 마찬가지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입면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 하나의 유연한 곡선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것이 입면 전체일 수도 있고 담장의 둥근 모서리 일수도 있으며 발코니의 외곽 라인일 수도 있다. 때로는 원형 혹은 반원형의 탑을 부착하기도 했다. 건물 전체가 유기적으로 설계된 아인슈타인 타워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그는 “건물이란 아직 벌거벗은 신생아와 다름없다. 녹색의 레이스를 달아 예쁜 옷을 입혀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2라며 식물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나 얼핏 정원을 옹호하는 것 같은 이 말을 곰곰이 뜯어보면 조경가로서 그리 좋아할 일도 아니다. 그는 ‘정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녹색 레이스로서의 식물’을 말하고 있다. 사실 이런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건축가가 멘델존 하나만은 아니다. 거의 모든 건축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것이다. 다만 멘델존의 운이 좋지 않아서 제인 브라운의 『The Modern Garden』이란 책에 여러 번 인용된 덕에 지금 혼자 화살받이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어떻게 말했든 사실 그의 건축은, 특히 그의 완벽하고 매끄러운 곡선의 표면은 정원이 다가갈 틈을 내주지 않는 아성과 같다.
고정희는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손수 가꾼 아름다운 정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느 순간 그 정원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유년의 경험이 인연이 되었는지 조경을 평생의 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를 비롯 총 네 권의 정원·식물 책을 펴냈고, 칼 푀르스터와 그의 외동딸 마리안네가 쓴 책을 동시에 번역출간하기도 했다. 베를린 공과대학교 조경학과에서 ‘20세기 유럽 조경사’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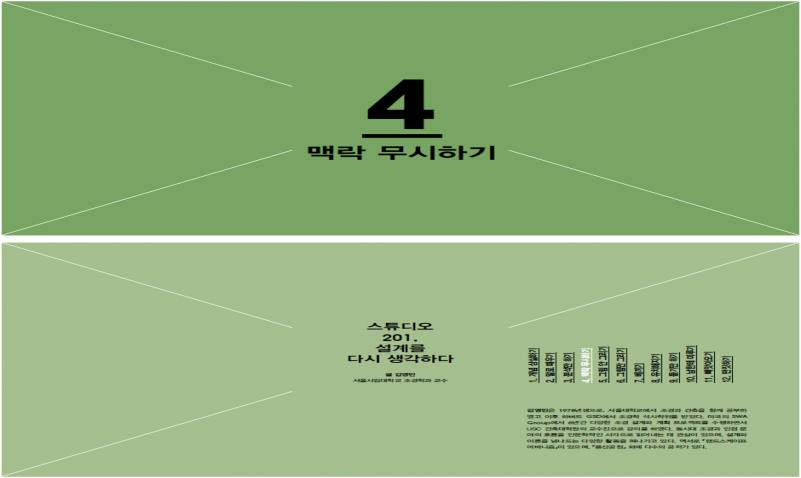 [스튜디오 201, 설계를 다시 생각하다] 맥락 무시하기
[스튜디오 201, 설계를 다시 생각하다] 맥락 무시하기
맥락의 이름으로
선유도공원, 청계천, 감천문화마을, 한양도성 길, 하늘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북한산 둘레길, 광화문광장, 북서울꿈의 숲, 이화동 벽화마을. 요 근래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다양한 조경 공간들이다. 프로젝트의 성격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디자인 방식도 전혀 다른 이 공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얼핏 보면 서로 닮은 구석을 찾기 힘든 이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 바로 맥락context이다. 요즈음 좋은 디자인이란 곧 맥락을 잘 고려하고 반영한 디자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듯하다. 화제가 되는 새로운 조경 작품이나 공모전 당선안의 설명을 보면 대상지에 남아있는 지형이 되었든, 인근 마을의 설화가 되었든, 그곳에 찾아오는 철새들이 되었든, 항상 맥락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영화를 중간부터 보면 전후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마찬가지로 주변의 맥락과 소통할 수 없는 설계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좋은 설계는 맥락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명제가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가 않다. 오랫동안 맥락을 무시하는 태도가 좋은 설계의 당연한 전제였다면 믿겠는가? 그리고 이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설계의 가치이기도 하다.
맥락이라는 새로운 바람
잠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은 유보하고 언제부터 맥락을 중심으로 설계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자. 맥락이 설계의 중요한 가치로 대두하게 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우리는 설계에서 맥락이 지니는 의미를 편견 없는 시선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조짐은 이미 1960년대부터 건축계를 중심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몇몇 선구적인 건축가들의 개별적인 실험에서 시작된 모더니즘은 곧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어 서구의 근대 문명을 대표하는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1930년대 이후에 모더니즘은 국제주의의 이름으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로 전파되어 건축과 도시는 물론, 인간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한다. 1960년대는 성기 모더니즘이 건축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한 시기였다.1 국제주의, 더 넓게는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적인 건축 운동인 모더니즘이 내세운 가치는 새로움과 보편성이었다. 새로움과 보편성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거의 모든 과거의 가치가 부정되고 지역의 특수성은 배격당했다. 이렇게 모더니즘은 거의 반세기 동안 인간의 정주 구조에서 맥락을 철저히 지워왔다. 모더니즘 거장들의 시대가 저물어가던 1960년대 들어서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왔던 모더니즘의 가치관이 만들어낸 결과는 거장들이 꿈꾸어오던 이상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전의 마을과 도시를 구성하던 골목들은 그리드 형태의 차도로 정리되었고 자연스럽게 거리에서 사람들의 소리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지붕의 모양을 보면 어느 동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색 있던 건물 대신 지루하게 반복되는 콘크리트 박스형 건축물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공간이 되었다.
모더니즘이 유일한 건축적 양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를 어쩔 수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비서구권 건축가들의 괴리감은 더욱 컸다. 유럽과 미국의 젊은 건축가들 역시 모더니즘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모더니즘은 최소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양식이었다. 그러나 제3세계의 건축가들에게 모더니즘은 서구에서 수입된, 어쩌면 강요되었을 지도 모르는 이질적인 양식이었다. 1960년대 정치적으로 과거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하고 있을 무렵 오히려 그들의 도시와 삶은 다시 근대화와 국제화라는 명분으로 종속되기 시작했다. 모더니즘은 그들의 맥락을 파괴하는 데 가장 선두에 서있었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겨울의 왕국인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 왜 지중해의 이상을 담은 수평창과 평지붕을 사용해야 하는가? 누구보다 강렬한 태양과 색채를 가진 멕시코에서 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회색과 백색의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동안 목조로 건물을 지어오던 일본에서 콘크리트와 철골의 건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새로운 그들의 건축을 시도한다.2 맥락이 다시 중요해진다. 그리고 완전한 제국을 완성했다고 자부했던 성기 모더니즘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새로움과 보편성보다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맥락을 중요시한 젊은 건축가들의 작업들은 이후 이론가들에 의해 맥락주의contextualism, 혹은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된다.3 그리고 이 새로운 흐름은 모더니즘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 선봉에 서게 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모더니즘이 끝났다는 선언은 더 이상 특별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이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이제 거장들이 떠난 모더니즘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 전선을 구성했던 후계자들은 모더니즘의 가치를 대체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해야했다. 이때 역사, 의미, 상황, 장소성, 지역성, 정체성 같이 모더니즘이 부정했던 가치들을 포괄하는 맥락의 개념이 전면에 등장한다. 맥락의 대두와 함께 조경의 가치가 새삼스럽게 주목받기 시작한다.4
솔직히 말하자면 20세기 전반부에서 조경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근대 도시와 함께 나타난 새로운 공원이 근대적 의미의 조경이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는 했지만, 인간의 정주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급진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조경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조경은 도시와 괴리된 낙원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그 모든 형태의 변화에 대한 변명거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었다. 공원은 극도로 열악해져만 가는 산업도시에 대한 구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면죄부를 주기도 했으며, 모더니즘이 과거의 맥락을 모조리 파괴해가는 과정에서도 이를 정당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맥락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는 과정에서 경관은 모더니즘이 장악했던 반세기 동안 잃어버린 가치를 복원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된다. 왜냐하면 맥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관을 만드는 조경의 역할 역시 재조명받게 된다.
김영민은 1978년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조경과 건축을 함께 공부하였고 이후 하버드 GSD에서 조경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의 SWA Group에서 6년간 다양한 조경 설계와 계획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USC 건축대학원의 교수진으로 강의를 하였다. 동시대 조경과 인접 분야의 흐름을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읽어내는 데 관심이 있으며, 설계와 이론을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역서로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이 있으며, 『용산공원』 외에 다수의 공저가 있다.
-
 [조경가의 서재] 기억 속 서가의 풍경
‘정조의 상림십경’에 대한 글을 쓰게 된
[조경가의 서재] 기억 속 서가의 풍경
‘정조의 상림십경’에 대한 글을 쓰게 된
이즘은 책은 읽지 않고 음악이나 듣고, 드라마만 보며 산다. 그래서 ‘네 놈이 읽은 책을 뱉어내라’는 죽비를 맞았을 때 궁한 마음에 이십여 년 전에 읽었던, 기억에도 가물거리는 그들을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 먼저 이해를 구한다. 내 낡은 기억의 통로를 따라가다 혹여 길을 잃더라도 당신은 명주실 되잡고 무사히 빠져나가시길 바란다.
세상에는 무수한 길이 있듯이 책 속에도 수많은 길이 있다. 그리고 어느 길로 접어드는가는 우연과 인연이 만들어낸 운명 같은 일이다. 스치고 지나갔던 옷자락이 나중에 다시 만나 환하게 밝아지는 일은, 책의 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십여 년 전쯤, 짧은 글을 하나 쓴 적이 있다. 사실 그 글은 연속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한 편만 쓰고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지금 와서 그 글을 어떻게 쓰게 되었을까 되짚어보니 꽤나 오랜시간 적잖은 만남이 거기에 얽혀 있었다.
1984년과 1985년 사이의 어느 날이었을 게다. 자주 가던 다방에서 사람들 틈에 있던 그녀는 ‘그’의 시를 내게 알려주었다. “갈 봄 여름 없이, 처형 받은 세월이었지 / 축제도 화환도 없는 세월이었지…”1로 시작되는 시,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2는 이 숨 막히는 시까지. 폭력과 저항이, 절망만큼이나 희망을 길어 올리던 그 시절을 실험적 언어와 도저한 슬픔으로 그려내던 황지우의 시집을 읽으며 나는 조금씩 성장했고, 그의 네 번째 시집 『게눈 속의 연꽃』에서 ‘산경山經’을 노래했을 때 기꺼이 그를 따라 『산해경山海經』3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와는 그즘에서 헤어지게 됐지만 말이다.
기원전 3~4세기에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산해경』은 크게 ‘산경’과 ‘해경’으로 나뉘는 중국과 그 주변에 대한 상상의 지리서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만 측정 가능한 위치와 상상의 동물, 불가해한 일이 끝없이 펼쳐진다. 지은이도 없이, 오랜 세월 주석만 첨삭되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동아시아 정신 세계의 한 부분을 그려 낸 책, 그저 이야기로만 듣던 해태며 봉황, 주작이 전부였던 내게 오백 리씩 가면 나타나는 그 많은 동물들이 멸종된 고대 생물로 느껴지는 떨림이었다. 글을 옮긴 정재서는 역자 서문과 그의 책 『동양적인 것의 슬픔』에서 고전이 담고 있는 다의적 함의와 여러 층위의 중첩을 풀어헤치며 “구조의 금간 틈, 차이에 대한 눈뜸은 항상 모든 지배적 언술 체계 내에 존재하는 이항 대립을 의식하는 시각으로부터 발생된다”4고 일깨웠다. 그리고 서구에 의해 타자화 되고, 다시 중국에 의해 타자화 되었던 중국 중심의 세계주의에 대한 독해를 위해 서쪽으로 2,765리 가면 만날 수 있는 사이드Edward W. Said를 불러들였을 때 ‘고조선에서 중화문화권에 속했다고 하는 조선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품으며, 예전에 스치며 지나듯 읽었던 먼지 덮인 문학잡지5를 다셔 펼쳐보게 되었다.
이수학은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이원조경에서 4년 동안 일했다. 프랑스 라빌레뜨 건축학교와 고등사회과학대학원이 공동 개설한 ‘정원·경관·지역’ 데으아(D.E.A.) 학위를 했고, 현재 아뜰리에나무를 꾸리고 있다.
-
 [그들이 설계하는 법] 태도, 접촉면 경관
[그들이 설계하는 법] 태도, 접촉면 경관
1 사실 기고를 마음먹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조경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설계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기획 의도와 조금 더 먼저 이 길을 가고 있는 선배로서 조경을 시작하는 학생들이나 후배들에게 들려 줄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편집진의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맘이 내키지 않는 다. 학교를 벗어나 업으로서 조경을 시작한 지 이제 고작 10년 남짓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여전히 헤매고 있는 풋내기 조경가가 지면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무모하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2 “왜 요새 블로그1에 글 안 올리세요? 예전엔 종종 들어갔었는데.” 오랜만에 방치해 두었던 블로그에 들어가 보았다. 한동안 꽤나 정성들여 글이며 자료를 올렸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뜸해졌다. “요샌 바빠서. 정신이 없네.” 사실 바쁜 일상에 쫓겨서가 아니다.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아직 여물지 않은 생각들을, 여전히 진행 중인 실험들을 글로 적는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싶어진 것이다. 나는 신입사원 면접을 할 때마다 좋아하는 조경가가 누구냐는 질문을 한다. 지원자의 설계적 성향을 파악해 보기 위함인데, 언젠가 한 친구가 “OOO이라는 우리 학교 선배요. 그 선배만큼 열정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라고 답했다. 그때는 ‘이 친구는 아는 조경가도 한 사람 없나’ 그렇게 생각했다. 한참을 지나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태도’를 이야기 한 것이었다. 유명 작가의 작품집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멋진 디자인이나 철학보다도, 가까이서 직접 보고 느낀 친한 선배의 ‘열정’이 더 큰 힘이 되었으리라. 그리고 그것이 지금 조경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 자신에게도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열정’은 언제나 과정을 의미하며, 태도를 지배한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가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 용기를 내본다.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들은 나의 조경에 대한 태도, 아직은 어설픈 과정의 이야기들이다.
3 “형, 형이 하는 설계는 잘 모르겠어요. 다이어그램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꼭 그렇게 어렵게 조경해야 되나요” 몇 해 전이다. 한 후배 녀석이 우리 회사에서 제출한 설계공모 도판을 보았는지 술자리에서 묻는다. 내가 지금까지 해 온 설계공모 작업들은 잘된 설계안이 아닐뿐더러,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다. 다이어그램은 복잡하고, 디자인은 매우 거칠고 개념적이며,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충분치 않으니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운 좋게 여러 작업들이 당선은 되었지만, 대상지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과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명쾌하게 제시해야 하는 설계공모의 결과물로서는 사실 낙제다.
4 기술사사무소 렛의 장종수 소장님과의 개인적인연으로 시작하게 된 설계공모 작업들2은 나로서는 참 행운이었다. “우린 목표가 2등이야.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하자고.” 진심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시니 맘은 편하다. 사실 당시 진행된 국내 설계공모 작품들을 보면서 항상 아쉽다고 느끼는 점들이 몇 가지 있었다. 그동안 내가 배우고 공부해 온 해외의 많은 설계공모가 그러했듯, 설계공모는 작품을 통해 설계자만의 디자인 사고와 새로운 설계 기법, 여러 가지 도시적·사회적·철학적 때론 정치적 담론까지도 공론화할 수 있는 ‘설계안 이상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시절 지겹게 보아왔던 라빌레뜨 공원이나 다운스뷰파크, 프레시킬스 뿐만 아니라 근대적 공원의 시작이자 최초의 공원 설계공모격인 센트럴파크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소위 잘 뽑아진 결과물로서의 공간적·경관적 형태와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것은 좋은 설계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좋은 설계공모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5 또 다른 한 가지는 대상지(site)를 대하는 설계자의 태도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대지와 설계안의 괴리감이다. 흔히들 우리가 설계해야 할 대상지는 백지가 아니라고 쉽게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설계는 직접적인 설계 대상인 대지, 그 장소에 담긴 경관(landscape)이라는 실체(substance)를 ‘탐구’하고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외부와의 물리적·비물리적 관계성 및 맥락성(context)을 통해 그 땅의 개념적 의미를 ‘해석’하고 ‘부여’하려는 경향이 지나치게 강하다. 게다가 하이브리드라는 시대적 흐름은 개념이나 이론, 디자인 철학이나 방법론까지도 조경이 아닌 외부로부터 차용되어야 더 ‘쿨‘한 것으로 몰아간다. 경관이라는 실체에 대한 탐구와 내부로부터의 고민 없이 밖으로의 팽창만을 꿈꾸는 조경은 걱정스럽다. 우리가 의무감처럼 행해왔던 많은 분석 리스트 중에 순수하게 조경만의 언어로 대상지를 들여다보는 분석 방법은 몇 가지나 있는가? 그것만으로 우리만의 디자인을 이끌어 내기에 여전히 충분한가? 그리고 그것들은 디자인으로 잘 발전되어 왔나?
6매번 설계공모 작업 때마다 고민하고 전달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다루어야 하는 땅에 관한 이야기,‘그 장소만의 경관 체계(landscape system)를 어떻게 읽고 해석해 나갈 것인가’와 해석된 경관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이종(異種)의 조직 속에서 작동 가능한 새로운 경관,즉 변이적 경관(landscape cultivar)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파주운정지구 도시기반시설 조경설계공모(2007)에서는 대상지의 경관을 형성해 온 기작과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의 기작을 중첩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 대지에 순응하며 도시 조직의 일부로서 작동하는 경관을 제안하고자 하였고,강북생태문화공원 설계공모(2008)에서는 대상지 내부의 자연 조직과 도시 조직이 만나는 추이대 형성 과정을 통해 대상지의 경관을 조직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체계인 메타스케이프(metascape)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충북혁신도시 설계공모(2008)에서는 대상지에 존재하는 일상적 경관 중 가장 마이크로한 경관 요소들을 찾아 이들의 재조합을 통해 경관 중합체(landscape polymer)라는 대상지만의 경관이 내재된 변이적 경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고,하남미사지구 설계공모(2009)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대상지의 경관을 지배해 온 농지의 미세 지형과 시스템,조각 숲의 구조와 기능을 새로운 공원의 기반적 시스템(infrastructural system)으로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내곡 보금자리지구 조경설계공모(2010)에서는 지형 구조가 도시의 공간감과 스케일,생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서울의 팽창 과정을 되짚어 봄으로써 알아보고자 하였고,송산그린시티 철새서식지 설계공모(2011)에서는 대상지를 여러 유형의 비오톱 조합체로 인식하고,대체 서식처로서의 작동을 위한 필수적인 비오톱을 선정하고 이들의 이식(grafting)과 복제(cloning),재조합(re-organization)을 통한 단계적 서식처의 복원을 제안하였다.
7물론 지금까지 해온 나의 작업들이 깊이 있는 논쟁을 끌어낼 만한 것들이 못 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경관을 바라보는 일관된 가치관’을 가지고 설계에 접근하려고 애써 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비록 불완전한 모습일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내어 놓는 사람들이,설계자의 가치관들을 각자의 설계 언어로 꾸준히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또 그러한 노력들이 현장에서 설계 작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더욱 가치 있을 것이다. 우리 설계가들은 매일 생각하고,시도하고,시행착오를 거친다. 조경이라는 실용적 학문에 있어서 이러한 피드백의 과정은 더 할 수 없이 중요한 가치이며,설계자 개개인이 자기만의 경관을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우리나라 조경의 스펙트럼이 더 다양해지리라 믿기 때문이다.
8경관은 하나의 장소가 작동하기 위한 공감각적 시스템이다. 사실 경관은 마치 수백만 개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작은 톱니바퀴들처럼 그곳만의 조직으로 오랫동안 서로 맞물려 작동하며 만들어진 커다란 아날로그시계와도 같다. 경관은 시간을 거슬러 하나의 장소가 작동되어 오던 그 장소만의 역사적·사회적·생태적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담아낸다. 씨앗이 토양과 소통하며 뿌리를 내리고 환경―비,바람,기온,습도 등에 반응하며 그 장소만의 식생을 이루는 것처럼, 인간이 대지와 소통하며 경작을 하고 길을 내고 공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경관은 그 속에 담겨있는 요소들 모두가 서로 반응하며 지금껏 만들어온 ‘장소와 요소, 요소와 요소들 간의 소통’에 의한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경관은 이러한 장소의 시스템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무형의 산물, 즉 공간에 대한 감흥을담는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그때의 분위기나 느낌이 전해지지 않아 아쉬워했던 경험처럼,경관은 한 장소의 소리,향기,촉감,공간감,문화,역사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장소만의 고유의 공기를 담는 공감각의 매체(synaesthetic media)다.
9변이적 경관(landscape cultivar). 우리가 설계를 해야 하는 대상지는 오랜 시간 땅과 소통하며 그 장소만의 공감각적 경관을 담고 있는 물리적 바탕이기도 하지만,동시에 앞으로 이 땅을 이용하게 될 새로운 이용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할 시간적 매체(temporal media)이기도 하다. 이때 대상지의 표면(surface)은 단순히 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실재하는 지형적 베이스(topographic base)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대상지의 역사,문화,생태계를 포함하는 이 땅의 ‘과거의 기억’을 유일하게 담아내며 현재와 관계를 맺어주는 오래된 사진 앨범과 같다. 우리들 스스로 항상 되뇌는 말처럼,‘조경’이라는 작업이 단순히 대지를 ‘화장’하는 일이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의 설계가 단순히 미학적 가치를 넘어 이 땅의 경관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경관,그 기억을 드러내고,그것이 이 땅에 들어올 새로운 조직과 유연히 작동할 수 있도록,두 조직 간의 상충(contradiction)을 경관적으로 중재(arbitration)하는 작업이 되어야함을 이야기한다. 변이적 경관이란 ‘변이’라는 말 자체가 담고 있는 것처럼 ‘본질’,이 땅의 ‘경관적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대지의 기억이 말끔히 지워진 새로운 ‘B’라는 제3의 경관이 아니라 ‘조건과 입장이 다른 여러 켜들이 얽혀서 생성적 배역을 해나가는 조경의 역할3’,즉 ‘A-1’의 경관인 것이다.
10접촉면 경관(interface landscape). 벌써 10년 전이다. 나의 블로그 타이틀이기도 한 이 용어는 대학원에서 MVRDV의 책을 읽다가 우연히 내 가슴에 박혀 버렸다.“세계는 세계와 우리의 접촉면의 관계 안에서 변화한다. 세계의 한계는 우리 접촉면의 한계다. 우리는 세계의 실체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의 접촉면 과 상호작용한다.”4
그들이 꺼내 놓은 이 단어는 내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해법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왜 대상지의 경관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해 주었다. 사실 ‘접촉면’이라는 우리말보다 ‘인터페이스’라는 외래어가 더 익숙하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핸드폰,인터넷,각종 프로그램,게임 등 우리는 하루에 수십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만난다.
우리가 매일 쓰는 포토샵의 바탕화면은 버전 업이 될 때마다,새롭게 바뀐 디자인에 놀라워하기도 하지만,바뀐 아이콘 위치에 곧 당황스러워 하기도 한다. 인터넷의 포털사이트 역시 어떤 사이트의 홈 화면은 잘 정리되어 쉽고 정확하게 그날의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어떤 곳은 쓸데없거나 잘못된 기사들을 제공해 오히려 시간만 허비시키거나 사건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조경 설계라는 작업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웹을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할 때,사용자는 ‘인터페이스 화면’이라는 유일한 매개면 만을 통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능과 정보와 소통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상지’ 역시 이용자가 한 장소에 담긴 다양한 경관적 정보들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적 매개면(environmental agency)이며,설계자가 어떠한 경관적 잠재력을 읽어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땅에 대한 의미와 이용자들의 이해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조경’이라는 작업은 대상지와 이용자 사이의 역사, 문화, 생태 그리고 공감각적 감흥을 포괄하는 접촉면 경관을 형성하는 작업이며, 그것을 통해 이 땅의 가치를 이해하고, 경관과 소통하고, 장소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의미 깊은 작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11‘또 대상지?’ 사실 진부한 것은 대상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였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만의 눈으로, 보다 창의적으로 대상지를 깊게 들여다보고, 각자가 읽은 것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밖으로부터의 언어들과는 차별되는 우리만의 디자인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각주 1
“인터페이스 랜드스케이프(www.cyworld.com/interface_landscape)”란 이름의 개인 블로그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조경 설계에 관심 있는 동료나 후배들과 나의 고민과 자료를 공유하고 싶단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늘 나의 조경 사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수학 소장(아뜰리에나무)의 열정을 좇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다
각주 2
이번호에 소개하는 설계공모 작업들은 SWA Los Angeles재직 당시 기술사사무소 렛과 개인 자격으로 협업하였거나, 이후 기술사사무소 렛의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작업한 것들이다. 그중 파주운정지구 도시기반시설 조경설계공모(나군, 2007), 강북생태문화공원 설계공모(2008),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조경설계공모(A구역, 2008)는 당시 SWA 동료였던 서울시립대학교 김영민 교수와 함께 작업하였다.
각주3
정욱주,“상충의 도시, 생성의 층위”,『LAnD: 조경·미학·디자인』,도서출판 조경, 2006.
각주 4
Peter Weibel, “Architecture as Interface”, MVRDV, MVRDV at VPRO, Actar, 1998. 재인용
김현민은 1975년생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경을 공부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조경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조경가협회(ASLA)에서 수여하는 우수졸업자상을 받았으며, 미국의 SWA Group에서 Shanghai Gubei Gold Street Plan, Symphony Park Competition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기술사사무소 렛, 비오이엔씨에서 계획, 설계 및 정원 시공에 이르는 폭 넓은 실무를 경험하였고, 국내 여러 대학에서 조경 설계를 강의하였다.
아파트에 얽힌 우리의 삶 아파트 인생 展 2014.3.6.~2014.5.6.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아파트는 급작스럽게 우리 삶에 녹아들었다. 1950년대 서울에 초창기 아파트가 출현한 후 불과 30여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사람들은 각자 삶의 위치에 따라 아파트를 다르게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펼쳐진 다층적인 삶의 모습은 길지 않은 아파트 발달사 속에 촘촘하게얽혀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이를 전시로 엮어냈다.기획을 맡은 정수인 학예사는 “아파트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며 “아파트가 담고 있는 삶의 여러 모습을 통해, 주로 비판의 대상이었던 아파트를 ‘우리 것’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전시 의도를 밝혔다. “아파트 인생” 展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뉜다. 우선 중산층의 표상이 된 ‘아파트를 좇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아파트 개발로 ‘쫓겨나는 사람들’의 삶이 이어진다. 마지막 ‘내 고향 아파트’에서는 차가운 콘크리트를 따듯한 고향으로 여기는 아파트 키드를 묘사한다. 세대와 계층의 차이로 다르게 펼쳐진 세 가지 ‘아파트인생’인 셈이다.연계 전시로 열리는 “프로젝트 APT” 展도 눈여겨볼만하다. 아파트를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현대 작가17인이 참여하여 아파트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했다.아파트의 탄생과 소멸, 아파트에 내재된 욕망, 아파트에 관한 추억과 환상이 담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아파트를 좇는 사람들: 아파트와 중산층의 역사 ‘아파트를 좇는 사람들’에서는 해방 이후 최초로 건설된 종암아파트부터 오늘날의 타워팰리스로 이어지는, 아파트 공급과 중산층 양산의 역사가 전개된다. 각 시대별 아파트가 탄생한 배경과 아파트를 ‘좇는’ 중산층의 삶을 당시의 사진과 분양 홍보물, 아파트 지구도 등다양한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아파트의 발달로 인해 변화하는 어머니들의 삶과 복부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풀어냈다. 생활양식의 변화를 다룬 전시 가운데 서초삼호아파트의 내부를 구현한부분이 흥미롭다. 서초삼호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철거될 예정인데, 그곳에 살던 한 가구의 집(111m2, 33평)을 전시장에 옮겨 놓았다. 분양 당시의 모습을 거의 변형 없이 유지하기 위해 라디에이터, 붙박이형 거실장식장 등을 고스란히 전시했다. 아파트 내장재와 함께 옮겨온 생활용품과 가구는 시대에 맞게 추가 보완하여 1980년대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는데 이용했다. 관람객은 현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30년 전 아파트 생활 공간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거스르는 독특한 체험이다. 쫓겨나는 사람들: 철거민들의 이야기 아파트를 좇는 사람들이 중산층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아파트로부터 쫓겨나 삶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다. 영화 “홀리데이”(2006)의 철거 반대 운동 장면을 편집한 영상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코너는 이러한 철거민들의 삶을 다룬다. 아파트 개발은 서울의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터전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았다. 1960년대 서울 도심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은 상계, 목동 등지의 외곽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1971년에는 광주 대단지 이주 사건이 일어나면서 도시빈민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1980년대는 상계, 목동개발로 촉발된 철거민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난 시기다. 전시된 사진과 언론 출판물 등은 이러한 철거민들의 삶을 오롯이 담고 있다. 특히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 “상계동 올림픽”(1988)은 1980년대 철거민들이 마주한 처절한 현실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한다. 내 고향 아파트: 아파트 키드 세 번째 코너에 들어서면 동요 “고향의 봄”이 들려온다. 노랫말 속 ‘꽃피는 산골’을 고향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중년들에게 콘크리트로 포장된 아파트는 어색한 타향일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를 전후로 태어난 ‘아파트 키드’에게 아파트는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고향이다. 아파트가 품고 있는 그들의 다양한 추억을 보여주기 위해 약 한 달간 시민 사진 공모가 진행되었다. 전시에는 『윤미네 집』으로 유명한 고 전몽각 작가 등 총 10인의 사진이 공개된다. 재건축으로 철거를 앞둔 둔촌주공아파트를 주제로 하는 전시도 볼 수 있다. 이인규 시민큐레이터의 주도로, 둔촌주공아파트를 고향으로 여기는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모았다. 이 사진들은 전시장의 ‘기억의 지도’ 위에 놓여졌다. 사진 속에는 삭막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눈썰매를 타는 언덕, 코끼리 모양의 미끄럼틀 등 즐거움이 깃든 장소가 담겨 있다. 둔촌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키드’의 고향은 오늘날에도 재건축을 위해 허물어지고 있다. 무너진 아파트 잔해에는 이들의 따듯한 기억이 서려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우리 곁에 언제나 익숙하게 서 있는 아파트를 ‘삶’이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본다. 렌즈에 비친 아파트는 단조로운 회색 블록이 아니다. 살아있는 중산층의 역사이고, 철거민들의 삶을 누른 흔적이며, 아파트 키드의 아늑한 고향이다. 이러한 삶의 단면들은 결코 낯선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파트로 빚어진 도시 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시는 더욱 친근하게 다가온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안내하는 아파트 인생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아파트 인생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양질의 공원 조성으로 구도심 활성화 모색
안동시 도심소공원 설계 공모
지난 2월 ‘안동 도심소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의 당선작이 발표됐다. 당선작은 해동기술개발공사가 제출한 작품으로 ‘한국의 선비 정신’을 콘셉트로 하여 안동 구도심의 소공원을 특화 공간으로 설계했다. 안동시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48억 원을 들여 ‘안동 중앙문화의거리 사업’을 시행한 바 있는 데, 이 사업은 신한은행~대구도료, 안동관~대구은행(510m) 구간의 가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공동화 되어 가는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며 사람들이 찾아들자 부족한 녹지와 야외 쉼터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시는 구도심의 부족한 녹지 해결을 위해 중앙문화의거리 시점부에 방치된 공터를 매입했고, 이를 소공원으로 조성해 중앙문화의거리와 연계된 녹지를마련하고자 했다. 공모전의 대상지는 안동시 운흥동 소공원(가칭) 외 2개소(옥야동 소공원, 태화동 소공원) 약 3,000m2로, 안동 중앙문화의거리와 연접해 있는 공간이다. 각각 안동 구시장과 신시장, 서부시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데, 방문객뿐만 아니라 시장의 상인과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겸하고 안동시에서 공 들인 ‘안동 중앙문화의거리 사업’의 연장선에 있어 소공원 대상지의 입지적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시에서는 입찰 방식이 아닌 설계공모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대부분의 소공원 조성은 입찰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에 많은 소공원들이 저가 설계 입찰이나 입찰 후의 하도와 재하도, 하급 공무원과 시공/시설물 업체의 유착 등으로 공사 결과물이 허술해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결국 재공사를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3월 7일 서울시설공단 주관으로 열린 ‘조경공사전문가 합동 토론회’에서도 설계 원안의 품질이 조경공사 품질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현장의 상황과 크게 다른 설계도면도 다수 생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발주처가 설계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길 당부하기도 했다. 조경공사 발주 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는 한 회사 기술진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로 두세 가지 안을 만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공원은 한 번 조성하면, 몇 십 년은 유지해야 하므로,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생각했다”며, 설계공모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양질의 공원 조성으로 구도심 활성화 모색
안동시 도심소공원 설계 공모
지난 2월 ‘안동 도심소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의 당선작이 발표됐다. 당선작은 해동기술개발공사가 제출한 작품으로 ‘한국의 선비 정신’을 콘셉트로 하여 안동 구도심의 소공원을 특화 공간으로 설계했다. 안동시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48억 원을 들여 ‘안동 중앙문화의거리 사업’을 시행한 바 있는 데, 이 사업은 신한은행~대구도료, 안동관~대구은행(510m) 구간의 가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공동화 되어 가는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며 사람들이 찾아들자 부족한 녹지와 야외 쉼터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시는 구도심의 부족한 녹지 해결을 위해 중앙문화의거리 시점부에 방치된 공터를 매입했고, 이를 소공원으로 조성해 중앙문화의거리와 연계된 녹지를마련하고자 했다. 공모전의 대상지는 안동시 운흥동 소공원(가칭) 외 2개소(옥야동 소공원, 태화동 소공원) 약 3,000m2로, 안동 중앙문화의거리와 연접해 있는 공간이다. 각각 안동 구시장과 신시장, 서부시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데, 방문객뿐만 아니라 시장의 상인과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겸하고 안동시에서 공 들인 ‘안동 중앙문화의거리 사업’의 연장선에 있어 소공원 대상지의 입지적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시에서는 입찰 방식이 아닌 설계공모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대부분의 소공원 조성은 입찰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에 많은 소공원들이 저가 설계 입찰이나 입찰 후의 하도와 재하도, 하급 공무원과 시공/시설물 업체의 유착 등으로 공사 결과물이 허술해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결국 재공사를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3월 7일 서울시설공단 주관으로 열린 ‘조경공사전문가 합동 토론회’에서도 설계 원안의 품질이 조경공사 품질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현장의 상황과 크게 다른 설계도면도 다수 생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발주처가 설계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길 당부하기도 했다. 조경공사 발주 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는 한 회사 기술진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로 두세 가지 안을 만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공원은 한 번 조성하면, 몇 십 년은 유지해야 하므로,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생각했다”며, 설계공모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학술회의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
한국 인구의 1/5이 서울에 산다. 그만큼 한국의 도시 중 가장 번화하고 활성화되어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도시 곳곳에 과거의 흔적들이 스며있고, 일상에서 유구한 역사의 맥락과 닿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형과 하나 된 한양도성 성곽 유적이 서울을 가로지르고있기 때문인데,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치며 파괴되었음에도 상당 부분 그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대도시 속에서 원형을 잘 유지한 성곽 유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몇 년간 한양도성 성곽의 멸실된 구간에 대해 복원 작업과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 몇 년 사이 한양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지난해 11월 14일에는 한양도성의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그 후1년간 ‘진정성’과 ‘완전성’을 인정받으면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확정된다. 여기서 짚어볼 부분이 있다. 바로 성곽마을이다. 확장되는 유산의 개념 그동안 한양도성의 가치는 성곽 자체에만 중점을 두어 문화재라는 단편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한된 시각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한양도성 성곽과 연접한 곳에는 20여개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대개 성곽마을은 노후화된 마을로 개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왔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기점으로, 이제 그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서울연구원과 온공간연구소는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양도성 주변에 위치한 성곽마을에 대한 학술회의(서울시 후원)를 개최했다. 한양도성이 아닌, 성곽마을을 주제로 한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박소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따르면 유산의 개념과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제 장소와 경관까지도 유산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양도성의 진정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 단일 건축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서울의 장소성과 도시 경관으로서 가치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박 교수는 “단일 건축물일 때의 보존 방식과 장소 및 경관일 때의 보존 방식은 다르다”면서, “살아있는 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요인의 하나로 지역공동체의 지속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양도성 성곽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성곽마을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재개발에 발목 잡힌 주거 환경 개선 성곽마을은 계획된 마을이 아니다. 전후 피난민들이 한양도성 주변으로 모이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때문에 주거를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은데, 박학룡 대표(동네목수)는 ‘장수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곽마을의 실태를 전했다. “장수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과 갈라진 콘크리트 벽, 깨진 골목길 계단이 눈에 들어왔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투자수익을 위해서는 동네가 더 낡고 위험해야 한다고 여기는 집주인들이 많았다. 집주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세입자들은 언제 헐릴지 모르는 남의 집을 굳이 돈을 들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재개발예정구역이 된 순간부터 전혀 관리되지 않는 동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개발 계획이 성곽마을 주민들의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꺾어놓고 있었다. 다른 마을도 이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이혜경 교수(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북정마을의 최대 화두도 재개발이었다.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마을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그렇지 않은 주민은 환경이 더욱 열악한 곳으로 밀려났다. 성곽의 보존 그리고 재개발. 환경적 제한과 개발 논리 사이에서 성곽마을 사람들은 소외되어 왔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받아들이고 살아온 것이다. 장소와 사람의 내밀한 대화 아파트 재건축이나 대규모 공사를 통한 정비가 주거환경 개선의 최선으로 여겨지던 과거의 방식은 이제 시민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정도 이러한 개발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심부 관리계획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존 장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재조명해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박학룡 대표는 주민 간의 관계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 장수마을 경관 개선 가능성을 일깨웠고, 이혜경 교수는 관官, 학學, 예藝, 민民 파트너십을 통해 북정마을을 예술의 무대로서 기능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의지를 불어넣었다. 기존과다른 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 성공적인 성곽마을 개선 사례로 꼽히며 장수마을과 북정마을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양도성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치는 사람이다. 학술회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 사이에 거듭 강조된 내용은 사람들과 장소가 가진 이야기다.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경관 향상과 한양도성 성곽의 물리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살아있는 장소가 되어야 그 가치가 배가 된다는 것이다. 송경용 이사장(나눔과 미래)은 “과거의 도시 개발방식은 개발의 희생자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해왔지만, 이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과 그들이 사는 장소의 내밀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양도성의 성곽이 살아있는 생물로서, 사람과 성이 대화하는 성곽마을로 살아 숨쉬기를기대했다.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대화. 이는 성곽마을을 넘어 도시에 대규모 개발만이 주거 환경과 경관 개선의 정답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학술회의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
한국 인구의 1/5이 서울에 산다. 그만큼 한국의 도시 중 가장 번화하고 활성화되어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도시 곳곳에 과거의 흔적들이 스며있고, 일상에서 유구한 역사의 맥락과 닿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형과 하나 된 한양도성 성곽 유적이 서울을 가로지르고있기 때문인데,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치며 파괴되었음에도 상당 부분 그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대도시 속에서 원형을 잘 유지한 성곽 유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몇 년간 한양도성 성곽의 멸실된 구간에 대해 복원 작업과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 몇 년 사이 한양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지난해 11월 14일에는 한양도성의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그 후1년간 ‘진정성’과 ‘완전성’을 인정받으면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확정된다. 여기서 짚어볼 부분이 있다. 바로 성곽마을이다. 확장되는 유산의 개념 그동안 한양도성의 가치는 성곽 자체에만 중점을 두어 문화재라는 단편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한된 시각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한양도성 성곽과 연접한 곳에는 20여개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대개 성곽마을은 노후화된 마을로 개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왔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기점으로, 이제 그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서울연구원과 온공간연구소는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양도성 주변에 위치한 성곽마을에 대한 학술회의(서울시 후원)를 개최했다. 한양도성이 아닌, 성곽마을을 주제로 한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박소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따르면 유산의 개념과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제 장소와 경관까지도 유산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양도성의 진정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 단일 건축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서울의 장소성과 도시 경관으로서 가치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박 교수는 “단일 건축물일 때의 보존 방식과 장소 및 경관일 때의 보존 방식은 다르다”면서, “살아있는 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요인의 하나로 지역공동체의 지속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양도성 성곽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성곽마을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재개발에 발목 잡힌 주거 환경 개선 성곽마을은 계획된 마을이 아니다. 전후 피난민들이 한양도성 주변으로 모이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때문에 주거를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은데, 박학룡 대표(동네목수)는 ‘장수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곽마을의 실태를 전했다. “장수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과 갈라진 콘크리트 벽, 깨진 골목길 계단이 눈에 들어왔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투자수익을 위해서는 동네가 더 낡고 위험해야 한다고 여기는 집주인들이 많았다. 집주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세입자들은 언제 헐릴지 모르는 남의 집을 굳이 돈을 들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재개발예정구역이 된 순간부터 전혀 관리되지 않는 동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개발 계획이 성곽마을 주민들의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꺾어놓고 있었다. 다른 마을도 이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이혜경 교수(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북정마을의 최대 화두도 재개발이었다.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마을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그렇지 않은 주민은 환경이 더욱 열악한 곳으로 밀려났다. 성곽의 보존 그리고 재개발. 환경적 제한과 개발 논리 사이에서 성곽마을 사람들은 소외되어 왔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받아들이고 살아온 것이다. 장소와 사람의 내밀한 대화 아파트 재건축이나 대규모 공사를 통한 정비가 주거환경 개선의 최선으로 여겨지던 과거의 방식은 이제 시민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정도 이러한 개발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심부 관리계획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존 장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재조명해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박학룡 대표는 주민 간의 관계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 장수마을 경관 개선 가능성을 일깨웠고, 이혜경 교수는 관官, 학學, 예藝, 민民 파트너십을 통해 북정마을을 예술의 무대로서 기능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의지를 불어넣었다. 기존과다른 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 성공적인 성곽마을 개선 사례로 꼽히며 장수마을과 북정마을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양도성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치는 사람이다. 학술회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 사이에 거듭 강조된 내용은 사람들과 장소가 가진 이야기다.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경관 향상과 한양도성 성곽의 물리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살아있는 장소가 되어야 그 가치가 배가 된다는 것이다. 송경용 이사장(나눔과 미래)은 “과거의 도시 개발방식은 개발의 희생자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해왔지만, 이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과 그들이 사는 장소의 내밀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양도성의 성곽이 살아있는 생물로서, 사람과 성이 대화하는 성곽마을로 살아 숨쉬기를기대했다.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대화. 이는 성곽마을을 넘어 도시에 대규모 개발만이 주거 환경과 경관 개선의 정답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제11회 조경의 날
지난 3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경학회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의 주최로 2014년 제11회 조경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3월 3일을 조경의 날로 제정하여 갖는 첫 번째 행사인 만큼 많은 조경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1부 양병이 이사장(한국내셔널트러스트, 서울그린트러스트)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2부 조경의 날 기념식, 3부는 서울광장에서 시민참여 정원만들기 행사로 진행되었다. 양병이 이사장은 “조경의 날로 정한 3월 3일은 공원법의 제정일이며 경주 안압지의 축조일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조경을 알리고 조경인 서로 결속을 다지며, 분야를 자가진단,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경의 날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이어 새로운 조경의 키워드로 시민참여와 융합, 문화, 건강과 힐링, 기후변화, 사이버 공간 등을 언급하며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배 회장(한국조경학회,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올해부터는 범조경계의 공동주관으로 바뀌면서 조경계 통합의 새로운 잔치로 큰 의의가 있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더불어 조경계 발전을 위한 상설연구기관의 전 단계로 두 가지의 연구센터 ‘정원학연구센터’와 조경학회내 ‘조경정책연구센터’를 발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은 “특정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그 분야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 될 때 상징적 의미도 가질 수 있고, 일도 추진력 있게 진행된다.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조경 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조경의 날을 기념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국토교통 부장관 표창은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조경진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장대수 대표이사(청경엔지니어링), 정복현 대표이사(삼흥엘앤씨), 김정식 대표이사(온유조경), 정길균 대표이사(케이엘에스), 한국수자원공사, 류기혁 주무관(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이 수상하였다. 자랑스러운 조경인상은 진상철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안승홍 교수(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김인수 소장(환경조형연구소 그륀바우), 신현돈 대표이사(서안알앤디조경디자인), 양기방 편집국장(한국건설신문), 전승범 대표이사(이우환경디자인), 허남태 대표이사(신정조경), 조성학 대표이사(예진조경건설),김득일 대표(명산), 조영철 부장(GS건설)이, 공로상은 노영일 대표이사(예건)가 수상하였다. 공로상을 수상한 노영일 대표이사는 “요즘 조경산업진흥법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민생과 관련된 법률들의 추진이 폐기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국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빠른 시일 안에 조경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켜 우리 업계 독립법률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캐나다 ‘2014 국제 가든 페스티벌’
여섯 개의 당선작
지난 1월 28일, 캐나다 퀘벡의 그랜드 메티스Grand-Métis에서 열릴 국제 가든 페스티벌 당선작들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이 가든 페스티벌은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였고, 당선작들은 이후 6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레포드 정원Reford Garden에 전시된다. 이번 공모에는 35개국의 700명이 넘는 건축가, 조경가, 디자이너 및 예술가들이 293개에 달하는 현대적 정원 설계안을 제출했다. 이번 공모의 주인공이 된 6개의 당선작은 캐나다, 한국, 스페인, 스위스, 미국 등 5개국의 설계가들에게 돌아갔다. 당선작 외에 “Bal àla villa”, “sPOTs” 2개의 프로젝트는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 공모전의 6명의 심사위원은 드니 부셰Denis Boucher(프로젝트 담당자, 퀘벡 종교유산위원회conseil du patrimoine religieux 소속), 세실 콤벨Cécile Combelle(아틀리에 바르다Barda의 건축가, 2013 가든 페스티벌에서 “he SacréPotager Garden신성한 정원”을 설계), 조경가 빈센트 르메이Vincent Lemay, 마테이 파퀸Matei Paquin(모멘트 팩토리Moment Factory의 프로젝트 개발 이사), 안 웨브Ann Webb(전 캐나다 예술 재단 운영이사이자 발행인), 그리고 알렉산더 레포드Alexander Reford(국제 가든 페스티벌과 메티스/레포드 정원jardins de Métis/Reford의 책임자)였다. 국제 가든 페스티벌과 레포드 정원 국제 가든 페스티벌은 북미 대륙에서 열리는 동시대 가든 페스티벌의 대표격이며, 가스페 반도Gaspé Peninsula의 초입에 있는 메티스 정원에서 진행된다. 엘시 레포드Elsie Reford가 조성한 역사적 장소인 메티스 정원과 인접한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역사와 현대성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보존과 전통 그리고 혁신 사이의 대화를 만들어 나간다. 매년 페스티벌에서는 세인트로렌스 강St. Lawrence River 둑 자연 환경에 대해 각자 다양한 원칙을 가지고 설계한 60명 이상의 건축가, 조경가, 디자이너들의 개념적 정원Conceptual Garden을 전시한다. 2000년도에 페스티벌이 시작된 이후, 140개 이상의 정원이 그랜드 메티스Grand-Métis에서, 그리고 캐나다 및 세계 전역에서 야외 설치 프로젝트를 통해 전시되었다. 문화 공간이자 관광지의 기능을 50년 이상 해온 레포드 정원은 오늘날 퀘벡 동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한 곳으로, 방문객들에게 감각적인 모든 경험을 제공한다. 역사적 정원 및 에스테반의 여름 별장Estevan Lodge이 있는 이 국가적 사적지는 최근 퀘벡 주정부에의해 문화 유적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참고로 레포드정원은 올해 5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휴일 없이 개장한다. 국제 가든 페스티벌은 많은 공공 및 민간 파트너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개최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경제발전은 그 자체로 경관의 실험적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도 한다. 하이드로 퀘벡Hydro-Québec은 1999년 이후부터 레포드 정원의 주요 스폰서가 되어 페스티벌을 지원하고 있다. Afterburn 작품 “에프터번Afterburn”이 제공하는 종말 이후적postapocalyptic 체험을 통해 방문객들은 화재를 겪은 자연이 어떻게 스스로 재생하는지, 그리고 상처 입은 경관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설계자는 크세니아 캐그너Ksenia Kagner와 니코 엘리엇Nicko Elliott으로 구성된 ‘시빌리안 프로젝트 Civilian Projects’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나고 브루클린에 기반을 둔 이들의 예술과 건축은 경관과 물성이 가진 사회적 가능성에 강조점을 두며 작동한다. 이들은 세부설계 및 정원의 구조를 통해 정원 내에서 인간화된 시스템과 자연 환경 시스템 간의 상호 의존성을 읽어낼 수 있게 했다. 크세니아 캐그너는 제임스 코너의 필드오퍼레이션스 소속 PA프로젝트 건축가며, 니코 엘리엇은 창조적인 부동산 개발사 매크로 시Macro Sea의 설계 디렉터를 맡고 있다. Cone Garden 이 정원은 오렌지색의 원형 콘cone 구조물들로 이루어진 팝업 정원이다. 정원의 콘 구조물은 건설 현장의 상징적 심벌이며,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인공물의 구축, 해체, 재구축을 상징한다. 콘 구조물은 방문객들과 이곳을 지나가는 이들을 위한 플랜터이자 의자가 되며,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이 된다. 이 작품의 설계자는 한국 서울에 소재한 ‘라이브스케이프’의 건축가이자 조경가인 유승종, 조경가 심병준, 식물 전문가 조혜령, 조경 설계가 조용철, 정일태, 김진환, 윤수정,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 권병준이다. 라이브스케이프는 살아 있는 자연적 재료를 이용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내러티브가 있는 공간을 창출한다. 이들은 다양한 스케일의 여러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으며, 예술적 측면의 접근 방식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합의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ine Garden 대상지의 자연 환경 속에 빽빽하게 정렬된 안전용 보안 테이프로 만들어진 이 현대판 미로는 이곳에 방문하고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스위스 바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캐나다 출신의 미술가 겸 디자이너인 줄리아 잠로지크Julia Jamrozik와 코린켐스터Coryn Kempster가 설계했다. 이들은 설치, 드로잉, 비디오, 건축을 통해 도시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살펴보고 이 현상들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재현한다. 잠로지크와 켐스터는 공공 영역에 대해 호기심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과 집단이 공간의 내부와 외부를 이용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은 2003년 이후부터 함께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Méristème 식물 세포 시스템을 육안으로 보이는 구조체로 재현하는 이 작품은 인류 사회의 미래를 보장해줄 식물의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떠올리게 한다. 이 정원은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의 디자이너인 캐롤라인 마가Caloline Magar, 마리 조제 가뇽Marie Josée Gagnon,프랑소와 라블랑Francois Lablanc으로 이루어진 ‘샤시CHÂSSI’가 설계했다. 샤시는 건축, 조경, 도시계획, 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변적 형태의 디자이너 그룹이다. 구성원들은 공동으로 단기간의 일시적 설치 작업을 함으로써 건축적 특징을 부각시키며, 개별 부지의 오너십을 유쾌한 방식으로 강화하기 위해 미술, 문화, 디자인 작업을 촉진시키고 있다. Orange Secret “오렌지 시크릿Orange Secret”은 위요된 공간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과 그 지각으로 작동된다. 이 정원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 지각을 완성하도록 해주는 수많은 자극 중에서 시각적 특징을 분리시켜 정원의 오렌지색 차원orange dimension을 탐험할 수 있게 한다. 이 작품은 미국 뉴욕의 조경가 및 도시설계가인 윌리엄 로버트William E. Roberts, 농공학자이자 조경가인 로라 산틴Laura Santin으로 구성된 ‘노마드 스튜디오NomadStudio’가 설계했다. 노마드 스튜디오는 조경 분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각 프로젝트마다 적합한 팀을 편성하여 운용한다. 이 같은 방식은 각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유연성, 동기 부여,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Rotunda 물이 담긴 원형 접시 형태의 “로툰다Rotunda”는 새와 곤충의 식량인 꽃가루와 잎사귀를 매일 모아주어 정원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작품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에 소재한 ‘시티래버러토리Citylaboratory’의 건축가 오로라 아르멘탈 루이즈Aurora Armental Ruiz와 스테파노 시울로 워커Stefano Ciurlo Walker가 설계했다. 협력적 건축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은 역사적·문화적·자연적 가치를 지닌 지역과 도시에 적합한 설계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의 진취적인 계획은 다양한 프로젝트, 워크숍, 이벤트, 출판등의 실현을 위해 모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자, 학생들을 하나로 묶어준다.
캐나다 ‘2014 국제 가든 페스티벌’
여섯 개의 당선작
지난 1월 28일, 캐나다 퀘벡의 그랜드 메티스Grand-Métis에서 열릴 국제 가든 페스티벌 당선작들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이 가든 페스티벌은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였고, 당선작들은 이후 6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레포드 정원Reford Garden에 전시된다. 이번 공모에는 35개국의 700명이 넘는 건축가, 조경가, 디자이너 및 예술가들이 293개에 달하는 현대적 정원 설계안을 제출했다. 이번 공모의 주인공이 된 6개의 당선작은 캐나다, 한국, 스페인, 스위스, 미국 등 5개국의 설계가들에게 돌아갔다. 당선작 외에 “Bal àla villa”, “sPOTs” 2개의 프로젝트는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 공모전의 6명의 심사위원은 드니 부셰Denis Boucher(프로젝트 담당자, 퀘벡 종교유산위원회conseil du patrimoine religieux 소속), 세실 콤벨Cécile Combelle(아틀리에 바르다Barda의 건축가, 2013 가든 페스티벌에서 “he SacréPotager Garden신성한 정원”을 설계), 조경가 빈센트 르메이Vincent Lemay, 마테이 파퀸Matei Paquin(모멘트 팩토리Moment Factory의 프로젝트 개발 이사), 안 웨브Ann Webb(전 캐나다 예술 재단 운영이사이자 발행인), 그리고 알렉산더 레포드Alexander Reford(국제 가든 페스티벌과 메티스/레포드 정원jardins de Métis/Reford의 책임자)였다. 국제 가든 페스티벌과 레포드 정원 국제 가든 페스티벌은 북미 대륙에서 열리는 동시대 가든 페스티벌의 대표격이며, 가스페 반도Gaspé Peninsula의 초입에 있는 메티스 정원에서 진행된다. 엘시 레포드Elsie Reford가 조성한 역사적 장소인 메티스 정원과 인접한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역사와 현대성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보존과 전통 그리고 혁신 사이의 대화를 만들어 나간다. 매년 페스티벌에서는 세인트로렌스 강St. Lawrence River 둑 자연 환경에 대해 각자 다양한 원칙을 가지고 설계한 60명 이상의 건축가, 조경가, 디자이너들의 개념적 정원Conceptual Garden을 전시한다. 2000년도에 페스티벌이 시작된 이후, 140개 이상의 정원이 그랜드 메티스Grand-Métis에서, 그리고 캐나다 및 세계 전역에서 야외 설치 프로젝트를 통해 전시되었다. 문화 공간이자 관광지의 기능을 50년 이상 해온 레포드 정원은 오늘날 퀘벡 동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한 곳으로, 방문객들에게 감각적인 모든 경험을 제공한다. 역사적 정원 및 에스테반의 여름 별장Estevan Lodge이 있는 이 국가적 사적지는 최근 퀘벡 주정부에의해 문화 유적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참고로 레포드정원은 올해 5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휴일 없이 개장한다. 국제 가든 페스티벌은 많은 공공 및 민간 파트너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개최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경제발전은 그 자체로 경관의 실험적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도 한다. 하이드로 퀘벡Hydro-Québec은 1999년 이후부터 레포드 정원의 주요 스폰서가 되어 페스티벌을 지원하고 있다. Afterburn 작품 “에프터번Afterburn”이 제공하는 종말 이후적postapocalyptic 체험을 통해 방문객들은 화재를 겪은 자연이 어떻게 스스로 재생하는지, 그리고 상처 입은 경관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설계자는 크세니아 캐그너Ksenia Kagner와 니코 엘리엇Nicko Elliott으로 구성된 ‘시빌리안 프로젝트 Civilian Projects’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나고 브루클린에 기반을 둔 이들의 예술과 건축은 경관과 물성이 가진 사회적 가능성에 강조점을 두며 작동한다. 이들은 세부설계 및 정원의 구조를 통해 정원 내에서 인간화된 시스템과 자연 환경 시스템 간의 상호 의존성을 읽어낼 수 있게 했다. 크세니아 캐그너는 제임스 코너의 필드오퍼레이션스 소속 PA프로젝트 건축가며, 니코 엘리엇은 창조적인 부동산 개발사 매크로 시Macro Sea의 설계 디렉터를 맡고 있다. Cone Garden 이 정원은 오렌지색의 원형 콘cone 구조물들로 이루어진 팝업 정원이다. 정원의 콘 구조물은 건설 현장의 상징적 심벌이며,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인공물의 구축, 해체, 재구축을 상징한다. 콘 구조물은 방문객들과 이곳을 지나가는 이들을 위한 플랜터이자 의자가 되며,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이 된다. 이 작품의 설계자는 한국 서울에 소재한 ‘라이브스케이프’의 건축가이자 조경가인 유승종, 조경가 심병준, 식물 전문가 조혜령, 조경 설계가 조용철, 정일태, 김진환, 윤수정,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 권병준이다. 라이브스케이프는 살아 있는 자연적 재료를 이용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내러티브가 있는 공간을 창출한다. 이들은 다양한 스케일의 여러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으며, 예술적 측면의 접근 방식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합의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ine Garden 대상지의 자연 환경 속에 빽빽하게 정렬된 안전용 보안 테이프로 만들어진 이 현대판 미로는 이곳에 방문하고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스위스 바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캐나다 출신의 미술가 겸 디자이너인 줄리아 잠로지크Julia Jamrozik와 코린켐스터Coryn Kempster가 설계했다. 이들은 설치, 드로잉, 비디오, 건축을 통해 도시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살펴보고 이 현상들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재현한다. 잠로지크와 켐스터는 공공 영역에 대해 호기심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과 집단이 공간의 내부와 외부를 이용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은 2003년 이후부터 함께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Méristème 식물 세포 시스템을 육안으로 보이는 구조체로 재현하는 이 작품은 인류 사회의 미래를 보장해줄 식물의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떠올리게 한다. 이 정원은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의 디자이너인 캐롤라인 마가Caloline Magar, 마리 조제 가뇽Marie Josée Gagnon,프랑소와 라블랑Francois Lablanc으로 이루어진 ‘샤시CHÂSSI’가 설계했다. 샤시는 건축, 조경, 도시계획, 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변적 형태의 디자이너 그룹이다. 구성원들은 공동으로 단기간의 일시적 설치 작업을 함으로써 건축적 특징을 부각시키며, 개별 부지의 오너십을 유쾌한 방식으로 강화하기 위해 미술, 문화, 디자인 작업을 촉진시키고 있다. Orange Secret “오렌지 시크릿Orange Secret”은 위요된 공간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과 그 지각으로 작동된다. 이 정원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 지각을 완성하도록 해주는 수많은 자극 중에서 시각적 특징을 분리시켜 정원의 오렌지색 차원orange dimension을 탐험할 수 있게 한다. 이 작품은 미국 뉴욕의 조경가 및 도시설계가인 윌리엄 로버트William E. Roberts, 농공학자이자 조경가인 로라 산틴Laura Santin으로 구성된 ‘노마드 스튜디오NomadStudio’가 설계했다. 노마드 스튜디오는 조경 분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각 프로젝트마다 적합한 팀을 편성하여 운용한다. 이 같은 방식은 각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유연성, 동기 부여,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Rotunda 물이 담긴 원형 접시 형태의 “로툰다Rotunda”는 새와 곤충의 식량인 꽃가루와 잎사귀를 매일 모아주어 정원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작품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에 소재한 ‘시티래버러토리Citylaboratory’의 건축가 오로라 아르멘탈 루이즈Aurora Armental Ruiz와 스테파노 시울로 워커Stefano Ciurlo Walker가 설계했다. 협력적 건축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은 역사적·문화적·자연적 가치를 지닌 지역과 도시에 적합한 설계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의 진취적인 계획은 다양한 프로젝트, 워크숍, 이벤트, 출판등의 실현을 위해 모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자, 학생들을 하나로 묶어준다. The Connected City
댈러스와 트리니티 강을 연결하다
지난 2013년 4월, 댈러스 도심과 트리니티 강을 연결하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모색하는 ‘The Connected City Design Challenge’가 시작되었다. 이 설계 공모전은 지역적·국제적으로 재능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세 개의 팀을 지명초청했다. 동시에 전문가, 비전문가, 예술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에 23개국과 21개의 디자인 스쿨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107가지의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6개월간 이 아이디어들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초청 전문 팀들의 강연, 작품 전시, 온라인 전시 등이 펼쳐졌다. 네쉬어 조각 센터Nasher Sculpture Center와 댈러스 미술관DMA, Dallas Museum of Art에서 진행된 4개의 행사에는 1,200명이 넘는 관객이 참석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마음에 드는 설계안을 직접 골랐다. 대상지는 댈러스의 핵심적인 도시 자산인 다운타운과 트리니티 강으로, 이곳은 이 도시의 삶의 질과 장소성을 높여 활기찬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될 것이다. 댈러스 다운타운의 서쪽 부분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도시 설계 문제를 대표하는 도전적 사례에 해당한다. 리버프론트, 리유니온/유니온 역Reunion/ Union Station, 댈러스 시민 센터Dallas Civic Center, 웨스트 엔드West End를 포함하는 여러 다운타운 지구로 구성된 이곳은, 사우 스사이드Southside·시더스Cedars·디자인 지구·빅토리아 공원 지역과 트리니티 강 사이에 독특하게 위치해있다. 그러나 이 지역들 중 일관성 있게 연결된 곳은 아무 곳도 없다. 지명 초청 부문에서는 Stoss+SHoP, Ricardo Bofill Taller de Arquitectura, OMA*AMO의 작품이 초청되었고, 일반 공모 부문에서는 Kohki Hiranuma Architect & Assoc., Bogdan Chipara, Raik Thoning & Marius Kreft, Mclain Clutter의 제출작이 당선되었다. 지명 초청 부문과 일반 공모 부문의 제출작을 통해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주요 테마를 도출했다. 1. 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근린의 존중과 특별 지정 ; 2. 장소를 통합하기 위한 경관의 이용 ; 3. 장애물 극복하고 공익을 더하기 위한 물의 활용 가능성 ; 4. 파편화된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잘 디자인된 가로의 필요성 ; 5. 도시의 재통합을 위한 지역 자동차 인프라스트럭처의 잠재력 ; 6. 비전의 실천을 위한 임시 법률 제정 다음에서는 지명 초청작 세 작품을 소개한다. Hyper Density Hyper Landscape Stoss+SHoP 고밀도의 집약적 경관은 댈러스의 미래에 대한 전략이자 비전이다. 이는 도시와 강을 재통합시키고 변화의 시작 단계를 마련해 준다. HDHLHyper Density Hyper Landscape을 통해 댈러스의 기존 도시 경관과 자연 경관의 질을 더욱 높여, 이 지역의 개발 기회와 경제적 번영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한다. HDHL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역할을 다양하게 수행하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한 경관을 활용한 도시 구역에 대한 전략이다. 그것은 댈러스의 기업, 자연 자원, 비즈니스 활동, 다양한 도시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한다. HDHL은다시 꿈꾸는 특유의 댈러스 그 자체다. 이 접근의 핵심은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진 프로그램화된 지속가능한 경관 내에 배치되는 세 개의 새롭고 역동적이고 혼합적인 근린주구다. 도시 그리드와 도시녹지의 확장은 서로 유익한 영향을 주어, 댈러스를 보다 생기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활기차고 경쟁력 있게 한다. 이러한 경관의 중심에 기존의 트리니티 강이 있다. 수질 여과와 홍수 유역으로서의 기능을 두 배로 증가시키고, 공공 공간, 습지, 정원의 생기를 획기적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 새로운 공간들은 강변 도로에 새로 설치되는 경전철과 유료 도로를 따라 확장되는 보행로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트리니티 범람원을 텍사스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공 공간으로 바뀌게 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놀 수 있는 댈러스의 중심에 성장 에너지와 활기를 넘치게 하고, 자발적이고 예기치 않은 상호 작용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집 근처에서 직접 자연을 경험하게 되어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도시와 경관의 체험을누릴 수 있게 되고, 도시 개발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공간 통행권을 성취한다. 높은 밀도, 집약적 경관, 고도의 연결성을 통해 댈러스가 새로워진다. Dallas Trinity and Downtown The Connected City Ricardo Bofill Taller de Arquitectura 우리는 이번 전략적 계획이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로부터 동시대의 문화에 이르는 꿈의 일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댈러스가 궁극적으로 생태, 교통, 토지 이용, 사회적 경제의 통합을 통해 다운타운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도시의 연속성은 예술지구에서부터 시작되어 보행로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과학·자연·에너지 공원, 레저 트리니티 공원Leisure Trinity Park, 그리고 새로운 선셋 프롬나드Sunset Promenade로 확장된다. ‘D 워크D walk’는 댈러스 미술관을 페롯 자연과학박물관The Perot Museum of Nature and Science까지 연결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존 F. 케네디 메모리얼 광장JFK Memorial과 새로 지은 다리를 가로질러, 강가 대로변, 바이오 돔Bio Dome, 공원, 새로운 호수로 확산된다. 고유의 흑토blackland 대초원은, 모든 가로변에 식재된 가로 레벨의 소프트/하드 조경 설계의 생태적 바탕이 된다. 또한 지역적·국제적 바이오 미메시스bio-mimesis를 통해 자연을 재생하는 +E 박물관과 공원, 야외 시장 등을 네트워크화 하는 거점이 된다. 우리의 마스터플랜은 유료 도로와 고속도로를 통합시켜 네 개의 새로운 강변 구역을 댈러스 다운타운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도시계획이다. 이는 다면적인 교통계획을 통해 가능하다. 즉 시민들이 자동차 하나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 셰어링,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BRT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다. 이는 일련의 인터체인지 거점 주변의 개발을 촉진시켜 교통체계를 완벽하게 연결하고 집과 직장 및 일상생활 공간 사이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가로를 보장해 준다. 구역별 설계와 도시 간 연결은 장소성과 정체성, 즉 ‘장소의 혼genius-loci’을 생성시킨다. 트리니티 강변 산책로는 매력적인 도시와 자연의 축이 되어, 건물 내부와 외부 거리가 연결되는 1층을 활성화시키며, 트리니티호수와 공원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다층 데크로 이어진다. 2 Rivers / 2 Cities OMA*AMO 댈러스와 트리니티 강 코리도corridor 사이에는 현재 고속도로와 미개발 토지가 가득하다. 이 구역은 댈러스 주변에 일종의 해자를 형성하고 있어, 딜리 플라자Dealey Plaza에 면해 있는 다운타운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고 워터프론트와 도시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 우리의 비전은 댈러스 다운타운과 트리니티 강을 연결하고 이들 사이에 있는 구역을 개발하여 활력 있는 새로운 선형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자연 채광과 필터링 기능을 갖춘 강변 유역과 배수로는 오래된 트리니티 강을 재구성하여 리버프론트 대로를 따라 새로운 생태계의 축을 형성한다. 이 새로운 생태계는 개발에 기초가 되는 요소를 제공하여 다운타운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며 새롭고 또렷한 어메니티 구역을 만들어낸다. I-35고속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위 아래로 개입시킨다. 북쪽과 남쪽에 보행자를 위해 새로 만든 다리는 주요 DART 역으로의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다운타운에 근접해있는 딜리 플라자와 휴스턴과 제퍼슨의 고가교는,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입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형된다. 이 지역의 발전을 확실히 나타내는 대상지 내에 있는 원호 형태의 두 개의 고리는 댈러스 다운타운과 트리니티 강 사이를 새롭게 잇고 새로운 강을 만든다. 두개의 원호가 활기를 되찾은 수로와 리버프론트 대로를 가로지른다. 이곳의 일련의 문화적 장소와 야외 어메니티 지역은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중심축을 형성한다. 이 축을 따라, 남쪽의 록 아일랜드Rock Island부터 북쪽의 디자인 지구Design District까지 다도해처럼 밀집된 도시섬들을 늘어놓는다. 각 섬은 그 주변의 특유한 프로그램에 따라 전략적으로 혼합되고 연결된다.
The Connected City
댈러스와 트리니티 강을 연결하다
지난 2013년 4월, 댈러스 도심과 트리니티 강을 연결하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모색하는 ‘The Connected City Design Challenge’가 시작되었다. 이 설계 공모전은 지역적·국제적으로 재능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세 개의 팀을 지명초청했다. 동시에 전문가, 비전문가, 예술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에 23개국과 21개의 디자인 스쿨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107가지의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6개월간 이 아이디어들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초청 전문 팀들의 강연, 작품 전시, 온라인 전시 등이 펼쳐졌다. 네쉬어 조각 센터Nasher Sculpture Center와 댈러스 미술관DMA, Dallas Museum of Art에서 진행된 4개의 행사에는 1,200명이 넘는 관객이 참석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마음에 드는 설계안을 직접 골랐다. 대상지는 댈러스의 핵심적인 도시 자산인 다운타운과 트리니티 강으로, 이곳은 이 도시의 삶의 질과 장소성을 높여 활기찬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될 것이다. 댈러스 다운타운의 서쪽 부분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도시 설계 문제를 대표하는 도전적 사례에 해당한다. 리버프론트, 리유니온/유니온 역Reunion/ Union Station, 댈러스 시민 센터Dallas Civic Center, 웨스트 엔드West End를 포함하는 여러 다운타운 지구로 구성된 이곳은, 사우 스사이드Southside·시더스Cedars·디자인 지구·빅토리아 공원 지역과 트리니티 강 사이에 독특하게 위치해있다. 그러나 이 지역들 중 일관성 있게 연결된 곳은 아무 곳도 없다. 지명 초청 부문에서는 Stoss+SHoP, Ricardo Bofill Taller de Arquitectura, OMA*AMO의 작품이 초청되었고, 일반 공모 부문에서는 Kohki Hiranuma Architect & Assoc., Bogdan Chipara, Raik Thoning & Marius Kreft, Mclain Clutter의 제출작이 당선되었다. 지명 초청 부문과 일반 공모 부문의 제출작을 통해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주요 테마를 도출했다. 1. 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근린의 존중과 특별 지정 ; 2. 장소를 통합하기 위한 경관의 이용 ; 3. 장애물 극복하고 공익을 더하기 위한 물의 활용 가능성 ; 4. 파편화된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잘 디자인된 가로의 필요성 ; 5. 도시의 재통합을 위한 지역 자동차 인프라스트럭처의 잠재력 ; 6. 비전의 실천을 위한 임시 법률 제정 다음에서는 지명 초청작 세 작품을 소개한다. Hyper Density Hyper Landscape Stoss+SHoP 고밀도의 집약적 경관은 댈러스의 미래에 대한 전략이자 비전이다. 이는 도시와 강을 재통합시키고 변화의 시작 단계를 마련해 준다. HDHLHyper Density Hyper Landscape을 통해 댈러스의 기존 도시 경관과 자연 경관의 질을 더욱 높여, 이 지역의 개발 기회와 경제적 번영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한다. HDHL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역할을 다양하게 수행하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한 경관을 활용한 도시 구역에 대한 전략이다. 그것은 댈러스의 기업, 자연 자원, 비즈니스 활동, 다양한 도시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한다. HDHL은다시 꿈꾸는 특유의 댈러스 그 자체다. 이 접근의 핵심은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진 프로그램화된 지속가능한 경관 내에 배치되는 세 개의 새롭고 역동적이고 혼합적인 근린주구다. 도시 그리드와 도시녹지의 확장은 서로 유익한 영향을 주어, 댈러스를 보다 생기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활기차고 경쟁력 있게 한다. 이러한 경관의 중심에 기존의 트리니티 강이 있다. 수질 여과와 홍수 유역으로서의 기능을 두 배로 증가시키고, 공공 공간, 습지, 정원의 생기를 획기적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 새로운 공간들은 강변 도로에 새로 설치되는 경전철과 유료 도로를 따라 확장되는 보행로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트리니티 범람원을 텍사스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공 공간으로 바뀌게 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놀 수 있는 댈러스의 중심에 성장 에너지와 활기를 넘치게 하고, 자발적이고 예기치 않은 상호 작용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집 근처에서 직접 자연을 경험하게 되어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도시와 경관의 체험을누릴 수 있게 되고, 도시 개발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공간 통행권을 성취한다. 높은 밀도, 집약적 경관, 고도의 연결성을 통해 댈러스가 새로워진다. Dallas Trinity and Downtown The Connected City Ricardo Bofill Taller de Arquitectura 우리는 이번 전략적 계획이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로부터 동시대의 문화에 이르는 꿈의 일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댈러스가 궁극적으로 생태, 교통, 토지 이용, 사회적 경제의 통합을 통해 다운타운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도시의 연속성은 예술지구에서부터 시작되어 보행로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과학·자연·에너지 공원, 레저 트리니티 공원Leisure Trinity Park, 그리고 새로운 선셋 프롬나드Sunset Promenade로 확장된다. ‘D 워크D walk’는 댈러스 미술관을 페롯 자연과학박물관The Perot Museum of Nature and Science까지 연결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존 F. 케네디 메모리얼 광장JFK Memorial과 새로 지은 다리를 가로질러, 강가 대로변, 바이오 돔Bio Dome, 공원, 새로운 호수로 확산된다. 고유의 흑토blackland 대초원은, 모든 가로변에 식재된 가로 레벨의 소프트/하드 조경 설계의 생태적 바탕이 된다. 또한 지역적·국제적 바이오 미메시스bio-mimesis를 통해 자연을 재생하는 +E 박물관과 공원, 야외 시장 등을 네트워크화 하는 거점이 된다. 우리의 마스터플랜은 유료 도로와 고속도로를 통합시켜 네 개의 새로운 강변 구역을 댈러스 다운타운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도시계획이다. 이는 다면적인 교통계획을 통해 가능하다. 즉 시민들이 자동차 하나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 셰어링,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BRT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다. 이는 일련의 인터체인지 거점 주변의 개발을 촉진시켜 교통체계를 완벽하게 연결하고 집과 직장 및 일상생활 공간 사이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가로를 보장해 준다. 구역별 설계와 도시 간 연결은 장소성과 정체성, 즉 ‘장소의 혼genius-loci’을 생성시킨다. 트리니티 강변 산책로는 매력적인 도시와 자연의 축이 되어, 건물 내부와 외부 거리가 연결되는 1층을 활성화시키며, 트리니티호수와 공원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다층 데크로 이어진다. 2 Rivers / 2 Cities OMA*AMO 댈러스와 트리니티 강 코리도corridor 사이에는 현재 고속도로와 미개발 토지가 가득하다. 이 구역은 댈러스 주변에 일종의 해자를 형성하고 있어, 딜리 플라자Dealey Plaza에 면해 있는 다운타운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고 워터프론트와 도시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 우리의 비전은 댈러스 다운타운과 트리니티 강을 연결하고 이들 사이에 있는 구역을 개발하여 활력 있는 새로운 선형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자연 채광과 필터링 기능을 갖춘 강변 유역과 배수로는 오래된 트리니티 강을 재구성하여 리버프론트 대로를 따라 새로운 생태계의 축을 형성한다. 이 새로운 생태계는 개발에 기초가 되는 요소를 제공하여 다운타운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며 새롭고 또렷한 어메니티 구역을 만들어낸다. I-35고속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위 아래로 개입시킨다. 북쪽과 남쪽에 보행자를 위해 새로 만든 다리는 주요 DART 역으로의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다운타운에 근접해있는 딜리 플라자와 휴스턴과 제퍼슨의 고가교는,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입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형된다. 이 지역의 발전을 확실히 나타내는 대상지 내에 있는 원호 형태의 두 개의 고리는 댈러스 다운타운과 트리니티 강 사이를 새롭게 잇고 새로운 강을 만든다. 두개의 원호가 활기를 되찾은 수로와 리버프론트 대로를 가로지른다. 이곳의 일련의 문화적 장소와 야외 어메니티 지역은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중심축을 형성한다. 이 축을 따라, 남쪽의 록 아일랜드Rock Island부터 북쪽의 디자인 지구Design District까지 다도해처럼 밀집된 도시섬들을 늘어놓는다. 각 섬은 그 주변의 특유한 프로그램에 따라 전략적으로 혼합되고 연결된다. [100 장면으로 재구성한 조경사] 조경의 상대성 이론
#9 에리히 멘델존, 내 건축에 녹색 레이스를 입혀다오 미국 유타에 가면 로버트 스미스슨이 만든 달팽이 방파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막 한복판에 소위 저먼 빌리지German Village라고 하는 것이 있다. 독일인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독일식 다세대주택을 재현해 놓은 일종의 세트장이다. 세트장이지만 영화를 찍으려고 만든 것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베를린 폭격을 연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1943년부터 연합군들이 전면전에 돌입하며 카셀, 함부르크와 드레스덴 등의 다른 도시들은 불바다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베를린의 집들은 어찌 된 일인지 소이탄 공격이 별 효과가 없었다. 특히 19세기 후반부에 노동자들을 위해 튼튼하게 지은 다세대주택들이 폭격에 강했다. 그 시대에 이미 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건축 기법을 모색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연합군들이 미처 모르고 있었다. 집과 집 사이의 벽에는 창문 없는 맨 벽에 돌, 벽돌, 콘크리트 등 비연소성 소재만을 사용했고 최소한 24cm 두께로 지었으며 건축 소재뿐 아니라 건물 배치에서도 불이 서로 옮겨붙지 않도록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세심한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다. 궁리 끝에 미국 국방성의 화학전戰 담당자가 당시 미국에 망명 와 있던 독일 출신의 유대인 건축가 에리히 멘델존Eric Mendelsohn(1887~1953)에게 비밀리에 자문을 요청했다. 멘델존은 이에 응했고 거의 원본과 똑같이 건물을 만들어 주었다. 독일식의 튼튼한 가구도 만들어 넣고 침대 시트, 커튼까지 그대로 재현했다고 한다. 유타는 공기가 건조하여 발화 양상이 베를린과 달랐으므로 오일의 성질을 조정한 후, 비 내리는 베를린마냥 물을 뿌려가며 폭격 연습을 했다고 한다. 결국 폭격에 성공했고 모두 세 번을 재건하여 연습을 반복한 후 마지막에 남은 건물 두 채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어쩌면 다가올 3차 세계대전을 대비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파괴되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건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저먼 빌리지가 한때 널리 명성을 떨쳤던 스타 건축가 멘델존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당시 그는 56세였으니 원숙한 경지에 들어 왕성히 활동할 나이였지만 베를린을 떠난 뒤 운도 그를 떠났는지 별로 이렇다 할 작품을 남기지 못했다. 한때 뜻을 같이 했던 미스 반 데어 로에나 발터 그로피우스와는 달리 망명 후에 일이 썩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한창 시절은 1920년대였다. 독일 뿐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축가 중 하나였으며 소위 말하는 ‘유선형 건축Streamline Architecture’의 대표자였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포츠담에 있는 태양관측소 ‘아인슈타인 타워’다. 1919년부터 1922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아인슈타인은 여러 번 활동 무대를 옮겼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개발할 당시에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었으며 베를린의 천문학자들에게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한번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때 천문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던 프로인틀리히 교수는 첼로를 연주하는 천문학자로서 멘델존과 친한 사이였다. 멘델존의 아내도 첼리스트였으므로 서로 잘 알고 지냈다. 프로인틀리히 교수가 어느 날 멘델존에게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태양관측소를 한 번 지어볼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아인슈타인 타워였다. 완성된 관측소를 보고 아인슈타인은 “건물이 상당히 유기적이네”라고 평했다고 한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뿐 아니라 ‘유기적인 건축’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낸 셈이다. 이렇게 상대성 이론이 유기적인 건축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자 베를린과 포츠담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천문대가 준공되었던 1922년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탔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아인슈타인에게 별장을 하나 선사했는데 그 별장이 바로 포츠담근처에 있었다. 그러니 베를린과 포츠담의 시민들이 마치 자신들이 노벨상을 탄 것처럼 흥분했던 것이다. 아인슈타인 타워는 구경거리가 되었고 상대성 이론은 화젯거리가 되었다. 후에 포츠담의 칼 푀르스터 설계실에서 근무하던 헤르타 함머바허1는 상대성 이론을 정원의 형태로 한번 풀어보겠다고 기염을 토했으며 그 결과물을 1936년 드레스덴의 정원 박람회에 출품했다. 물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아인슈타인 타워로 일약 유명해진 멘델존은 곧 스타 건축가가 되었고 한창 때에는 직원 40명을 둔 큰 사무실을 운영했다. 일이 너무 많아 비명을 질렀으며 리하르트 노이트라Richard Neutra, 율리우스 포제너Julius Posener 등의 쟁쟁한 인물들이 그의 사무실에서 견습생으로 일했다. 건축학 외에 경영학도 전공한 덕분인지 멘델존은 경제적으로도 승승가 도를 달려 동료들의 시기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물론 그의 집과 재산은 나중에 나치에게 남김없이 몰수당하고 만다. 그러나 지금 에리히 멘델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까닭은 단지 그가 모더니즘의 대표 건축가 중 하나로서 고찰의 대상이 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반복해서 표현했던 그의 정원관 때문이다. 그는 자연과 정원을 사랑한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다. 건축의 단단함과 뾰족함, 직선과 모남을 식물이 부드럽게 감싸주어야 한다고 거듭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개인 주택도 다수 설계했는데 대부분 정원을 직접 만들었다. 짐작컨대 그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미국의 프랭크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유선형이라고는 하나 그의 건축은 다른 모더니즘 건축들과 마찬가지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입면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 하나의 유연한 곡선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것이 입면 전체일 수도 있고 담장의 둥근 모서리 일수도 있으며 발코니의 외곽 라인일 수도 있다. 때로는 원형 혹은 반원형의 탑을 부착하기도 했다. 건물 전체가 유기적으로 설계된 아인슈타인 타워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그는 “건물이란 아직 벌거벗은 신생아와 다름없다. 녹색의 레이스를 달아 예쁜 옷을 입혀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2라며 식물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나 얼핏 정원을 옹호하는 것 같은 이 말을 곰곰이 뜯어보면 조경가로서 그리 좋아할 일도 아니다. 그는 ‘정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녹색 레이스로서의 식물’을 말하고 있다. 사실 이런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건축가가 멘델존 하나만은 아니다. 거의 모든 건축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것이다. 다만 멘델존의 운이 좋지 않아서 제인 브라운의 『The Modern Garden』이란 책에 여러 번 인용된 덕에 지금 혼자 화살받이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어떻게 말했든 사실 그의 건축은, 특히 그의 완벽하고 매끄러운 곡선의 표면은 정원이 다가갈 틈을 내주지 않는 아성과 같다. 고정희는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손수 가꾼 아름다운 정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느 순간 그 정원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유년의 경험이 인연이 되었는지 조경을 평생의 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를 비롯 총 네 권의 정원·식물 책을 펴냈고, 칼 푀르스터와 그의 외동딸 마리안네가 쓴 책을 동시에 번역출간하기도 했다. 베를린 공과대학교 조경학과에서 ‘20세기 유럽 조경사’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00 장면으로 재구성한 조경사] 조경의 상대성 이론
#9 에리히 멘델존, 내 건축에 녹색 레이스를 입혀다오 미국 유타에 가면 로버트 스미스슨이 만든 달팽이 방파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막 한복판에 소위 저먼 빌리지German Village라고 하는 것이 있다. 독일인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독일식 다세대주택을 재현해 놓은 일종의 세트장이다. 세트장이지만 영화를 찍으려고 만든 것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베를린 폭격을 연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1943년부터 연합군들이 전면전에 돌입하며 카셀, 함부르크와 드레스덴 등의 다른 도시들은 불바다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베를린의 집들은 어찌 된 일인지 소이탄 공격이 별 효과가 없었다. 특히 19세기 후반부에 노동자들을 위해 튼튼하게 지은 다세대주택들이 폭격에 강했다. 그 시대에 이미 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건축 기법을 모색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연합군들이 미처 모르고 있었다. 집과 집 사이의 벽에는 창문 없는 맨 벽에 돌, 벽돌, 콘크리트 등 비연소성 소재만을 사용했고 최소한 24cm 두께로 지었으며 건축 소재뿐 아니라 건물 배치에서도 불이 서로 옮겨붙지 않도록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세심한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다. 궁리 끝에 미국 국방성의 화학전戰 담당자가 당시 미국에 망명 와 있던 독일 출신의 유대인 건축가 에리히 멘델존Eric Mendelsohn(1887~1953)에게 비밀리에 자문을 요청했다. 멘델존은 이에 응했고 거의 원본과 똑같이 건물을 만들어 주었다. 독일식의 튼튼한 가구도 만들어 넣고 침대 시트, 커튼까지 그대로 재현했다고 한다. 유타는 공기가 건조하여 발화 양상이 베를린과 달랐으므로 오일의 성질을 조정한 후, 비 내리는 베를린마냥 물을 뿌려가며 폭격 연습을 했다고 한다. 결국 폭격에 성공했고 모두 세 번을 재건하여 연습을 반복한 후 마지막에 남은 건물 두 채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어쩌면 다가올 3차 세계대전을 대비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파괴되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건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저먼 빌리지가 한때 널리 명성을 떨쳤던 스타 건축가 멘델존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당시 그는 56세였으니 원숙한 경지에 들어 왕성히 활동할 나이였지만 베를린을 떠난 뒤 운도 그를 떠났는지 별로 이렇다 할 작품을 남기지 못했다. 한때 뜻을 같이 했던 미스 반 데어 로에나 발터 그로피우스와는 달리 망명 후에 일이 썩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한창 시절은 1920년대였다. 독일 뿐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축가 중 하나였으며 소위 말하는 ‘유선형 건축Streamline Architecture’의 대표자였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포츠담에 있는 태양관측소 ‘아인슈타인 타워’다. 1919년부터 1922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아인슈타인은 여러 번 활동 무대를 옮겼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개발할 당시에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었으며 베를린의 천문학자들에게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한번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때 천문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던 프로인틀리히 교수는 첼로를 연주하는 천문학자로서 멘델존과 친한 사이였다. 멘델존의 아내도 첼리스트였으므로 서로 잘 알고 지냈다. 프로인틀리히 교수가 어느 날 멘델존에게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태양관측소를 한 번 지어볼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아인슈타인 타워였다. 완성된 관측소를 보고 아인슈타인은 “건물이 상당히 유기적이네”라고 평했다고 한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뿐 아니라 ‘유기적인 건축’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낸 셈이다. 이렇게 상대성 이론이 유기적인 건축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자 베를린과 포츠담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천문대가 준공되었던 1922년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탔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아인슈타인에게 별장을 하나 선사했는데 그 별장이 바로 포츠담근처에 있었다. 그러니 베를린과 포츠담의 시민들이 마치 자신들이 노벨상을 탄 것처럼 흥분했던 것이다. 아인슈타인 타워는 구경거리가 되었고 상대성 이론은 화젯거리가 되었다. 후에 포츠담의 칼 푀르스터 설계실에서 근무하던 헤르타 함머바허1는 상대성 이론을 정원의 형태로 한번 풀어보겠다고 기염을 토했으며 그 결과물을 1936년 드레스덴의 정원 박람회에 출품했다. 물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아인슈타인 타워로 일약 유명해진 멘델존은 곧 스타 건축가가 되었고 한창 때에는 직원 40명을 둔 큰 사무실을 운영했다. 일이 너무 많아 비명을 질렀으며 리하르트 노이트라Richard Neutra, 율리우스 포제너Julius Posener 등의 쟁쟁한 인물들이 그의 사무실에서 견습생으로 일했다. 건축학 외에 경영학도 전공한 덕분인지 멘델존은 경제적으로도 승승가 도를 달려 동료들의 시기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물론 그의 집과 재산은 나중에 나치에게 남김없이 몰수당하고 만다. 그러나 지금 에리히 멘델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까닭은 단지 그가 모더니즘의 대표 건축가 중 하나로서 고찰의 대상이 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반복해서 표현했던 그의 정원관 때문이다. 그는 자연과 정원을 사랑한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다. 건축의 단단함과 뾰족함, 직선과 모남을 식물이 부드럽게 감싸주어야 한다고 거듭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개인 주택도 다수 설계했는데 대부분 정원을 직접 만들었다. 짐작컨대 그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미국의 프랭크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유선형이라고는 하나 그의 건축은 다른 모더니즘 건축들과 마찬가지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입면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 하나의 유연한 곡선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것이 입면 전체일 수도 있고 담장의 둥근 모서리 일수도 있으며 발코니의 외곽 라인일 수도 있다. 때로는 원형 혹은 반원형의 탑을 부착하기도 했다. 건물 전체가 유기적으로 설계된 아인슈타인 타워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그는 “건물이란 아직 벌거벗은 신생아와 다름없다. 녹색의 레이스를 달아 예쁜 옷을 입혀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2라며 식물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나 얼핏 정원을 옹호하는 것 같은 이 말을 곰곰이 뜯어보면 조경가로서 그리 좋아할 일도 아니다. 그는 ‘정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녹색 레이스로서의 식물’을 말하고 있다. 사실 이런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건축가가 멘델존 하나만은 아니다. 거의 모든 건축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것이다. 다만 멘델존의 운이 좋지 않아서 제인 브라운의 『The Modern Garden』이란 책에 여러 번 인용된 덕에 지금 혼자 화살받이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어떻게 말했든 사실 그의 건축은, 특히 그의 완벽하고 매끄러운 곡선의 표면은 정원이 다가갈 틈을 내주지 않는 아성과 같다. 고정희는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손수 가꾼 아름다운 정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느 순간 그 정원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유년의 경험이 인연이 되었는지 조경을 평생의 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를 비롯 총 네 권의 정원·식물 책을 펴냈고, 칼 푀르스터와 그의 외동딸 마리안네가 쓴 책을 동시에 번역출간하기도 했다. 베를린 공과대학교 조경학과에서 ‘20세기 유럽 조경사’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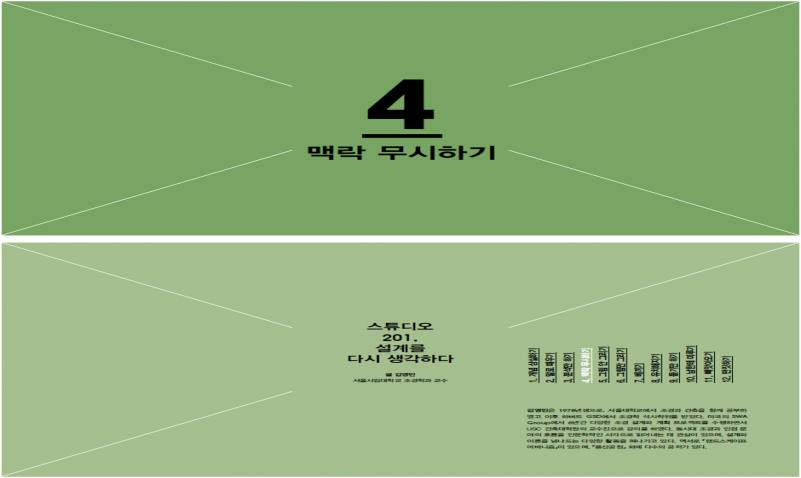 [스튜디오 201, 설계를 다시 생각하다] 맥락 무시하기
맥락의 이름으로 선유도공원, 청계천, 감천문화마을, 한양도성 길, 하늘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북한산 둘레길, 광화문광장, 북서울꿈의 숲, 이화동 벽화마을. 요 근래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다양한 조경 공간들이다. 프로젝트의 성격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디자인 방식도 전혀 다른 이 공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얼핏 보면 서로 닮은 구석을 찾기 힘든 이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 바로 맥락context이다. 요즈음 좋은 디자인이란 곧 맥락을 잘 고려하고 반영한 디자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듯하다. 화제가 되는 새로운 조경 작품이나 공모전 당선안의 설명을 보면 대상지에 남아있는 지형이 되었든, 인근 마을의 설화가 되었든, 그곳에 찾아오는 철새들이 되었든, 항상 맥락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영화를 중간부터 보면 전후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마찬가지로 주변의 맥락과 소통할 수 없는 설계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좋은 설계는 맥락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명제가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가 않다. 오랫동안 맥락을 무시하는 태도가 좋은 설계의 당연한 전제였다면 믿겠는가? 그리고 이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설계의 가치이기도 하다. 맥락이라는 새로운 바람 잠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은 유보하고 언제부터 맥락을 중심으로 설계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자. 맥락이 설계의 중요한 가치로 대두하게 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우리는 설계에서 맥락이 지니는 의미를 편견 없는 시선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조짐은 이미 1960년대부터 건축계를 중심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몇몇 선구적인 건축가들의 개별적인 실험에서 시작된 모더니즘은 곧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어 서구의 근대 문명을 대표하는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1930년대 이후에 모더니즘은 국제주의의 이름으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로 전파되어 건축과 도시는 물론, 인간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한다. 1960년대는 성기 모더니즘이 건축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한 시기였다.1 국제주의, 더 넓게는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적인 건축 운동인 모더니즘이 내세운 가치는 새로움과 보편성이었다. 새로움과 보편성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거의 모든 과거의 가치가 부정되고 지역의 특수성은 배격당했다. 이렇게 모더니즘은 거의 반세기 동안 인간의 정주 구조에서 맥락을 철저히 지워왔다. 모더니즘 거장들의 시대가 저물어가던 1960년대 들어서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왔던 모더니즘의 가치관이 만들어낸 결과는 거장들이 꿈꾸어오던 이상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전의 마을과 도시를 구성하던 골목들은 그리드 형태의 차도로 정리되었고 자연스럽게 거리에서 사람들의 소리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지붕의 모양을 보면 어느 동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색 있던 건물 대신 지루하게 반복되는 콘크리트 박스형 건축물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공간이 되었다. 모더니즘이 유일한 건축적 양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를 어쩔 수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비서구권 건축가들의 괴리감은 더욱 컸다. 유럽과 미국의 젊은 건축가들 역시 모더니즘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모더니즘은 최소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양식이었다. 그러나 제3세계의 건축가들에게 모더니즘은 서구에서 수입된, 어쩌면 강요되었을 지도 모르는 이질적인 양식이었다. 1960년대 정치적으로 과거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하고 있을 무렵 오히려 그들의 도시와 삶은 다시 근대화와 국제화라는 명분으로 종속되기 시작했다. 모더니즘은 그들의 맥락을 파괴하는 데 가장 선두에 서있었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겨울의 왕국인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 왜 지중해의 이상을 담은 수평창과 평지붕을 사용해야 하는가? 누구보다 강렬한 태양과 색채를 가진 멕시코에서 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회색과 백색의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동안 목조로 건물을 지어오던 일본에서 콘크리트와 철골의 건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새로운 그들의 건축을 시도한다.2 맥락이 다시 중요해진다. 그리고 완전한 제국을 완성했다고 자부했던 성기 모더니즘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새로움과 보편성보다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맥락을 중요시한 젊은 건축가들의 작업들은 이후 이론가들에 의해 맥락주의contextualism, 혹은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된다.3 그리고 이 새로운 흐름은 모더니즘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 선봉에 서게 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모더니즘이 끝났다는 선언은 더 이상 특별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이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이제 거장들이 떠난 모더니즘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 전선을 구성했던 후계자들은 모더니즘의 가치를 대체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해야했다. 이때 역사, 의미, 상황, 장소성, 지역성, 정체성 같이 모더니즘이 부정했던 가치들을 포괄하는 맥락의 개념이 전면에 등장한다. 맥락의 대두와 함께 조경의 가치가 새삼스럽게 주목받기 시작한다.4 솔직히 말하자면 20세기 전반부에서 조경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근대 도시와 함께 나타난 새로운 공원이 근대적 의미의 조경이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는 했지만, 인간의 정주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급진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조경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조경은 도시와 괴리된 낙원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그 모든 형태의 변화에 대한 변명거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었다. 공원은 극도로 열악해져만 가는 산업도시에 대한 구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면죄부를 주기도 했으며, 모더니즘이 과거의 맥락을 모조리 파괴해가는 과정에서도 이를 정당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맥락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는 과정에서 경관은 모더니즘이 장악했던 반세기 동안 잃어버린 가치를 복원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된다. 왜냐하면 맥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관을 만드는 조경의 역할 역시 재조명받게 된다. 김영민은 1978년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조경과 건축을 함께 공부하였고 이후 하버드 GSD에서 조경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의 SWA Group에서 6년간 다양한 조경 설계와 계획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USC 건축대학원의 교수진으로 강의를 하였다. 동시대 조경과 인접 분야의 흐름을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읽어내는 데 관심이 있으며, 설계와 이론을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역서로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이 있으며, 『용산공원』 외에 다수의 공저가 있다.
[스튜디오 201, 설계를 다시 생각하다] 맥락 무시하기
맥락의 이름으로 선유도공원, 청계천, 감천문화마을, 한양도성 길, 하늘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북한산 둘레길, 광화문광장, 북서울꿈의 숲, 이화동 벽화마을. 요 근래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다양한 조경 공간들이다. 프로젝트의 성격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디자인 방식도 전혀 다른 이 공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얼핏 보면 서로 닮은 구석을 찾기 힘든 이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 바로 맥락context이다. 요즈음 좋은 디자인이란 곧 맥락을 잘 고려하고 반영한 디자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듯하다. 화제가 되는 새로운 조경 작품이나 공모전 당선안의 설명을 보면 대상지에 남아있는 지형이 되었든, 인근 마을의 설화가 되었든, 그곳에 찾아오는 철새들이 되었든, 항상 맥락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영화를 중간부터 보면 전후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마찬가지로 주변의 맥락과 소통할 수 없는 설계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좋은 설계는 맥락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명제가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가 않다. 오랫동안 맥락을 무시하는 태도가 좋은 설계의 당연한 전제였다면 믿겠는가? 그리고 이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설계의 가치이기도 하다. 맥락이라는 새로운 바람 잠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은 유보하고 언제부터 맥락을 중심으로 설계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자. 맥락이 설계의 중요한 가치로 대두하게 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우리는 설계에서 맥락이 지니는 의미를 편견 없는 시선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조짐은 이미 1960년대부터 건축계를 중심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몇몇 선구적인 건축가들의 개별적인 실험에서 시작된 모더니즘은 곧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어 서구의 근대 문명을 대표하는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1930년대 이후에 모더니즘은 국제주의의 이름으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로 전파되어 건축과 도시는 물론, 인간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한다. 1960년대는 성기 모더니즘이 건축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한 시기였다.1 국제주의, 더 넓게는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적인 건축 운동인 모더니즘이 내세운 가치는 새로움과 보편성이었다. 새로움과 보편성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거의 모든 과거의 가치가 부정되고 지역의 특수성은 배격당했다. 이렇게 모더니즘은 거의 반세기 동안 인간의 정주 구조에서 맥락을 철저히 지워왔다. 모더니즘 거장들의 시대가 저물어가던 1960년대 들어서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왔던 모더니즘의 가치관이 만들어낸 결과는 거장들이 꿈꾸어오던 이상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전의 마을과 도시를 구성하던 골목들은 그리드 형태의 차도로 정리되었고 자연스럽게 거리에서 사람들의 소리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지붕의 모양을 보면 어느 동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색 있던 건물 대신 지루하게 반복되는 콘크리트 박스형 건축물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공간이 되었다. 모더니즘이 유일한 건축적 양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를 어쩔 수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비서구권 건축가들의 괴리감은 더욱 컸다. 유럽과 미국의 젊은 건축가들 역시 모더니즘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모더니즘은 최소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양식이었다. 그러나 제3세계의 건축가들에게 모더니즘은 서구에서 수입된, 어쩌면 강요되었을 지도 모르는 이질적인 양식이었다. 1960년대 정치적으로 과거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하고 있을 무렵 오히려 그들의 도시와 삶은 다시 근대화와 국제화라는 명분으로 종속되기 시작했다. 모더니즘은 그들의 맥락을 파괴하는 데 가장 선두에 서있었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겨울의 왕국인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 왜 지중해의 이상을 담은 수평창과 평지붕을 사용해야 하는가? 누구보다 강렬한 태양과 색채를 가진 멕시코에서 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회색과 백색의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동안 목조로 건물을 지어오던 일본에서 콘크리트와 철골의 건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새로운 그들의 건축을 시도한다.2 맥락이 다시 중요해진다. 그리고 완전한 제국을 완성했다고 자부했던 성기 모더니즘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새로움과 보편성보다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맥락을 중요시한 젊은 건축가들의 작업들은 이후 이론가들에 의해 맥락주의contextualism, 혹은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된다.3 그리고 이 새로운 흐름은 모더니즘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 선봉에 서게 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모더니즘이 끝났다는 선언은 더 이상 특별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이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이제 거장들이 떠난 모더니즘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 전선을 구성했던 후계자들은 모더니즘의 가치를 대체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해야했다. 이때 역사, 의미, 상황, 장소성, 지역성, 정체성 같이 모더니즘이 부정했던 가치들을 포괄하는 맥락의 개념이 전면에 등장한다. 맥락의 대두와 함께 조경의 가치가 새삼스럽게 주목받기 시작한다.4 솔직히 말하자면 20세기 전반부에서 조경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근대 도시와 함께 나타난 새로운 공원이 근대적 의미의 조경이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는 했지만, 인간의 정주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급진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조경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조경은 도시와 괴리된 낙원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그 모든 형태의 변화에 대한 변명거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었다. 공원은 극도로 열악해져만 가는 산업도시에 대한 구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면죄부를 주기도 했으며, 모더니즘이 과거의 맥락을 모조리 파괴해가는 과정에서도 이를 정당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맥락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는 과정에서 경관은 모더니즘이 장악했던 반세기 동안 잃어버린 가치를 복원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된다. 왜냐하면 맥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관을 만드는 조경의 역할 역시 재조명받게 된다. 김영민은 1978년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조경과 건축을 함께 공부하였고 이후 하버드 GSD에서 조경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의 SWA Group에서 6년간 다양한 조경 설계와 계획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USC 건축대학원의 교수진으로 강의를 하였다. 동시대 조경과 인접 분야의 흐름을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읽어내는 데 관심이 있으며, 설계와 이론을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역서로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이 있으며, 『용산공원』 외에 다수의 공저가 있다.[조경가의 서재] 기억 속 서가의 풍경 ‘정조의 상림십경’에 대한 글을 쓰게 된
이즘은 책은 읽지 않고 음악이나 듣고, 드라마만 보며 산다. 그래서 ‘네 놈이 읽은 책을 뱉어내라’는 죽비를 맞았을 때 궁한 마음에 이십여 년 전에 읽었던, 기억에도 가물거리는 그들을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 먼저 이해를 구한다. 내 낡은 기억의 통로를 따라가다 혹여 길을 잃더라도 당신은 명주실 되잡고 무사히 빠져나가시길 바란다. 세상에는 무수한 길이 있듯이 책 속에도 수많은 길이 있다. 그리고 어느 길로 접어드는가는 우연과 인연이 만들어낸 운명 같은 일이다. 스치고 지나갔던 옷자락이 나중에 다시 만나 환하게 밝아지는 일은, 책의 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십여 년 전쯤, 짧은 글을 하나 쓴 적이 있다. 사실 그 글은 연속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한 편만 쓰고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지금 와서 그 글을 어떻게 쓰게 되었을까 되짚어보니 꽤나 오랜시간 적잖은 만남이 거기에 얽혀 있었다. 1984년과 1985년 사이의 어느 날이었을 게다. 자주 가던 다방에서 사람들 틈에 있던 그녀는 ‘그’의 시를 내게 알려주었다. “갈 봄 여름 없이, 처형 받은 세월이었지 / 축제도 화환도 없는 세월이었지…”1로 시작되는 시,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2는 이 숨 막히는 시까지. 폭력과 저항이, 절망만큼이나 희망을 길어 올리던 그 시절을 실험적 언어와 도저한 슬픔으로 그려내던 황지우의 시집을 읽으며 나는 조금씩 성장했고, 그의 네 번째 시집 『게눈 속의 연꽃』에서 ‘산경山經’을 노래했을 때 기꺼이 그를 따라 『산해경山海經』3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와는 그즘에서 헤어지게 됐지만 말이다. 기원전 3~4세기에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산해경』은 크게 ‘산경’과 ‘해경’으로 나뉘는 중국과 그 주변에 대한 상상의 지리서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만 측정 가능한 위치와 상상의 동물, 불가해한 일이 끝없이 펼쳐진다. 지은이도 없이, 오랜 세월 주석만 첨삭되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동아시아 정신 세계의 한 부분을 그려 낸 책, 그저 이야기로만 듣던 해태며 봉황, 주작이 전부였던 내게 오백 리씩 가면 나타나는 그 많은 동물들이 멸종된 고대 생물로 느껴지는 떨림이었다. 글을 옮긴 정재서는 역자 서문과 그의 책 『동양적인 것의 슬픔』에서 고전이 담고 있는 다의적 함의와 여러 층위의 중첩을 풀어헤치며 “구조의 금간 틈, 차이에 대한 눈뜸은 항상 모든 지배적 언술 체계 내에 존재하는 이항 대립을 의식하는 시각으로부터 발생된다”4고 일깨웠다. 그리고 서구에 의해 타자화 되고, 다시 중국에 의해 타자화 되었던 중국 중심의 세계주의에 대한 독해를 위해 서쪽으로 2,765리 가면 만날 수 있는 사이드Edward W. Said를 불러들였을 때 ‘고조선에서 중화문화권에 속했다고 하는 조선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품으며, 예전에 스치며 지나듯 읽었던 먼지 덮인 문학잡지5를 다셔 펼쳐보게 되었다. 이수학은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이원조경에서 4년 동안 일했다. 프랑스 라빌레뜨 건축학교와 고등사회과학대학원이 공동 개설한 ‘정원·경관·지역’ 데으아(D.E.A.) 학위를 했고, 현재 아뜰리에나무를 꾸리고 있다. [그들이 설계하는 법] 태도, 접촉면 경관
1 사실 기고를 마음먹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조경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설계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기획 의도와 조금 더 먼저 이 길을 가고 있는 선배로서 조경을 시작하는 학생들이나 후배들에게 들려 줄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편집진의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맘이 내키지 않는 다. 학교를 벗어나 업으로서 조경을 시작한 지 이제 고작 10년 남짓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여전히 헤매고 있는 풋내기 조경가가 지면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무모하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2 “왜 요새 블로그1에 글 안 올리세요? 예전엔 종종 들어갔었는데.” 오랜만에 방치해 두었던 블로그에 들어가 보았다. 한동안 꽤나 정성들여 글이며 자료를 올렸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뜸해졌다. “요샌 바빠서. 정신이 없네.” 사실 바쁜 일상에 쫓겨서가 아니다.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아직 여물지 않은 생각들을, 여전히 진행 중인 실험들을 글로 적는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싶어진 것이다. 나는 신입사원 면접을 할 때마다 좋아하는 조경가가 누구냐는 질문을 한다. 지원자의 설계적 성향을 파악해 보기 위함인데, 언젠가 한 친구가 “OOO이라는 우리 학교 선배요. 그 선배만큼 열정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라고 답했다. 그때는 ‘이 친구는 아는 조경가도 한 사람 없나’ 그렇게 생각했다. 한참을 지나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태도’를 이야기 한 것이었다. 유명 작가의 작품집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멋진 디자인이나 철학보다도, 가까이서 직접 보고 느낀 친한 선배의 ‘열정’이 더 큰 힘이 되었으리라. 그리고 그것이 지금 조경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 자신에게도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열정’은 언제나 과정을 의미하며, 태도를 지배한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가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 용기를 내본다.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들은 나의 조경에 대한 태도, 아직은 어설픈 과정의 이야기들이다. 3 “형, 형이 하는 설계는 잘 모르겠어요. 다이어그램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꼭 그렇게 어렵게 조경해야 되나요” 몇 해 전이다. 한 후배 녀석이 우리 회사에서 제출한 설계공모 도판을 보았는지 술자리에서 묻는다. 내가 지금까지 해 온 설계공모 작업들은 잘된 설계안이 아닐뿐더러,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다. 다이어그램은 복잡하고, 디자인은 매우 거칠고 개념적이며,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충분치 않으니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운 좋게 여러 작업들이 당선은 되었지만, 대상지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과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명쾌하게 제시해야 하는 설계공모의 결과물로서는 사실 낙제다. 4 기술사사무소 렛의 장종수 소장님과의 개인적인연으로 시작하게 된 설계공모 작업들2은 나로서는 참 행운이었다. “우린 목표가 2등이야.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하자고.” 진심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시니 맘은 편하다. 사실 당시 진행된 국내 설계공모 작품들을 보면서 항상 아쉽다고 느끼는 점들이 몇 가지 있었다. 그동안 내가 배우고 공부해 온 해외의 많은 설계공모가 그러했듯, 설계공모는 작품을 통해 설계자만의 디자인 사고와 새로운 설계 기법, 여러 가지 도시적·사회적·철학적 때론 정치적 담론까지도 공론화할 수 있는 ‘설계안 이상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시절 지겹게 보아왔던 라빌레뜨 공원이나 다운스뷰파크, 프레시킬스 뿐만 아니라 근대적 공원의 시작이자 최초의 공원 설계공모격인 센트럴파크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소위 잘 뽑아진 결과물로서의 공간적·경관적 형태와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것은 좋은 설계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좋은 설계공모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5 또 다른 한 가지는 대상지(site)를 대하는 설계자의 태도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대지와 설계안의 괴리감이다. 흔히들 우리가 설계해야 할 대상지는 백지가 아니라고 쉽게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설계는 직접적인 설계 대상인 대지, 그 장소에 담긴 경관(landscape)이라는 실체(substance)를 ‘탐구’하고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외부와의 물리적·비물리적 관계성 및 맥락성(context)을 통해 그 땅의 개념적 의미를 ‘해석’하고 ‘부여’하려는 경향이 지나치게 강하다. 게다가 하이브리드라는 시대적 흐름은 개념이나 이론, 디자인 철학이나 방법론까지도 조경이 아닌 외부로부터 차용되어야 더 ‘쿨‘한 것으로 몰아간다. 경관이라는 실체에 대한 탐구와 내부로부터의 고민 없이 밖으로의 팽창만을 꿈꾸는 조경은 걱정스럽다. 우리가 의무감처럼 행해왔던 많은 분석 리스트 중에 순수하게 조경만의 언어로 대상지를 들여다보는 분석 방법은 몇 가지나 있는가? 그것만으로 우리만의 디자인을 이끌어 내기에 여전히 충분한가? 그리고 그것들은 디자인으로 잘 발전되어 왔나? 6매번 설계공모 작업 때마다 고민하고 전달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다루어야 하는 땅에 관한 이야기,‘그 장소만의 경관 체계(landscape system)를 어떻게 읽고 해석해 나갈 것인가’와 해석된 경관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이종(異種)의 조직 속에서 작동 가능한 새로운 경관,즉 변이적 경관(landscape cultivar)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파주운정지구 도시기반시설 조경설계공모(2007)에서는 대상지의 경관을 형성해 온 기작과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의 기작을 중첩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 대지에 순응하며 도시 조직의 일부로서 작동하는 경관을 제안하고자 하였고,강북생태문화공원 설계공모(2008)에서는 대상지 내부의 자연 조직과 도시 조직이 만나는 추이대 형성 과정을 통해 대상지의 경관을 조직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체계인 메타스케이프(metascape)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충북혁신도시 설계공모(2008)에서는 대상지에 존재하는 일상적 경관 중 가장 마이크로한 경관 요소들을 찾아 이들의 재조합을 통해 경관 중합체(landscape polymer)라는 대상지만의 경관이 내재된 변이적 경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고,하남미사지구 설계공모(2009)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대상지의 경관을 지배해 온 농지의 미세 지형과 시스템,조각 숲의 구조와 기능을 새로운 공원의 기반적 시스템(infrastructural system)으로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내곡 보금자리지구 조경설계공모(2010)에서는 지형 구조가 도시의 공간감과 스케일,생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서울의 팽창 과정을 되짚어 봄으로써 알아보고자 하였고,송산그린시티 철새서식지 설계공모(2011)에서는 대상지를 여러 유형의 비오톱 조합체로 인식하고,대체 서식처로서의 작동을 위한 필수적인 비오톱을 선정하고 이들의 이식(grafting)과 복제(cloning),재조합(re-organization)을 통한 단계적 서식처의 복원을 제안하였다. 7물론 지금까지 해온 나의 작업들이 깊이 있는 논쟁을 끌어낼 만한 것들이 못 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경관을 바라보는 일관된 가치관’을 가지고 설계에 접근하려고 애써 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비록 불완전한 모습일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내어 놓는 사람들이,설계자의 가치관들을 각자의 설계 언어로 꾸준히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또 그러한 노력들이 현장에서 설계 작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더욱 가치 있을 것이다. 우리 설계가들은 매일 생각하고,시도하고,시행착오를 거친다. 조경이라는 실용적 학문에 있어서 이러한 피드백의 과정은 더 할 수 없이 중요한 가치이며,설계자 개개인이 자기만의 경관을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우리나라 조경의 스펙트럼이 더 다양해지리라 믿기 때문이다. 8경관은 하나의 장소가 작동하기 위한 공감각적 시스템이다. 사실 경관은 마치 수백만 개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작은 톱니바퀴들처럼 그곳만의 조직으로 오랫동안 서로 맞물려 작동하며 만들어진 커다란 아날로그시계와도 같다. 경관은 시간을 거슬러 하나의 장소가 작동되어 오던 그 장소만의 역사적·사회적·생태적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담아낸다. 씨앗이 토양과 소통하며 뿌리를 내리고 환경―비,바람,기온,습도 등에 반응하며 그 장소만의 식생을 이루는 것처럼, 인간이 대지와 소통하며 경작을 하고 길을 내고 공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경관은 그 속에 담겨있는 요소들 모두가 서로 반응하며 지금껏 만들어온 ‘장소와 요소, 요소와 요소들 간의 소통’에 의한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경관은 이러한 장소의 시스템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무형의 산물, 즉 공간에 대한 감흥을담는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그때의 분위기나 느낌이 전해지지 않아 아쉬워했던 경험처럼,경관은 한 장소의 소리,향기,촉감,공간감,문화,역사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장소만의 고유의 공기를 담는 공감각의 매체(synaesthetic media)다. 9변이적 경관(landscape cultivar). 우리가 설계를 해야 하는 대상지는 오랜 시간 땅과 소통하며 그 장소만의 공감각적 경관을 담고 있는 물리적 바탕이기도 하지만,동시에 앞으로 이 땅을 이용하게 될 새로운 이용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할 시간적 매체(temporal media)이기도 하다. 이때 대상지의 표면(surface)은 단순히 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실재하는 지형적 베이스(topographic base)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대상지의 역사,문화,생태계를 포함하는 이 땅의 ‘과거의 기억’을 유일하게 담아내며 현재와 관계를 맺어주는 오래된 사진 앨범과 같다. 우리들 스스로 항상 되뇌는 말처럼,‘조경’이라는 작업이 단순히 대지를 ‘화장’하는 일이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의 설계가 단순히 미학적 가치를 넘어 이 땅의 경관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경관,그 기억을 드러내고,그것이 이 땅에 들어올 새로운 조직과 유연히 작동할 수 있도록,두 조직 간의 상충(contradiction)을 경관적으로 중재(arbitration)하는 작업이 되어야함을 이야기한다. 변이적 경관이란 ‘변이’라는 말 자체가 담고 있는 것처럼 ‘본질’,이 땅의 ‘경관적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대지의 기억이 말끔히 지워진 새로운 ‘B’라는 제3의 경관이 아니라 ‘조건과 입장이 다른 여러 켜들이 얽혀서 생성적 배역을 해나가는 조경의 역할3’,즉 ‘A-1’의 경관인 것이다. 10접촉면 경관(interface landscape). 벌써 10년 전이다. 나의 블로그 타이틀이기도 한 이 용어는 대학원에서 MVRDV의 책을 읽다가 우연히 내 가슴에 박혀 버렸다.“세계는 세계와 우리의 접촉면의 관계 안에서 변화한다. 세계의 한계는 우리 접촉면의 한계다. 우리는 세계의 실체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의 접촉면 과 상호작용한다.”4 그들이 꺼내 놓은 이 단어는 내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해법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왜 대상지의 경관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해 주었다. 사실 ‘접촉면’이라는 우리말보다 ‘인터페이스’라는 외래어가 더 익숙하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핸드폰,인터넷,각종 프로그램,게임 등 우리는 하루에 수십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만난다. 우리가 매일 쓰는 포토샵의 바탕화면은 버전 업이 될 때마다,새롭게 바뀐 디자인에 놀라워하기도 하지만,바뀐 아이콘 위치에 곧 당황스러워 하기도 한다. 인터넷의 포털사이트 역시 어떤 사이트의 홈 화면은 잘 정리되어 쉽고 정확하게 그날의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어떤 곳은 쓸데없거나 잘못된 기사들을 제공해 오히려 시간만 허비시키거나 사건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조경 설계라는 작업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웹을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할 때,사용자는 ‘인터페이스 화면’이라는 유일한 매개면 만을 통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능과 정보와 소통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상지’ 역시 이용자가 한 장소에 담긴 다양한 경관적 정보들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적 매개면(environmental agency)이며,설계자가 어떠한 경관적 잠재력을 읽어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땅에 대한 의미와 이용자들의 이해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조경’이라는 작업은 대상지와 이용자 사이의 역사, 문화, 생태 그리고 공감각적 감흥을 포괄하는 접촉면 경관을 형성하는 작업이며, 그것을 통해 이 땅의 가치를 이해하고, 경관과 소통하고, 장소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의미 깊은 작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11‘또 대상지?’ 사실 진부한 것은 대상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였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만의 눈으로, 보다 창의적으로 대상지를 깊게 들여다보고, 각자가 읽은 것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밖으로부터의 언어들과는 차별되는 우리만의 디자인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각주 1 “인터페이스 랜드스케이프(www.cyworld.com/interface_landscape)”란 이름의 개인 블로그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조경 설계에 관심 있는 동료나 후배들과 나의 고민과 자료를 공유하고 싶단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늘 나의 조경 사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수학 소장(아뜰리에나무)의 열정을 좇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다 각주 2 이번호에 소개하는 설계공모 작업들은 SWA Los Angeles재직 당시 기술사사무소 렛과 개인 자격으로 협업하였거나, 이후 기술사사무소 렛의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작업한 것들이다. 그중 파주운정지구 도시기반시설 조경설계공모(나군, 2007), 강북생태문화공원 설계공모(2008),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조경설계공모(A구역, 2008)는 당시 SWA 동료였던 서울시립대학교 김영민 교수와 함께 작업하였다. 각주3 정욱주,“상충의 도시, 생성의 층위”,『LAnD: 조경·미학·디자인』,도서출판 조경, 2006. 각주 4 Peter Weibel, “Architecture as Interface”, MVRDV, MVRDV at VPRO, Actar, 1998. 재인용 김현민은 1975년생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경을 공부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조경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조경가협회(ASLA)에서 수여하는 우수졸업자상을 받았으며, 미국의 SWA Group에서 Shanghai Gubei Gold Street Plan, Symphony Park Competition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기술사사무소 렛, 비오이엔씨에서 계획, 설계 및 정원 시공에 이르는 폭 넓은 실무를 경험하였고, 국내 여러 대학에서 조경 설계를 강의하였다.
[그들이 설계하는 법] 태도, 접촉면 경관
1 사실 기고를 마음먹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조경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설계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기획 의도와 조금 더 먼저 이 길을 가고 있는 선배로서 조경을 시작하는 학생들이나 후배들에게 들려 줄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편집진의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맘이 내키지 않는 다. 학교를 벗어나 업으로서 조경을 시작한 지 이제 고작 10년 남짓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여전히 헤매고 있는 풋내기 조경가가 지면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무모하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2 “왜 요새 블로그1에 글 안 올리세요? 예전엔 종종 들어갔었는데.” 오랜만에 방치해 두었던 블로그에 들어가 보았다. 한동안 꽤나 정성들여 글이며 자료를 올렸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뜸해졌다. “요샌 바빠서. 정신이 없네.” 사실 바쁜 일상에 쫓겨서가 아니다.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아직 여물지 않은 생각들을, 여전히 진행 중인 실험들을 글로 적는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싶어진 것이다. 나는 신입사원 면접을 할 때마다 좋아하는 조경가가 누구냐는 질문을 한다. 지원자의 설계적 성향을 파악해 보기 위함인데, 언젠가 한 친구가 “OOO이라는 우리 학교 선배요. 그 선배만큼 열정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라고 답했다. 그때는 ‘이 친구는 아는 조경가도 한 사람 없나’ 그렇게 생각했다. 한참을 지나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태도’를 이야기 한 것이었다. 유명 작가의 작품집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멋진 디자인이나 철학보다도, 가까이서 직접 보고 느낀 친한 선배의 ‘열정’이 더 큰 힘이 되었으리라. 그리고 그것이 지금 조경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 자신에게도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열정’은 언제나 과정을 의미하며, 태도를 지배한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가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 용기를 내본다.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들은 나의 조경에 대한 태도, 아직은 어설픈 과정의 이야기들이다. 3 “형, 형이 하는 설계는 잘 모르겠어요. 다이어그램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꼭 그렇게 어렵게 조경해야 되나요” 몇 해 전이다. 한 후배 녀석이 우리 회사에서 제출한 설계공모 도판을 보았는지 술자리에서 묻는다. 내가 지금까지 해 온 설계공모 작업들은 잘된 설계안이 아닐뿐더러,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다. 다이어그램은 복잡하고, 디자인은 매우 거칠고 개념적이며,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충분치 않으니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운 좋게 여러 작업들이 당선은 되었지만, 대상지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과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명쾌하게 제시해야 하는 설계공모의 결과물로서는 사실 낙제다. 4 기술사사무소 렛의 장종수 소장님과의 개인적인연으로 시작하게 된 설계공모 작업들2은 나로서는 참 행운이었다. “우린 목표가 2등이야.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하자고.” 진심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시니 맘은 편하다. 사실 당시 진행된 국내 설계공모 작품들을 보면서 항상 아쉽다고 느끼는 점들이 몇 가지 있었다. 그동안 내가 배우고 공부해 온 해외의 많은 설계공모가 그러했듯, 설계공모는 작품을 통해 설계자만의 디자인 사고와 새로운 설계 기법, 여러 가지 도시적·사회적·철학적 때론 정치적 담론까지도 공론화할 수 있는 ‘설계안 이상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시절 지겹게 보아왔던 라빌레뜨 공원이나 다운스뷰파크, 프레시킬스 뿐만 아니라 근대적 공원의 시작이자 최초의 공원 설계공모격인 센트럴파크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소위 잘 뽑아진 결과물로서의 공간적·경관적 형태와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것은 좋은 설계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좋은 설계공모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5 또 다른 한 가지는 대상지(site)를 대하는 설계자의 태도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대지와 설계안의 괴리감이다. 흔히들 우리가 설계해야 할 대상지는 백지가 아니라고 쉽게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설계는 직접적인 설계 대상인 대지, 그 장소에 담긴 경관(landscape)이라는 실체(substance)를 ‘탐구’하고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외부와의 물리적·비물리적 관계성 및 맥락성(context)을 통해 그 땅의 개념적 의미를 ‘해석’하고 ‘부여’하려는 경향이 지나치게 강하다. 게다가 하이브리드라는 시대적 흐름은 개념이나 이론, 디자인 철학이나 방법론까지도 조경이 아닌 외부로부터 차용되어야 더 ‘쿨‘한 것으로 몰아간다. 경관이라는 실체에 대한 탐구와 내부로부터의 고민 없이 밖으로의 팽창만을 꿈꾸는 조경은 걱정스럽다. 우리가 의무감처럼 행해왔던 많은 분석 리스트 중에 순수하게 조경만의 언어로 대상지를 들여다보는 분석 방법은 몇 가지나 있는가? 그것만으로 우리만의 디자인을 이끌어 내기에 여전히 충분한가? 그리고 그것들은 디자인으로 잘 발전되어 왔나? 6매번 설계공모 작업 때마다 고민하고 전달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다루어야 하는 땅에 관한 이야기,‘그 장소만의 경관 체계(landscape system)를 어떻게 읽고 해석해 나갈 것인가’와 해석된 경관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이종(異種)의 조직 속에서 작동 가능한 새로운 경관,즉 변이적 경관(landscape cultivar)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파주운정지구 도시기반시설 조경설계공모(2007)에서는 대상지의 경관을 형성해 온 기작과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의 기작을 중첩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 대지에 순응하며 도시 조직의 일부로서 작동하는 경관을 제안하고자 하였고,강북생태문화공원 설계공모(2008)에서는 대상지 내부의 자연 조직과 도시 조직이 만나는 추이대 형성 과정을 통해 대상지의 경관을 조직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체계인 메타스케이프(metascape)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충북혁신도시 설계공모(2008)에서는 대상지에 존재하는 일상적 경관 중 가장 마이크로한 경관 요소들을 찾아 이들의 재조합을 통해 경관 중합체(landscape polymer)라는 대상지만의 경관이 내재된 변이적 경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고,하남미사지구 설계공모(2009)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대상지의 경관을 지배해 온 농지의 미세 지형과 시스템,조각 숲의 구조와 기능을 새로운 공원의 기반적 시스템(infrastructural system)으로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내곡 보금자리지구 조경설계공모(2010)에서는 지형 구조가 도시의 공간감과 스케일,생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서울의 팽창 과정을 되짚어 봄으로써 알아보고자 하였고,송산그린시티 철새서식지 설계공모(2011)에서는 대상지를 여러 유형의 비오톱 조합체로 인식하고,대체 서식처로서의 작동을 위한 필수적인 비오톱을 선정하고 이들의 이식(grafting)과 복제(cloning),재조합(re-organization)을 통한 단계적 서식처의 복원을 제안하였다. 7물론 지금까지 해온 나의 작업들이 깊이 있는 논쟁을 끌어낼 만한 것들이 못 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경관을 바라보는 일관된 가치관’을 가지고 설계에 접근하려고 애써 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비록 불완전한 모습일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내어 놓는 사람들이,설계자의 가치관들을 각자의 설계 언어로 꾸준히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또 그러한 노력들이 현장에서 설계 작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더욱 가치 있을 것이다. 우리 설계가들은 매일 생각하고,시도하고,시행착오를 거친다. 조경이라는 실용적 학문에 있어서 이러한 피드백의 과정은 더 할 수 없이 중요한 가치이며,설계자 개개인이 자기만의 경관을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우리나라 조경의 스펙트럼이 더 다양해지리라 믿기 때문이다. 8경관은 하나의 장소가 작동하기 위한 공감각적 시스템이다. 사실 경관은 마치 수백만 개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작은 톱니바퀴들처럼 그곳만의 조직으로 오랫동안 서로 맞물려 작동하며 만들어진 커다란 아날로그시계와도 같다. 경관은 시간을 거슬러 하나의 장소가 작동되어 오던 그 장소만의 역사적·사회적·생태적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담아낸다. 씨앗이 토양과 소통하며 뿌리를 내리고 환경―비,바람,기온,습도 등에 반응하며 그 장소만의 식생을 이루는 것처럼, 인간이 대지와 소통하며 경작을 하고 길을 내고 공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경관은 그 속에 담겨있는 요소들 모두가 서로 반응하며 지금껏 만들어온 ‘장소와 요소, 요소와 요소들 간의 소통’에 의한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경관은 이러한 장소의 시스템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무형의 산물, 즉 공간에 대한 감흥을담는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그때의 분위기나 느낌이 전해지지 않아 아쉬워했던 경험처럼,경관은 한 장소의 소리,향기,촉감,공간감,문화,역사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장소만의 고유의 공기를 담는 공감각의 매체(synaesthetic media)다. 9변이적 경관(landscape cultivar). 우리가 설계를 해야 하는 대상지는 오랜 시간 땅과 소통하며 그 장소만의 공감각적 경관을 담고 있는 물리적 바탕이기도 하지만,동시에 앞으로 이 땅을 이용하게 될 새로운 이용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할 시간적 매체(temporal media)이기도 하다. 이때 대상지의 표면(surface)은 단순히 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실재하는 지형적 베이스(topographic base)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대상지의 역사,문화,생태계를 포함하는 이 땅의 ‘과거의 기억’을 유일하게 담아내며 현재와 관계를 맺어주는 오래된 사진 앨범과 같다. 우리들 스스로 항상 되뇌는 말처럼,‘조경’이라는 작업이 단순히 대지를 ‘화장’하는 일이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의 설계가 단순히 미학적 가치를 넘어 이 땅의 경관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경관,그 기억을 드러내고,그것이 이 땅에 들어올 새로운 조직과 유연히 작동할 수 있도록,두 조직 간의 상충(contradiction)을 경관적으로 중재(arbitration)하는 작업이 되어야함을 이야기한다. 변이적 경관이란 ‘변이’라는 말 자체가 담고 있는 것처럼 ‘본질’,이 땅의 ‘경관적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대지의 기억이 말끔히 지워진 새로운 ‘B’라는 제3의 경관이 아니라 ‘조건과 입장이 다른 여러 켜들이 얽혀서 생성적 배역을 해나가는 조경의 역할3’,즉 ‘A-1’의 경관인 것이다. 10접촉면 경관(interface landscape). 벌써 10년 전이다. 나의 블로그 타이틀이기도 한 이 용어는 대학원에서 MVRDV의 책을 읽다가 우연히 내 가슴에 박혀 버렸다.“세계는 세계와 우리의 접촉면의 관계 안에서 변화한다. 세계의 한계는 우리 접촉면의 한계다. 우리는 세계의 실체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의 접촉면 과 상호작용한다.”4 그들이 꺼내 놓은 이 단어는 내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해법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왜 대상지의 경관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해 주었다. 사실 ‘접촉면’이라는 우리말보다 ‘인터페이스’라는 외래어가 더 익숙하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핸드폰,인터넷,각종 프로그램,게임 등 우리는 하루에 수십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만난다. 우리가 매일 쓰는 포토샵의 바탕화면은 버전 업이 될 때마다,새롭게 바뀐 디자인에 놀라워하기도 하지만,바뀐 아이콘 위치에 곧 당황스러워 하기도 한다. 인터넷의 포털사이트 역시 어떤 사이트의 홈 화면은 잘 정리되어 쉽고 정확하게 그날의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어떤 곳은 쓸데없거나 잘못된 기사들을 제공해 오히려 시간만 허비시키거나 사건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조경 설계라는 작업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웹을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할 때,사용자는 ‘인터페이스 화면’이라는 유일한 매개면 만을 통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능과 정보와 소통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상지’ 역시 이용자가 한 장소에 담긴 다양한 경관적 정보들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적 매개면(environmental agency)이며,설계자가 어떠한 경관적 잠재력을 읽어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땅에 대한 의미와 이용자들의 이해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조경’이라는 작업은 대상지와 이용자 사이의 역사, 문화, 생태 그리고 공감각적 감흥을 포괄하는 접촉면 경관을 형성하는 작업이며, 그것을 통해 이 땅의 가치를 이해하고, 경관과 소통하고, 장소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의미 깊은 작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11‘또 대상지?’ 사실 진부한 것은 대상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였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만의 눈으로, 보다 창의적으로 대상지를 깊게 들여다보고, 각자가 읽은 것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밖으로부터의 언어들과는 차별되는 우리만의 디자인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각주 1 “인터페이스 랜드스케이프(www.cyworld.com/interface_landscape)”란 이름의 개인 블로그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조경 설계에 관심 있는 동료나 후배들과 나의 고민과 자료를 공유하고 싶단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늘 나의 조경 사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수학 소장(아뜰리에나무)의 열정을 좇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다 각주 2 이번호에 소개하는 설계공모 작업들은 SWA Los Angeles재직 당시 기술사사무소 렛과 개인 자격으로 협업하였거나, 이후 기술사사무소 렛의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작업한 것들이다. 그중 파주운정지구 도시기반시설 조경설계공모(나군, 2007), 강북생태문화공원 설계공모(2008),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조경설계공모(A구역, 2008)는 당시 SWA 동료였던 서울시립대학교 김영민 교수와 함께 작업하였다. 각주3 정욱주,“상충의 도시, 생성의 층위”,『LAnD: 조경·미학·디자인』,도서출판 조경, 2006. 각주 4 Peter Weibel, “Architecture as Interface”, MVRDV, MVRDV at VPRO, Actar, 1998. 재인용 김현민은 1975년생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경을 공부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조경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조경가협회(ASLA)에서 수여하는 우수졸업자상을 받았으며, 미국의 SWA Group에서 Shanghai Gubei Gold Street Plan, Symphony Park Competition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기술사사무소 렛, 비오이엔씨에서 계획, 설계 및 정원 시공에 이르는 폭 넓은 실무를 경험하였고, 국내 여러 대학에서 조경 설계를 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