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드 포인트(Tide Point)
타이드 포인트(Tide Point)
버려졌던 오래된 산업부지가 볼티모어 첨단 항구 Baltimore’s Digital Harbor의 중심지로 변화된 이 프로젝트는 ‘탈바꿈(transformation)’의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타이드 포인트는 Procter & Gamble의 주요 비누공장 중 하나였다. 이 대상지에서 추구한 조경은 이웃 주민들을 수변으로 끌어낼 뿐만 아니라, 오피스 단지의 요구에도 잘 맞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즉, 유동적인 이벤트 공간이자 사람들이 만나고 먹고 쉬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했다. 여름에는 안개 생성장치가 보행자를 시원하게 하고, 그물침대와 아디론댁식의 의자(adirondack chair)가 보행로와 수변 광장 여기저기에 놓인다.
우리는 대상지의 산업적인 특징들을 보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다소 완화시켰고, 이를 통해 방문객을 초대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석구석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작은 정원들을 조성함으로써 대상지의 스케일을 세분화했다. 단지의 핵심은 수변에 있는 기다란 목재 산책로인데, 여름의 뜨거운 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안개 생성장치가 판자 사이로 시원한 안개를 발생시킨다. 그 안개 생성장치들은 볼티모어의 길고 뜨거운 여름동안 방문객들을 시원하게 하는 실용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항구의 존재감을 형성하는 자극적이고 눈에 띄는 방식이기도 하다. 밤이 되면 안개에 다양한 색의 조명을 비춤으로써 드라마틱한 연출이 가능하다. 대상지의 계획은 차량동선과 보행자로, 그리고 시민들의 수변으로의 접근을 위한 볼티모어시의 지역권(地役權)을 명확하게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메릴랜드 역사재단(Maryland Historic Trust)과 내무부로부터 역사적인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Design _ W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LLCDesigners/planners/co-workers and staff _ Barbara Wilks, Andrea Steele, Amy VonaLocation _ Baltimore, Maryland, USAArea _ 13acres글, 자료제공 _ W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LLC|
[email protected]
-
 프라그스 가로(Prags Boulevard)
프라그스 가로(Prags Boulevard)
Prags Boulevard는 오래된 산업지역들과 대형 아파트 빌딩 사이에 위치하며, 매우 낡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조화롭지 못한 지역이었다. 도로시스템과 공공시설들이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공모전의 주요 컨셉은 특별한 장소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도시의 기반시설로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주요 특징
마스터플랜의 가장 중요한 건축적 특징은 포플러나무와 잔디, 녹색 의자 등 연속되는 녹색 요소들로 이루어진 가로의 조성이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이 Prags Boulevard 변화의 주요한 요소였다. 이 가로는 장소의 건강성과 움직이는 활동을 지향함으로써 공원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되었다. 활동공간들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녹색 요소들에 대응하도록 배치되었다. 가로와 활동공간들은 공원을 통합하며, 서로 연결하는 요소로 보이기도 한다.
건설 원칙과 재료의 선택
토양 오염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공사를 하는데 대규모 굴착과 기반 구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자 소망이었다. 자칫하면 매장물과 세금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재료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데, 모든 경계부위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안전한 구조로 이루어진 프레임이나 박스로 제작되었으며, 주름진 펜스는 필요에 따라 고정될 수 있는 도금된 기둥으로 설치되었다. 이 펜스는 도금된 기둥과 목재 기둥이 고정된 수평적인 밴드로 구성되었다. 산업, 주택, 교통과 도시 삶이 혼재된 공간의 균일하지 않은 특성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안전한” 재료를 선택하기보다 모던한 재료를 시도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선택된 재료는 관습적이지 않고, 오래된 것들과 매우 새로운 것들의 충돌을 함축하고 있다. 보행로의 표면은 강한 그래픽 패턴을 갖고 있고, 광장들과 활동공간은 녹색 속에 붉은 색 공간으로 표시되며, 가장자리는 스테인리스 스틸, 녹색 네온등, 펜스의 부드러운 곡선, 화강암 경계석, 검정 고무판 등으로 마감되었다.
활동공간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공간들은 위치와 크기, 일부는 기능까지도 변화되었다. 모든 D구역은 독립적인 주제들로 개발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활동공간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들은 방문카드/광장(visiting card/square), 정원(garden), 무대(stage), 코트(court), 케이지(cage), 어린이정원(kindergarten), 그리고 경사로/스케이팅 구역(ramp/scating area)으로 설정되었다.
Design _ Arkitekt Kristine Jensens TegnestueEngineering _ Moe & BrфdsgaardCommission _ The Municipality of CopenhagenLocation _ Copenhagen, DenmarkSize _ 68,000㎡(length of boulevard _ 2㎞)Completion _ 2005. 11Budget _ 2,7 mill. euro글, 자료제공 _ Akitekt Kristine Jensens Tegn | www.kristinejensen.dk
-
 Frederick Gibberd
Frederick Gibberd
프레드릭 기버드의 정원
정원은 어느 특정인만의 전유물, 혹은 특정 분야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마음속의 정원이 있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일상 공간 내에서 정원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 수많은 실험과 시도가 반복될 때 시대를 대표하는 양식이 출현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아름다우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가정 주부였던 로즈마리(Rosemary Verey )여사나 영화 감독이었던 데릭 저먼(Derek Jarman)의 정원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 하자면 20세기 영국 건축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프레드릭 기버드Frederick Gibberd(1908~1984)가 그의 마지막 생애의 28년을 살았던 곳의 정원을 들 수 있다. 근대건축의 개척자 중의 한명으로 평가 받고 있는 기버드는 도시설계가이기도 하면서 조경가라고 할 수도 있다. 초기의 풀먼 코트Pullman Court(1934~1935)를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할로 뉴타운(Harlow New Town)계획, 런던 히드로 공항 터미널, 리버풀의 로마 가톨릭 성당(1962~1967) 등 그는 많은 건축물과 도시계획을 남겼다. - 중략 -
기버드가 구입하기 이전에 저택에 정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원의 많은 부분이 소유주들이 바뀌면서 첨가되어 왔다. 이 저택의 역사는 1907년 법정 변호사인 뉴먼(FJ Newman)이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든 것부터 시작된다. 저택 앞의 장방형 연못과 라임 가로수길은 이 당시의 흔적이다. 1920년에 저택은 공무원인 블랙쇼(John Blackshaw)에게 팔렸고 그는 장방형의 연못 끝부분에 정자를 세우고 저택의 입구에 오두막을 지었다. 이후 한 명의 소유주가 더 바뀐 후 1936년 의사인 랙(Victor Lack)이 저택을 구입 후 이곳을 작은 농장으로 개조한다. 이후 농장은 다시 부동산 시장에 나오고 5년이 넘도록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하다가 집을 찾던 기버드의 눈에 띈다.
건물이 많이 낡은 상태였지만 다시 지을 수는 없었다. 재미있게도 그가 도시의 종합계획자였지만 그린벨트 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재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의 책임자라 하여도 특혜를 받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그는 주거건축에 대한 이상향을 이곳에서 구현할 수가 없었다. 대신 그는 실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지붕의 기와를 바꾸고, 테라스를 만들거나 넓히는 등 개보수에 중점을 두었다. 연못, 잔디밭, 숲속의 빈터, 가로수길은 81개의 조각품, 큰 도기화분, 그리고 건축물의 잔재를 위한 무대로서 기버드에 의해서 차례차례 첨가되거나 변모되었다. 하지만 기버드는 이 정원을 위한 어떤 마스터플랜도 제작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명료하다. 바로 자신 스스로가 고객이기 때문에 그림을 준비할 이유도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변화시킬 수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곤 하였다. 기버드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한 사고를 가진 직관적 정원사였다. 식재를 한 후 그것이 적합하다면 잘 자라서 주변과 조화를 이룰 것이고 아니라면 뽑아버리거나 정리하고 다른 것을 또 식재하면 된다는 단순하지만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로 정원을 가꾸어 갔다. 이러한 그의 방법은 최근에 영국 문화유산기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원 복원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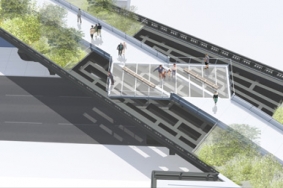 뉴욕 하이라인 프로젝트 - 현재와 미래
뉴욕 하이라인 프로젝트 - 현재와 미래
뉴욕 하이라인(The High Line, New York, NY)은 프로젝트 자체가 가지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적인 정체성, 버려졌던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재이용이라는 흥미로운 주제, 이야깃거리를 제공해왔다. 2004년 뉴욕시에서 야심차게 주최한 설계 공모전에서 조경, 지역 설계 회사인 Field Operations, LLC의 주도하에 결성된 팀이 설계권을 부여 받은 이후로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디자인팀의 인고의 세월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2008년 6월 클라이언트팀(Client team)의 일원인 프렌즈 오브 더 하이라인(Friends of the High Line)이 설계1공구의 70% 완성과 설계2공구의 설계도면 완성을 기념하기 위한 책인『Designing the High Line』을 출판함으로써 하이라인의 개장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2007년 6월부터 설계2공구 리드 디자이너(Lead Designer)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하이라인이 허드슨 야드 개발 부지(Hudson yard development site)로 연장되어 끝나는 부분—비공식적으로 잠정적 설계3공구라 일컬어진다—에 대한 설계 제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하이라인이 현재 어떠한 진행 상태에 있으며, 2공구 디자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설계2공구
설계2공구 부지의 특성은 1공구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진다. 전체 하이라인 부지는 고가 철로였다는 역사를 반영하듯 좁은 선형이나, 1공구에서는 선로가 휘어지거나, 방향을 틀거나, 혹은 분지를 만들어 빠져나가는 등의 다양한 변이를 보여준 반면 2공구의 부지는 9블록에 거쳐 직선을 유지하는 단조로움을 보이며 더욱이 폭이 30feet를 넘지 않을 만큼 좁기도 하다. 설계가 시작될 무렵만 하더라도, 이 구간의 하이라인은 저층 건물로 위요되어 있거나 노출되어 있어서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은 맨해튼 서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나, 이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무상한 풍경일 뿐이었다.
이미 하이라인 재설계의 특수를 타고 주변 지역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2공구가 관통하고 있었던 저소득층 주택단지 블록의 일부는 고급 호텔이나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다. 특히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듯, 새로이 입지할 건물들은 모두 세계적인, 혹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건축가들의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하이라인은 건축물 전시장과 같은 복잡한 경관을 관통하게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때문에 디자인팀은 하이라인의 곧은 직선부지를 더욱 강조하여 강한 시선의 축을 형성하는데 전체적인 초점을 두었으며, 그 선상에서 다양한 경험의 에피소드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이유로 2공구 전 구간은 6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다.
각 구간은 식물 생태군 혹은 다른 형태적 특징에 따라 이름 지어졌는데, 이는 하이라인 설계 초기단계에서 행해진 식생 현황 조사에서 착상을 얻은 것이다. 하이라인이 20여년간 방치되어 있는 동안 다양한 종류의 자생식물이 천이를 통해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형성하였다. 구조물이 긴 거리를 통해 연장되어 있었던 만큼 부분마다의 미기후가 달랐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식생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으며, 이를 적극 도입하고자 한 것은 클라이언트팀과 디자인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
 스튜디오 101, 설계를 묻다(4)
스튜디오 101, 설계를 묻다(4)
형태: 보이지 않는 것도 디자인하는 형태적 상상력
리플
최근에 자하 하디드(Zaha Hadid ) “스타일”로 설계해달라는 암묵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고, 클라이언트의 취향이니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적당히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흘려버렸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이번호의 주제인 형태와 지난호의 주제인 정체성에 관한 혼돈이 양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일이 일상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섬뜩하기까지 하다. 예를 들어 미장원에서 한번쯤 해봄직한 일, 잡지를 뒤적이며 유명 연예인의 스타일과 같이 해달라고 주문하는 일 말이다. 원하는 스타일대로 척척 가공해주는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유능한 걸까? 혹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에게만 어울리는, 나만을 위한 마법을 부려주는 사람이 유능한 걸까? 우리는 고객이 주문하는 요구에 따라 어떤 형태(혹은 스타일)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설계가의 능력이 어떤 고객이 원하는 어떤 스타일로도 해줄 수 있는 다재다능함일까? 그렇게 된다면 설계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나에게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마치 “시그너쳐 룩”을 구사하는 패션디자이너처럼 설계적 정체성이 형태적으로도 존재해야하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이 엉키면서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어렵고 무거우면서도 우리 주변 일상에서 늘 부딪칠 만큼 공기같이 가벼운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체성의 문제가 아주 쉽게 형태적 정체성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 솔직담백한 얘기보따리를 풀어주신 정욱주 교수에 이어 이번 주제는 형태이다. 뒤져보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저런 설계를 하다가 끄적여놓은 단상의 흔적들이 형태에 관련된 것이 많다. 아마도 설계의 여러 단계 중에서도 합목적적이면서도 유연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낯선“형태를 찾는 과정”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집착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이번호는 그렇기에 형태라는 큰 화두 아래 사라질 뻔했던 메모들을 정리하여 모자이크하는 식으로 구성해볼까 한다.
설계에 있어서 형태
케빈 린치(Kevin Lynch)와 개리 핵(Gary Hack)은『단지설계Site Design』라는 책에서 설계는 결국 특정 프로그램을 만족시키는 형태를 찾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설계의 범위와 정의, 그리고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는 해도 설계 혹은 디자인의 본질적인 측면은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만큼 형태에 대한 논의는 설계에 대한 대화에 있어서 핵심적일 것이다. 모더니즘 건축의 모토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는 명제는 이전시대의 형태와 장식을 구별하여 가장 순수한 기능에 기초한 형태만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사고에 기반한다. 역사적으로 건축물이나 정원 혹은 공원의 형태는 당대의 시대적 양식과 관련이 깊다. 쉬운 예로 유럽의 풍경식 정원과 정형식 정원의 뚜렷한 대비는 그 시대의 지배적인 미적 관점 혹은 문화적 양식이 어떠한 형태로 외부공간에 반영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다원화되고 단일한 양식이 지배하지 않는 현대에 있어서 건조환경의 형태 역시 다원화되고, 개별적인 설계가의 관점에 의해 부여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에 대한 준거는 매우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조경설계에 있어서 형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의되고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선빨”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우리는 형태에 대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왜 수많은 공원들은 지루한 형태적인 반복을 하고 있는가? 아마도 설계에 대한 고민 중 상당 부분은 형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제 형태에 대한 몇 가지 소주제를 통해“왜 이렇게 형태잡기가 힘든가”에 대한 냉정한 자기반성을 해보자.
 타이드 포인트(Tide Point)
버려졌던 오래된 산업부지가 볼티모어 첨단 항구 Baltimore’s Digital Harbor의 중심지로 변화된 이 프로젝트는 ‘탈바꿈(transformation)’의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타이드 포인트는 Procter & Gamble의 주요 비누공장 중 하나였다. 이 대상지에서 추구한 조경은 이웃 주민들을 수변으로 끌어낼 뿐만 아니라, 오피스 단지의 요구에도 잘 맞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즉, 유동적인 이벤트 공간이자 사람들이 만나고 먹고 쉬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했다. 여름에는 안개 생성장치가 보행자를 시원하게 하고, 그물침대와 아디론댁식의 의자(adirondack chair)가 보행로와 수변 광장 여기저기에 놓인다. 우리는 대상지의 산업적인 특징들을 보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다소 완화시켰고, 이를 통해 방문객을 초대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석구석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작은 정원들을 조성함으로써 대상지의 스케일을 세분화했다. 단지의 핵심은 수변에 있는 기다란 목재 산책로인데, 여름의 뜨거운 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안개 생성장치가 판자 사이로 시원한 안개를 발생시킨다. 그 안개 생성장치들은 볼티모어의 길고 뜨거운 여름동안 방문객들을 시원하게 하는 실용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항구의 존재감을 형성하는 자극적이고 눈에 띄는 방식이기도 하다. 밤이 되면 안개에 다양한 색의 조명을 비춤으로써 드라마틱한 연출이 가능하다. 대상지의 계획은 차량동선과 보행자로, 그리고 시민들의 수변으로의 접근을 위한 볼티모어시의 지역권(地役權)을 명확하게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메릴랜드 역사재단(Maryland Historic Trust)과 내무부로부터 역사적인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Design _ W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LLCDesigners/planners/co-workers and staff _ Barbara Wilks, Andrea Steele, Amy VonaLocation _ Baltimore, Maryland, USAArea _ 13acres글, 자료제공 _ W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LLC| [email protected]
타이드 포인트(Tide Point)
버려졌던 오래된 산업부지가 볼티모어 첨단 항구 Baltimore’s Digital Harbor의 중심지로 변화된 이 프로젝트는 ‘탈바꿈(transformation)’의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타이드 포인트는 Procter & Gamble의 주요 비누공장 중 하나였다. 이 대상지에서 추구한 조경은 이웃 주민들을 수변으로 끌어낼 뿐만 아니라, 오피스 단지의 요구에도 잘 맞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즉, 유동적인 이벤트 공간이자 사람들이 만나고 먹고 쉬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했다. 여름에는 안개 생성장치가 보행자를 시원하게 하고, 그물침대와 아디론댁식의 의자(adirondack chair)가 보행로와 수변 광장 여기저기에 놓인다. 우리는 대상지의 산업적인 특징들을 보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다소 완화시켰고, 이를 통해 방문객을 초대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석구석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작은 정원들을 조성함으로써 대상지의 스케일을 세분화했다. 단지의 핵심은 수변에 있는 기다란 목재 산책로인데, 여름의 뜨거운 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안개 생성장치가 판자 사이로 시원한 안개를 발생시킨다. 그 안개 생성장치들은 볼티모어의 길고 뜨거운 여름동안 방문객들을 시원하게 하는 실용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항구의 존재감을 형성하는 자극적이고 눈에 띄는 방식이기도 하다. 밤이 되면 안개에 다양한 색의 조명을 비춤으로써 드라마틱한 연출이 가능하다. 대상지의 계획은 차량동선과 보행자로, 그리고 시민들의 수변으로의 접근을 위한 볼티모어시의 지역권(地役權)을 명확하게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메릴랜드 역사재단(Maryland Historic Trust)과 내무부로부터 역사적인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Design _ W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LLCDesigners/planners/co-workers and staff _ Barbara Wilks, Andrea Steele, Amy VonaLocation _ Baltimore, Maryland, USAArea _ 13acres글, 자료제공 _ W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LLC| [email protected] 프라그스 가로(Prags Boulevard)
Prags Boulevard는 오래된 산업지역들과 대형 아파트 빌딩 사이에 위치하며, 매우 낡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조화롭지 못한 지역이었다. 도로시스템과 공공시설들이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공모전의 주요 컨셉은 특별한 장소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도시의 기반시설로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주요 특징 마스터플랜의 가장 중요한 건축적 특징은 포플러나무와 잔디, 녹색 의자 등 연속되는 녹색 요소들로 이루어진 가로의 조성이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이 Prags Boulevard 변화의 주요한 요소였다. 이 가로는 장소의 건강성과 움직이는 활동을 지향함으로써 공원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되었다. 활동공간들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녹색 요소들에 대응하도록 배치되었다. 가로와 활동공간들은 공원을 통합하며, 서로 연결하는 요소로 보이기도 한다. 건설 원칙과 재료의 선택 토양 오염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공사를 하는데 대규모 굴착과 기반 구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자 소망이었다. 자칫하면 매장물과 세금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재료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데, 모든 경계부위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안전한 구조로 이루어진 프레임이나 박스로 제작되었으며, 주름진 펜스는 필요에 따라 고정될 수 있는 도금된 기둥으로 설치되었다. 이 펜스는 도금된 기둥과 목재 기둥이 고정된 수평적인 밴드로 구성되었다. 산업, 주택, 교통과 도시 삶이 혼재된 공간의 균일하지 않은 특성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안전한” 재료를 선택하기보다 모던한 재료를 시도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선택된 재료는 관습적이지 않고, 오래된 것들과 매우 새로운 것들의 충돌을 함축하고 있다. 보행로의 표면은 강한 그래픽 패턴을 갖고 있고, 광장들과 활동공간은 녹색 속에 붉은 색 공간으로 표시되며, 가장자리는 스테인리스 스틸, 녹색 네온등, 펜스의 부드러운 곡선, 화강암 경계석, 검정 고무판 등으로 마감되었다. 활동공간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공간들은 위치와 크기, 일부는 기능까지도 변화되었다. 모든 D구역은 독립적인 주제들로 개발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활동공간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들은 방문카드/광장(visiting card/square), 정원(garden), 무대(stage), 코트(court), 케이지(cage), 어린이정원(kindergarten), 그리고 경사로/스케이팅 구역(ramp/scating area)으로 설정되었다. Design _ Arkitekt Kristine Jensens TegnestueEngineering _ Moe & BrфdsgaardCommission _ The Municipality of CopenhagenLocation _ Copenhagen, DenmarkSize _ 68,000㎡(length of boulevard _ 2㎞)Completion _ 2005. 11Budget _ 2,7 mill. euro글, 자료제공 _ Akitekt Kristine Jensens Tegn | www.kristinejensen.dk
프라그스 가로(Prags Boulevard)
Prags Boulevard는 오래된 산업지역들과 대형 아파트 빌딩 사이에 위치하며, 매우 낡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조화롭지 못한 지역이었다. 도로시스템과 공공시설들이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공모전의 주요 컨셉은 특별한 장소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도시의 기반시설로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주요 특징 마스터플랜의 가장 중요한 건축적 특징은 포플러나무와 잔디, 녹색 의자 등 연속되는 녹색 요소들로 이루어진 가로의 조성이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이 Prags Boulevard 변화의 주요한 요소였다. 이 가로는 장소의 건강성과 움직이는 활동을 지향함으로써 공원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되었다. 활동공간들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녹색 요소들에 대응하도록 배치되었다. 가로와 활동공간들은 공원을 통합하며, 서로 연결하는 요소로 보이기도 한다. 건설 원칙과 재료의 선택 토양 오염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공사를 하는데 대규모 굴착과 기반 구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자 소망이었다. 자칫하면 매장물과 세금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재료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데, 모든 경계부위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안전한 구조로 이루어진 프레임이나 박스로 제작되었으며, 주름진 펜스는 필요에 따라 고정될 수 있는 도금된 기둥으로 설치되었다. 이 펜스는 도금된 기둥과 목재 기둥이 고정된 수평적인 밴드로 구성되었다. 산업, 주택, 교통과 도시 삶이 혼재된 공간의 균일하지 않은 특성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안전한” 재료를 선택하기보다 모던한 재료를 시도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선택된 재료는 관습적이지 않고, 오래된 것들과 매우 새로운 것들의 충돌을 함축하고 있다. 보행로의 표면은 강한 그래픽 패턴을 갖고 있고, 광장들과 활동공간은 녹색 속에 붉은 색 공간으로 표시되며, 가장자리는 스테인리스 스틸, 녹색 네온등, 펜스의 부드러운 곡선, 화강암 경계석, 검정 고무판 등으로 마감되었다. 활동공간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공간들은 위치와 크기, 일부는 기능까지도 변화되었다. 모든 D구역은 독립적인 주제들로 개발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활동공간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들은 방문카드/광장(visiting card/square), 정원(garden), 무대(stage), 코트(court), 케이지(cage), 어린이정원(kindergarten), 그리고 경사로/스케이팅 구역(ramp/scating area)으로 설정되었다. Design _ Arkitekt Kristine Jensens TegnestueEngineering _ Moe & BrфdsgaardCommission _ The Municipality of CopenhagenLocation _ Copenhagen, DenmarkSize _ 68,000㎡(length of boulevard _ 2㎞)Completion _ 2005. 11Budget _ 2,7 mill. euro글, 자료제공 _ Akitekt Kristine Jensens Tegn | www.kristinejensen.dk Frederick Gibberd
프레드릭 기버드의 정원 정원은 어느 특정인만의 전유물, 혹은 특정 분야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마음속의 정원이 있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일상 공간 내에서 정원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 수많은 실험과 시도가 반복될 때 시대를 대표하는 양식이 출현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아름다우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가정 주부였던 로즈마리(Rosemary Verey )여사나 영화 감독이었던 데릭 저먼(Derek Jarman)의 정원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 하자면 20세기 영국 건축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프레드릭 기버드Frederick Gibberd(1908~1984)가 그의 마지막 생애의 28년을 살았던 곳의 정원을 들 수 있다. 근대건축의 개척자 중의 한명으로 평가 받고 있는 기버드는 도시설계가이기도 하면서 조경가라고 할 수도 있다. 초기의 풀먼 코트Pullman Court(1934~1935)를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할로 뉴타운(Harlow New Town)계획, 런던 히드로 공항 터미널, 리버풀의 로마 가톨릭 성당(1962~1967) 등 그는 많은 건축물과 도시계획을 남겼다. - 중략 - 기버드가 구입하기 이전에 저택에 정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원의 많은 부분이 소유주들이 바뀌면서 첨가되어 왔다. 이 저택의 역사는 1907년 법정 변호사인 뉴먼(FJ Newman)이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든 것부터 시작된다. 저택 앞의 장방형 연못과 라임 가로수길은 이 당시의 흔적이다. 1920년에 저택은 공무원인 블랙쇼(John Blackshaw)에게 팔렸고 그는 장방형의 연못 끝부분에 정자를 세우고 저택의 입구에 오두막을 지었다. 이후 한 명의 소유주가 더 바뀐 후 1936년 의사인 랙(Victor Lack)이 저택을 구입 후 이곳을 작은 농장으로 개조한다. 이후 농장은 다시 부동산 시장에 나오고 5년이 넘도록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하다가 집을 찾던 기버드의 눈에 띈다. 건물이 많이 낡은 상태였지만 다시 지을 수는 없었다. 재미있게도 그가 도시의 종합계획자였지만 그린벨트 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재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의 책임자라 하여도 특혜를 받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그는 주거건축에 대한 이상향을 이곳에서 구현할 수가 없었다. 대신 그는 실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지붕의 기와를 바꾸고, 테라스를 만들거나 넓히는 등 개보수에 중점을 두었다. 연못, 잔디밭, 숲속의 빈터, 가로수길은 81개의 조각품, 큰 도기화분, 그리고 건축물의 잔재를 위한 무대로서 기버드에 의해서 차례차례 첨가되거나 변모되었다. 하지만 기버드는 이 정원을 위한 어떤 마스터플랜도 제작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명료하다. 바로 자신 스스로가 고객이기 때문에 그림을 준비할 이유도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변화시킬 수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곤 하였다. 기버드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한 사고를 가진 직관적 정원사였다. 식재를 한 후 그것이 적합하다면 잘 자라서 주변과 조화를 이룰 것이고 아니라면 뽑아버리거나 정리하고 다른 것을 또 식재하면 된다는 단순하지만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로 정원을 가꾸어 갔다. 이러한 그의 방법은 최근에 영국 문화유산기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원 복원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Frederick Gibberd
프레드릭 기버드의 정원 정원은 어느 특정인만의 전유물, 혹은 특정 분야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마음속의 정원이 있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일상 공간 내에서 정원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 수많은 실험과 시도가 반복될 때 시대를 대표하는 양식이 출현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아름다우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가정 주부였던 로즈마리(Rosemary Verey )여사나 영화 감독이었던 데릭 저먼(Derek Jarman)의 정원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 하자면 20세기 영국 건축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프레드릭 기버드Frederick Gibberd(1908~1984)가 그의 마지막 생애의 28년을 살았던 곳의 정원을 들 수 있다. 근대건축의 개척자 중의 한명으로 평가 받고 있는 기버드는 도시설계가이기도 하면서 조경가라고 할 수도 있다. 초기의 풀먼 코트Pullman Court(1934~1935)를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할로 뉴타운(Harlow New Town)계획, 런던 히드로 공항 터미널, 리버풀의 로마 가톨릭 성당(1962~1967) 등 그는 많은 건축물과 도시계획을 남겼다. - 중략 - 기버드가 구입하기 이전에 저택에 정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원의 많은 부분이 소유주들이 바뀌면서 첨가되어 왔다. 이 저택의 역사는 1907년 법정 변호사인 뉴먼(FJ Newman)이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든 것부터 시작된다. 저택 앞의 장방형 연못과 라임 가로수길은 이 당시의 흔적이다. 1920년에 저택은 공무원인 블랙쇼(John Blackshaw)에게 팔렸고 그는 장방형의 연못 끝부분에 정자를 세우고 저택의 입구에 오두막을 지었다. 이후 한 명의 소유주가 더 바뀐 후 1936년 의사인 랙(Victor Lack)이 저택을 구입 후 이곳을 작은 농장으로 개조한다. 이후 농장은 다시 부동산 시장에 나오고 5년이 넘도록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하다가 집을 찾던 기버드의 눈에 띈다. 건물이 많이 낡은 상태였지만 다시 지을 수는 없었다. 재미있게도 그가 도시의 종합계획자였지만 그린벨트 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재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의 책임자라 하여도 특혜를 받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그는 주거건축에 대한 이상향을 이곳에서 구현할 수가 없었다. 대신 그는 실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지붕의 기와를 바꾸고, 테라스를 만들거나 넓히는 등 개보수에 중점을 두었다. 연못, 잔디밭, 숲속의 빈터, 가로수길은 81개의 조각품, 큰 도기화분, 그리고 건축물의 잔재를 위한 무대로서 기버드에 의해서 차례차례 첨가되거나 변모되었다. 하지만 기버드는 이 정원을 위한 어떤 마스터플랜도 제작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명료하다. 바로 자신 스스로가 고객이기 때문에 그림을 준비할 이유도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변화시킬 수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곤 하였다. 기버드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한 사고를 가진 직관적 정원사였다. 식재를 한 후 그것이 적합하다면 잘 자라서 주변과 조화를 이룰 것이고 아니라면 뽑아버리거나 정리하고 다른 것을 또 식재하면 된다는 단순하지만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로 정원을 가꾸어 갔다. 이러한 그의 방법은 최근에 영국 문화유산기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원 복원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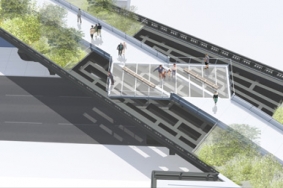 뉴욕 하이라인 프로젝트 - 현재와 미래
뉴욕 하이라인(The High Line, New York, NY)은 프로젝트 자체가 가지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적인 정체성, 버려졌던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재이용이라는 흥미로운 주제, 이야깃거리를 제공해왔다. 2004년 뉴욕시에서 야심차게 주최한 설계 공모전에서 조경, 지역 설계 회사인 Field Operations, LLC의 주도하에 결성된 팀이 설계권을 부여 받은 이후로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디자인팀의 인고의 세월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2008년 6월 클라이언트팀(Client team)의 일원인 프렌즈 오브 더 하이라인(Friends of the High Line)이 설계1공구의 70% 완성과 설계2공구의 설계도면 완성을 기념하기 위한 책인『Designing the High Line』을 출판함으로써 하이라인의 개장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2007년 6월부터 설계2공구 리드 디자이너(Lead Designer)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하이라인이 허드슨 야드 개발 부지(Hudson yard development site)로 연장되어 끝나는 부분—비공식적으로 잠정적 설계3공구라 일컬어진다—에 대한 설계 제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하이라인이 현재 어떠한 진행 상태에 있으며, 2공구 디자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설계2공구 설계2공구 부지의 특성은 1공구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진다. 전체 하이라인 부지는 고가 철로였다는 역사를 반영하듯 좁은 선형이나, 1공구에서는 선로가 휘어지거나, 방향을 틀거나, 혹은 분지를 만들어 빠져나가는 등의 다양한 변이를 보여준 반면 2공구의 부지는 9블록에 거쳐 직선을 유지하는 단조로움을 보이며 더욱이 폭이 30feet를 넘지 않을 만큼 좁기도 하다. 설계가 시작될 무렵만 하더라도, 이 구간의 하이라인은 저층 건물로 위요되어 있거나 노출되어 있어서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은 맨해튼 서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나, 이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무상한 풍경일 뿐이었다. 이미 하이라인 재설계의 특수를 타고 주변 지역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2공구가 관통하고 있었던 저소득층 주택단지 블록의 일부는 고급 호텔이나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다. 특히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듯, 새로이 입지할 건물들은 모두 세계적인, 혹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건축가들의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하이라인은 건축물 전시장과 같은 복잡한 경관을 관통하게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때문에 디자인팀은 하이라인의 곧은 직선부지를 더욱 강조하여 강한 시선의 축을 형성하는데 전체적인 초점을 두었으며, 그 선상에서 다양한 경험의 에피소드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이유로 2공구 전 구간은 6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다. 각 구간은 식물 생태군 혹은 다른 형태적 특징에 따라 이름 지어졌는데, 이는 하이라인 설계 초기단계에서 행해진 식생 현황 조사에서 착상을 얻은 것이다. 하이라인이 20여년간 방치되어 있는 동안 다양한 종류의 자생식물이 천이를 통해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형성하였다. 구조물이 긴 거리를 통해 연장되어 있었던 만큼 부분마다의 미기후가 달랐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식생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으며, 이를 적극 도입하고자 한 것은 클라이언트팀과 디자인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뉴욕 하이라인 프로젝트 - 현재와 미래
뉴욕 하이라인(The High Line, New York, NY)은 프로젝트 자체가 가지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적인 정체성, 버려졌던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재이용이라는 흥미로운 주제, 이야깃거리를 제공해왔다. 2004년 뉴욕시에서 야심차게 주최한 설계 공모전에서 조경, 지역 설계 회사인 Field Operations, LLC의 주도하에 결성된 팀이 설계권을 부여 받은 이후로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디자인팀의 인고의 세월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2008년 6월 클라이언트팀(Client team)의 일원인 프렌즈 오브 더 하이라인(Friends of the High Line)이 설계1공구의 70% 완성과 설계2공구의 설계도면 완성을 기념하기 위한 책인『Designing the High Line』을 출판함으로써 하이라인의 개장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2007년 6월부터 설계2공구 리드 디자이너(Lead Designer)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하이라인이 허드슨 야드 개발 부지(Hudson yard development site)로 연장되어 끝나는 부분—비공식적으로 잠정적 설계3공구라 일컬어진다—에 대한 설계 제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하이라인이 현재 어떠한 진행 상태에 있으며, 2공구 디자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설계2공구 설계2공구 부지의 특성은 1공구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진다. 전체 하이라인 부지는 고가 철로였다는 역사를 반영하듯 좁은 선형이나, 1공구에서는 선로가 휘어지거나, 방향을 틀거나, 혹은 분지를 만들어 빠져나가는 등의 다양한 변이를 보여준 반면 2공구의 부지는 9블록에 거쳐 직선을 유지하는 단조로움을 보이며 더욱이 폭이 30feet를 넘지 않을 만큼 좁기도 하다. 설계가 시작될 무렵만 하더라도, 이 구간의 하이라인은 저층 건물로 위요되어 있거나 노출되어 있어서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은 맨해튼 서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나, 이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무상한 풍경일 뿐이었다. 이미 하이라인 재설계의 특수를 타고 주변 지역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2공구가 관통하고 있었던 저소득층 주택단지 블록의 일부는 고급 호텔이나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다. 특히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듯, 새로이 입지할 건물들은 모두 세계적인, 혹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건축가들의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하이라인은 건축물 전시장과 같은 복잡한 경관을 관통하게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때문에 디자인팀은 하이라인의 곧은 직선부지를 더욱 강조하여 강한 시선의 축을 형성하는데 전체적인 초점을 두었으며, 그 선상에서 다양한 경험의 에피소드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이유로 2공구 전 구간은 6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다. 각 구간은 식물 생태군 혹은 다른 형태적 특징에 따라 이름 지어졌는데, 이는 하이라인 설계 초기단계에서 행해진 식생 현황 조사에서 착상을 얻은 것이다. 하이라인이 20여년간 방치되어 있는 동안 다양한 종류의 자생식물이 천이를 통해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형성하였다. 구조물이 긴 거리를 통해 연장되어 있었던 만큼 부분마다의 미기후가 달랐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식생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으며, 이를 적극 도입하고자 한 것은 클라이언트팀과 디자인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스튜디오 101, 설계를 묻다(4)
형태: 보이지 않는 것도 디자인하는 형태적 상상력 리플 최근에 자하 하디드(Zaha Hadid ) “스타일”로 설계해달라는 암묵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고, 클라이언트의 취향이니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적당히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흘려버렸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이번호의 주제인 형태와 지난호의 주제인 정체성에 관한 혼돈이 양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일이 일상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섬뜩하기까지 하다. 예를 들어 미장원에서 한번쯤 해봄직한 일, 잡지를 뒤적이며 유명 연예인의 스타일과 같이 해달라고 주문하는 일 말이다. 원하는 스타일대로 척척 가공해주는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유능한 걸까? 혹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에게만 어울리는, 나만을 위한 마법을 부려주는 사람이 유능한 걸까? 우리는 고객이 주문하는 요구에 따라 어떤 형태(혹은 스타일)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설계가의 능력이 어떤 고객이 원하는 어떤 스타일로도 해줄 수 있는 다재다능함일까? 그렇게 된다면 설계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나에게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마치 “시그너쳐 룩”을 구사하는 패션디자이너처럼 설계적 정체성이 형태적으로도 존재해야하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이 엉키면서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어렵고 무거우면서도 우리 주변 일상에서 늘 부딪칠 만큼 공기같이 가벼운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체성의 문제가 아주 쉽게 형태적 정체성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 솔직담백한 얘기보따리를 풀어주신 정욱주 교수에 이어 이번 주제는 형태이다. 뒤져보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저런 설계를 하다가 끄적여놓은 단상의 흔적들이 형태에 관련된 것이 많다. 아마도 설계의 여러 단계 중에서도 합목적적이면서도 유연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낯선“형태를 찾는 과정”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집착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이번호는 그렇기에 형태라는 큰 화두 아래 사라질 뻔했던 메모들을 정리하여 모자이크하는 식으로 구성해볼까 한다. 설계에 있어서 형태 케빈 린치(Kevin Lynch)와 개리 핵(Gary Hack)은『단지설계Site Design』라는 책에서 설계는 결국 특정 프로그램을 만족시키는 형태를 찾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설계의 범위와 정의, 그리고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는 해도 설계 혹은 디자인의 본질적인 측면은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만큼 형태에 대한 논의는 설계에 대한 대화에 있어서 핵심적일 것이다. 모더니즘 건축의 모토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는 명제는 이전시대의 형태와 장식을 구별하여 가장 순수한 기능에 기초한 형태만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사고에 기반한다. 역사적으로 건축물이나 정원 혹은 공원의 형태는 당대의 시대적 양식과 관련이 깊다. 쉬운 예로 유럽의 풍경식 정원과 정형식 정원의 뚜렷한 대비는 그 시대의 지배적인 미적 관점 혹은 문화적 양식이 어떠한 형태로 외부공간에 반영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다원화되고 단일한 양식이 지배하지 않는 현대에 있어서 건조환경의 형태 역시 다원화되고, 개별적인 설계가의 관점에 의해 부여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에 대한 준거는 매우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조경설계에 있어서 형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의되고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선빨”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우리는 형태에 대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왜 수많은 공원들은 지루한 형태적인 반복을 하고 있는가? 아마도 설계에 대한 고민 중 상당 부분은 형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제 형태에 대한 몇 가지 소주제를 통해“왜 이렇게 형태잡기가 힘든가”에 대한 냉정한 자기반성을 해보자.
스튜디오 101, 설계를 묻다(4)
형태: 보이지 않는 것도 디자인하는 형태적 상상력 리플 최근에 자하 하디드(Zaha Hadid ) “스타일”로 설계해달라는 암묵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고, 클라이언트의 취향이니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적당히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흘려버렸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이번호의 주제인 형태와 지난호의 주제인 정체성에 관한 혼돈이 양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일이 일상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섬뜩하기까지 하다. 예를 들어 미장원에서 한번쯤 해봄직한 일, 잡지를 뒤적이며 유명 연예인의 스타일과 같이 해달라고 주문하는 일 말이다. 원하는 스타일대로 척척 가공해주는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유능한 걸까? 혹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에게만 어울리는, 나만을 위한 마법을 부려주는 사람이 유능한 걸까? 우리는 고객이 주문하는 요구에 따라 어떤 형태(혹은 스타일)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설계가의 능력이 어떤 고객이 원하는 어떤 스타일로도 해줄 수 있는 다재다능함일까? 그렇게 된다면 설계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나에게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마치 “시그너쳐 룩”을 구사하는 패션디자이너처럼 설계적 정체성이 형태적으로도 존재해야하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이 엉키면서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어렵고 무거우면서도 우리 주변 일상에서 늘 부딪칠 만큼 공기같이 가벼운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체성의 문제가 아주 쉽게 형태적 정체성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 솔직담백한 얘기보따리를 풀어주신 정욱주 교수에 이어 이번 주제는 형태이다. 뒤져보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저런 설계를 하다가 끄적여놓은 단상의 흔적들이 형태에 관련된 것이 많다. 아마도 설계의 여러 단계 중에서도 합목적적이면서도 유연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낯선“형태를 찾는 과정”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집착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이번호는 그렇기에 형태라는 큰 화두 아래 사라질 뻔했던 메모들을 정리하여 모자이크하는 식으로 구성해볼까 한다. 설계에 있어서 형태 케빈 린치(Kevin Lynch)와 개리 핵(Gary Hack)은『단지설계Site Design』라는 책에서 설계는 결국 특정 프로그램을 만족시키는 형태를 찾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설계의 범위와 정의, 그리고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는 해도 설계 혹은 디자인의 본질적인 측면은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만큼 형태에 대한 논의는 설계에 대한 대화에 있어서 핵심적일 것이다. 모더니즘 건축의 모토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는 명제는 이전시대의 형태와 장식을 구별하여 가장 순수한 기능에 기초한 형태만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사고에 기반한다. 역사적으로 건축물이나 정원 혹은 공원의 형태는 당대의 시대적 양식과 관련이 깊다. 쉬운 예로 유럽의 풍경식 정원과 정형식 정원의 뚜렷한 대비는 그 시대의 지배적인 미적 관점 혹은 문화적 양식이 어떠한 형태로 외부공간에 반영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다원화되고 단일한 양식이 지배하지 않는 현대에 있어서 건조환경의 형태 역시 다원화되고, 개별적인 설계가의 관점에 의해 부여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에 대한 준거는 매우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조경설계에 있어서 형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의되고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선빨”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우리는 형태에 대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왜 수많은 공원들은 지루한 형태적인 반복을 하고 있는가? 아마도 설계에 대한 고민 중 상당 부분은 형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제 형태에 대한 몇 가지 소주제를 통해“왜 이렇게 형태잡기가 힘든가”에 대한 냉정한 자기반성을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