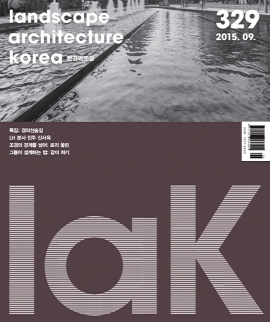#57
로마 시민을 위한 물 - 기원전 4세기, 아콰에둑투스
에어컨은 물론 없고 선풍기도 잘 모르는 베를린에서 35도를 오가는 폭염이 2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다. 더위에 멍해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오로지 하나, ‘물’이다. 조경사에서 물이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서구의 정원은 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식물이 가장 중요했겠지만 물 없이 자랄 수 있는 식물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물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지금껏 보아 온 드넓은 풍경 호수의 잔잔함이 아니라 솟구치고 쏟아져 내리며 물보라를 뿌리는 시원함에 대한 이야기가 좋을 것이다. 오백 개 넘는 분수가 마구 솟구치는 빌라 데스테Villa d’Este가 떠오른다. 그러나 정원에 물을 정성스럽게 담아낸 것은 이미 고대부터 시작되지 않았던가.
잠시 고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다. 아득한 옛날, 정원의 역사가 시작된 곳은 하필 건조하고 더운 지역이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물론이고 그리스와 로마 역시 더운 곳이다. 특히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자연적인 오아시스에 만족하지 않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산의 원천에서 물을 끌어다 마른 땅을 적셔 평야를 만들었고, 도시가 형성된 후부터는 고도의 관수 시스템을 완성했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파라다이스 정원이 가능했던 것도 이런 관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구 정원의 기원이 메소포타미아에 있고 메소포타미아 정원의 구조를 결정한 것이 관수 시스템이었으므로 서구 정원의 기하학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해석도 있다.1 그도 그럴 것이 모든 면적을 고루 적시려면 수로를 격자형으로 정연히 배치하는 것이 가장 합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원에 가장 먼저 수로가 등장했다. 더불어 수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샘 혹은 분수가 있었고 수로의 물이 모이는 연못이 있었다. 그리고 연못의 물은 다시 지하나 지상의 수로로 빠져나가 정원 밖의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천 시스템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려면 정원 밖에도 수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베를린처럼 땅만 조금 파면 물이 나오는 곳이라면 정원에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퍼 올렸을 것이다. 한국처럼 산이 많은 곳이라면 뒷산 골짜기에 졸졸 흐르는 계류를 끌어다 썼을 것이다. 그러나 사막에 도시를 세웠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참 많은 수고를 하여 물을 끌어다 대었으므로 그 덕에 엔지니어링이 남다르게 발달할 수 있었다. 기왕 수고하는 김에 돌을 반듯하게 깎아 수로를 만들어 보기 좋게 했으며 물이 흘러나오는 샘도 동물 모양이나 꽃 모양으로 아름답게 장식했다. 수압을 이용해 물을 역류시키는 기술도 터득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분수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상하수도 시스템이 농경 문화와 함께 발달했고 도시를 존재하게 했다. 흥미로운 것은 고대의 물 공급 시스템이 현재의 상하수도 시스템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기술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스로 전해지고 그리스에서 다시 로마로 전해지면서 극치를 이루었다. 아콰에둑투스aquaeductus2라고 불리는 로마의 물 공급 시스템은 가히 기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며 로마 엔지니어링의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지금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지를 다니다 보면 계곡에 교량처럼 생긴 석조 구조물이 더러 남아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 교량을 아콰에둑투스라고 이해하고 있다(가르교 사진 참조). 그러나 아콰에둑투스는 본래 샘, 수로, 저수지 등을 포함한 물 공급 시스템 전체를 말한다. 펌프가 없던 시절이었으므로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했다. 속도를 조절해야했으므로 근소한 경사(0.035~0.37%)를 주면서 수로를 연결했는데, 물을 보호하고 증발을 막기 위해 전 연장의 85%는 지하에 터널을 만들어 흐르게 했다. 다만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곳에는 교량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같으면 펌프를 써서 끌어올렸겠지만 당시의 역류 기술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치형으로 운치 있게 만든 것은 미학적 이유보다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었다. 2층이나 3층으로 지은 것 역시 골짜기의 깊이, 즉 교량의 높이에 따라 기둥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였다.3 그 결과로 숨을 죽이게 하는 건축 미학이 탄생했다. 수로의 폭은 대개 1m 남짓, 깊이는 평균 1.5m 정도였으니 상당한 양의 물이 흘렀다. 산 위의 샘물을 우선 저수지에 모았다가 이를 수로로 흘려보냈으며 물이 도시에 도착하면 다시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하 탱크에 모았다. 말이 지하 탱크이지 그 규모나 축조 양식은 대형 성당을 방불케 했다. 그래서 이를 카스텔 룸, 즉 ‘성’이라고 불렀다. 이 카스텔 룸에서 다시 세 개의 용수로가 각각 갈라져 나갔다. 하나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공용 수도에 공급되었고, 그 다음 테르메라고 불리는 공중목욕탕에 공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각 주택에 보내졌다. 이런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진 때는 기원전 312년, 아직 공화정이던 시절이었다. 이후 인구가 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물의 수요도 증가했으므로 여러 개의 아콰에둑투스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약 700년이 지난 서기 400년경에는 로마 시에만 11개의 시스템에 총 연장 504km의 수로가 연결되었다. 공중목욕탕이 11개소, 사설 스파가 856개소, 그리고 도시 전역에 1,352개의 공공 분수가 있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분수는 본래 장식용이 아니라 공공 수도 시설이었다. 여기서 종일 물이 졸졸 흘러 누구나 마시고 쓸 수 있었다. 주택 대부분에 별도의 수도가 연결되어 있었으나 서민 연립 주택의 경우 1층에만 수도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물을 길어다 썼다. 이렇게 하여 고대 로마인들은 매일 목욕을 하며 물을 펑펑 썼고 물 소비량으로 문화적 수준을 가늠했다. 당시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이 현재 유럽인들 소비량의 두 배 이상이었다.4 여기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게르만족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게르만족에 속하는 고트족이었다. 서기 537년 로마를 포위하고 공략했던 고트족은 도시로 들어가는 모든 수로를 메우거나 파괴해 버렸다. 이후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화려한 물 문화 역시 말라버렸다. 로마의 모든 문화와 문명은 멀리 비잔틴 제국으로 이사 갔고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는 서서히 퇴색해 갔다. 이후 바티칸에 교황청이 세워지면서 교황들이 아콰에둑투스를 일부 복원하긴 했지만 그때의 영광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
물론 아콰에둑투스는 로마 시에만 설치된 것이 아니다. 이탈리아 곳곳은 물론 점령지에도 수로를 놓고 스파를 만들어 로마 제국의 위상을 높였다. 지금도 동으로는 터키, 서로는 영국, 북으로는 독일까지 아콰에둑투스와 로마의 분수, 테르메의 흔적이 수없이 남아 있다. 조경이나 건축을 하는 사람치고 아콰에둑투스의 높은 교량을 보고 가슴 뛰지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파리 시트로앵 공원의 디자이너들 역시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아콰에둑투스에서 영감을 받아 수로 시스템을 만들고 공원의 동쪽 경계로 삼았다.
고정희는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손수 가꾼 아름다운 정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느 순간 그 정원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유년의 경험이 인연이 되었는지 조경을 평생의 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를 비롯 총 네 권의 정원·식물 책을 펴냈고, 칼 푀르스터와 그의 외동딸 마리안네가 쓴 책을 동시에 번역 출간하기도 했다. 베를린 공과대학교 조경학과에서 ‘20세기 유럽 조경사’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베를린에 거주하며 ‘써드스페이스 베를린 환경아카데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