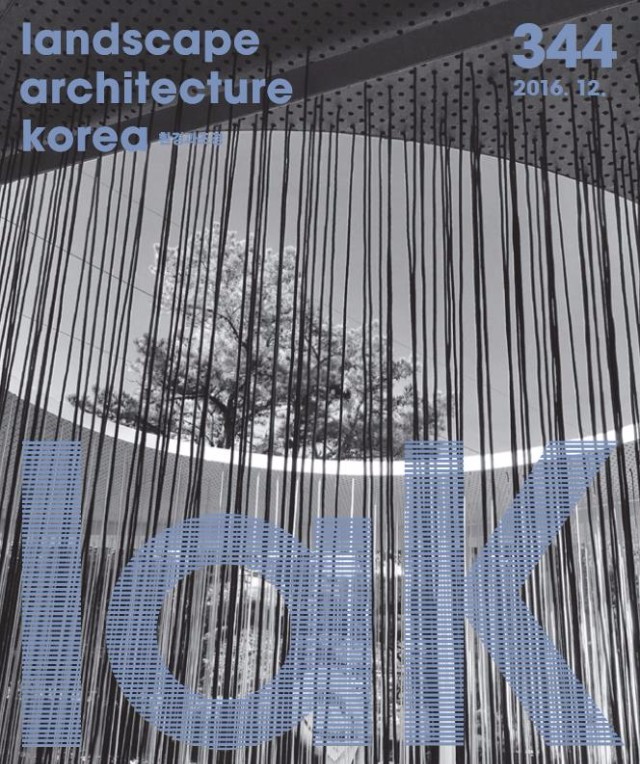낭만의 가을을 앗아간 청와대 발 황당 뉴스가 겨울의 평화마저 집어삼키고 있다. 덕분에 올 한해의 소중한 기억이 다 날아갔다. 명색이 편집주간인데 바로 지난 호의 내용조차 생각나지 않는 지경이다. 애써 과월호 열한 권을 다시 꺼내 읽으며 금년의 흔적 몇 곳에 ‘오방색’ 포스트잇을 붙여 본다.
2016년 1월호,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용산공원 설계의 쟁점을 다룬 ‘용산공원의 현재를 묻다’를 특집으로 올렸다. 비생산적인 정치적 논쟁을 넘어 설계 자체에 대한 토론을 이끌고자 한 기획이었다. 여름을 거치며 용산공원이 모처럼 사회적 이슈로 일간지 지면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놓인 것은 엉뚱하게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철 지난 기 싸움이었다. 다섯 개의 다리를 모아 특집으로 꾸린 2월호의 ‘다리, 연결 그 이상’에는 기대 이상의 피드백이 있었다.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의 천국 코펜하겐에 새로 들어선 시르켈브로엔Cirkelbroen에 여러 독자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마침 이 다리를 디자인한 아이슬란드 태생 아티스트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전시회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지금 리움에서 열리고 있다.
사회학자, 지리학자, 건축가, 아티스트 등이 참여한 3월호의 기획물 ‘젠트리피케이션, 몇 가지 시선’에는 표피적 도시재생의 이면을 진단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 같은 호에 실은 최근작 굿즈 라인Goods Line은 19세기에 들어선 철로를 재사용해 시드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프로젝트인데, 올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여러 디자인 어워드를 휩쓸기도 했다. 4월호에는 오방색 포스트잇을 아티스트 문경원 인터뷰와 그의 ‘프라미스 파크’ 작업에 붙이고 싶다. 그의 미래 공원에 대한 실험은 공원이라는 소우주의 향(냄새) 탐구로 이어지기도 했다(7월호 ‘뷰’). 개인적으로는 4월호 에디토리얼 지면을 빌려 ‘조경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6월호에는 ‘조경이라는 이름’에 문제를 제기해 보았다. 많은 독자들로부터 피드백이 돌아와 내심 놀랐는데, 조금 더 공식적인 방향으로 이 주제를 이어나가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
올해 독자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특집은 아마 5월호의 ‘설계사무소를 시작한다는 것’이 아닐까. 편집부는 이 기획을 창업 특집이라 부르며 꽤 오랫동안 공을 들였는데, 경기 탓, 제도 탓에 지친 독자들은 이 지면에서 다룬 신생 사무소들, 젊은 조경가들의 도전기에 큰 호응을 보내주셨다. 계약, 공모, 자격, 설계비 등 설계 현장의 쟁점을 다룬 6월호의 ‘설계환경을 진단하다’에도 적지 않은 반향이 돌아왔다. 6월호의 근작 바랑가루Barangaroo Reserve는 아마 올해 선택한 작품 중 아이디어, 규모, 작업 방식 모든 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7월호에는 2016년 세계 조경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퍼싱 스퀘어Pershing Square 설계공모를 담았다. 1866년 이후 150년 동안 무려 일곱 차례나 옷을 갈아입은 기구한 광장, 아장스 테르Agence Ter의 당선작이 이곳의 운명을 어떻게 돌려놓을지 주목된다.
마침 이 즈음에 11월호의 아장스 테르 특집 기획을 시작했던 터라, 편집부는 일면식도 없는 그들의 당선에 환호를 터뜨리기도 했다. 8월호에는 경의선숲길 3단계 구간을 실었다. 서울의 대표적인 선형 공원으로 진화해가고 있는 경의선숲길에서 우리는 도시와 공원의 역동적 만남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유례없는 무더위를 견디며 만들었던 9월호에는 모처럼 국내 조경가의 작품만을 담을 수 있었다. 지난 10년간 특유의 설계 문법을 실험하고 구축해 온 오피스박김과 이화원의 근작들에 독자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으리라. 10월호는 지자체가 주도한 신도시이자 공원과 호수로 도시의 골격을 짠 녹색 도시인 광교에 주목했다. 특집 ‘광교신도시의 교훈’을 통해 광교의 조성 과정을 되짚어보고 신도시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서 의의를 살펴보고자 했다. 10월호를 편집하던 기간은 『환경과조경』이 주관한 제2회 서울정원박람회 준비와 겹쳐 전쟁 상황을 방불케 했다. 11월호는 조경가 특집에 할애됐는데, 올해의 주인공은 파리 기반의 조경설계사무소 아장스 테르였다.
이번 12월호에는 여러 연재물의 마지막 원고가 실린다. 3년 전의 리뉴얼 이후 36회를 완주한 ‘공간 공감’이 이번 호로 막을 내린다. 이 연재를 위해 김아연, 김용택, 박승진, 이홍선, 정욱주, 다섯 명의 조경가는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답사와 토론을 진행했다. 고정희 박사의 ‘100장면으로 재구성한 조경사’도 3년의 긴 항해를 마친다. 동시대의 생생한 장면에서 시작해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다시 현재로 되돌아온 긴 여정, 말 그대로 조경사의 재구성이었다. 2015년 3월호부터 많은 실무 조경가들의 공감을 얻으며 연재된 이대영 소장의 ‘재료와 디테일’도 아쉬운 끝맺음을 한다. 전진형 교수의 ‘리질리언스 읽기’는 지난 11월호로 6개월간의 연재를 맺었다. 오랜만에 ‘고향 조경 땅’을 여행한 민성훈 교수, 그의 ‘조경의 경제학’도 이번 원고가 12회의 마지막 순서다. 많은 수의 독자를 지녔던 심소미 선생의 ‘떠도는 시선들, 큐레이터 뷰’는 내년 첫 호에 문을 닫는다. 리뉴얼 이후 세 달 마다 바통을 넘겨온 ‘그들이 설계하는 법’은 올해의 서예례 교수, 안세헌 소장, 진양교 교수, 박준서 소장 편에 이어 2017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며, 서영애 소장의 ‘시네마 스케이프’ 역시 내년에도 독자들을 만난다. 길고 어두운 동굴에 갇힌 것 못지않은 고통을 감내하며 원고를 보내주신 여러 연재 필자들의 인내와 노고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짐작하시겠지만, 많은 꼭지의 문을 닫는 만큼 2017년의 『환경과조경』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신년호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기로 한다. 『환경과조경』의 자매지로 2003년 3월에 창간된 『에코스케이프』(『조경시공』, 『조경생태시공』이란 이름을 거쳐 왔다)가 통권 100호인 이번 12월호를 끝으로 휴간에 들어간다는 아쉬운 소식을 무거운 마음으로 알려드린다. 매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자 지난 10월 문을 연 ‘e-환경과조경www.lak.co.kr’에 보다 힘을 기울이기 위한 선택임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
한결같이 반겨주시는 독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과조경』은 2017년에도 한결같은 ‘조경문화 발전소’로 독자 여러분 곁에 다가갈 것을 약속 드린다. 이렇게 2016년을 마감한다. 아니 통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