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일기: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
그림일기: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
소외된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낭만적 건축가故정기용의 건축 드로잉 작품전
국립현대미술관이 건축가 故정기용(1945~2011)의 드로잉 작품들을 공개했다. 2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제5전시실에서 ‘그림일기: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 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국내 건축전문 큐레이터 1호인 정다영 씨의 주도로 기획됐다. 작고 2주기를 맞는 정기용이 생전에 기증한 약 2만여 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2년여의 시간동안 연구·분류하여 2천여 점을 선별해 정기용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정기용은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이후 프랑스에서 유학하며 건축과 도시계획을 공부했다. 이때 접한 풍부한 문화 담론들은 그에게 건축에서 삶의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68혁명을 이끈 푸코, 아날트 콥 등 신지식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고착화된 기존 제도를 거부하고, 무가치한 것들에서 건축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귀국 후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사회 현실과 구조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고, 우리 땅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중략)
“우리들이 농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건축가는 해결사가 아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고 공간적으로 조직해주는 직업이다. 특히 공공건물이 그렇다. 건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 _ 정기용
정기용은 현대건축 2세대에 속하는 건축가이다. 이종건 교수(경기대학교)에 따르면 2세대에 속한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건축을 페티시(fetish)하게 생각한다. 건축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정기용은 건축의 한계를 알고, 건축을 통해서 삶을 좀 더 낫게 하려했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는 “낭만은 현실에 뿌리가 없는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외되는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정기용이 이러한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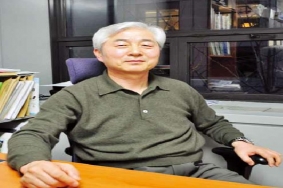 오희영(현대산업개발 前 상무)
오희영(현대산업개발 前 상무)
Oh, Hee Young
“새로운 길 위에 서서”
짙은 녹색의 편안한 복장이 여유로워 보였다. 처음 평상복을 입고 인터뷰를 갖는다는 오희영 前 상무현대산업개발이다. 대형 건설사 조경직으로 30년여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그가 2012년을 끝으로 회사생활을 마감했다. 누구의 권유가 아닌 자신의 결정이었다. 맡은 업무량도 상당했고, 사내에서도 두터운 신망을 받는 그였기에, 모두가 퇴사 결정에 의아해 했다. 그러나 오희영 前 상무의 대답은 명료했다. ‘조경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었다.’
“모든 건설공종의 마침표는 조경이 찍는다. 조경으로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더 남아 있어도 되지 않는냐는 말씀을 하신다. 건설사 내에서도 아직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조경쟁이답게 정갈하게 마무리 하고 싶었다. 멋진 마무리라고 응원해 주는 주변분도 있어 마음이 한결 편하다”
쉽지 않던 건설사 입사초기건설사 조경직에게 오희영 이름 석자가 의미하는 것은 크다. 그는 대형 건설사 최초로 조경직을 독립시켰고, 임원 자리까지 오른 장본인이다. 건축, 토목에 비해 조경의 사업적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 前 상무가 대기업에서 조경직을 독립시킨 것은 조경분야뿐만 아니라 인접분야에서도 하나의 사건이었다. 다른 건설사 조경직도 그의 행보를 보며 희망을 그렸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건설사 조경직의 대부’라는 수식이 따라붙는다.그런 오희영 前 상무지만, 경력직으로 현대산업개발에 입사한 1984년, 그의 앞에 닥친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전 회사에서 현장소장(숭인공원, 석촌호수 등) 하던 사람이 각종 심부름을 도맡아 하였고, 조경 관련 사무도 모두 그의 몫이었다. 회사의 유일한 조경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개발이 붐을 타며, 그의 앞에 놓이기 시작한 생소한 해외설계설명서와 도면더미는 좌절감까지 맛보게 했다. 하지만 오희영 前 상무는 관련 전문가를 수소문하고, 직접 찾아다니며, 새로운 해외 조경프로젝트를 완수해 냈다.
“입사 초기, 사실 후회를 많이 했다. 국내 조경공사만으로도 충분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일이 있으면 알아보고, 직접 찾고야 마는 성격이어서 해외건축부 당시의 기억이 많이 남고 보람도 있다.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산사람 기질이 배인 것 같다.”
-
 옛 그림, 물을 철학하다
옛 그림, 물을 철학하다
Water is expressed philosophically as old paintings
신화시대의 물3눈물이 흘러 강물이 되고 - 역사책이 감춘 역사
세상에는 사실을 사실로 말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해야만 할 때 사람들은 진실의 외피에 살짝 엷은 색을 입혀 본질을 감춘다. 때로는 전혀 다른 색을 칠해 상대방의 눈을 속이기까지 한다. 진실이 드러날 경우 치명상을 입거나 생명이 다칠 위험이 있을 때 쓰는 안전장치다. 신화와 전설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만큼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과장이 심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하다. 그러나 신화와 전설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생생한 진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신화를 만든 이야기꾼(話者)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눈 밝은 사람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실의 겉에 껍질을 입혔다. 껍질은 마치 환자가 쓴 약을 삼킬 수 있도록 내용물에 캡슐을 씌우는 것과 같다. 캡슐을 벗기고 나면 수 천 년의 세월을 견뎌서라도 꼭 밝히고 싶은 진실이 담겨 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책이 아닌 신화와 전설에 열광하는 이유다.
소상팔경도의 실제 장소인 소수와 상수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는 중국과 조선,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산수화다. 소상(瀟湘)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덟 장면으로 그린 그림인데, 소상(瀟湘)은 소수(瀟水)와 상수(湘水)를 합한 말로 중국 호남성(湖南省) 남안(南岸)에 있는 지역을 지칭한다. 소상팔경도는 소수와 상수를 포함해 두 물줄기가 흘러드는 동정호(洞庭湖)일대를 배경으로 그렸다.동정호는 중국 최대의 호수로 주변의 산과 강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장소다. 예로부터 많은 시인과 화가들은 소상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로 읊고 그림으로 남겼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의 시인 굴원(屈原, B.C.343?~B.B.277?)이 『이소(離騷)』에서 소상(瀟湘)을 처음 언급한 이래 두보(杜甫, 712~770)의 「등악양루(登岳陽樓)」, 범중엄(范仲淹, 989~1052)의 「악양루기(岳陽樓記)」 등 많은 시가 쏟아져 나왔다. 북송(北宋)의 송적(宋迪, 약 1015~약 1080)은 처음으로 소상팔경도를 그렸는데,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전래되어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려졌다. 소상팔경도는 평사낙안(平沙落雁, 물가에 내려앉은 기러기), 원포귀범(遠浦歸帆, 멀리서 돌아오는 배), 산시청람(山市晴嵐, 맑게 갠 산속의 도시), 강천모설(江天暮雪, 강과 하늘에 내리는 저녁 눈), 동정추월(洞庭秋月, 동정호에 뜨는 가을밤의 달), 소상야우(瀟湘夜雨, 소상에 내리는 저녁 비), 연사모종(煙寺暮鐘, 구름과 안개 속에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어촌낙조(漁村落照, 어촌에 비치는 저녁 노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팔경도는 실제 있는 장소를 그린 그림인 만큼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라 불러야 마땅하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소상팔경도는 실경이라는 의미 대신 아름다운 경치를 그린 산수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또한 멋진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 살고 싶은 이상향으로 탈바꿈되었다. 그러다보니 그림도 관념적이고 형식화되었으며 비슷비슷한 틀이 형성되었다.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된 《소상팔경도》 중의 <소상야우>와 <동정추월>을 살펴보겠다.<소상야우>는 비가 내리는 저녁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나뭇잎이 무성한 것으로 봐서 한여름이나 초가을일 것 같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듯 나뭇가지가 꺾일 정도로 위태롭다. 붓질에 따라 사선으로 그어진 먹빛이 휘몰아치는 빗줄기를 실감나게 보여준다.강가에는 버섯처럼 웅크린 집이 몇 채 서 있을 뿐 나루터에도 돌다리 위에도 사람 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오직 어둑해진 밤에 내리는 비만 천지의 주인이다. 만약 지나가던 나그네가 비를 만나 발길이 묶였다면 객지에서 느끼는 여수(旅愁)가 만만치 않으리라.<소상야우>가 격렬한 고독을 그렸다면 <동정추월>은 단정한 명상을 그렸다. 동정호에 달이 떴다. 강에는 달구경 나온 사람이 탄 배가 한 척 떠 있다. 전경에 대각선으로 솟아오른 언덕에는 소나무 두 그루가 서 있고 빈 정자가 세워져 있다. 이런 구도는 조선 초기에 활동했던 안견(安堅)의 《소상팔경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경물이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구도는 안견과 그의 화풍을 추종한 안견파(安堅派) 화가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소상팔경도》는 특히 조선 초기에 크게 유행했다. 안견 진작眞作으로 전해지는 작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안견풍으로 그린 여러 점의 작품도 전해진다.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은 당대를 대표하는 19명의 시를 결합한 《소상팔경시첩》을 남겼다. 《소상팔경도》는 조선 말기까지 여러 화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그려졌다. 문청, 이흥효, 함윤덕, 이징을 비롯하여 전충효, 김명국, 최북, 심사정, 정선, 김득신 등의 유명 작가들이 소상팔경도를 그렸으며 민화의 소재로도 등장하게 된다.
-
 조경의 경계를 넘어: 조경의 영토를 넓혀나가는 주목할만한 조경가 12인(4)
조경의 경계를 넘어: 조경의 영토를 넓혀나가는 주목할만한 조경가 12인(4)
The Forefront of Landscape Architecture 12 Innovators Opening New Horizons of the Field
2011년 여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인 광화문을 물바다로 만든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에서도 빗물관리에 대한 중요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경우 10,286km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하수관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후변화시대의 예측 불가능한 강우량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심도 터널, 분산형 빗물관리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대통령령 13514호’를 통해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도록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지시하였고, 상하원 의원들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타 단체가 유출수 수질 및 수량 관리를 위해 그린인프라 시설을 계획, 설계 및 적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린인프라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미국조경가협회(ASLA)는 2011년 7월 그린인프라를 장려하는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 물순환 체계를 보전하고 하천 수질을 개선하며,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조경 공간을 창출하고 도시를 만드는 조경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함과 동시에, 하천 수질 개선 및 수자원 보전, 도시 물관리 분야로 업역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오리건 컨벤션센터의 레인가든을 통해 빗물관리에 있어서 조경의 역할에 대한 선구적인 작품을 남긴 캐롤 메이어리드(Carol Mayer Reed)의 작품세계를 소개하였다. 당초 4월호에는 브라운필드 및 도시생태(Brownfield Design)를 다루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필자는 최근 그린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제 서울시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분산형 빗물관리와 그린인프라 시설들의 모범 사례로서 뉴욕시 공원국에서 그린인프라 부문 디렉터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네티 컴프턴(Nette Compton)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대규모 도시설계(Large Scale Urban Design) _ Signe Nielsen 2. 해일에 대비한 갯벌 및 해안 생태 공원(Salt Marsh Design) _ Van Atta3. 좁은 도시면적을 이용한 레인가든(Stormwater Treatment) _ Mayer Reed4. 도시의 빗물관리를 위한 그린인프라스트럭처Green Infrastructure _ Nette Compton5. 브라운필드 및 도시생태(Brownfield Design) _ Julie Bargman, Dirt Studio6. 토착 식물 디자인(Roof top and local planting design) _ Oehem van Sweden7. 조경 이론(Urban Design and Landscape) _ Witold Rybczinski8. 시민 참여(Community Design) _ Walter Hood9. 환경예술(Art & Design) _ Claude Cormier, Canada10. 탄소제로 및 친환경 소재(Life-cycle Design and low-impact materia) _ Michael McDonough Partners11. 친환경 주거정원(Sustainable Residential Design) _ David Kelly, Rees Roberts Partners12. 대규모 도시옥상농업(Urban Rooftop Farming) _ Ben Flanner, Brooklyn Grange 13. 스마트 성장 도시디자인(Smart Growth Design) _ Andres Duany
네티 컴프턴(Nette Compton) 뉴욕시 공원국 그린인프라부문 디렉터 NYC Parks Department
지속가능한 조경을 향한 열정의 리더뉴욕시의 블룸버그 시장은 2002년 취임 후, 8년간 약 6조 원의 예산을 하천과 해안의 수질 정화에 쏟아 부었다. 그 결과 뉴욕항의 전체적 수질은 지난 100년을 통틀어 가장 우수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천과 수로들의 오염도는 심각하다. 대부분의 자금이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하수처리장을 최신 시설로 개선하는데 주로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심각한 문제인 우·오수 합류관거(CSO)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 출간된 뉴욕시 그린인프라스트럭처 플랜 보고서(NYC Green Infrastructure Plan)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며,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집중형 하수처리장의 증설을 대신하는 분산형 빗물집수시설, 즉 그린인프라의 도입이다. 빗물이 하수관거에서 오수와 합류되면,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게 되고, 그 결과 우·오수 합류수는 그대로 하천과 해안으로 방류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을 동반하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게 된다. 비가 내릴 때만을 위한 기계적 시설투자보다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녹지를 증설함으로써,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우수의 양을 줄이고, 토양으로의 침투를 보조하며, 도시와 지역에 사회적, 생태적 혜택을 동반하자는 것이 뉴욕시 그린인프라 프로그램의 주된 아이디어이다.
Q. 뉴욕시 공원국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제가 공원국의 일원이 된 지는 약 6년 반이 되었습니다. 코넬대학교에서 조경학과 식물학을 전공했는데, 조경학과에서는 조경의 과학적 측면을 파는 ‘모범생’ 축에 들었습니다. 이어 대학원에서 도시생태학을 전공했고, 논문의 주제는 뉴욕시의 옥상정원을 빗물 저류에 최적화된 형태로 디자인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도시에서 빗물은 실질적으로 폐기물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저는 여기에 큰 잠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물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빗물이 무척 흔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여지를 간과하기 쉽지만, 그 양 자체가 엄청나다는 사실만으로도 빗물은 제대로 작동하는 도시경관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빗물이란 도시 환경에서 불변하는 하나의 요소이지 않습니까? 관점만 바꾸면 골칫덩이에서 여러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저에게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생각되었고, 이 일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반드시 내가 해내야 할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빗물에 관련한 아이디어로 관심을 집중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조경이라는 영역을 탐색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그린스트리트(Green Street)와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A. 흠…좋은 질문이네요. 벤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자면, 서로 교집합인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린스트리트란 기본적으로 공도(公道)에 위치하고, 교통국 관할인데, 지나치게 넓은 보행로나 과도한 폭으로 계획된 차도 또는 도로상에 큰 면적으로 사선이 칠해진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못한 포장면 부분을 녹지로 바꾸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대개 부정형으로 형성된 도로망에서 꺾이는 부분이나 양방통행이 일방통행으로 바뀌는 지점, 도로가 끝나는 지점 같은 곳에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죽은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공간을 활용하자는 것이 그린스트리트입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면이 녹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소극적 형태의 빗물저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린인프라의 한 요소로 이해되는 그린스트리트란, 보다 적극적인 빗물 저류 장치로서 일반적 그린스트리트보다 3~10배가량 많은 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질토양 지역에서는 특별히 많은 양의 빗물을 처리하도록 고안된 곳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빗물을 흡수해서 하부로 침투시키고, 쇄석층이 자체 저류를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린인프라는 또한 단순히 홍수저감을 위한 그린스트리트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타입의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가령 뉴욕시 환경국에서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도 용지상의 생태수로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린스트리트가 도로 상의 과도한 부분을 활용하거나 불합리한 도로 선형을 재정비해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면, 그린인프라에서 말하는 공도 용지상의 생태수로란, 기존과 같은 면적의 가로수 식재구역을 이용하되 도로에 흐르는 빗물을 집수하여 식재면으로 유도함으로써 빗물을 저류하고 정화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것이 그린인프라 사업의 주된 방식이고요, 다공질 투수 포장면이라든가 인조잔디 스포츠경기장 하부에 거대한 빗물 저류조의 건설 등도 포함됩니다.
Q.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경의 흐름이나, 공적공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A. 저는 공적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유연한 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지나가다보면, 어떤 장소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단일한 기능으로만 설계된 곳이 있습니다.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우리는 이런 공간을 유지할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광장을 만든다면, 그 광장은 당연히 빗물을 다루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면, 당연히 방과 후에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곳이 되겠지만 이른 아침에 그곳을 걷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에게도 역시 좋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단일한 용도를 가지는 공간이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가진 돈을 쓰는데 보다 영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엄청난 돈을 한 가지 활용도만을 지니고 있는 곳에 투자한다면, 당신은 그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
 도시농업, 이대로 괜찮은가?
도시농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특별시가 얼마 전 ‘Agro-City 서울’을 비전으로 하여 2020년까지 서울시민 가구당 3.3㎡의 텃밭을 조성,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농업 붐이 일다 급기야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시에서 마련한 이 정책의 방향성과 그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과 국내외사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도시농업정책에 대해 진단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특히 지난 3월 18일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데 본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해당 안은 건축물이 내·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여 도시농업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면적 일부를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발의안은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2012년 하반기의 서울시 건축조례개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결국 지금 추진하는 서울시의 도시농업정책은 의도와 상관없이 조경계 지형을 흔드는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점검 1. 서울시의 목표 ‘1가구 당 3.3㎡의 텃밭’은 적당한가?통계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2012년 기준 4,177,970세대이며, 여기에 1세대 당 3.3㎡를 대입하면 약 13.79㎢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는 여의도(8.35㎢)의 1.6배가량 되는 면적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3.3㎡은 1평인데, ‘한평텃밭’과 같은 개념으로 서울시민 1가구 당 1평으로 설정하여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말농장이 보통 3~5평 정도 수준인데, 1평만 되어도 작물을 키우기에는 문제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도시농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조차 서울시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면적을 제시했는지, 적정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목표치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내용이 지배적이다. 현대사회의 다각화된 가족과 세대 구성, 식성, 여가문화, 계절별 활동, 도시환경 등을 종합하여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관한 의문을 품는 것이다. 이렇듯 충분히 조사와 뚜렷한 근거 없이 제시된 양적 목표치는,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기 쉽고 반발을 불러 올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러한 양적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가 2012년도 서울시 건축조례안 개정과 2013년 3월 18일의 건축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푸른도시 만들기 워크숍
푸른도시 만들기 워크숍
서울시 공원녹지 미래상에 시민의견 수렴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가 되자 서울시청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이기 시작했다. 이유는 바로 서울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수립하기 위한 “푸른도시 만들기 워크숍”이 이날 개최되었기 때문.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에서 작성한 ‘푸른도시 선언 초안’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고자 진행되었다. 이강오 사무처장서울그린트러스트이 사회를 맡았으며, 무대에는 벤치와 테이블, 화분 등을 놓아 푸른도시, 공원, 녹지 등의 주제성을 보다 부각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서울특별시은 “오래 전부터 공원녹지의 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왔다. 시민주도로 조성·관리 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좋은 도시를 손수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였다.이어 문승국 부시장서울시 행정2부은 “4월 5일 식목일이 다가오고 있다. 식목일 하루뿐이 아닌 4월을 통째로 ‘식목월’로 만들어, 서울 곳곳에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 기업, 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여 꽃과 나무로 뒤덮인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실무위원장인 조경진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가 푸른도시 선언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작성원칙, 전략, 비전, 방향, 슬로건 등을 소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푸른도시 선언의 초안은 ‘더불어 사는 숲의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사람·소프트웨어·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몇 가지 작성원칙이 있었는데 첫째, 쉽고 소통 가능한 언어로 작성한다. 둘째, 현상에 대한 진단과 제안을 제시한다. 셋째, 미래지향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수준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는 시민들과 함께 푸른도시 선언을 만들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10주년 기념 정기총회 및 기술세미나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10주년 기념 정기총회 및 기술세미나
인공지반녹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지난 2월 28일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인성교육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회장 이은희, 이하 인공지반녹화협회) 10주년 기념 ‘정기총회 및 기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인공지반녹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현수 부회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이 인공지반녹화 시공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인공지반녹화의 과거와 현재의 실태를 짚어보았다. 이후 이동근 부회장(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은 ‘재해와 복지’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인공지반녹화의 미래를 내다보았다.
이후 안동만 고문(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을 좌장으로 황상연 사무관(환경부 자연정책과), 한정훈 팀장(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최연철 부장((재)경기농림진흥재단 녹화사업부), 한승호 대표((주)한설그린), 변동원 대표((주)한국 CCR), 송병화 교수(벽성대학 조경과)가 토론회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는 환경부, 서울특별시,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사)한국경관학회, (사)한국환경생태학회,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에서 후원했다. 정기총회에서 한승호 대표가 수석부회장에, 최연철 부장이 상임이사에 각각 선출되었으며, 2년을 임기로 매년 한명씩 교차로 선출되는 감사에는 변동원 대표이사가 올해도 활동을 잇게 되었다. 시상식에서는 양병이 명예회장(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과 안동만 고문(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임승빈 고문(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특별공로상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과 (재)경기농림진흥재단이 수상했다.
한편 인공지반녹화협회는 “2013년에도 제5회 인공지반녹화대상을 개최하고, 인공지반녹화 시공사례 D/B를 꾸준히 업데이트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초에는 인공지반녹화협회 10주년을 기념하여 해외 인공지반녹화 사례지 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나는 도시농부다, ‘도시농업 콘서트’ 개최
나는 도시농부다, ‘도시농업 콘서트’ 개최
텃밭에서 나누는 ‘TALK, TALK, TALK'
도시농업이 대세다. 너도 나도 빈 땅이나 베란다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텃밭을 가꾸고 심지어 돈을 내고 땅을 빌려 내가 먹을 작물을 재배한다. 가까운 상점에 가서 채소를 사먹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오히려 시간과 비용 투자대비 저렴하기까지 하다. 왜 사람들은 도시농업에 열광할까?
‘나는 도시농부다’를 주제로 한 ‘도시농업 콘서트’가 지난 2월 19일 안양 평촌아트홀에서 올해로 2회를 맞이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경기농림진흥재단 김정한 대표이사 외 600여명의 도시농부와 도시농부를 꿈꾸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를 주최한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도시농업을 통해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더불어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조 아래 콘서트 형식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도시농업을 통해 얻은 경험담을 풀어놓으며 그들만의 도시농업 비전과 노하우를 소개했다.
광주 매곡초등학교에는 학교농장을 일군 사례를 소개했으며, 대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텃밭 동아리 ‘씨앗들’은 농사짓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주민자치센터의 쓸모없던 옥상을 주민들의 힘으로 텃밭으로 조성한 안산시 본오2동 주민자치센터의 ‘보니텃밭’과 도시농사를 지으며 암을 이겨낸 이세영와 문은순 씨의 이야기도 토크콘서트에서 공개됐다.
-
 感慨無量
感慨無量
Be Deeply Moved
오늘 아침 이곳저곳에 뿌릴 씨앗들을 정리하며, 이 꽃은 어느 정원에, 이 풀은 어느 둔덕에 심겨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려나 하는 기대감으로 잔잔한 흥분을 느꼈습니다.<환경과조경>이 이번 호로 300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알 한알의 씨앗이 싹트고 꽃피어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찬탄의 순간순간을 만들어 주듯 조경에 관련된 전공서는 물론 잡지 한 권 없던 불모지에 첫 호를 내기 시작한 <환경과조경>은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조경인들에게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조경인들에게 프라이드를 심어 준 힘이었고 조경인들을 결속하는 사랑의 끈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 보면, 첫 호의 태동은 ‘감격’ 그 자체였답니다. 잡지사에 근무했다는 일천한 경력 때문에 저를 기획과 편집부터 온갖 궂은일까지 고루 참여시킨 지금의 발행인이신 ‘은사’님의 특명으로 사무실도, 비품도, 하다못해 사진기조차 개인적인 조달로 시작한 작업이었고, 그때 참여하신 거의 모든 분들은 자원봉사에 가까웠습니다. 오직 조경계를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그러면서 그 일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일인지 편집기간 내내 웃음이 그치지 않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같이 즐거운 고통을 나누던 편집장 김용택 화백님, 김현선 선생, 나현영 여사, 그리고 유병림 교수님 등등 그리운 분들입니다.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정확한 날에 어김없이 책상 앞에 전달되는 <환경과조경>을 보지만, 그동안 이 잡지 출판의 지속성 때문에 발행인이신 오휘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가슴이 조마조마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추억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아름답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또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 봅니다. 저는 민들레, 할미꽃, 그리고 박주가리 씨앗을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하얀 털이 달린 씨앗, 그 한 대를 꺾어 들고 ‘후’ 불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날아가서 잘 뿌리내리고 싹트고 꽃피고 다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고…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갈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한바퀴 돈, 먼 이국땅에서 여전히 노랗게 핀 민들레를 보면서 씨앗의 여정이랄까, 식물의 퍼져가는 힘에 새삼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경이로운 여정에 찬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환경과조경>은 앞으로도 한국 조경계의 유일한 잡지로서의 긍지와 정진의 자세로 여전히 확장되어 나갈 것이고, 고난의 순간이 닥쳐와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조경계도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도약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디자인만이 아닙니다. 공사의 질도 당연히 더 높아지지 않는 한 건축이나 기타 경쟁 분야들과의 전쟁과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조경가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무엇’ 조경가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수화의 발묵처럼, 조경인들의 손을 거쳐 나온 모든 일들이 발묵처럼 감동의 여울이 번지고 스미고, 퍼져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살아 있는 땅이고 흙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는 태도는 유한한 지구 자원의 지속성에 있고,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경가들이 남기는 생태발자국들이 우리 국토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라야 합니다.조경계가 변하고, 더 한층 질이 높아지고 조경인들이 이 땅에 사는 한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 300회 간행 기쁨을 넘어 다시 무거운 짐을 지셔야겠습니다. 조경인들로 하여금 더 높은 안목을 기르고, 가야 할, 걸어야 할, 해야 할 일들을 저 만치 앞서서 제시해 주셔야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This morning I felt a little excited, assorting the flower seeds that I would sow and imagining how they would give pleasure to us upon coming out splendidly. When I heard the news that ELA was going to publish its 300th issue, I couldn’t help looking back on the days I spent reading the magazines and entertaining myself with them. Like colorful flowers blossoming on hills in the spring, ELA has been a great joy to every professional in the industry, helping enhancing the pride of the landscape architects in the country.
I can still remember vividly how deeply I was moved by the first publication of ELA, when I had to take care of every matter of detail such as maintaining the office and purchasing equipment including even a camera. My insignificant work experience with a magazine publisher made Dr. Whee Young Oh the founder and publisher of ELA as well as my teacher, recruit me. Then Professor Oh let me take part in each and every step in planning and editing process. At that time, all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ere not employees but volunteers. We worked pleasantly and happily together, knowing that what we were doing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I am missing my old colleagues like Yong Taek Kim, Hyun Sun Kim, Hyun Young Nah, and Byung Rim You. We shared each other’s burden and worked co-operatively. Upon the arrival of the magazine every month, I sometimes think of the times when Professor Oh and the other members of ELA were faced with difficulties continuing the publication. After all these years, those moments have become priceless and treasured memories of good old days.
Let’s get back to the story of seeds. Since my childhood, I have been particularly fond of the seeds of dandelions, pasque flowers, and milkweeds. I played with them, blowing them into the air and imagining how far they would fly, where they would land, and whether they would grow to be beautiful flowers. Living far away from my home country, I still see pretty dandelions in yellow and stand in great awe of the miraculous circle of life in nature. Like these beautiful wild flowers, I believe, ELA, the most prestigious publication of the industry, will spread around the world and continue its growth, in spite of any difficulties.
In addition, it is time that landscape architecture paid more attention to its future development. It is not merely about the enhanced quality of design, but also about that of practice. Otherwise, I might be impossible to compete with other industries including architecture. A work of a landscape architect should be what others can never try to imitate, and it should be something extraordinary that can strike a chord in the hearts of the audience. It has to be touching and inspiring. What we are dealing with are soil and earth full of life, and what we are focused on are the sustainability of the limited amount of resources and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Therefore, the ecological footprints of landscape architects should contribute to conserving and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of Korea. As the atmosphere of the industry changes over time, the quality of practice is improved, and landscape architects continue to serve as invaluable professional in our society, ELA will have take its responsibility as the leading publication in the country. ELA should actively plays its role in broadening the horizon of landscape architects, and providing directions for the industry with guidance and insigh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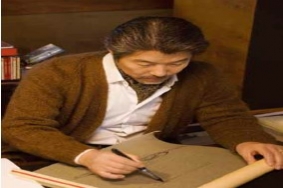 30300
30300
30300
<환경과조경>의 3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의미 있는 일인지 알고 있기에 축하의 마음은 더욱 더 큽니다. 또한 오휘영 창간인께서 30년 동안 300호를 발행할 때까지 발행, 편집인을 하셨다는 것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그 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과조경>이란 이름으로 조경 잡지가 대한민국에 처음 선보였을 때에는 한국은 조경이란 학문이나 업역이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서로의 업무 구분이 확실치 않았던 때입니다. 조경은 설계만 하지 않고 시공을 겸하고 있든지 엔지니어링에 속한 한 부분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학교에만 계시던 오휘영 교수께서 잡지를 창간하셨을 때 사실 속으로 얼마나 이 책이 계속될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건축가와 문화·예술 관련자들이 잡지를 발간하고 또 연속되기를 바랐으나 많은 출판물들이 기억을 뒤로하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예술 사조와 건축 관련 이데올로기를 펼치기 위해 많은 선구자들이 희생으로 잡지를 발행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알렸으나 그 뜻을 지속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92년부터 월간으로 전환하기 전 까지는 격월간 내지는 계간으로 발간되었으며, 1996년 8월 통권 100호 기념호에서는 조경에서의 철학을 주제로 특집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잡지에서의 특집 발행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특히 기획하는 아이디어와 진행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조경이라는 특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도시문제와 전통 또는 신도시문제까지 넘나들며 전공자들과 일반인들의 시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가져왔으며 보이지 않는 행간 속에 녹아 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할 것입니다. 1996년 우수잡지 수상에 이어 2013년에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되어 그 진가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찰스 젱스가 디자인 한 정원을 <환경과조경>을 통해 보았고, 현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찰스 젱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기사들이 많이 있지만 나에게는 직접 활용한 경우여서 특별히 마음에 남습니다.
조경물과 건축물과의 구분, 조경가와 건축가의 구별 등의 예민한 마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작업하면서 별 문제 없이 활동하고 있으나, 일부 서로의 이해의 폭이 작은 사람들로부터 간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원래가 한 몸이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이런 갈등은 특히나 융·복합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서로가 맞고 틀림을 논하기보다 서로 다름과 더 잘 하는 부분을 찾아 배우며 공존·상생을 해야 합니다.
건축에 입문한 지 이제 40년이 되어가나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 느끼는 것은 한국건축이야 말로 조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류 문화가 바야흐로 전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가는 이 시점에 한국 조경과 건축의 단아함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때입니다. 다른 분야들이 전 세계도 좁다며 활약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조경, 건축계도 함께 손을 잡고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 전면에 <환경과조경>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영광이 <환경과조경>에 함께 하기를 빌며 오휘영 발행인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한국의 조경 발전에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의 독자로서 오랫동안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또 다른 30년 다음 300호를 기대합니다.
I s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each and every member of Environment and Landscape Architecture of Korea on the occasion of its 300th issue. I am fully aware of how difficult it has been to keep providing such an invaluable publication, and I hope that you can enjoy every right to celebrate. In addition, Dr. Whee Young Oh, the founder of ELA has served as the editor and publisher of the magazine for the last 30 years, which is a real rarity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By the time ELA was first published in Korea, there were few people who understood what landscape architecture is mainly about, and there was virtually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that of conventional architecture. The industry was dealing with not only designs but also practices, considered as a small part of engineering in general. Frankly speaking, when I heard the news that Professor Oh had started publication, I wondered how long he would and could keep it going, for a number of architects and artists had already launched magazines and tried to continue publication only to find themselves in great discouragement, and among them were some renowned visionaries who strived to introduce art history and new ideas of architecture little known to the nation at the time. Before ELA became a monthly in 1992, it had been published either bimonthly or quarterly, and in July 1996, it celebrated its 100th issue with a special coverage on the role of philosophy in landscape architecture. It usually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create special editions of a magazin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coming up with innovative editorial ideas and taking care of the details of publication process. With its main focus on landscape architecture, ELA has dealt with a variety of subjects including the problems of urbanism, heritage, and issues of new town development, to name a few, meeting the needs of professionals and general public alike. The magazine has made a constant progress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and there must be much more contribution and dedication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an what meet the eye. It has been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ources of information for the industry, awarded several prizes for its top quality and resourcefulness. A few years ago, I read about the garden designed by Charles Jencks on the pages of ELA, and then visited the site myself. I was lucky enough to meet him in person and listen to his own explanation about the work. Of the numerous reports that I found interesting and informative, this is the most memorable in that it really helped me a lot in reality. Most people find it not so much difficult to create mutual understanding when dealing with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distinction between landscape architecture and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s and architects. There are, however, some individuals not willing to accept the different ideas and opinions of others, sticking to their own narrow point-of-views. Such an attitude is not welcome in this age of convergence. Co-existence is made possible when we try to learn from others and enjoy what diversity has to offer. Even though I have been working in the architectural industry for almost 40 years, I’ve still got plenty to learn. One thing I can be sure of is that architecture in Korea is so closely intertwined with landscape architecture. Korean pop culture has been taking the world by storm these days. It’s time that the Korean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took actions to introduce their elegant beauty to the world. I hope ELA can contribute to facilitat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industries in promoting themselves on the global stage. I wish you your continuing success, and strongly believe that Dr. Whee Young Oh and all the members of ELA will keep helping the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grow and develop in the future. Congratulations again and best wishes for another 30 years and 300 issues.
 그림일기: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
소외된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낭만적 건축가故정기용의 건축 드로잉 작품전 국립현대미술관이 건축가 故정기용(1945~2011)의 드로잉 작품들을 공개했다. 2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제5전시실에서 ‘그림일기: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 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국내 건축전문 큐레이터 1호인 정다영 씨의 주도로 기획됐다. 작고 2주기를 맞는 정기용이 생전에 기증한 약 2만여 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2년여의 시간동안 연구·분류하여 2천여 점을 선별해 정기용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정기용은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이후 프랑스에서 유학하며 건축과 도시계획을 공부했다. 이때 접한 풍부한 문화 담론들은 그에게 건축에서 삶의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68혁명을 이끈 푸코, 아날트 콥 등 신지식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고착화된 기존 제도를 거부하고, 무가치한 것들에서 건축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귀국 후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사회 현실과 구조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고, 우리 땅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중략) “우리들이 농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건축가는 해결사가 아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고 공간적으로 조직해주는 직업이다. 특히 공공건물이 그렇다. 건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 _ 정기용 정기용은 현대건축 2세대에 속하는 건축가이다. 이종건 교수(경기대학교)에 따르면 2세대에 속한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건축을 페티시(fetish)하게 생각한다. 건축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정기용은 건축의 한계를 알고, 건축을 통해서 삶을 좀 더 낫게 하려했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는 “낭만은 현실에 뿌리가 없는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외되는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정기용이 이러한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림일기: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
소외된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낭만적 건축가故정기용의 건축 드로잉 작품전 국립현대미술관이 건축가 故정기용(1945~2011)의 드로잉 작품들을 공개했다. 2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제5전시실에서 ‘그림일기: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 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국내 건축전문 큐레이터 1호인 정다영 씨의 주도로 기획됐다. 작고 2주기를 맞는 정기용이 생전에 기증한 약 2만여 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2년여의 시간동안 연구·분류하여 2천여 점을 선별해 정기용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정기용은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이후 프랑스에서 유학하며 건축과 도시계획을 공부했다. 이때 접한 풍부한 문화 담론들은 그에게 건축에서 삶의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68혁명을 이끈 푸코, 아날트 콥 등 신지식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고착화된 기존 제도를 거부하고, 무가치한 것들에서 건축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귀국 후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사회 현실과 구조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고, 우리 땅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중략) “우리들이 농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건축가는 해결사가 아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고 공간적으로 조직해주는 직업이다. 특히 공공건물이 그렇다. 건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 _ 정기용 정기용은 현대건축 2세대에 속하는 건축가이다. 이종건 교수(경기대학교)에 따르면 2세대에 속한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건축을 페티시(fetish)하게 생각한다. 건축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정기용은 건축의 한계를 알고, 건축을 통해서 삶을 좀 더 낫게 하려했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는 “낭만은 현실에 뿌리가 없는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외되는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정기용이 이러한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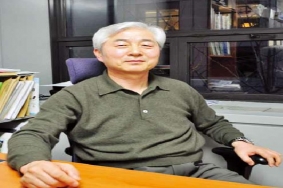 오희영(현대산업개발 前 상무)
Oh, Hee Young “새로운 길 위에 서서” 짙은 녹색의 편안한 복장이 여유로워 보였다. 처음 평상복을 입고 인터뷰를 갖는다는 오희영 前 상무현대산업개발이다. 대형 건설사 조경직으로 30년여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그가 2012년을 끝으로 회사생활을 마감했다. 누구의 권유가 아닌 자신의 결정이었다. 맡은 업무량도 상당했고, 사내에서도 두터운 신망을 받는 그였기에, 모두가 퇴사 결정에 의아해 했다. 그러나 오희영 前 상무의 대답은 명료했다. ‘조경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었다.’ “모든 건설공종의 마침표는 조경이 찍는다. 조경으로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더 남아 있어도 되지 않는냐는 말씀을 하신다. 건설사 내에서도 아직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조경쟁이답게 정갈하게 마무리 하고 싶었다. 멋진 마무리라고 응원해 주는 주변분도 있어 마음이 한결 편하다” 쉽지 않던 건설사 입사초기건설사 조경직에게 오희영 이름 석자가 의미하는 것은 크다. 그는 대형 건설사 최초로 조경직을 독립시켰고, 임원 자리까지 오른 장본인이다. 건축, 토목에 비해 조경의 사업적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 前 상무가 대기업에서 조경직을 독립시킨 것은 조경분야뿐만 아니라 인접분야에서도 하나의 사건이었다. 다른 건설사 조경직도 그의 행보를 보며 희망을 그렸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건설사 조경직의 대부’라는 수식이 따라붙는다.그런 오희영 前 상무지만, 경력직으로 현대산업개발에 입사한 1984년, 그의 앞에 닥친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전 회사에서 현장소장(숭인공원, 석촌호수 등) 하던 사람이 각종 심부름을 도맡아 하였고, 조경 관련 사무도 모두 그의 몫이었다. 회사의 유일한 조경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개발이 붐을 타며, 그의 앞에 놓이기 시작한 생소한 해외설계설명서와 도면더미는 좌절감까지 맛보게 했다. 하지만 오희영 前 상무는 관련 전문가를 수소문하고, 직접 찾아다니며, 새로운 해외 조경프로젝트를 완수해 냈다. “입사 초기, 사실 후회를 많이 했다. 국내 조경공사만으로도 충분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일이 있으면 알아보고, 직접 찾고야 마는 성격이어서 해외건축부 당시의 기억이 많이 남고 보람도 있다.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산사람 기질이 배인 것 같다.”
오희영(현대산업개발 前 상무)
Oh, Hee Young “새로운 길 위에 서서” 짙은 녹색의 편안한 복장이 여유로워 보였다. 처음 평상복을 입고 인터뷰를 갖는다는 오희영 前 상무현대산업개발이다. 대형 건설사 조경직으로 30년여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그가 2012년을 끝으로 회사생활을 마감했다. 누구의 권유가 아닌 자신의 결정이었다. 맡은 업무량도 상당했고, 사내에서도 두터운 신망을 받는 그였기에, 모두가 퇴사 결정에 의아해 했다. 그러나 오희영 前 상무의 대답은 명료했다. ‘조경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었다.’ “모든 건설공종의 마침표는 조경이 찍는다. 조경으로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더 남아 있어도 되지 않는냐는 말씀을 하신다. 건설사 내에서도 아직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조경쟁이답게 정갈하게 마무리 하고 싶었다. 멋진 마무리라고 응원해 주는 주변분도 있어 마음이 한결 편하다” 쉽지 않던 건설사 입사초기건설사 조경직에게 오희영 이름 석자가 의미하는 것은 크다. 그는 대형 건설사 최초로 조경직을 독립시켰고, 임원 자리까지 오른 장본인이다. 건축, 토목에 비해 조경의 사업적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 前 상무가 대기업에서 조경직을 독립시킨 것은 조경분야뿐만 아니라 인접분야에서도 하나의 사건이었다. 다른 건설사 조경직도 그의 행보를 보며 희망을 그렸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건설사 조경직의 대부’라는 수식이 따라붙는다.그런 오희영 前 상무지만, 경력직으로 현대산업개발에 입사한 1984년, 그의 앞에 닥친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전 회사에서 현장소장(숭인공원, 석촌호수 등) 하던 사람이 각종 심부름을 도맡아 하였고, 조경 관련 사무도 모두 그의 몫이었다. 회사의 유일한 조경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개발이 붐을 타며, 그의 앞에 놓이기 시작한 생소한 해외설계설명서와 도면더미는 좌절감까지 맛보게 했다. 하지만 오희영 前 상무는 관련 전문가를 수소문하고, 직접 찾아다니며, 새로운 해외 조경프로젝트를 완수해 냈다. “입사 초기, 사실 후회를 많이 했다. 국내 조경공사만으로도 충분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일이 있으면 알아보고, 직접 찾고야 마는 성격이어서 해외건축부 당시의 기억이 많이 남고 보람도 있다.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산사람 기질이 배인 것 같다.” 옛 그림, 물을 철학하다
Water is expressed philosophically as old paintings 신화시대의 물3눈물이 흘러 강물이 되고 - 역사책이 감춘 역사 세상에는 사실을 사실로 말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해야만 할 때 사람들은 진실의 외피에 살짝 엷은 색을 입혀 본질을 감춘다. 때로는 전혀 다른 색을 칠해 상대방의 눈을 속이기까지 한다. 진실이 드러날 경우 치명상을 입거나 생명이 다칠 위험이 있을 때 쓰는 안전장치다. 신화와 전설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만큼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과장이 심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하다. 그러나 신화와 전설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생생한 진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신화를 만든 이야기꾼(話者)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눈 밝은 사람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실의 겉에 껍질을 입혔다. 껍질은 마치 환자가 쓴 약을 삼킬 수 있도록 내용물에 캡슐을 씌우는 것과 같다. 캡슐을 벗기고 나면 수 천 년의 세월을 견뎌서라도 꼭 밝히고 싶은 진실이 담겨 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책이 아닌 신화와 전설에 열광하는 이유다. 소상팔경도의 실제 장소인 소수와 상수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는 중국과 조선,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산수화다. 소상(瀟湘)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덟 장면으로 그린 그림인데, 소상(瀟湘)은 소수(瀟水)와 상수(湘水)를 합한 말로 중국 호남성(湖南省) 남안(南岸)에 있는 지역을 지칭한다. 소상팔경도는 소수와 상수를 포함해 두 물줄기가 흘러드는 동정호(洞庭湖)일대를 배경으로 그렸다.동정호는 중국 최대의 호수로 주변의 산과 강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장소다. 예로부터 많은 시인과 화가들은 소상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로 읊고 그림으로 남겼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의 시인 굴원(屈原, B.C.343?~B.B.277?)이 『이소(離騷)』에서 소상(瀟湘)을 처음 언급한 이래 두보(杜甫, 712~770)의 「등악양루(登岳陽樓)」, 범중엄(范仲淹, 989~1052)의 「악양루기(岳陽樓記)」 등 많은 시가 쏟아져 나왔다. 북송(北宋)의 송적(宋迪, 약 1015~약 1080)은 처음으로 소상팔경도를 그렸는데,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전래되어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려졌다. 소상팔경도는 평사낙안(平沙落雁, 물가에 내려앉은 기러기), 원포귀범(遠浦歸帆, 멀리서 돌아오는 배), 산시청람(山市晴嵐, 맑게 갠 산속의 도시), 강천모설(江天暮雪, 강과 하늘에 내리는 저녁 눈), 동정추월(洞庭秋月, 동정호에 뜨는 가을밤의 달), 소상야우(瀟湘夜雨, 소상에 내리는 저녁 비), 연사모종(煙寺暮鐘, 구름과 안개 속에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어촌낙조(漁村落照, 어촌에 비치는 저녁 노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팔경도는 실제 있는 장소를 그린 그림인 만큼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라 불러야 마땅하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소상팔경도는 실경이라는 의미 대신 아름다운 경치를 그린 산수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또한 멋진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 살고 싶은 이상향으로 탈바꿈되었다. 그러다보니 그림도 관념적이고 형식화되었으며 비슷비슷한 틀이 형성되었다.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된 《소상팔경도》 중의 <소상야우>와 <동정추월>을 살펴보겠다.<소상야우>는 비가 내리는 저녁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나뭇잎이 무성한 것으로 봐서 한여름이나 초가을일 것 같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듯 나뭇가지가 꺾일 정도로 위태롭다. 붓질에 따라 사선으로 그어진 먹빛이 휘몰아치는 빗줄기를 실감나게 보여준다.강가에는 버섯처럼 웅크린 집이 몇 채 서 있을 뿐 나루터에도 돌다리 위에도 사람 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오직 어둑해진 밤에 내리는 비만 천지의 주인이다. 만약 지나가던 나그네가 비를 만나 발길이 묶였다면 객지에서 느끼는 여수(旅愁)가 만만치 않으리라.<소상야우>가 격렬한 고독을 그렸다면 <동정추월>은 단정한 명상을 그렸다. 동정호에 달이 떴다. 강에는 달구경 나온 사람이 탄 배가 한 척 떠 있다. 전경에 대각선으로 솟아오른 언덕에는 소나무 두 그루가 서 있고 빈 정자가 세워져 있다. 이런 구도는 조선 초기에 활동했던 안견(安堅)의 《소상팔경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경물이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구도는 안견과 그의 화풍을 추종한 안견파(安堅派) 화가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소상팔경도》는 특히 조선 초기에 크게 유행했다. 안견 진작眞作으로 전해지는 작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안견풍으로 그린 여러 점의 작품도 전해진다.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은 당대를 대표하는 19명의 시를 결합한 《소상팔경시첩》을 남겼다. 《소상팔경도》는 조선 말기까지 여러 화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그려졌다. 문청, 이흥효, 함윤덕, 이징을 비롯하여 전충효, 김명국, 최북, 심사정, 정선, 김득신 등의 유명 작가들이 소상팔경도를 그렸으며 민화의 소재로도 등장하게 된다.
옛 그림, 물을 철학하다
Water is expressed philosophically as old paintings 신화시대의 물3눈물이 흘러 강물이 되고 - 역사책이 감춘 역사 세상에는 사실을 사실로 말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해야만 할 때 사람들은 진실의 외피에 살짝 엷은 색을 입혀 본질을 감춘다. 때로는 전혀 다른 색을 칠해 상대방의 눈을 속이기까지 한다. 진실이 드러날 경우 치명상을 입거나 생명이 다칠 위험이 있을 때 쓰는 안전장치다. 신화와 전설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만큼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과장이 심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하다. 그러나 신화와 전설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생생한 진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신화를 만든 이야기꾼(話者)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눈 밝은 사람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실의 겉에 껍질을 입혔다. 껍질은 마치 환자가 쓴 약을 삼킬 수 있도록 내용물에 캡슐을 씌우는 것과 같다. 캡슐을 벗기고 나면 수 천 년의 세월을 견뎌서라도 꼭 밝히고 싶은 진실이 담겨 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책이 아닌 신화와 전설에 열광하는 이유다. 소상팔경도의 실제 장소인 소수와 상수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는 중국과 조선,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산수화다. 소상(瀟湘)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덟 장면으로 그린 그림인데, 소상(瀟湘)은 소수(瀟水)와 상수(湘水)를 합한 말로 중국 호남성(湖南省) 남안(南岸)에 있는 지역을 지칭한다. 소상팔경도는 소수와 상수를 포함해 두 물줄기가 흘러드는 동정호(洞庭湖)일대를 배경으로 그렸다.동정호는 중국 최대의 호수로 주변의 산과 강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장소다. 예로부터 많은 시인과 화가들은 소상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로 읊고 그림으로 남겼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의 시인 굴원(屈原, B.C.343?~B.B.277?)이 『이소(離騷)』에서 소상(瀟湘)을 처음 언급한 이래 두보(杜甫, 712~770)의 「등악양루(登岳陽樓)」, 범중엄(范仲淹, 989~1052)의 「악양루기(岳陽樓記)」 등 많은 시가 쏟아져 나왔다. 북송(北宋)의 송적(宋迪, 약 1015~약 1080)은 처음으로 소상팔경도를 그렸는데,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전래되어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려졌다. 소상팔경도는 평사낙안(平沙落雁, 물가에 내려앉은 기러기), 원포귀범(遠浦歸帆, 멀리서 돌아오는 배), 산시청람(山市晴嵐, 맑게 갠 산속의 도시), 강천모설(江天暮雪, 강과 하늘에 내리는 저녁 눈), 동정추월(洞庭秋月, 동정호에 뜨는 가을밤의 달), 소상야우(瀟湘夜雨, 소상에 내리는 저녁 비), 연사모종(煙寺暮鐘, 구름과 안개 속에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어촌낙조(漁村落照, 어촌에 비치는 저녁 노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팔경도는 실제 있는 장소를 그린 그림인 만큼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라 불러야 마땅하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소상팔경도는 실경이라는 의미 대신 아름다운 경치를 그린 산수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또한 멋진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 살고 싶은 이상향으로 탈바꿈되었다. 그러다보니 그림도 관념적이고 형식화되었으며 비슷비슷한 틀이 형성되었다.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된 《소상팔경도》 중의 <소상야우>와 <동정추월>을 살펴보겠다.<소상야우>는 비가 내리는 저녁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나뭇잎이 무성한 것으로 봐서 한여름이나 초가을일 것 같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듯 나뭇가지가 꺾일 정도로 위태롭다. 붓질에 따라 사선으로 그어진 먹빛이 휘몰아치는 빗줄기를 실감나게 보여준다.강가에는 버섯처럼 웅크린 집이 몇 채 서 있을 뿐 나루터에도 돌다리 위에도 사람 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오직 어둑해진 밤에 내리는 비만 천지의 주인이다. 만약 지나가던 나그네가 비를 만나 발길이 묶였다면 객지에서 느끼는 여수(旅愁)가 만만치 않으리라.<소상야우>가 격렬한 고독을 그렸다면 <동정추월>은 단정한 명상을 그렸다. 동정호에 달이 떴다. 강에는 달구경 나온 사람이 탄 배가 한 척 떠 있다. 전경에 대각선으로 솟아오른 언덕에는 소나무 두 그루가 서 있고 빈 정자가 세워져 있다. 이런 구도는 조선 초기에 활동했던 안견(安堅)의 《소상팔경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경물이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구도는 안견과 그의 화풍을 추종한 안견파(安堅派) 화가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소상팔경도》는 특히 조선 초기에 크게 유행했다. 안견 진작眞作으로 전해지는 작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안견풍으로 그린 여러 점의 작품도 전해진다.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은 당대를 대표하는 19명의 시를 결합한 《소상팔경시첩》을 남겼다. 《소상팔경도》는 조선 말기까지 여러 화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그려졌다. 문청, 이흥효, 함윤덕, 이징을 비롯하여 전충효, 김명국, 최북, 심사정, 정선, 김득신 등의 유명 작가들이 소상팔경도를 그렸으며 민화의 소재로도 등장하게 된다. 조경의 경계를 넘어: 조경의 영토를 넓혀나가는 주목할만한 조경가 12인(4)
The Forefront of Landscape Architecture 12 Innovators Opening New Horizons of the Field 2011년 여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인 광화문을 물바다로 만든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에서도 빗물관리에 대한 중요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경우 10,286km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하수관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후변화시대의 예측 불가능한 강우량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심도 터널, 분산형 빗물관리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대통령령 13514호’를 통해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도록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지시하였고, 상하원 의원들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타 단체가 유출수 수질 및 수량 관리를 위해 그린인프라 시설을 계획, 설계 및 적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린인프라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미국조경가협회(ASLA)는 2011년 7월 그린인프라를 장려하는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 물순환 체계를 보전하고 하천 수질을 개선하며,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조경 공간을 창출하고 도시를 만드는 조경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함과 동시에, 하천 수질 개선 및 수자원 보전, 도시 물관리 분야로 업역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오리건 컨벤션센터의 레인가든을 통해 빗물관리에 있어서 조경의 역할에 대한 선구적인 작품을 남긴 캐롤 메이어리드(Carol Mayer Reed)의 작품세계를 소개하였다. 당초 4월호에는 브라운필드 및 도시생태(Brownfield Design)를 다루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필자는 최근 그린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제 서울시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분산형 빗물관리와 그린인프라 시설들의 모범 사례로서 뉴욕시 공원국에서 그린인프라 부문 디렉터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네티 컴프턴(Nette Compton)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대규모 도시설계(Large Scale Urban Design) _ Signe Nielsen 2. 해일에 대비한 갯벌 및 해안 생태 공원(Salt Marsh Design) _ Van Atta3. 좁은 도시면적을 이용한 레인가든(Stormwater Treatment) _ Mayer Reed4. 도시의 빗물관리를 위한 그린인프라스트럭처Green Infrastructure _ Nette Compton5. 브라운필드 및 도시생태(Brownfield Design) _ Julie Bargman, Dirt Studio6. 토착 식물 디자인(Roof top and local planting design) _ Oehem van Sweden7. 조경 이론(Urban Design and Landscape) _ Witold Rybczinski8. 시민 참여(Community Design) _ Walter Hood9. 환경예술(Art & Design) _ Claude Cormier, Canada10. 탄소제로 및 친환경 소재(Life-cycle Design and low-impact materia) _ Michael McDonough Partners11. 친환경 주거정원(Sustainable Residential Design) _ David Kelly, Rees Roberts Partners12. 대규모 도시옥상농업(Urban Rooftop Farming) _ Ben Flanner, Brooklyn Grange 13. 스마트 성장 도시디자인(Smart Growth Design) _ Andres Duany 네티 컴프턴(Nette Compton) 뉴욕시 공원국 그린인프라부문 디렉터 NYC Parks Department 지속가능한 조경을 향한 열정의 리더뉴욕시의 블룸버그 시장은 2002년 취임 후, 8년간 약 6조 원의 예산을 하천과 해안의 수질 정화에 쏟아 부었다. 그 결과 뉴욕항의 전체적 수질은 지난 100년을 통틀어 가장 우수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천과 수로들의 오염도는 심각하다. 대부분의 자금이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하수처리장을 최신 시설로 개선하는데 주로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심각한 문제인 우·오수 합류관거(CSO)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 출간된 뉴욕시 그린인프라스트럭처 플랜 보고서(NYC Green Infrastructure Plan)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며,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집중형 하수처리장의 증설을 대신하는 분산형 빗물집수시설, 즉 그린인프라의 도입이다. 빗물이 하수관거에서 오수와 합류되면,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게 되고, 그 결과 우·오수 합류수는 그대로 하천과 해안으로 방류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을 동반하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게 된다. 비가 내릴 때만을 위한 기계적 시설투자보다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녹지를 증설함으로써,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우수의 양을 줄이고, 토양으로의 침투를 보조하며, 도시와 지역에 사회적, 생태적 혜택을 동반하자는 것이 뉴욕시 그린인프라 프로그램의 주된 아이디어이다. Q. 뉴욕시 공원국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제가 공원국의 일원이 된 지는 약 6년 반이 되었습니다. 코넬대학교에서 조경학과 식물학을 전공했는데, 조경학과에서는 조경의 과학적 측면을 파는 ‘모범생’ 축에 들었습니다. 이어 대학원에서 도시생태학을 전공했고, 논문의 주제는 뉴욕시의 옥상정원을 빗물 저류에 최적화된 형태로 디자인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도시에서 빗물은 실질적으로 폐기물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저는 여기에 큰 잠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물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빗물이 무척 흔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여지를 간과하기 쉽지만, 그 양 자체가 엄청나다는 사실만으로도 빗물은 제대로 작동하는 도시경관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빗물이란 도시 환경에서 불변하는 하나의 요소이지 않습니까? 관점만 바꾸면 골칫덩이에서 여러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저에게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생각되었고, 이 일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반드시 내가 해내야 할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빗물에 관련한 아이디어로 관심을 집중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조경이라는 영역을 탐색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그린스트리트(Green Street)와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A. 흠…좋은 질문이네요. 벤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자면, 서로 교집합인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린스트리트란 기본적으로 공도(公道)에 위치하고, 교통국 관할인데, 지나치게 넓은 보행로나 과도한 폭으로 계획된 차도 또는 도로상에 큰 면적으로 사선이 칠해진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못한 포장면 부분을 녹지로 바꾸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대개 부정형으로 형성된 도로망에서 꺾이는 부분이나 양방통행이 일방통행으로 바뀌는 지점, 도로가 끝나는 지점 같은 곳에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죽은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공간을 활용하자는 것이 그린스트리트입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면이 녹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소극적 형태의 빗물저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린인프라의 한 요소로 이해되는 그린스트리트란, 보다 적극적인 빗물 저류 장치로서 일반적 그린스트리트보다 3~10배가량 많은 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질토양 지역에서는 특별히 많은 양의 빗물을 처리하도록 고안된 곳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빗물을 흡수해서 하부로 침투시키고, 쇄석층이 자체 저류를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린인프라는 또한 단순히 홍수저감을 위한 그린스트리트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타입의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가령 뉴욕시 환경국에서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도 용지상의 생태수로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린스트리트가 도로 상의 과도한 부분을 활용하거나 불합리한 도로 선형을 재정비해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면, 그린인프라에서 말하는 공도 용지상의 생태수로란, 기존과 같은 면적의 가로수 식재구역을 이용하되 도로에 흐르는 빗물을 집수하여 식재면으로 유도함으로써 빗물을 저류하고 정화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것이 그린인프라 사업의 주된 방식이고요, 다공질 투수 포장면이라든가 인조잔디 스포츠경기장 하부에 거대한 빗물 저류조의 건설 등도 포함됩니다. Q.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경의 흐름이나, 공적공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A. 저는 공적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유연한 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지나가다보면, 어떤 장소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단일한 기능으로만 설계된 곳이 있습니다.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우리는 이런 공간을 유지할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광장을 만든다면, 그 광장은 당연히 빗물을 다루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면, 당연히 방과 후에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곳이 되겠지만 이른 아침에 그곳을 걷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에게도 역시 좋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단일한 용도를 가지는 공간이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가진 돈을 쓰는데 보다 영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엄청난 돈을 한 가지 활용도만을 지니고 있는 곳에 투자한다면, 당신은 그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경의 경계를 넘어: 조경의 영토를 넓혀나가는 주목할만한 조경가 12인(4)
The Forefront of Landscape Architecture 12 Innovators Opening New Horizons of the Field 2011년 여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인 광화문을 물바다로 만든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에서도 빗물관리에 대한 중요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경우 10,286km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하수관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후변화시대의 예측 불가능한 강우량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심도 터널, 분산형 빗물관리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대통령령 13514호’를 통해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도록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지시하였고, 상하원 의원들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타 단체가 유출수 수질 및 수량 관리를 위해 그린인프라 시설을 계획, 설계 및 적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린인프라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미국조경가협회(ASLA)는 2011년 7월 그린인프라를 장려하는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 물순환 체계를 보전하고 하천 수질을 개선하며,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조경 공간을 창출하고 도시를 만드는 조경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함과 동시에, 하천 수질 개선 및 수자원 보전, 도시 물관리 분야로 업역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오리건 컨벤션센터의 레인가든을 통해 빗물관리에 있어서 조경의 역할에 대한 선구적인 작품을 남긴 캐롤 메이어리드(Carol Mayer Reed)의 작품세계를 소개하였다. 당초 4월호에는 브라운필드 및 도시생태(Brownfield Design)를 다루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필자는 최근 그린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제 서울시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분산형 빗물관리와 그린인프라 시설들의 모범 사례로서 뉴욕시 공원국에서 그린인프라 부문 디렉터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네티 컴프턴(Nette Compton)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대규모 도시설계(Large Scale Urban Design) _ Signe Nielsen 2. 해일에 대비한 갯벌 및 해안 생태 공원(Salt Marsh Design) _ Van Atta3. 좁은 도시면적을 이용한 레인가든(Stormwater Treatment) _ Mayer Reed4. 도시의 빗물관리를 위한 그린인프라스트럭처Green Infrastructure _ Nette Compton5. 브라운필드 및 도시생태(Brownfield Design) _ Julie Bargman, Dirt Studio6. 토착 식물 디자인(Roof top and local planting design) _ Oehem van Sweden7. 조경 이론(Urban Design and Landscape) _ Witold Rybczinski8. 시민 참여(Community Design) _ Walter Hood9. 환경예술(Art & Design) _ Claude Cormier, Canada10. 탄소제로 및 친환경 소재(Life-cycle Design and low-impact materia) _ Michael McDonough Partners11. 친환경 주거정원(Sustainable Residential Design) _ David Kelly, Rees Roberts Partners12. 대규모 도시옥상농업(Urban Rooftop Farming) _ Ben Flanner, Brooklyn Grange 13. 스마트 성장 도시디자인(Smart Growth Design) _ Andres Duany 네티 컴프턴(Nette Compton) 뉴욕시 공원국 그린인프라부문 디렉터 NYC Parks Department 지속가능한 조경을 향한 열정의 리더뉴욕시의 블룸버그 시장은 2002년 취임 후, 8년간 약 6조 원의 예산을 하천과 해안의 수질 정화에 쏟아 부었다. 그 결과 뉴욕항의 전체적 수질은 지난 100년을 통틀어 가장 우수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천과 수로들의 오염도는 심각하다. 대부분의 자금이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하수처리장을 최신 시설로 개선하는데 주로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심각한 문제인 우·오수 합류관거(CSO)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 출간된 뉴욕시 그린인프라스트럭처 플랜 보고서(NYC Green Infrastructure Plan)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며,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집중형 하수처리장의 증설을 대신하는 분산형 빗물집수시설, 즉 그린인프라의 도입이다. 빗물이 하수관거에서 오수와 합류되면,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게 되고, 그 결과 우·오수 합류수는 그대로 하천과 해안으로 방류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을 동반하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게 된다. 비가 내릴 때만을 위한 기계적 시설투자보다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녹지를 증설함으로써,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우수의 양을 줄이고, 토양으로의 침투를 보조하며, 도시와 지역에 사회적, 생태적 혜택을 동반하자는 것이 뉴욕시 그린인프라 프로그램의 주된 아이디어이다. Q. 뉴욕시 공원국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제가 공원국의 일원이 된 지는 약 6년 반이 되었습니다. 코넬대학교에서 조경학과 식물학을 전공했는데, 조경학과에서는 조경의 과학적 측면을 파는 ‘모범생’ 축에 들었습니다. 이어 대학원에서 도시생태학을 전공했고, 논문의 주제는 뉴욕시의 옥상정원을 빗물 저류에 최적화된 형태로 디자인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도시에서 빗물은 실질적으로 폐기물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저는 여기에 큰 잠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물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빗물이 무척 흔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여지를 간과하기 쉽지만, 그 양 자체가 엄청나다는 사실만으로도 빗물은 제대로 작동하는 도시경관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빗물이란 도시 환경에서 불변하는 하나의 요소이지 않습니까? 관점만 바꾸면 골칫덩이에서 여러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저에게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생각되었고, 이 일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반드시 내가 해내야 할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빗물에 관련한 아이디어로 관심을 집중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조경이라는 영역을 탐색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그린스트리트(Green Street)와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A. 흠…좋은 질문이네요. 벤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자면, 서로 교집합인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린스트리트란 기본적으로 공도(公道)에 위치하고, 교통국 관할인데, 지나치게 넓은 보행로나 과도한 폭으로 계획된 차도 또는 도로상에 큰 면적으로 사선이 칠해진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못한 포장면 부분을 녹지로 바꾸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대개 부정형으로 형성된 도로망에서 꺾이는 부분이나 양방통행이 일방통행으로 바뀌는 지점, 도로가 끝나는 지점 같은 곳에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죽은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공간을 활용하자는 것이 그린스트리트입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면이 녹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소극적 형태의 빗물저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린인프라의 한 요소로 이해되는 그린스트리트란, 보다 적극적인 빗물 저류 장치로서 일반적 그린스트리트보다 3~10배가량 많은 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질토양 지역에서는 특별히 많은 양의 빗물을 처리하도록 고안된 곳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빗물을 흡수해서 하부로 침투시키고, 쇄석층이 자체 저류를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린인프라는 또한 단순히 홍수저감을 위한 그린스트리트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타입의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가령 뉴욕시 환경국에서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도 용지상의 생태수로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린스트리트가 도로 상의 과도한 부분을 활용하거나 불합리한 도로 선형을 재정비해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면, 그린인프라에서 말하는 공도 용지상의 생태수로란, 기존과 같은 면적의 가로수 식재구역을 이용하되 도로에 흐르는 빗물을 집수하여 식재면으로 유도함으로써 빗물을 저류하고 정화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것이 그린인프라 사업의 주된 방식이고요, 다공질 투수 포장면이라든가 인조잔디 스포츠경기장 하부에 거대한 빗물 저류조의 건설 등도 포함됩니다. Q.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경의 흐름이나, 공적공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A. 저는 공적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유연한 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지나가다보면, 어떤 장소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단일한 기능으로만 설계된 곳이 있습니다.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우리는 이런 공간을 유지할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광장을 만든다면, 그 광장은 당연히 빗물을 다루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면, 당연히 방과 후에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곳이 되겠지만 이른 아침에 그곳을 걷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에게도 역시 좋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단일한 용도를 가지는 공간이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가진 돈을 쓰는데 보다 영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엄청난 돈을 한 가지 활용도만을 지니고 있는 곳에 투자한다면, 당신은 그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농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특별시가 얼마 전 ‘Agro-City 서울’을 비전으로 하여 2020년까지 서울시민 가구당 3.3㎡의 텃밭을 조성,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농업 붐이 일다 급기야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시에서 마련한 이 정책의 방향성과 그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과 국내외사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도시농업정책에 대해 진단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특히 지난 3월 18일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데 본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해당 안은 건축물이 내·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여 도시농업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면적 일부를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발의안은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2012년 하반기의 서울시 건축조례개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결국 지금 추진하는 서울시의 도시농업정책은 의도와 상관없이 조경계 지형을 흔드는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점검 1. 서울시의 목표 ‘1가구 당 3.3㎡의 텃밭’은 적당한가?통계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2012년 기준 4,177,970세대이며, 여기에 1세대 당 3.3㎡를 대입하면 약 13.79㎢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는 여의도(8.35㎢)의 1.6배가량 되는 면적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3.3㎡은 1평인데, ‘한평텃밭’과 같은 개념으로 서울시민 1가구 당 1평으로 설정하여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말농장이 보통 3~5평 정도 수준인데, 1평만 되어도 작물을 키우기에는 문제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도시농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조차 서울시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면적을 제시했는지, 적정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목표치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내용이 지배적이다. 현대사회의 다각화된 가족과 세대 구성, 식성, 여가문화, 계절별 활동, 도시환경 등을 종합하여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관한 의문을 품는 것이다. 이렇듯 충분히 조사와 뚜렷한 근거 없이 제시된 양적 목표치는,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기 쉽고 반발을 불러 올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러한 양적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가 2012년도 서울시 건축조례안 개정과 2013년 3월 18일의 건축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농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특별시가 얼마 전 ‘Agro-City 서울’을 비전으로 하여 2020년까지 서울시민 가구당 3.3㎡의 텃밭을 조성,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농업 붐이 일다 급기야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시에서 마련한 이 정책의 방향성과 그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과 국내외사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도시농업정책에 대해 진단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특히 지난 3월 18일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데 본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해당 안은 건축물이 내·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여 도시농업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면적 일부를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발의안은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2012년 하반기의 서울시 건축조례개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결국 지금 추진하는 서울시의 도시농업정책은 의도와 상관없이 조경계 지형을 흔드는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점검 1. 서울시의 목표 ‘1가구 당 3.3㎡의 텃밭’은 적당한가?통계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2012년 기준 4,177,970세대이며, 여기에 1세대 당 3.3㎡를 대입하면 약 13.79㎢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는 여의도(8.35㎢)의 1.6배가량 되는 면적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3.3㎡은 1평인데, ‘한평텃밭’과 같은 개념으로 서울시민 1가구 당 1평으로 설정하여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말농장이 보통 3~5평 정도 수준인데, 1평만 되어도 작물을 키우기에는 문제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도시농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조차 서울시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면적을 제시했는지, 적정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목표치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내용이 지배적이다. 현대사회의 다각화된 가족과 세대 구성, 식성, 여가문화, 계절별 활동, 도시환경 등을 종합하여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관한 의문을 품는 것이다. 이렇듯 충분히 조사와 뚜렷한 근거 없이 제시된 양적 목표치는,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기 쉽고 반발을 불러 올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러한 양적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가 2012년도 서울시 건축조례안 개정과 2013년 3월 18일의 건축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푸른도시 만들기 워크숍
서울시 공원녹지 미래상에 시민의견 수렴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가 되자 서울시청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이기 시작했다. 이유는 바로 서울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수립하기 위한 “푸른도시 만들기 워크숍”이 이날 개최되었기 때문.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에서 작성한 ‘푸른도시 선언 초안’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고자 진행되었다. 이강오 사무처장서울그린트러스트이 사회를 맡았으며, 무대에는 벤치와 테이블, 화분 등을 놓아 푸른도시, 공원, 녹지 등의 주제성을 보다 부각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서울특별시은 “오래 전부터 공원녹지의 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왔다. 시민주도로 조성·관리 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좋은 도시를 손수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였다.이어 문승국 부시장서울시 행정2부은 “4월 5일 식목일이 다가오고 있다. 식목일 하루뿐이 아닌 4월을 통째로 ‘식목월’로 만들어, 서울 곳곳에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 기업, 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여 꽃과 나무로 뒤덮인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실무위원장인 조경진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가 푸른도시 선언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작성원칙, 전략, 비전, 방향, 슬로건 등을 소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푸른도시 선언의 초안은 ‘더불어 사는 숲의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사람·소프트웨어·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몇 가지 작성원칙이 있었는데 첫째, 쉽고 소통 가능한 언어로 작성한다. 둘째, 현상에 대한 진단과 제안을 제시한다. 셋째, 미래지향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수준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는 시민들과 함께 푸른도시 선언을 만들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푸른도시 만들기 워크숍
서울시 공원녹지 미래상에 시민의견 수렴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가 되자 서울시청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이기 시작했다. 이유는 바로 서울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수립하기 위한 “푸른도시 만들기 워크숍”이 이날 개최되었기 때문.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에서 작성한 ‘푸른도시 선언 초안’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고자 진행되었다. 이강오 사무처장서울그린트러스트이 사회를 맡았으며, 무대에는 벤치와 테이블, 화분 등을 놓아 푸른도시, 공원, 녹지 등의 주제성을 보다 부각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서울특별시은 “오래 전부터 공원녹지의 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왔다. 시민주도로 조성·관리 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좋은 도시를 손수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였다.이어 문승국 부시장서울시 행정2부은 “4월 5일 식목일이 다가오고 있다. 식목일 하루뿐이 아닌 4월을 통째로 ‘식목월’로 만들어, 서울 곳곳에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 기업, 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여 꽃과 나무로 뒤덮인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실무위원장인 조경진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가 푸른도시 선언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작성원칙, 전략, 비전, 방향, 슬로건 등을 소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푸른도시 선언의 초안은 ‘더불어 사는 숲의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사람·소프트웨어·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몇 가지 작성원칙이 있었는데 첫째, 쉽고 소통 가능한 언어로 작성한다. 둘째, 현상에 대한 진단과 제안을 제시한다. 셋째, 미래지향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수준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는 시민들과 함께 푸른도시 선언을 만들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10주년 기념 정기총회 및 기술세미나
인공지반녹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지난 2월 28일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인성교육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회장 이은희, 이하 인공지반녹화협회) 10주년 기념 ‘정기총회 및 기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인공지반녹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현수 부회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이 인공지반녹화 시공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인공지반녹화의 과거와 현재의 실태를 짚어보았다. 이후 이동근 부회장(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은 ‘재해와 복지’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인공지반녹화의 미래를 내다보았다. 이후 안동만 고문(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을 좌장으로 황상연 사무관(환경부 자연정책과), 한정훈 팀장(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최연철 부장((재)경기농림진흥재단 녹화사업부), 한승호 대표((주)한설그린), 변동원 대표((주)한국 CCR), 송병화 교수(벽성대학 조경과)가 토론회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는 환경부, 서울특별시,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사)한국경관학회, (사)한국환경생태학회,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에서 후원했다. 정기총회에서 한승호 대표가 수석부회장에, 최연철 부장이 상임이사에 각각 선출되었으며, 2년을 임기로 매년 한명씩 교차로 선출되는 감사에는 변동원 대표이사가 올해도 활동을 잇게 되었다. 시상식에서는 양병이 명예회장(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과 안동만 고문(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임승빈 고문(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특별공로상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과 (재)경기농림진흥재단이 수상했다. 한편 인공지반녹화협회는 “2013년에도 제5회 인공지반녹화대상을 개최하고, 인공지반녹화 시공사례 D/B를 꾸준히 업데이트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초에는 인공지반녹화협회 10주년을 기념하여 해외 인공지반녹화 사례지 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10주년 기념 정기총회 및 기술세미나
인공지반녹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지난 2월 28일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인성교육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회장 이은희, 이하 인공지반녹화협회) 10주년 기념 ‘정기총회 및 기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인공지반녹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현수 부회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이 인공지반녹화 시공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인공지반녹화의 과거와 현재의 실태를 짚어보았다. 이후 이동근 부회장(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은 ‘재해와 복지’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인공지반녹화의 미래를 내다보았다. 이후 안동만 고문(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을 좌장으로 황상연 사무관(환경부 자연정책과), 한정훈 팀장(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최연철 부장((재)경기농림진흥재단 녹화사업부), 한승호 대표((주)한설그린), 변동원 대표((주)한국 CCR), 송병화 교수(벽성대학 조경과)가 토론회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는 환경부, 서울특별시,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사)한국경관학회, (사)한국환경생태학회,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에서 후원했다. 정기총회에서 한승호 대표가 수석부회장에, 최연철 부장이 상임이사에 각각 선출되었으며, 2년을 임기로 매년 한명씩 교차로 선출되는 감사에는 변동원 대표이사가 올해도 활동을 잇게 되었다. 시상식에서는 양병이 명예회장(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과 안동만 고문(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임승빈 고문(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특별공로상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과 (재)경기농림진흥재단이 수상했다. 한편 인공지반녹화협회는 “2013년에도 제5회 인공지반녹화대상을 개최하고, 인공지반녹화 시공사례 D/B를 꾸준히 업데이트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초에는 인공지반녹화협회 10주년을 기념하여 해외 인공지반녹화 사례지 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는 도시농부다, ‘도시농업 콘서트’ 개최
텃밭에서 나누는 ‘TALK, TALK, TALK' 도시농업이 대세다. 너도 나도 빈 땅이나 베란다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텃밭을 가꾸고 심지어 돈을 내고 땅을 빌려 내가 먹을 작물을 재배한다. 가까운 상점에 가서 채소를 사먹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오히려 시간과 비용 투자대비 저렴하기까지 하다. 왜 사람들은 도시농업에 열광할까? ‘나는 도시농부다’를 주제로 한 ‘도시농업 콘서트’가 지난 2월 19일 안양 평촌아트홀에서 올해로 2회를 맞이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경기농림진흥재단 김정한 대표이사 외 600여명의 도시농부와 도시농부를 꿈꾸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를 주최한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도시농업을 통해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더불어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조 아래 콘서트 형식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도시농업을 통해 얻은 경험담을 풀어놓으며 그들만의 도시농업 비전과 노하우를 소개했다. 광주 매곡초등학교에는 학교농장을 일군 사례를 소개했으며, 대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텃밭 동아리 ‘씨앗들’은 농사짓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주민자치센터의 쓸모없던 옥상을 주민들의 힘으로 텃밭으로 조성한 안산시 본오2동 주민자치센터의 ‘보니텃밭’과 도시농사를 지으며 암을 이겨낸 이세영와 문은순 씨의 이야기도 토크콘서트에서 공개됐다.
나는 도시농부다, ‘도시농업 콘서트’ 개최
텃밭에서 나누는 ‘TALK, TALK, TALK' 도시농업이 대세다. 너도 나도 빈 땅이나 베란다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텃밭을 가꾸고 심지어 돈을 내고 땅을 빌려 내가 먹을 작물을 재배한다. 가까운 상점에 가서 채소를 사먹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오히려 시간과 비용 투자대비 저렴하기까지 하다. 왜 사람들은 도시농업에 열광할까? ‘나는 도시농부다’를 주제로 한 ‘도시농업 콘서트’가 지난 2월 19일 안양 평촌아트홀에서 올해로 2회를 맞이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경기농림진흥재단 김정한 대표이사 외 600여명의 도시농부와 도시농부를 꿈꾸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를 주최한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도시농업을 통해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더불어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조 아래 콘서트 형식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도시농업을 통해 얻은 경험담을 풀어놓으며 그들만의 도시농업 비전과 노하우를 소개했다. 광주 매곡초등학교에는 학교농장을 일군 사례를 소개했으며, 대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텃밭 동아리 ‘씨앗들’은 농사짓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주민자치센터의 쓸모없던 옥상을 주민들의 힘으로 텃밭으로 조성한 안산시 본오2동 주민자치센터의 ‘보니텃밭’과 도시농사를 지으며 암을 이겨낸 이세영와 문은순 씨의 이야기도 토크콘서트에서 공개됐다. 感慨無量
Be Deeply Moved 오늘 아침 이곳저곳에 뿌릴 씨앗들을 정리하며, 이 꽃은 어느 정원에, 이 풀은 어느 둔덕에 심겨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려나 하는 기대감으로 잔잔한 흥분을 느꼈습니다.<환경과조경>이 이번 호로 300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알 한알의 씨앗이 싹트고 꽃피어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찬탄의 순간순간을 만들어 주듯 조경에 관련된 전공서는 물론 잡지 한 권 없던 불모지에 첫 호를 내기 시작한 <환경과조경>은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조경인들에게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조경인들에게 프라이드를 심어 준 힘이었고 조경인들을 결속하는 사랑의 끈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 보면, 첫 호의 태동은 ‘감격’ 그 자체였답니다. 잡지사에 근무했다는 일천한 경력 때문에 저를 기획과 편집부터 온갖 궂은일까지 고루 참여시킨 지금의 발행인이신 ‘은사’님의 특명으로 사무실도, 비품도, 하다못해 사진기조차 개인적인 조달로 시작한 작업이었고, 그때 참여하신 거의 모든 분들은 자원봉사에 가까웠습니다. 오직 조경계를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그러면서 그 일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일인지 편집기간 내내 웃음이 그치지 않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같이 즐거운 고통을 나누던 편집장 김용택 화백님, 김현선 선생, 나현영 여사, 그리고 유병림 교수님 등등 그리운 분들입니다.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정확한 날에 어김없이 책상 앞에 전달되는 <환경과조경>을 보지만, 그동안 이 잡지 출판의 지속성 때문에 발행인이신 오휘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가슴이 조마조마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추억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아름답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또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 봅니다. 저는 민들레, 할미꽃, 그리고 박주가리 씨앗을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하얀 털이 달린 씨앗, 그 한 대를 꺾어 들고 ‘후’ 불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날아가서 잘 뿌리내리고 싹트고 꽃피고 다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고…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갈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한바퀴 돈, 먼 이국땅에서 여전히 노랗게 핀 민들레를 보면서 씨앗의 여정이랄까, 식물의 퍼져가는 힘에 새삼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경이로운 여정에 찬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환경과조경>은 앞으로도 한국 조경계의 유일한 잡지로서의 긍지와 정진의 자세로 여전히 확장되어 나갈 것이고, 고난의 순간이 닥쳐와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조경계도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도약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디자인만이 아닙니다. 공사의 질도 당연히 더 높아지지 않는 한 건축이나 기타 경쟁 분야들과의 전쟁과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조경가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무엇’ 조경가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수화의 발묵처럼, 조경인들의 손을 거쳐 나온 모든 일들이 발묵처럼 감동의 여울이 번지고 스미고, 퍼져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살아 있는 땅이고 흙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는 태도는 유한한 지구 자원의 지속성에 있고,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경가들이 남기는 생태발자국들이 우리 국토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라야 합니다.조경계가 변하고, 더 한층 질이 높아지고 조경인들이 이 땅에 사는 한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 300회 간행 기쁨을 넘어 다시 무거운 짐을 지셔야겠습니다. 조경인들로 하여금 더 높은 안목을 기르고, 가야 할, 걸어야 할, 해야 할 일들을 저 만치 앞서서 제시해 주셔야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This morning I felt a little excited, assorting the flower seeds that I would sow and imagining how they would give pleasure to us upon coming out splendidly. When I heard the news that ELA was going to publish its 300th issue, I couldn’t help looking back on the days I spent reading the magazines and entertaining myself with them. Like colorful flowers blossoming on hills in the spring, ELA has been a great joy to every professional in the industry, helping enhancing the pride of the landscape architects in the country. I can still remember vividly how deeply I was moved by the first publication of ELA, when I had to take care of every matter of detail such as maintaining the office and purchasing equipment including even a camera. My insignificant work experience with a magazine publisher made Dr. Whee Young Oh the founder and publisher of ELA as well as my teacher, recruit me. Then Professor Oh let me take part in each and every step in planning and editing process. At that time, all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ere not employees but volunteers. We worked pleasantly and happily together, knowing that what we were doing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I am missing my old colleagues like Yong Taek Kim, Hyun Sun Kim, Hyun Young Nah, and Byung Rim You. We shared each other’s burden and worked co-operatively. Upon the arrival of the magazine every month, I sometimes think of the times when Professor Oh and the other members of ELA were faced with difficulties continuing the publication. After all these years, those moments have become priceless and treasured memories of good old days. Let’s get back to the story of seeds. Since my childhood, I have been particularly fond of the seeds of dandelions, pasque flowers, and milkweeds. I played with them, blowing them into the air and imagining how far they would fly, where they would land, and whether they would grow to be beautiful flowers. Living far away from my home country, I still see pretty dandelions in yellow and stand in great awe of the miraculous circle of life in nature. Like these beautiful wild flowers, I believe, ELA, the most prestigious publication of the industry, will spread around the world and continue its growth, in spite of any difficulties. In addition, it is time that landscape architecture paid more attention to its future development. It is not merely about the enhanced quality of design, but also about that of practice. Otherwise, I might be impossible to compete with other industries including architecture. A work of a landscape architect should be what others can never try to imitate, and it should be something extraordinary that can strike a chord in the hearts of the audience. It has to be touching and inspiring. What we are dealing with are soil and earth full of life, and what we are focused on are the sustainability of the limited amount of resources and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Therefore, the ecological footprints of landscape architects should contribute to conserving and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of Korea. As the atmosphere of the industry changes over time, the quality of practice is improved, and landscape architects continue to serve as invaluable professional in our society, ELA will have take its responsibility as the leading publication in the country. ELA should actively plays its role in broadening the horizon of landscape architects, and providing directions for the industry with guidance and insight.
感慨無量
Be Deeply Moved 오늘 아침 이곳저곳에 뿌릴 씨앗들을 정리하며, 이 꽃은 어느 정원에, 이 풀은 어느 둔덕에 심겨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려나 하는 기대감으로 잔잔한 흥분을 느꼈습니다.<환경과조경>이 이번 호로 300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알 한알의 씨앗이 싹트고 꽃피어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찬탄의 순간순간을 만들어 주듯 조경에 관련된 전공서는 물론 잡지 한 권 없던 불모지에 첫 호를 내기 시작한 <환경과조경>은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조경인들에게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조경인들에게 프라이드를 심어 준 힘이었고 조경인들을 결속하는 사랑의 끈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 보면, 첫 호의 태동은 ‘감격’ 그 자체였답니다. 잡지사에 근무했다는 일천한 경력 때문에 저를 기획과 편집부터 온갖 궂은일까지 고루 참여시킨 지금의 발행인이신 ‘은사’님의 특명으로 사무실도, 비품도, 하다못해 사진기조차 개인적인 조달로 시작한 작업이었고, 그때 참여하신 거의 모든 분들은 자원봉사에 가까웠습니다. 오직 조경계를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그러면서 그 일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일인지 편집기간 내내 웃음이 그치지 않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같이 즐거운 고통을 나누던 편집장 김용택 화백님, 김현선 선생, 나현영 여사, 그리고 유병림 교수님 등등 그리운 분들입니다.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정확한 날에 어김없이 책상 앞에 전달되는 <환경과조경>을 보지만, 그동안 이 잡지 출판의 지속성 때문에 발행인이신 오휘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가슴이 조마조마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추억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아름답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또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 봅니다. 저는 민들레, 할미꽃, 그리고 박주가리 씨앗을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하얀 털이 달린 씨앗, 그 한 대를 꺾어 들고 ‘후’ 불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날아가서 잘 뿌리내리고 싹트고 꽃피고 다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고…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갈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한바퀴 돈, 먼 이국땅에서 여전히 노랗게 핀 민들레를 보면서 씨앗의 여정이랄까, 식물의 퍼져가는 힘에 새삼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경이로운 여정에 찬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환경과조경>은 앞으로도 한국 조경계의 유일한 잡지로서의 긍지와 정진의 자세로 여전히 확장되어 나갈 것이고, 고난의 순간이 닥쳐와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조경계도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도약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디자인만이 아닙니다. 공사의 질도 당연히 더 높아지지 않는 한 건축이나 기타 경쟁 분야들과의 전쟁과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조경가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무엇’ 조경가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수화의 발묵처럼, 조경인들의 손을 거쳐 나온 모든 일들이 발묵처럼 감동의 여울이 번지고 스미고, 퍼져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살아 있는 땅이고 흙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는 태도는 유한한 지구 자원의 지속성에 있고,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경가들이 남기는 생태발자국들이 우리 국토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라야 합니다.조경계가 변하고, 더 한층 질이 높아지고 조경인들이 이 땅에 사는 한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 300회 간행 기쁨을 넘어 다시 무거운 짐을 지셔야겠습니다. 조경인들로 하여금 더 높은 안목을 기르고, 가야 할, 걸어야 할, 해야 할 일들을 저 만치 앞서서 제시해 주셔야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This morning I felt a little excited, assorting the flower seeds that I would sow and imagining how they would give pleasure to us upon coming out splendidly. When I heard the news that ELA was going to publish its 300th issue, I couldn’t help looking back on the days I spent reading the magazines and entertaining myself with them. Like colorful flowers blossoming on hills in the spring, ELA has been a great joy to every professional in the industry, helping enhancing the pride of the landscape architects in the country. I can still remember vividly how deeply I was moved by the first publication of ELA, when I had to take care of every matter of detail such as maintaining the office and purchasing equipment including even a camera. My insignificant work experience with a magazine publisher made Dr. Whee Young Oh the founder and publisher of ELA as well as my teacher, recruit me. Then Professor Oh let me take part in each and every step in planning and editing process. At that time, all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ere not employees but volunteers. We worked pleasantly and happily together, knowing that what we were doing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I am missing my old colleagues like Yong Taek Kim, Hyun Sun Kim, Hyun Young Nah, and Byung Rim You. We shared each other’s burden and worked co-operatively. Upon the arrival of the magazine every month, I sometimes think of the times when Professor Oh and the other members of ELA were faced with difficulties continuing the publication. After all these years, those moments have become priceless and treasured memories of good old days. Let’s get back to the story of seeds. Since my childhood, I have been particularly fond of the seeds of dandelions, pasque flowers, and milkweeds. I played with them, blowing them into the air and imagining how far they would fly, where they would land, and whether they would grow to be beautiful flowers. Living far away from my home country, I still see pretty dandelions in yellow and stand in great awe of the miraculous circle of life in nature. Like these beautiful wild flowers, I believe, ELA, the most prestigious publication of the industry, will spread around the world and continue its growth, in spite of any difficulties. In addition, it is time that landscape architecture paid more attention to its future development. It is not merely about the enhanced quality of design, but also about that of practice. Otherwise, I might be impossible to compete with other industries including architecture. A work of a landscape architect should be what others can never try to imitate, and it should be something extraordinary that can strike a chord in the hearts of the audience. It has to be touching and inspiring. What we are dealing with are soil and earth full of life, and what we are focused on are the sustainability of the limited amount of resources and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Therefore, the ecological footprints of landscape architects should contribute to conserving and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of Korea. As the atmosphere of the industry changes over time, the quality of practice is improved, and landscape architects continue to serve as invaluable professional in our society, ELA will have take its responsibility as the leading publication in the country. ELA should actively plays its role in broadening the horizon of landscape architects, and providing directions for the industry with guidance and insight.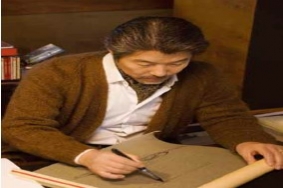 30300
30300 <환경과조경>의 3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의미 있는 일인지 알고 있기에 축하의 마음은 더욱 더 큽니다. 또한 오휘영 창간인께서 30년 동안 300호를 발행할 때까지 발행, 편집인을 하셨다는 것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그 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과조경>이란 이름으로 조경 잡지가 대한민국에 처음 선보였을 때에는 한국은 조경이란 학문이나 업역이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서로의 업무 구분이 확실치 않았던 때입니다. 조경은 설계만 하지 않고 시공을 겸하고 있든지 엔지니어링에 속한 한 부분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학교에만 계시던 오휘영 교수께서 잡지를 창간하셨을 때 사실 속으로 얼마나 이 책이 계속될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건축가와 문화·예술 관련자들이 잡지를 발간하고 또 연속되기를 바랐으나 많은 출판물들이 기억을 뒤로하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예술 사조와 건축 관련 이데올로기를 펼치기 위해 많은 선구자들이 희생으로 잡지를 발행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알렸으나 그 뜻을 지속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92년부터 월간으로 전환하기 전 까지는 격월간 내지는 계간으로 발간되었으며, 1996년 8월 통권 100호 기념호에서는 조경에서의 철학을 주제로 특집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잡지에서의 특집 발행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특히 기획하는 아이디어와 진행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조경이라는 특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도시문제와 전통 또는 신도시문제까지 넘나들며 전공자들과 일반인들의 시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가져왔으며 보이지 않는 행간 속에 녹아 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할 것입니다. 1996년 우수잡지 수상에 이어 2013년에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되어 그 진가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찰스 젱스가 디자인 한 정원을 <환경과조경>을 통해 보았고, 현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찰스 젱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기사들이 많이 있지만 나에게는 직접 활용한 경우여서 특별히 마음에 남습니다. 조경물과 건축물과의 구분, 조경가와 건축가의 구별 등의 예민한 마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작업하면서 별 문제 없이 활동하고 있으나, 일부 서로의 이해의 폭이 작은 사람들로부터 간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원래가 한 몸이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이런 갈등은 특히나 융·복합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서로가 맞고 틀림을 논하기보다 서로 다름과 더 잘 하는 부분을 찾아 배우며 공존·상생을 해야 합니다. 건축에 입문한 지 이제 40년이 되어가나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 느끼는 것은 한국건축이야 말로 조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류 문화가 바야흐로 전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가는 이 시점에 한국 조경과 건축의 단아함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때입니다. 다른 분야들이 전 세계도 좁다며 활약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조경, 건축계도 함께 손을 잡고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 전면에 <환경과조경>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영광이 <환경과조경>에 함께 하기를 빌며 오휘영 발행인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한국의 조경 발전에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의 독자로서 오랫동안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또 다른 30년 다음 300호를 기대합니다. I s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each and every member of Environment and Landscape Architecture of Korea on the occasion of its 300th issue. I am fully aware of how difficult it has been to keep providing such an invaluable publication, and I hope that you can enjoy every right to celebrate. In addition, Dr. Whee Young Oh, the founder of ELA has served as the editor and publisher of the magazine for the last 30 years, which is a real rarity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By the time ELA was first published in Korea, there were few people who understood what landscape architecture is mainly about, and there was virtually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that of conventional architecture. The industry was dealing with not only designs but also practices, considered as a small part of engineering in general. Frankly speaking, when I heard the news that Professor Oh had started publication, I wondered how long he would and could keep it going, for a number of architects and artists had already launched magazines and tried to continue publication only to find themselves in great discouragement, and among them were some renowned visionaries who strived to introduce art history and new ideas of architecture little known to the nation at the time. Before ELA became a monthly in 1992, it had been published either bimonthly or quarterly, and in July 1996, it celebrated its 100th issue with a special coverage on the role of philosophy in landscape architecture. It usually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create special editions of a magazin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coming up with innovative editorial ideas and taking care of the details of publication process. With its main focus on landscape architecture, ELA has dealt with a variety of subjects including the problems of urbanism, heritage, and issues of new town development, to name a few, meeting the needs of professionals and general public alike. The magazine has made a constant progress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and there must be much more contribution and dedication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an what meet the eye. It has been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ources of information for the industry, awarded several prizes for its top quality and resourcefulness. A few years ago, I read about the garden designed by Charles Jencks on the pages of ELA, and then visited the site myself. I was lucky enough to meet him in person and listen to his own explanation about the work. Of the numerous reports that I found interesting and informative, this is the most memorable in that it really helped me a lot in reality. Most people find it not so much difficult to create mutual understanding when dealing with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distinction between landscape architecture and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s and architects. There are, however, some individuals not willing to accept the different ideas and opinions of others, sticking to their own narrow point-of-views. Such an attitude is not welcome in this age of convergence. Co-existence is made possible when we try to learn from others and enjoy what diversity has to offer. Even though I have been working in the architectural industry for almost 40 years, I’ve still got plenty to learn. One thing I can be sure of is that architecture in Korea is so closely intertwined with landscape architecture. Korean pop culture has been taking the world by storm these days. It’s time that the Korean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took actions to introduce their elegant beauty to the world. I hope ELA can contribute to facilitat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industries in promoting themselves on the global stage. I wish you your continuing success, and strongly believe that Dr. Whee Young Oh and all the members of ELA will keep helping the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grow and develop in the future. Congratulations again and best wishes for another 30 years and 300 issues.
30300
30300 <환경과조경>의 3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의미 있는 일인지 알고 있기에 축하의 마음은 더욱 더 큽니다. 또한 오휘영 창간인께서 30년 동안 300호를 발행할 때까지 발행, 편집인을 하셨다는 것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그 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과조경>이란 이름으로 조경 잡지가 대한민국에 처음 선보였을 때에는 한국은 조경이란 학문이나 업역이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서로의 업무 구분이 확실치 않았던 때입니다. 조경은 설계만 하지 않고 시공을 겸하고 있든지 엔지니어링에 속한 한 부분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학교에만 계시던 오휘영 교수께서 잡지를 창간하셨을 때 사실 속으로 얼마나 이 책이 계속될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건축가와 문화·예술 관련자들이 잡지를 발간하고 또 연속되기를 바랐으나 많은 출판물들이 기억을 뒤로하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예술 사조와 건축 관련 이데올로기를 펼치기 위해 많은 선구자들이 희생으로 잡지를 발행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알렸으나 그 뜻을 지속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92년부터 월간으로 전환하기 전 까지는 격월간 내지는 계간으로 발간되었으며, 1996년 8월 통권 100호 기념호에서는 조경에서의 철학을 주제로 특집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잡지에서의 특집 발행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특히 기획하는 아이디어와 진행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조경이라는 특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도시문제와 전통 또는 신도시문제까지 넘나들며 전공자들과 일반인들의 시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가져왔으며 보이지 않는 행간 속에 녹아 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할 것입니다. 1996년 우수잡지 수상에 이어 2013년에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되어 그 진가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찰스 젱스가 디자인 한 정원을 <환경과조경>을 통해 보았고, 현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찰스 젱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기사들이 많이 있지만 나에게는 직접 활용한 경우여서 특별히 마음에 남습니다. 조경물과 건축물과의 구분, 조경가와 건축가의 구별 등의 예민한 마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작업하면서 별 문제 없이 활동하고 있으나, 일부 서로의 이해의 폭이 작은 사람들로부터 간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원래가 한 몸이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이런 갈등은 특히나 융·복합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서로가 맞고 틀림을 논하기보다 서로 다름과 더 잘 하는 부분을 찾아 배우며 공존·상생을 해야 합니다. 건축에 입문한 지 이제 40년이 되어가나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 느끼는 것은 한국건축이야 말로 조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류 문화가 바야흐로 전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가는 이 시점에 한국 조경과 건축의 단아함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때입니다. 다른 분야들이 전 세계도 좁다며 활약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조경, 건축계도 함께 손을 잡고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 전면에 <환경과조경>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영광이 <환경과조경>에 함께 하기를 빌며 오휘영 발행인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한국의 조경 발전에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의 독자로서 오랫동안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또 다른 30년 다음 300호를 기대합니다. I s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each and every member of Environment and Landscape Architecture of Korea on the occasion of its 300th issue. I am fully aware of how difficult it has been to keep providing such an invaluable publication, and I hope that you can enjoy every right to celebrate. In addition, Dr. Whee Young Oh, the founder of ELA has served as the editor and publisher of the magazine for the last 30 years, which is a real rarity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By the time ELA was first published in Korea, there were few people who understood what landscape architecture is mainly about, and there was virtually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that of conventional architecture. The industry was dealing with not only designs but also practices, considered as a small part of engineering in general. Frankly speaking, when I heard the news that Professor Oh had started publication, I wondered how long he would and could keep it going, for a number of architects and artists had already launched magazines and tried to continue publication only to find themselves in great discouragement, and among them were some renowned visionaries who strived to introduce art history and new ideas of architecture little known to the nation at the time. Before ELA became a monthly in 1992, it had been published either bimonthly or quarterly, and in July 1996, it celebrated its 100th issue with a special coverage on the role of philosophy in landscape architecture. It usually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create special editions of a magazin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coming up with innovative editorial ideas and taking care of the details of publication process. With its main focus on landscape architecture, ELA has dealt with a variety of subjects including the problems of urbanism, heritage, and issues of new town development, to name a few, meeting the needs of professionals and general public alike. The magazine has made a constant progress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and there must be much more contribution and dedication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an what meet the eye. It has been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ources of information for the industry, awarded several prizes for its top quality and resourcefulness. A few years ago, I read about the garden designed by Charles Jencks on the pages of ELA, and then visited the site myself. I was lucky enough to meet him in person and listen to his own explanation about the work. Of the numerous reports that I found interesting and informative, this is the most memorable in that it really helped me a lot in reality. Most people find it not so much difficult to create mutual understanding when dealing with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distinction between landscape architecture and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s and architects. There are, however, some individuals not willing to accept the different ideas and opinions of others, sticking to their own narrow point-of-views. Such an attitude is not welcome in this age of convergence. Co-existence is made possible when we try to learn from others and enjoy what diversity has to offer. Even though I have been working in the architectural industry for almost 40 years, I’ve still got plenty to learn. One thing I can be sure of is that architecture in Korea is so closely intertwined with landscape architecture. Korean pop culture has been taking the world by storm these days. It’s time that the Korean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took actions to introduce their elegant beauty to the world. I hope ELA can contribute to facilitat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industries in promoting themselves on the global stage. I wish you your continuing success, and strongly believe that Dr. Whee Young Oh and all the members of ELA will keep helping the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grow and develop in the future. Congratulations again and best wishes for another 30 years and 300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