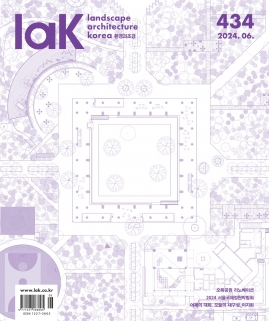![[크기변환]songpa 01.jpg](http://www.lak.co.kr/data/ebook_content/editor/20240605114558_uobywotf.jpg)
에피소드 1. 보조 바퀴 떼던 날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다 채점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시험지를 옆구리에 끼고 동네 카페에 앉았다. 사방팔방에서 정신을 두들겨 깨우는 진한 커피를 마시다 문득 생각이 난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따릉이가 보여서일까. 내 첫 ‘두발자전거’의 기억이다. 아직은 보조 바퀴에 의지해 동네를 오가던 시절, 어느 햇빛 좋은 일요일 오후. 내 자전거에서 보조 바퀴를 떼어내고 본연의 모습인 ‘삼천리 (두발) 자전거’를 타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끌고 ‘올림픽 프라자’로 향했다.
이상하게도 그 당시 올림픽공원은 멀다고 느껴졌었다. 아마 필자를 비롯한 동네 꼬마와 청소년에게 이곳 올림픽 프라자가 사실상의 어린이 체육공원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희한하게도 이 동네 상점가의 프라자조차도 거대한 광장, 오픈스페이스였다고 기억된다. 어릴 때라 모든 것이 크게 느껴졌다고 하기에는 팔다리의 길이적 변화가 크지 않으니 그저 성장에 따라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자.
프라자 한복판, 당시 막 서울에 들어왔던 (그리고 얼마 후 문을 닫은) 파파이스 앞에서 굳은 얼굴로 자전거에 올라탔다.
“아빠, 손 놓으면 안 돼요.”
“어, 절대 안 놓을게.”
“아빠, 진짜 손 놓지 마요.”
“안 놓는다니까.”
“진짜 놓으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말래도!”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가 눈치챘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미 양손을 놓고 뒷짐을 진 채로 바퀴를 굴려 멀어져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크게 프라자를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앞에서 허허 웃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던 그때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길로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며 함께 올림픽공원으로 향했다. 튜토리얼 끝. 이제 실전만이 남았다. 기세가 있을 때 완전히 익숙해져야 한다는 게 아버지의 지론이었기에, 무서움이 남아 있는 채로 침을 꿀꺽 삼키고 그 뒤를 따랐다. 차마 무섭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초등학생 시절이었기에(각주 1) 걱정을 속으로 삼키며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에 도착했다. 너무 힘을 꽉 주어 핏줄이 선 손으로 핸들을 부여잡고 크게 바퀴를 굴렸다.
![[크기변환]songpa 02.jpg](http://www.lak.co.kr/data/ebook_content/editor/20240605114620_grqaxmle.jpg)
![[크기변환]songpa 03.jpg](http://www.lak.co.kr/data/ebook_content/editor/20240605114620_wostkerf.jpg)
우리도 공원이 있다?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 이야기에는 필수적으로 88 서울올림픽에 관한 이야기가 동반된다. 1981년 독일 바덴바덴(Baden-Baden)에서 밀레니얼 직전, 소위 X세대를 비롯한 윗세대 한국인들에게 중요했던 순간. 제84차 IOC 총회에서 서울이 일본 나고야를 제치고 1988년 여름 올림픽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던, 옛날 뉴스 영상 짤에서나 본 그 장면이다.
1981년 발표를 시작으로 몇 년에 걸쳐 서울시의 도시 조직과 녹지 계획이 급변한다. 발표 직후 ‘올림픽새마을 7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됐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도시미화 버전이다. 대회가 코앞에 도달한 1985년에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시지부 주관으로 ‘범시민 손님맞이 및 도시공원화 새마을운동촉진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때 서울시는 친절함, 질서정연함을 시민들에게 요구하며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꿔진 서울의 참모습’을 외국에 보여주자는 내용을 역설했다.(각주 2) 아마 이 시기에 학교를 다니거나 전문 직군에 종사한 분이라면 직간접적으로 이 올림픽 열기에 동원됐을 것이라 짐작해 본다.
전반적으로 도시미화, 도시공원화, 건강도시 등의 슬로건이 혼합적으로 활용된 시기였음이 드러난다. 자연스럽게 겹쳐 떠오르는 시기가 있다. 바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던 문턱에서 영미권을 강타했던 ‘도시미화’ 이론이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에서 비롯된다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접해본 내용이다.
1982년 7월 올림픽공원 조성계획이, 이어서 9월에는 한강종합개발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이듬해에 올림픽공원 조성에 착공하고 국립경기장 단지의 계획에 대한 현상공모와 설계 용역이 진행됐다.3 저수로 정비나 올림픽대로 건설과 같은 인프라 건설은 물론, 온갖 크고 작은 공사가 우후죽순 진행되던 바로 그 시대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쯤에는 거의 모든 준비가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고 했던가.4 1986년 조성이 끝나 완공된 올림픽공원에서 관리 운영 방안을 고심하던 조경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마는데…….

* 환경과조경 434호(2024년 6월호) 수록본 일부
**각주 정리
1. 글의 전달성을 위한 거짓말이다. 사실 국민학생이었다.
2. “새마을운동 촉진대회”, 「매일경제」 1985년 4월 19일. www. mk.co.kr/news/economy/683095.
신명진은 뉴욕대학교에서 미술사를 공부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과와 협동과정 조경학전공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친 문어발 도시 연구자다. 현재 예술, 경험, 진정성 등 손에 잡히지 않는 도시의 차원에 관심을 두고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도시경관 매거진 『ULC』의 편집진이기도 하며, 종종 갤러리와 미술관을 오가며 온갖 세상만사에 관심을 두고있다. @jin.everyw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