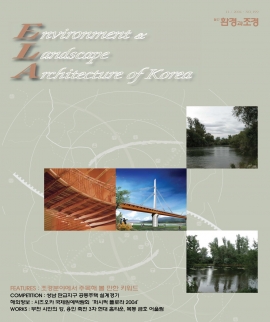계룡 갑사
갑사는 여느 다른 사찰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서 오랜 동안 기억에 남아 있던 사찰이었다. 강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적묵당과 진해당이 배치되어 길게 널려있었던 파사드가 참으로 기억에 남는 곳이었고, 특히 강당의 현판에 계룡갑사라 휘 갈려 놓은 강한 필체의 글씨가 그 맛을 더해주는 곳이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고찰 갑사의 옛 모습은 1970년대에 발간된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이란 이름의 한 사진집에 모두 여덟 장으로 간추려져 있다.
요즘 들어 절을 다녀온 사람들의 목소리는 둘로 나뉜다. 어디에고 옛 맛이 남아 있지 않아 씁쓸하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새로 잘 지어놓아 좋더라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주로 전자에 속하는 편이다. 옛 맛이 나는 것이 낡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새로 지었다 (혹은 새로 개보수 했다)고해서 반드시 옛 맛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못살던 시절에야 어차피 개보수하거나 확장을 할 여력이 없었으니 거의 옛 모습 그대로 지니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고 치면, 이러저러하게 근자에 크고 작은 개보수며 새로운 개발사업이 빈번해진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추이일수도 있다.
얼마 전,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절 들어오는 긴 진입부의 도로포장을 반대하여 그 사업을 않도록 조처했다는 일을 어느 일간지에서 읽은 적이 있다. 도로포장에 그치지 않고 산길을 넓혀 번듯한 차도를 내려는 추이에 반하여 이미 계획되어 있었을 사업을 굳이 마다한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새겨 보면 어떨까 싶은 것이다.
갑사 들어가는 길목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티나는 고찰을 찾는 기분으로 가 볼 수 있었던 작은 산사의 이미지를 지닌 곳이 드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최근에도 그런 느낌을 주는 곳들이 여전할까? 갑사 들어가는 길목에서 옛날의 사진과 비교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다.
지금의 갑사 들어가는 길과 옛 사진에 남아 있는 그 길을 두고 잠시 생각해 본 것은, 예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볼 기회가 없었을 요즘 세대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는 점이었다. 게 중에는 혹 절 들어가는 길목의 포장 같은 작은 일이 무슨 사찰의 원형훼손이니 원형보존의 문제니 하는 거창한 이야기꺼리가 되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찰의 원형이란 곧 사찰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것이고 그 이미지의 보존이란 것이 반드시 대웅전 일곽에 머물러 있는 절대적인 경관 가치로써 이야기될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간단히 생각하여, 갑사 들목에서는 그냥 바닥에 블록으로 깨끗하게 포장을 하여 걷기 편한 좋은 길을 마련한 것 외의 별다른 일은 없어 보인다. 변화는 결코 대대적인 개발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바닥 포장이라는 사소한 시설물 공사가 사찰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는 것임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략)
내 생각에는
사찰에는 바닥이든 석축이든 대개가 자연석 혹은 흙바닥이었다. 새로 포장을 한다거나 계단을 잘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사찰에는 잦은 개보수 작업이 생긴다. 반드시 옛 모습을 간직한 채 흙바닥이며 자연석으로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감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 그 해법을 자연스럽게 도출해 보려는 것이다.
쌍계사든 화엄사든 잘못된 것과 잘 처리된 것이 같은 경내에서 함께 하고 있었다. 문제점과 그 해답이 바로 인접하여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들은 근자에 이루어진 일이고 해답을 가진 것들은 보다 전 세월에 손질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한마디로 의견을 내 보이자면, 가능한 한 기존의 현황에 가깝게 (덜) 다듬어진 재료로 마감되어 갈 때 가장 어색하지 않은 마무리가 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산사를 찾았다가 몹시 씁쓸한 뒷맛을 안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옛 맛이 없다”고 하는 이면에는 기실 도시의 차도 변에 깔아 놓은 보도 불럭 같은 전통사찰의 바닥에서 비롯되는 그 아쉬움의 토로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정 기 호 Jung, Ki Ho·성균관대학교 건축·조경 및 토목공학부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댓글(0)
최근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