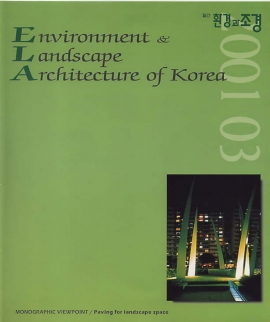박혔던 돌이 굴러온 돌에 치이다니
2000년 5월 연길에 다시 도착하니 봄색이 완연하였다. 지난겨울 지내기가 불편하여 잠시 귀국하였었는데 다행히도 도시를 메웠던 매연가스도 사라져 버린 후였다.
그 길로 연길시 도시계획국에 들러 기다리고 있던 프로젝트와 함께 설계원 직원 5명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이들은 꿈 많은 한창나이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느라 도무지 작업이 순조로울 수 없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대화도 나누어 볼 겸 필자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국경일을 택해 모처럼의 여가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성자산 산성(城子山 山城)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볼 것도 없는 야산을 왜 찾아야 하는지에 그들은 의아해 하는 것이다. 당초 이곳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고 있는 필자야 이러한 유적지에 대한 선택에 굳이 내색하고 싶지가 않아 결국은 이들 젊은이들을 안내하며 택시를 타고 찾는 수밖에 없었다.
산성은 고구려 때 세운 것이나 그후 발해, 요, 금시기까지 사용되다 포선만노(浦鮮萬奴)가 일으킨 동하국(東夏國)의 마지막 근거지였다.
현재 연길시를 가로지르는 부르하통하(만주어로 버드나무강)를 따라 동쪽 10㎞ 지점의 하류에서 해란강(느릅나무강)과 합수되는 이곳은 금나라 말년인 1215년에 요녕성 요양에서 대진국(大眞國)을 세웠다가 후에 연변지역으로 옮겨온 동하국의 남경성(南京城)인 것이다.
삼면의 절벽이 마치 말발굽 모양으로 안쪽의 분지를 에워싸고 있어 천혜의 요새를 이루고 있는데 산성뒷쪽의 소영자촌(小營子村)이란 곳에서 능선을 넘어 거의 산을 2/3정도 돌아야 입구를 만나게 된다.
도문까지의 철도변 조선족 마을로부터 진입하게 되었는데 네 개의 성문자리중 남동향의 좁은 골짜기가 중심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성벽은 능선을 따라 4454m에 이르고, 흙과 돌로 혼축된 산성안의 내부 구릉자리가 궁전터였던 듯 옥수수밭과 채전에는 각종기와나 옹기조각, 동전 등이 널려있었다.
거의 성터 중심지인 소나무 숲에 이르자 조선족 청년들과 더위를 식히며 옛사람들의 터를 잡는 지혜와 성의 내력을 설명하니 그들은 매우 놀라운 표정들이었다.
특히 강 건너 마을이 고향이라는 젊은이는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들은 바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었는데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어떻게 지역의 역사까지 파악하고 있는가에 의구심의 시선을 떨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야 이곳에서 태어나서 중국의 교육관으로 자랐기에 객관적인 역사를 판단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구려, 발해국이 우리민족의 터전이었음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주민족이 아니라 당연한 정착민의 긍지로서 옛 터전에 대한 책임감이 무거워야 할 것이다."라는 강조와 함께 "한국사람들이 이곳 연변지역을 힘들게 찾는 이유중의 하나는 백두산 관광이라는 요란스러운 행세보다도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와 터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니 올바른 역사관으로 가꾸어 주기를 부탁한다."라는 완곡한 격려의 말로 함께 찾은 이유를 설명하였다.
오늘날 중국에서 주시하고 있는 미묘한 민족갈등을 건드리기도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굴러 들어온 돌에 박혔던 돌이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현실을 그대로 좌시할수만도 없으니 그저 터전에 대한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장태현 Jang, Tae Hyun·청주대학교 환경학부 조경학전공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댓글(0)
최근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