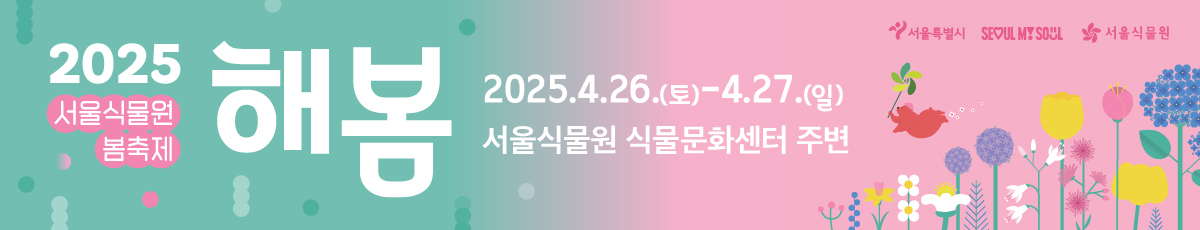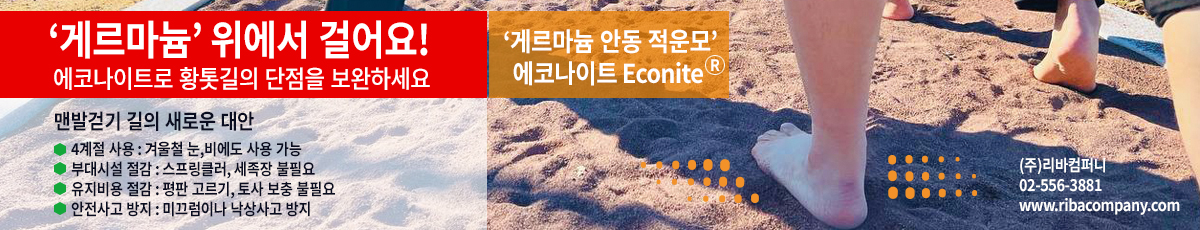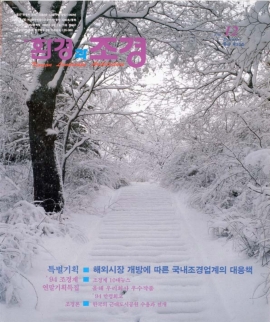고대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고구려 문화유적지는 언제나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미참 북경에서의 학술회의를 마치고 연변에 들렀을 때 백두산 및 이도백하진(二道白河鎭)에서 통화(通話) 경유 심양(瀋陽)으로 출발하는 야간열차가 있어 이를 이용하기로 결심하였다. 중국에서의 장시간 기차여행에 심각할 정도로 건강이 상했던 경험이 있어서 선뜻 내키지 않았으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다시 찾기 힘든 오지(奧地)에다 그동안 중국문화를 찾아 헤메면서도 당연히 우리의 것을 늦게 찾는데 대한 자책감이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고구려 유적의 유감 선조들의 기상과 기개를 감개무량하게 대하면서도 왜곡된 역사관에 의한 현지 안내인 설명이나 알량한 상품전시로 전락된 허술한 관리를 보자하니 그 육중했던 돌 무게에 가슴을 눌린듯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시대에 따라 영토와 거주민은 바뀔 수 있지만 고구려는 중국사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항의하였더니 북경에서부터 동행했던 안내양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북경대학 사학과를 종업했다는 그녀 역시 오로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의 젊은이었다. 답답한 심정을 압록강변 강뚝에 앉아 흐르는 물에나 씻어 버려야지 어찌 이곳에서 교육받은 그들을 탓할 수 있을까 보냐. 강건너 만포시의 아름다운 산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온다. 강건너 부터라도 우리의 땅이라고 가슴속에 다짐하여 보지만 역사보다 더욱 착잡한 오늘의 현실을 모르는 듯 압록강은 유유히도 흐르고 있었다. -발해(渤海)의 유지(遺址)들 일찍이 중국 동북(東北)에 웅거하면서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불리던 발해국은 지금의 연변(延邊)지방 여러곳에 많은 유지와 문물을 남기고 있었다. 돈화현(敦化縣) 돈화시 남쪽 교외에는 제1대 국왕이었던 대조영(大祚榮)이 건국한 도성(都城)이 자리잡고 있다. 오동성(敖東城) 동으로는 목단강에 이르고 북으로는 발해의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 ; 지금의 흑룡강성 영안현 동경성)로 통하는 길목에 있어 지리적 위치가 매우 좋은 곳이다. 오동성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성산자산(城山子山)은 발해건국(698)의 정황을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는 「구당서(舊唐書)?의 기록에 따른 동모산(東牟山)으로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상해시(上海)의 근대사(近代史) 흔적 힘들게 물어물어 당시를 기억하는 어느 중국 노인의 안내로 현장을 찾았으나 1956년도에 조성되었다는 노신(魯迅) 묘원(墓園)만 기다리고 있었다. 8월 15일을 기억하며 의미있게 찾았었는데 초개 같이 젊은 목숨을 던진 그에게는 조그마한 판자조각의 기념표지 하나 없었다. 윤의사의 피맺힌 한숨소리가 뒤로 들리는데 새삼 만주군관학교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후 93년도 여름에는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찾은 일이 있었다. 어느 좁은 골목으로 돌아들어가면 낡고 좁은 주택가에 청사로 썼었다는 3층 건물이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서민용 연립주택이었다. 이곳이 마당로(馬當路) 306의 4호인 임시정부청사이다. -조선족들의 민속 명절놀이등 음력 세시풍속은 거의 상실한채 양력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어린이날에 해당하는 6월 1일과 광복절을 대신하기 위한 노인절, 연변자치주 창립기념일인 9.3절을 우리의 추석과 같이 성대하게 즐기고 있다. 이러한 날에는 주로 집단군무로서 이질문화(異質文化)에 저항감을 나타내거나 경로회 성격의 민속놀이들로서 민족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이 된다. 중국이 추석을 명절로 지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추석날 틈을 내어 성묘를 하고는 곧 일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적으로 화장(火葬)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매장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두산에 대한 소고 90년도 8월 11일 처음으로 천문봉에 올랐을 때의 가슴터질 듯한 감격속에는 그러한 분할과정을 되씹어 볼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새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91년도 ‘세계 한민족 과학자 대회’ 연길 행사 때 북한 학자들과 함께 오르기로 약속되었으나 어느 사유였는지 8월 23일 우리 대표들만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 그들은 장백폭포를 지나 천지에 올랐었다는데, 아마도 그들은 천지의 분할과정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하였는지 참으로 의미있는 시간을 놓치게 되고 말았다. 그 후 금년 여름까지 연이어 올랐었으나 별다른 감흥도 없었고 처음 올라 탄성을 지르는 한국 관광객을 이상한 듯 주시하는 국경경비대의 모습이 오늘의 현실을 일깨워 주고 있을 뿐이었다.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남쪽 삼지연에서 올라이곳 장백폭포에 몸을 적실 수 있을까? 7천만이 함께 목욕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천지, 오늘도 우렁찬 폭포 소리는 우리 민족을 부르고 있는 듯 오랜 시간 발걸음을 멎게 한다.
※ 키워드 : 고구려 유적, 발해의 유지, 상해시, 조선족, 백두산
※ 페이지 : p126~p132
-고구려 유적의 유감 선조들의 기상과 기개를 감개무량하게 대하면서도 왜곡된 역사관에 의한 현지 안내인 설명이나 알량한 상품전시로 전락된 허술한 관리를 보자하니 그 육중했던 돌 무게에 가슴을 눌린듯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시대에 따라 영토와 거주민은 바뀔 수 있지만 고구려는 중국사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항의하였더니 북경에서부터 동행했던 안내양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북경대학 사학과를 종업했다는 그녀 역시 오로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의 젊은이었다. 답답한 심정을 압록강변 강뚝에 앉아 흐르는 물에나 씻어 버려야지 어찌 이곳에서 교육받은 그들을 탓할 수 있을까 보냐. 강건너 만포시의 아름다운 산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온다. 강건너 부터라도 우리의 땅이라고 가슴속에 다짐하여 보지만 역사보다 더욱 착잡한 오늘의 현실을 모르는 듯 압록강은 유유히도 흐르고 있었다. -발해(渤海)의 유지(遺址)들 일찍이 중국 동북(東北)에 웅거하면서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불리던 발해국은 지금의 연변(延邊)지방 여러곳에 많은 유지와 문물을 남기고 있었다. 돈화현(敦化縣) 돈화시 남쪽 교외에는 제1대 국왕이었던 대조영(大祚榮)이 건국한 도성(都城)이 자리잡고 있다. 오동성(敖東城) 동으로는 목단강에 이르고 북으로는 발해의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 ; 지금의 흑룡강성 영안현 동경성)로 통하는 길목에 있어 지리적 위치가 매우 좋은 곳이다. 오동성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성산자산(城山子山)은 발해건국(698)의 정황을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는 「구당서(舊唐書)?의 기록에 따른 동모산(東牟山)으로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상해시(上海)의 근대사(近代史) 흔적 힘들게 물어물어 당시를 기억하는 어느 중국 노인의 안내로 현장을 찾았으나 1956년도에 조성되었다는 노신(魯迅) 묘원(墓園)만 기다리고 있었다. 8월 15일을 기억하며 의미있게 찾았었는데 초개 같이 젊은 목숨을 던진 그에게는 조그마한 판자조각의 기념표지 하나 없었다. 윤의사의 피맺힌 한숨소리가 뒤로 들리는데 새삼 만주군관학교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후 93년도 여름에는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찾은 일이 있었다. 어느 좁은 골목으로 돌아들어가면 낡고 좁은 주택가에 청사로 썼었다는 3층 건물이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서민용 연립주택이었다. 이곳이 마당로(馬當路) 306의 4호인 임시정부청사이다. -조선족들의 민속 명절놀이등 음력 세시풍속은 거의 상실한채 양력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어린이날에 해당하는 6월 1일과 광복절을 대신하기 위한 노인절, 연변자치주 창립기념일인 9.3절을 우리의 추석과 같이 성대하게 즐기고 있다. 이러한 날에는 주로 집단군무로서 이질문화(異質文化)에 저항감을 나타내거나 경로회 성격의 민속놀이들로서 민족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이 된다. 중국이 추석을 명절로 지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추석날 틈을 내어 성묘를 하고는 곧 일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적으로 화장(火葬)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매장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두산에 대한 소고 90년도 8월 11일 처음으로 천문봉에 올랐을 때의 가슴터질 듯한 감격속에는 그러한 분할과정을 되씹어 볼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새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91년도 ‘세계 한민족 과학자 대회’ 연길 행사 때 북한 학자들과 함께 오르기로 약속되었으나 어느 사유였는지 8월 23일 우리 대표들만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 그들은 장백폭포를 지나 천지에 올랐었다는데, 아마도 그들은 천지의 분할과정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하였는지 참으로 의미있는 시간을 놓치게 되고 말았다. 그 후 금년 여름까지 연이어 올랐었으나 별다른 감흥도 없었고 처음 올라 탄성을 지르는 한국 관광객을 이상한 듯 주시하는 국경경비대의 모습이 오늘의 현실을 일깨워 주고 있을 뿐이었다.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남쪽 삼지연에서 올라이곳 장백폭포에 몸을 적실 수 있을까? 7천만이 함께 목욕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천지, 오늘도 우렁찬 폭포 소리는 우리 민족을 부르고 있는 듯 오랜 시간 발걸음을 멎게 한다.
※ 키워드 : 고구려 유적, 발해의 유지, 상해시, 조선족, 백두산
※ 페이지 : p126~p132
댓글(0)
최근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