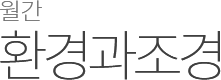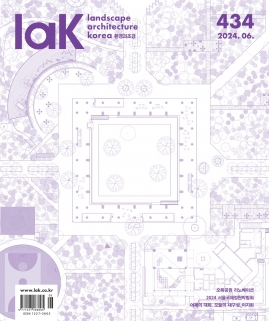‘도시-지역을 위한 지도책(Atlas For a City-Region)’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의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의 북아일랜드 사이 국경 지대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프로젝트다. 이 국경 지대는 EU와 영국 사이의 유일한 육상 국경이다.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GSD의 비평적 조경 디자인 연구소(Critical Landscapes Design Lab)가 진행한 이 연구는 영국 북아일랜드의 데리(Derry) 시와 스트라반(Strabane) 지방 자치구 의회, 그리고 아일랜드 공화국의 도니골(Donegal) 자치 의회가 공동 후원했다.
이 지도책은 아일랜드 섬의 북서 지방 풍경이 브렉시트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현실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해본 결과물이다. 하버드 GSD의 조경학과 수업과 국경 양쪽의 현지 조사에 기반을 둔 이 연구는 어떻게 풍경이 초국경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국경은 선이 아닌 풍경이다. 미래는 마을 사이의 연결망이나 조각보 같은 땅의 무늬처럼 풍경을 만들어내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브렉시트의 파급 효과, 기후 변화의 장기적 영향, 그리고 인구 변화는 이 국경 풍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적절한 계획과 디자인이 절실하다. 미래에 대한 상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도책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일랜드 북서부에 초超국경지역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 지역을 어떻게 지도로 그릴 것인가? 그리고 향후 200년 동안 그 지역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세 편의 글로 다루고자 한다. 휴대 가능한 전시로 디자인된 이 지도책은 초국경지역의 증거를 제시하고, 지도로 보여주며, 어떻게 경관이 북서부 지역의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는 데 유용한지 보여준다.
![[크기변환]Fig01-1.jpg](http://www.lak.co.kr/data/ebook_content/editor/20240605145300_pelwxikt.jpg)
![[크기변환]Fig01-3.jpg](http://www.lak.co.kr/data/ebook_content/editor/20240605145312_nqgrcrmg.jpg)
배경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국민 투표를 했을 때부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 초국경지역은 브렉시트의 위기와 기회에 직면했다.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국경 통제의 자유였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은 영국과 EU 사이의 유일한 육상 국경으로 브렉시트 협상 지연의 원인이었다. 이 국경은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 수립 이후 언제나 아일랜드와 영국 정치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다. 많은 이가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과 EU 사이의 국경 폐쇄가 과거 트러블 시기(각주 1)로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던 이 시기는 1998년 양 지역 사이의 국경을 개방하기로 한 ‘굿 프라이 데이 협정’으로 끝났다. 분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에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서 북아일랜드 주민의 다수, 특히 북아일랜드 서부 지역 주민은 EU에 잔류하기를 선택했다.
오늘날 국경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며 오직 작은 방지턱이나 도로 표면의 질감 변화만이 국경의 존재를 드러낸다. 초국경지역의 주민은 공공 서비스, 식품, 사회 기반 시설, 일상생활, 공간 패턴을 국경을 넘어 공유하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 풍경은 종종 ‘영국-아일랜드’로, 때로는 ‘천주교-개신교’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 풍경 속에는 영국인, 아일랜드인, 얼스터-스코틀랜드인뿐만 아니라, 바이킹, 노르만, 비잔틴, 그리고 최근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드, 수단, 시리아에서 온 노동자, 학생, 난민의 정체성도 표현되고 있다.
땅의 무늬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 토지 이용, 그리고 사람들의 포부와 소망의 기록을 읽고 그 위에 새로운 형태를 가늠해볼 수 있다. 초원의 경계에 자라는 생울타리는 무시하기 쉽다. 그 오래된 덤불과 배수로가 사회적, 경제적 복지와 개발과 딱히 관련 있어 보이진 않을 테니까. 사실 그 생울타리는 아일랜드 시골 풍경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적 통로일 뿐만 아니라 토지 재산의 경계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중요한 장치다.
얼스터-스코틀랜드 시 정체성의 상징이며 최근 200~300년 사이에 도입된 상대적으로 새로운 풍경 요소다. 초원의 크기와 생울타리 관리 정도는 그 주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시사한다. 필자는 현지에서 정돈된 생울타리는 대체로 기독교인의 것이며 천주교 신자들의 것은 대체로 덜 정돈되어 있다는 말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 그 지역의 향후 개발이 무엇이든 그 형태는 바로 생울타리로 정의된 땅 속에 있을 것이다.
한편 아일랜드 공화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더블린이나 코르크, 리머릭, 골웨이 같은 도시들은 이미 포화 상태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 국경 지대에 150만 명이 사는 도시를 제안하는 것은 공상이라 할 수 없다. 현재 700명의 인구가 전부인 킬리아 마을은 북아일랜드의 데리-런던데리 시, 아일랜드 공화국의 레터케니 시 사이의 고지대에 있다. 50년 이내로 킬리아 마을은 지역의 새로운 수도가 될지도 모른다.(각주 2)
브렉시트와 인구 변화로 인한 풍경의 변화도 분명하지만 기후 변화는 더 큰 위협이다. 이 지역은 50년 이내에 강수량이 줄고 지중해성 기후가 될 것이다. 북서부 지방에서 감자 재배는 어려워질 것이고, 대신 오렌지와 감귤류가 새로운 작물이 될 것이다. 기후 변화를 고려했을 때, 새로운 방식의 일과 삶의 형태를 상상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경을 선이 아닌 풍경으로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장기적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각주 3)
![[크기변환]Fig02.jpg](http://www.lak.co.kr/data/ebook_content/editor/20240605145328_vdhekfql.jpg)
* 환경과조경 434호(2024년 6월호) 수록본 일부
**각주 정리
1. 역주. 1960년대 후반부터 1998년까지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의 북아일랜드 간의 분쟁.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남아있기를 바랐던 영국 통합론주의자와 합병을 지지하는 북아일랜드인, 그리고 영국을 떠나 통일 아일랜드 공화국을 바랐던 아일랜드 독립주의자와 공화당원 간의 갈등으로 약 3,500명이 죽었다. 이 중 민간인이 52%였다. Malcolm Sutton, “Sutton Index of Deaths– Status Summary”, Conflict Archive on the Internet,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4 August 2015, Retrieved 31 August 2012.
2. 더 많은 아일랜드 인구 통계는 다음을 참고. www.cso.ie/en/releasesandpublications/ep/p-plfp/populationandlabour forceprojections2017-2051/populationprojectionsresults/ (2020년 4월 1일 접속)
3. Gareth Doherty and Pol Fité Matamoros, “From Line to Landscape: The Irish Northwest Border Region”, Architectural Design 263, pp.100~105.
게럿 도허티(Gareth Doherty)는 하버드 GSD 조경학과 교수이며, 아직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조경의 내러티브와 그 실체를 탐구하고 풀어낸다. 그는 경관 현지 조사(landscape fieldwork)라고 부르는 현장 중심 연구 방법을 통해 복합 경관에서 사람과 환경을 핵심 요소로 다룬다. 본 연재의 번역을 맡은 강준호는 하버드GSD를 졸업한 뒤 도허티의 비평적 조경 디자인 연구소(Critical Landscapes Design Lab)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현재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