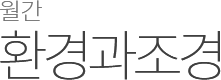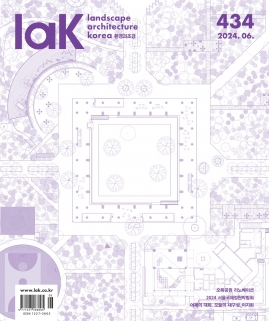공원의 크기를 실감하고 싶다면 걷기를 추천한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린 뚝섬한강공원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한강공원이다. 출근 지하철이 한강 위를 가로지를 때마다 내려다보이던 곳이라 그리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공원이 이렇게나 넓은 줄 몰랐다. 박람회를 운영하다 보면 공원 곳곳을 오가야 하는데, 저 끝으로 와달라는 무전이 오면 등줄기를 따라 땀이 흘렀다. 그러다 보니 하루 걸음 수가 3만 보를 넘기 일쑤. 직원 모두 앉을 곳만 보이면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옮기게 됐다.
그래서인지 이번 박람회 현장에서 제일 탐났던 건 정원도, 식물도, 정원 작업 용품도 아닌 의자였다. 말랑말랑해서 손에 감기는 느낌이 좋고, 몸을 아무렇게나 늘어뜨려도 푹신하고, 가벼워 이리저리 움직이기 쉬우며, 눈이 시리게 쨍한 핑크빛 의자 말이다. 박람회장 메인 무대를 비롯해, 잔디밭, 산책로 주변 곳곳에 놓여 있던 의자의 정체는 서울시 ‘펀 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든 ‘폼앤폼(Form&Form)’이었다. 산업 디자인 스튜디오 BKID가 만든 이 의자는 100% 재활용할 수 있는 발포폴리프로필렌(EPP)으로 만들어졌다. 의자의 본질적인 역할인 ‘앉는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자세를 하나의 형태(form)로서 그 자체를 제품 형태에 반영하고 했습니다. 특히 야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자들에 앉아 있는 모습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었습니다. 한편 ‘앉다’라는 단어는 그 행동 자체를 정의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휴식’이라는 개념도 지니고 있는데요. 따라서 휴식을 취하는 다양한 자세들을 관찰하고, 이를 하나의 제품 형태로 나타내고자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자는 싯(Sit), 린 하이(lean High), 린 로우(Lean Low) 세 가지 높이로 구성했습니다.”(각주 1) 박람회장에 놓였던 의자는 린 하이였는데, 제품을 다 보고 나니 계단 형태의 공간에 놓고 쓰기 좋은 린 로우가 탐났다.
우연처럼 비슷한 글을 이번호 잡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우선 김영민과 김영찬의 ‘앉는 정원’. 설계설명서에서 만난 문장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다.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정원은 쉼의 정원, 즉 앉는 정원이다. 뚝섬한강공원 잔디밭에서 본래 이루어지던 쉼의 행태와 동행하며, 그중 ‘앉기’에 집중해 쉼 속에서 다양한 앉음이 펼쳐지는 정원이다.” “공원의 쉼 중, 앉는 행위는 쉼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눕기, 앉기, 서기) 중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된다. 눕기와 서기 사이에는 다양한 종류의 앉기 방식이 나타난다. 이는 눕기와 서기의 행위가 한정적이기도 하나, 외부 공간에서 앉아 있기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자세한 내용은 36쪽)
쉼의 본질은 무엇일까. 박승진은 쉬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공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고심하고 그것은 바로 앉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걷는 것은 속도와 방향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목적이나 목표가 분명하다. 앉는다는 것은 걸음을 멈춰야만 할 수 있는 원초적 행동이다.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행위다.”(18쪽)
박람회를 찾아온 사람 대부분은 어깨에 큰 가방을 메거나 인근 피크닉 용품 대여점에서 빌린 카트에 짐을 가득히 싣고 나타났다. 돗자리파, 텐트파, 테이블 세트파 등 유형이 다양했지만, 그중 가장 자유로워 보인 건 폼앤폼을 들고 원하는 곳에 옮겨 앉은 사람들이었다. 해가 위치를 바꿔 그늘이 사라지거나 버스킹 공연이 시작되어도 살짝 이동하면 그만. 박승진이 선유도공원과 오목공원에서 목격했다는 장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당시 선유도공원이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의자를 원하는 곳으로 이리저리 옮기며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후 벤치가 모두 고정되었지만 잠시나마 시민들이 벤치를 자유롭게 활용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부터 공원에 의자를 왜 붙박이로 해놔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다.”(28쪽)
나도 이제 붙박이 벤치가 없는 공원을 상상한다. “공원은 극장이 아니므로 한쪽만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없다. 혼자도 오고 여럿이 함께 오기도 하기에, 따로 또 같이 앉을 수 있으면 좋다. 무리를 등지고 앉을 수도, 서로를 바라보고 앉을 수도 있어야 한다.”(18쪽)
**각주 정리
1. 이정훈, “산업 디자인 스튜디오가 만든 친환경 공공의자, 폼&폼”, 「디자인+」 2024년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