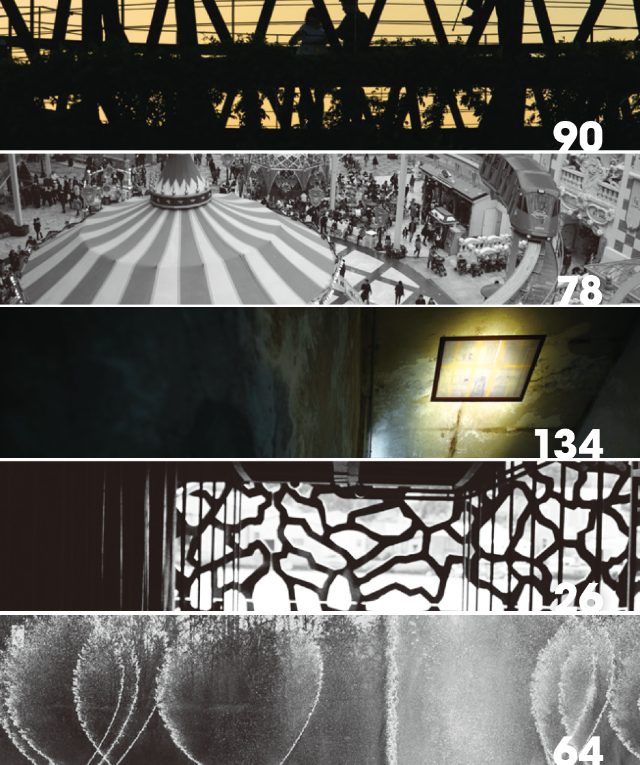
“공원엔 잘 가지 않고 산에 다닌다”고 답하고 나서 몇 초 후에 자주 다니는 도봉산이 국립‘공원’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또 다시 몇 초 후 집 근처에 벤치와 간단한 운동기구, 분수, 연못 등이 있는 곳이 ‘초안산근린공원’이라는 사실도 떠올랐다. 거의 매일 걷기 위해 가는 중랑천변 산책로도 어쩌면 공원일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공원에 자주다녔고 공원 가까이에 살고 있는데 왜 공원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는지 스스로 물었다.
나름의 답은 공원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는 것. 우선 공원이라고 하면 큰 규모의 인공 조림이 떠올랐고, 여의도공원이나 선유도공원 또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은 곳이 생각났다. 하지만 여의도공원은 가본 지 20년이 넘었고(그러니까 그땐 여의도광장이던 시절), 선유도공원은 5년이 넘었고, 뉴욕엔 가보지도 못했다.
공원에 대한 선입견은 하나 더 있다. 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인다는 것. 70대 할아버지가 농구복에 헤어밴드까지 하고 신중하게 드리블을 하다가 슛은 지나가는 사람이 제일 많을 때를 골라쏜다. 통 넓은 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30대 여성이 철봉에 매달려 발을 버둥거린다. 길게 매달리지 못하고 이내 떨어지지만 한번 키득거리면 그만이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노부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강아지가 예쁘다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표정이다. 돗자리를 깔고 싸온 음식을 먹는 커플은 그 시간, 그 장소에 같이 있는 것에 만족하는 표정이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치들은 관심과 무관심의 적절한 조화를 찾고 있다. 무관심한 표정은 매사에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오지랖이나 주책으로 보이기 십상인 것을 알고 있다. 분수대에서 놀든 공을 차든 모두 편안하고 여유 있어 보인다. 집 근처 초안산근린공원의 풍경이다.
여유로운 모습은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남들 보라고 일부러 짓는 표정이나, 단순한 선입견이 아닌 공원이 주는 표정이다. 공원이 있기에 생기는 여유다. 나무, 꽃, 잔디, 분수, 벤치, 간단한 운동기구가 주는 표정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젊음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되고, 몸을 움직여 보고 싶은 마음이 되고, 남들에게 관심을 주고 싶은 마음이 되는가 보다. 공원은 이런 이유로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규모에 상관없이….
집 근처 공원에 갈 땐 어떤 옷을 입을지, 뭘 신을지 고민하게 된다. 모두가 여유로워 보이는 공원에 맞는 차림을 하고 싶어서 신경을 쓴다. 운동복 광고지에 나오는 여자처럼은 입지 않되 어쩐지 활동적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여자처럼 입으려 노력하고, 공원에 나가면 이번엔 표정이 신경 쓰인다(사람이 많은 곳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의식하는 것은 직업병이다). 공원과 날씨에 어울리는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은은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천성이 아니라, 괜히 혼자 퉁명스러운 표정이 된다. 도대체가 공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라고 혼자 생각한다. 공이나 훌라후프라도 들고 나왔어야 한다고 후회할 때도 있다. 그래서 산에 간다.
산에 갈 땐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표정이 없다. 뭘 입을지 뭘 신을지 고민하지도 않는다. 그냥 가장 편안한 옷과 신발, 물 한 통이면 그만이다. 도봉산에 가는 날은 주로 평일 낮이라 산을 오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있다고 해도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어딘가 앉아서 누군가를 쳐다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저 발 디딜 곳을 쳐다보거나 멀리 있는 봉우리를 간간히 보며 걷는다.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하다. 몸이 가벼울 땐 도봉산정상인 자운봉까지 가지만 주로 우이암이라는 봉우리까지 쉬지 않고 걷는다. 우이암에는 나만의 자리가 있다. ‘숨자’라고 이름도 붙여 두었다(‘숨은 자리’라는 뜻이다). 숨자는 무심코 지나치면 보이지도 않는, 한 사람의 엉덩이만큼의 빈 공간이다. 다리는 펼 수 없고 아래는 낭떠러지다. 다리를 접어 턱밑으로 바짝 당겨 앉아서 의정부, 상계동, 노원 등의 동네를 내려다본다. 가져간 물을 마시고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으면 참 좋다. 바람이 시원하고 눈앞이 시원하다. 숨자에는 바람이 잘 지나가서 땀도, 근육의 피로도 금세 날아가 버린다. 혼자 산에 오르게 하는 어떤 집착도 잠시나마 날아가고 몸과 마음이 뽀송해 진다. 그럴 때, 숨자에서 혼자서 바람을 맞고 있을 때, 내 표정이 어떤지 모른다. 미간은 펴지고 눈은 평소보다 가늘어지고 볼이나 턱은 밑으로 쳐지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지 않을까 싶다. 아니면 바람이 당겨줘서 눈 코 입이 평평하게 펴져 있지는 않을까? 숨은 자리에 자주 가고 싶은 걸 보면 본적 없는 그 표정을 제일 편안하게 느끼는 듯하다. 공원엔 가고 싶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숨을 수 있는 빈 공간이 많은 공원이 있는 건 어떨까? 산에 가보면 자신만의 자리에서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누워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공원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나 혼자는 아닌 듯하다. 공원이 공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빈 공간이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에게 평일의 국립‘공원’을 추천한다. 평일에 못가는 사람들은 주말 오후 3시 넘어서 가면 한적한 곳을 발견할 수 있다. 그곳에서 남들도, 자신도 모르는 표정 하나를 발견해 보는 것도 공원이 주는 즐거움일 듯하다.
윤진성은 스무 살부터 연기를 하고 있다. 마흔을 넘기고는 여기저기서 연기 워크숍 강사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일 년의 반 정도 일을 하고, 일이 없을 땐 도봉산 국립공원, 수락산(거의 국립공원 수준이다), 관악산, 제주도의 한라산 국립공원 언저리를 오르거나 걸으며 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