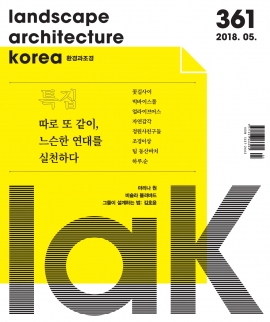도시에 대한 지배적 인상은 대개 사람의 눈높이 근처에서 만들어진다. 작은 화분 하나, 닳은 문고리 한 짝, 계단 난간의 유려한 선이나 담뱃재를 떠는 휴지통 모양의 영리함에서, 혹은 미술관 리플릿이 놓인 책장이나 쉼터의 벤치, 동네 술집의 아담한 간판에서 우리는 한 도시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성취해 낸 문화적 수준을 느낀다. 거대한 건축물이나 도로는 세계화된 자본과 권력의 의지를 통해 단시일내에도 이식될 수 있지만, 전능한 자본의 물결도 습관의 층과 결이 배어든 수천수만 가지의 일상적 오브제까지 적실 수는 없다. 어느 나라의 고속 전철도 속도는 비슷할지 몰라도 객실 의자의 팔걸이와 테이블의 부드러움, 쿠션의 지지력에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작가와 장인들이 쌓아온 노력의 세월, 실력의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디테일, 그리고 딱 그만큼의 사회적 눈높이가 쌓여 물건은 기쁨의 대상이 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사랑스런 경관이 된다.
우리는 어떤 문제든 돈으로 사서 해결하는 데 익숙해져 버렸다. 너무 쉽게 버리고 갈아치우는 시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다는 광고성 문구가 이상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다. 부엌은 셰프의 주방이 되어야 하고, 침실은 특급 호텔 같아야 하고, 거실은 쇼룸이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수많은 디자인 매체가 부추긴다. 인테리어 데코 상품을 파는 사람은 스스로를 라이프스타일 디렉터라 칭한다. 남이 정의해 준 멋을 스스로 찾아낸 것이라 착각하며 물건에 치여, 스타일에 치여 사느라 다들 피곤하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습관적인 고급 지향, 틀에 박힌 데코, 현실과 불일치한 책상머리의 허세가 거리를 꽉꽉 채워진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다는 개탄이 적지 않다. 잘 만든 하나보다는 형편없는 다량이 비좁게 들어찬 도시. 이제, 기름기 걷어내는 도시의 재편이 절실하다. 소박하고 영리하며 지적인 길과 광장. 현명한 사람이 꾸민 집처럼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디자인. 요즘 가장 잘 나간다는 가구 디자이너 박길종이 어떤 잡지에서 툭 뱉은 한마디가 마침 눈에 들어왔다. “사용하는 게 있으니까, 새로 만들 필요도 없구요.” 물건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물건을 자기 삶의 기준에 맞게 만들 수 있는 흔치 않은 디자이너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 소개된 그의 집 또한, 인테리어가 없는, 그냥 ‘집’이었다. ...(중략)...
* 환경과조경 361호(2018년 5월호) 수록본 일부
최이규는 1976년 부산 생으로 뉴욕에서 10여 년간 실무와 실험적 작업을 병행하며 저서 『시티오브뉴욕』을 펴냈고, 북미와 유럽의 공모전에서 수차례 우승했다. UNKNP.com의 공동 창업자로서 뉴욕시립미술관, 센트럴 파크, 소호 및 대구, 두바이, 올랜도, 런던, 위니펙 등에서 개인전 및 공동 전시를 가졌다. 현재 계명대학교 도시학부에 생태조경학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울산 원도심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