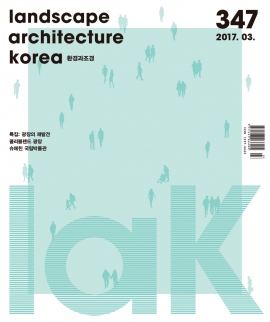2월 초, 결정 장애가 있는 난 고민에 빠졌다. J는 양양의 겨울 바다와 평창의 자작나무숲, 그리고 시골 찻집으로 이어지는(실은 양양의 회와 평창의 바비큐, 그리고 늦은 아침의 곤드레밥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1박 2일 코스를 제안했다. 보다 못한 K는 “여행은 다음에 가고 함께 광화문에 갑시다”라며, 나의 고민에 매듭을 지어 주었다. 그렇게 그 주 토요일 오후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겨울 연일 어이없는 뉴스가 쏟아지고 광화문에서는 촛불이 타오르는데, K와 나는 논문을 쓰겠다고 책상에 앉아 답답한 마음만 꾹꾹 누르고 있었다. 우리가 앉아만 있어서 되겠냐. 아니다, 우선은 연구를 마무리하고 2월이 되면 당장 광장으로 가자! 우리는 밥을 먹으며, 카톡을 주고받으며, 팟캐스트와 유튜브, SNS를 통해 해직 기자들이 또 살아남은 대안 언론들이 생산하는 뉴스를 체크하고 함께 분노하며 매일 나라 걱정을 했드랬다.
그런데 막상 2월이 되니, 날은 춥고 금쪽같은 토요일 오후에 하고 싶은 일도 여러가지였다. 하지만 나의 일을 남에게 맡겨 두었다는 부채감이 마음을 짓눌러 선뜻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어려웠다. 여하튼, 그 모든 유혹을 뒤로 하고 광장에 나가게 된 데는 사실 이번호 특집 주제가 ‘광장의 재발견’이니 현장에 가봐야겠다는 얄팍한 계산도 없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역이 붐빌 것이라 예상한 우리는 시청역으로 갔다. 지하철 역사 내부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둘러 쓴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지상으로 나오니 서울광장과 주변 도로는 탄핵에 반대하는 어르신들로 듬성듬성 채워져 있었다. ‘종북’에 대한 맹렬한 적의를 표현하는 현수막을 보니 아득해졌다. 이 모든 일들이 일단락된 뒤에 우리 사회는 극단적으로 헤집어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묵묵히 광화문광장을 향해 걸었다. 서울광장의 확성기 소리가 잦아드는 만큼 광화문광장의 마이크 소리가 커졌다. LED 초를 하나씩 사들고 집회의 행렬에 끼어 들어갔다. 광장에는 토요일 오후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초입, 이순신동상 주변에는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계기로 세워진 임시 공공극장인 블랙텐트, 그리고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텐트가 캠핑촌을 이루고 있었다. 얼마 전 P는 광화문광장의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광장 양편에서 수시로 땅을 울리며 달리는 자동차 때문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한다. 만약 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붙여 조성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점유하고 목소리를 냈을 것이다. 아마 그러한 광장 문화를 두려워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광장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지만 꽤 질서 있는 모습이었고, 공간 이용에도 나름의 규칙이 공유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로로 긴 광장 중간중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지만 세종문화회관의 대형 계단과 해치마당에서 이어지는 탐방로 양옆의 계단은 광장을 향한 스탠드가 되어 그 역시 사람들이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무얼 보고 있었을까. 사실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 그 자체가 스펙터클이었다.
광화문광장의 횡적 구조도 흥미로웠다.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양옆의 역사물길 넘어 광장 좌우 도로 한쪽은 차벽이 막아서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각 통신사 중계기 차량과 먹거리를 파는 노점이 늘어서 있었다. 공권력을 상징하며 시위대를 막아내는 차벽과 마치 축제를 연상하게 하는 노점이 공존하는 모습은 촛불집회의 복합적 성격을 드러내는 풍경이었다.
어쨌든 메인 행사는 무대에서 진행되고 스크린에 중계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스크린을 중심으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오와 열을 맞춰 빼곡하게 앉아 있었다. 우리도 한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촛불 파도도 타고, 구호도 외치고, 공연도 감상했다. 그러면서 어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감탄했다. 아마도 ‘국민’학교 시절 조회와 운동회로 단련된 결과가 아닐까. 그날 광화문광장의 풍경은 집단주의의 유산에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의 문화, 그리고 월드컵 이후 길거리 응원 문화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 축제의 모습이 짬뽕된 것처럼 보였다. 시민의 힘을 확인하는 광장에서 집단주의의 유산을 발견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촌스럽지만, 일단은 이러한 부조화 역시 우리의 문화적 자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드디어 거리 행진이 이어졌다. 집회의 사회자는 몇 가지 행진 경로를 설명했고, 우리는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경로를 택했다. 기대했던 대로 자동차가 다니던 도로를 걷는 기분은 색달랐다. 특히 각각 가회동과 원서동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Y와 나는 감회가 새로웠다. 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때를 떠올리며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일대를 보행로로 만든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반면 Y는 과연 집회와 같은 비일상적 이용의 필요가 얼마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행진 행렬이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향할 무렵 슬슬 배가 고팠던 우리는 인사동 어귀에서 밥집으로 들어갔다. 바깥의 열기는 딴 세상 일인 양 고요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도로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들이 달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