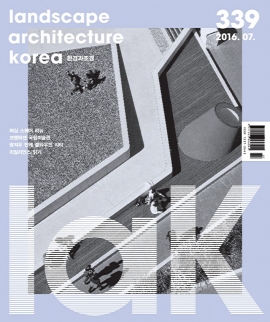- 고정희 ([email protected])

#87
빛을 담는 방법 - 중세의 고딕 성당
이런 이야기가 있다. 중세 유럽 한복판에 쉴다라는 도시가 있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본래 너무 똑똑했다. 그러나 똑똑해봤자 사는 것만 복잡하지 아무 이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모두 바보가 되어 살기로 했다. 이제 바보가 된 똑똑한 쉴다 시민들은 그 기념으로 시청사를 짓기로 결의했다. 곧 작업에 착수, 모두 힘을 합쳐 도운 끝에 건물이 완성되어 성대한 준공식을 열었다. 그런데 바보들답게 창문 내는 것을 잊은 까닭에 청사 안이 깜깜절벽이라 업무를 볼 수가 없었다. 다시 호프집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홧김에 맥주잔을 거푸 기울이던 어느 시민이 갑자기 무릎을 치며 외쳤다. “그렇지! 이거야. 맥주를 이렇게 잔에 담는 것처럼 햇빛을 양동이에 담아서 나르면 되지 않을까” 모두 갈채를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시민들은 양동이며 부대자루 등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열심히 빛을 담아종일 청사 안으로 날랐다. 참으로 부지런히 나른 끝에 해 질 무렵 모두 녹초가 되었다. 마침내 어둠이 내리고 쉴다 시민들은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시청으로 향했다. 그 결과가 어땠을지는 보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 지붕을 들어냈다. 눈비가 내리면 지붕을 다시 덮고. 그러다가 우연히 벽의 갈라진 틈으로 빛이 새어들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냈다고 한다.
교회 혹은 성당을 ‘빛의 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신은 곧 빛이므로 교회에 빛이 가득하면 이는 곧 신이 거하시는 것이라 믿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를 지을 때 되도록 많은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 대답이 창문에 있다는 사실은 쉴다 시의 현명한 바보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들처럼 지붕을 걷어낼 수는 없으므로 천장을 매우 높게 지어서 지붕이 거의 하늘에 닿게 해야 더 많은 빛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창문도 매우 커야 한다. 문제는 ‘기술적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였다. 창문을 많이 내면 벽의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거대한 지붕의 무게를 받아내지 못한다. 12세기 중반, 프랑스 중세 건축가들이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어 결국 빛이 가득한 성당을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된다. 벽이 해체된 순간이라고도 말한다. 기존의 두꺼운 벽 대신에 창문과 기둥을 연속시켜 성당의 외관을 완성했다. 이런 구조로 인해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짓는 것도 가능해졌다.
성당 건축은 대개 선박처럼 긴 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성당 내부 공간을 선체라고도 부른다. 이 홀은 다시 길이에 따라 세 구역으로 구분된다. 그중 중앙의 홀을 신랑身廊이라고 하며 이를 좌우에서 좁은 복도와 같은 측랑이 보좌한다. 신랑과 측랑은 벽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열주에 의해 분리되며 열주의 기둥과 기둥 사이는 대부분 아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구조를 ‘바실리카’라고 한다. 바실리카는 본래 고대의 공공건물이나 신전을 짓던 방식을 뜻했는데 기독교가 도입되면서 서서히 교회 건축을 일컫는 용어로 굳어졌다. 흔히 말하는 중세의 고딕 양식이란 바실리카의 기본 형태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성당은 대개 동서 방향으로 길게 짓는다. 신도들은 서쪽으로 입장하여 예루살렘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정석이다. 동쪽의 좁은 벽을 반원형으로 만들고 벽 전체를 창문으로 대체하면 해가 떠오르면서 빛이 곧 가득 차게 된다. 빛의 집을 짓는 첫 번째 원리다.
바실리카는 신랑의 천장이 측랑의 천장보다 훨씬 높은 것이 특징이다. 측랑은 중앙의 신랑을 되도록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좌우에서 받쳐 주는 역할을 한다. 홀을 크게 지었으므로 지붕 역시 매우 커서 그 무게가 만만치 않다. 이 지붕의 무게를 벽체로 받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둥에 분산시키는 것이 구조적 해법이었다.
그래야만 두껍고 투박한 벽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무게를 사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궁륭형의 독특한 천장 구조가 고안되었다. 돌로 만들었을 뿐 그 원리는 텐트와 같았다. 평평한 것도 아니고 완벽한 구형도 아닌 텐트 구조의 궁륭을 여러 개 연결해 천장을 완성했다. 대개 네 개의 기둥이 궁륭 하나를 받친다. 그러므로 연결된 궁륭의 숫자에 따라 기둥의 수도 결정되며 당연히 성당 홀의 길이도 결정된다. 그다음으로 기둥 사이의 아치를 뾰족하게 변형시켰다. 기둥 사이의 간격이 같더라도 아치가 높아짐으로써 천장도 같이 들어 올려졌다. 창문의 형태를 아치의 형태에 맞추었으므로 좁고 길며 끝이 뾰족한 고딕 특유의 창문이 탄생했다. 외벽 바깥쪽에는 추가로 ‘ㄱ’자의 구조물(버트레스라고도 함)을 대어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지탱했다. 물론 아무리 날렵하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돌의 총 무게가 만만치 않았으므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야 했다. 지하에 묻힌 돌의 무게와 지상에 쌓은 돌의 무게가 거의 같았다고 한다.
고정희는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손수 가꾼 아름다운 정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느 순간 그 정원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유년의 경험이 인연이 되었는지 조경을 평생의 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를 비롯 총 네 권의 정원·식물 책을 펴냈고, 칼 푀르스터와 그의 외동딸 마리안네가 쓴 책을 동시에 번역 출간하기도 했다. 베를린 공과대학교 조경학과에서 ‘20세기 유럽 조경사’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베를린에 거주하며 ‘써드스페이스 베를린 환경아카데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