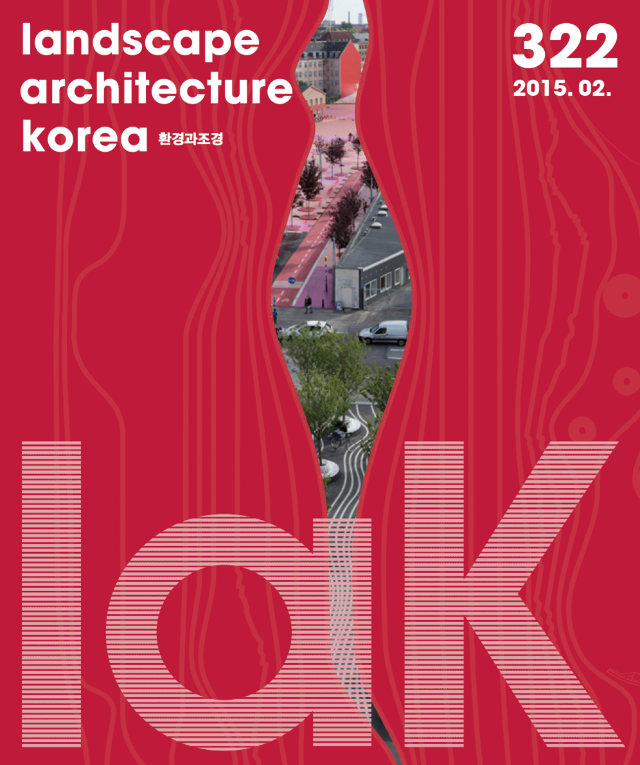
방배동에 짐을 푼 지 한 달 반이다. 『환경과조경』 식구들의 행동 반경이 슬슬 넓어지기 시작했다. 마감에 쫓기더라도 매끼를 배달 음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주일 전에는 요즘 뜨고 있다는 ‘사이길’로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간식이라고는 맥주밖에 모르는 남기준 편집장도 이곳에서는 수제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었다. 방배동 사이길은 함지박사거리 근처에서 서래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이다. 입에 쉽게 붙는 길 이름은 도로명 주소 ‘42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20세기 초의 옛 지도에서도 이 길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강남에서는 보기 드물게 시간의 흔적이 쌓인 장소다. 300미터 남짓한 거리지만 느긋하게 산책하며 커피 한 잔 하거나 아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골목이다. 당근 케이크로 유명한 동네 빵집, 개성 강한 가죽 수제품 가게, 발길을 유혹하는 아트갤러리, 제작과 판매를 같이 하는 향수 공방, 빈티지 소품 가게와 디자인 편집 숍이 적당한 여유와 밀도 속에 늘어서 있다. 건축가나 조경가가 폼 잡고 설계한 공간이 아니다. 과하지 않게 디자인된 잡지처럼 자연스럽게 잘 “편집된 공간”이다.
허나, 아쉽지만, 뻔하다. 매체를 조금 더 타고 셀카족 언니들이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이 사이길도 예의 ‘길 시리즈’처럼 대기업 프랜차이즈 숍에 점령당할 것이다. 가로수길처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더 세련되고 쾌적하게 개선하자는 심산으로 조경가를 불러 가게 앞에 녹지를 끼워 넣으면, 건축가가 폼잡고 손을 대면, ‘걷고 싶은 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보차를 분리하거나 없던 인도를 억지로 만들면, 이런 길이 오히려 망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전문가의 디자인이 자연발생적인 공간 편집을 망쳐놓은 사례를 무수히 목격해 왔다.
진한 농도의 수제 밀크 아이스크림콘이 녹아내릴 때쯤, 토포텍 1Topotek 1의 마르틴 라인-카노Martin Rein-Cano에게 사이길을 설계 사이트로 맡기면 어떤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을지 궁금해졌다. 이번 호 특집을 위해 몇 달째 토포텍 1을 붙잡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례적으로 100쪽의 지면을 할애한 토포텍 1의 작품들에 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기다려진다. 토포텍 1처럼 평가가 엇갈리는 동시대의 조경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생태, 과정, 작동 등과 같은 최근의 설계 이슈가 이제 지겨우시다면, 라인-카노라는 쟁점적 인물과 그의 문제작들을 놓고 모처럼 신선한 토론을 즐겨보시길 권한다.
강렬한 패턴과 고채도의 색과 굵은 선으로 가득한 토포텍 1의 작품은 과격하고 도발적이다. 꼭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느낌이다. 재작년 여름에 만났던 코펜하겐의 수퍼킬렌Superkilen은 숨이 막힐 정도로 자극적이었다. 데뷔작인 스카이 가든Sky Garden부터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라인-카노의 많은 작품들은 ‘시각적’ 어필만을 위해 원색과 강한 선으로 ‘바닥’에 마음껏 그림을 그렸군, 하는 첫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렇게 한방에 단언해 버리며 책장을 덮을 일은 아니다.
토포텍 1의 작업을 가로지르는 핵심은 ‘표면 전략surface strategy’이다. 3차원의 공간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구의 표면, 즉 바닥에 주목한다. 설계의 대상이 정원이건 공원이건 광장이건 넓은 대지이건 간에, 라인-카노는 그것을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늘과 만나는 이차원의 표면, 즉 바닥으로 환원한다. 표면으로 환원된 공간을 그는 시각적으로 ‘편집’한다.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때로는 통제된 규칙을 허물고 자유를 얻기 위해. 이러한 편집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 그의 일관된 ‘그래픽 비전graphic vision’이다. 토포텍 1의 작품들은 물리적 스케일이나 표면 질료의 성격과 상관없이 늘 그래픽적이다.
의도적인 선형 패턴의 그래픽을 통해 시각적 편집을 넘어서는 역사적·문화적 편집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리스의 신전, 모로코의 분수, 팔레스타인의 토양, 프랑스 정원의 자수화단, 영국 풍경화식 정원의 낭만, 일본 정원의 사색, 중국 정원의 정자 등 이질적 역사와 문화의 성분이 편집된다. 라인-카노의 작업은 표면이라는 같은 텍스트에 그래픽이라는 같은 매개체를 투입하여 이종의 가치와 복수의 문화가 교배된 새로운 콘텍스트를 편집해낸다. 그의 디자인에 단 하나의 개념을 달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편집’일 것이다. 편집 앞에 조금 거창한 수식어를 붙이자면 ‘미학적’보다는 ‘사회학적’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잘 편집된 공간 사이길에 토포텍 1의 편집된 공간들을 엎고 섞다 보니, 불현듯 “세상의 모든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편집”이라는 김정운의 구라가 그럴듯하게 와 닿는다. 이번 마감이 끝나면 요즘 잘 팔린다는 그의 신간 『에디톨로지』를 날라리 책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한번 찬찬히 읽어봐야겠다. 그나저나 이번 호가 잘 편집된 잡지일지, 근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