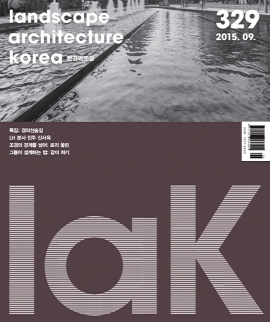- 조한결 ([email protected])

20대 초중반을 대흥동에서, 후반을 동교동에서 보내고 있다. 동아리 선후배 및 동기들과 어울려 이 주변 술집과 골목을 누비며 밤을 새고 무수한 레포트와 이력서를 동네 카페에서 죽치고 앉아 쓰곤 했던 내게 (현재의)경의선숲길과 그 일대는, 말하자면 나의 ‘주 무대’ 같은곳이다.
지금이야 이곳에 공원이 들어서고 주변에 번듯한 상가도 세워져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철길 일대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곳이 었다. 철길로 인해 오랫동안 단절되어온 탓에 철길을 사이에 두고 도시의 풍경은 낯선 느낌이 들만큼 확연히 달라졌다. 특히 서강대 학생들에게 철길 너머의 인근 하숙촌은 옆 건물 하숙생 알람 소리에 맞춰 기상한다는 농담―실제로 경험해 본 바, 단순한 우스개만은 아니다―이 있을 만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소금 단지만큼 짠내 나는 하숙집 아주머니의 바가지로 악명 높은 동네였다. 철길 일대는 가로등이 별로 없고 으슥해 늦은 밤이면 근처를 지나가기가 망설여지는 위험 지역이기도 했다. 철길을 따라서 억센 잡초가 뒤덮고 온갖 쓰레기가 널려 있었지만 아무도 이곳을 치우거나 가꾸지 않았다. 한때 중요한 물자와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는 경의선 철길은 도시 조직에 파묻히고 결국 지중화되어 폐쇄되면서 지역의 슬럼으로 변해갔다.
‘별 것 없는’ 공간이 사랑받는 법
5~6년 전 기억을 다시 끄집어낸 것은 이 으슥한 ‘뒷골목’이 공원으로 바뀐 것을 처음 보고 느꼈던 놀라움을 말하기 위해서다. 2012년,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찾아가 봤던 경의선숲길 1단계 구간(대흥동 구간)은 규모도 크지 않고(17,450m2) 디자인이 특별히 세련된 것도 아니지만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하는 ‘생기 있는 공원’이었다.
올해 개장한 경의선숲길 2단계 구간(연남동, 염리동, 새창고개 구간), 특히 연남동 구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뜨거울 정도다. SNS나 블로그 등에 공원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고 공원을 중심으로 한 상권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인근 스트리트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찾는 생활형 공원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 공원이 유행처럼 인기를 끌다 금방 시들해질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느 공원처럼 탁 트인 광장이나 테마 놀이터도 없고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기도 힘든 좁고 긴 선형 공원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