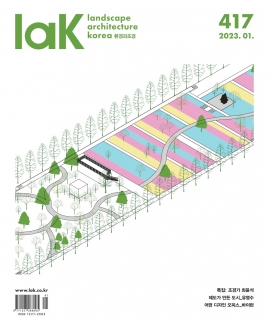- 유청오 ([email protected])
최윤석과는 작품 때문에 처음 만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인을 통한 촬영 의뢰가 다반사라 현장을 서성이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했던 게 첫 만남이었다. 깊고 진한 계절이 스치고 지날 때라 그런가, 낯설었다. 변하는 풍경 사이에 선 검고 큰 덩치가 인상에 남았다. 첫 기억은 선입견을 남겼다. 몰랐다. 그렇게 섬세한 사람이라는 것을. 에세이 필자로 추천 받았을 때 한참을 고민하다 그의 작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 글은 어쩌면 그의 작품 감상기일지도 모르겠다.
가끔 아주 먼 옛 일이 떠올라 잠시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최윤석의 최근 작품은 어린이정원이 많은데, 그의 정원에 가면 문득 추억들이 떠오른다. 오밀조밀한 공간에서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튀어오른다. 보물찾기하듯 조심스레 둘러보면 작은 시선(키 작은 초화와 작은 정원 요소들, 때로는 어린아이)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무심코 눈짓이 가리키는 곳을 함께 바라보면 또 다른 시선을 발견하게 된다. 검고 큰 덩치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힘든 곳곳의 아기자기함에 감탄하다가 사람의 외적 요소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어른들의 충고가 떠올라 도리질한다.
생각의 가장자리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조경 설계라면,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 밖으로 탄생시키는 몸짓이 현장의 풍경이 아닐까. 그래픽으로 짐작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현장에서 펼쳐진다. 그는 말보다 실행을 선호하고, 추상보다 현장을 좋아한다. 그래서일까 최윤석은 사무실보다 현장에서 더 눈에 띈다. 굳이 약속을 잡지 않아도 현장에 가면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무언가를 뚝딱이며 집중하고 있다. 그의 주변은 시간이 멈춘 듯 보인다.
시간은 변화무쌍하다. 형태를 지닌 것 마냥 흐릿했다가 또렷했다가 멀미가 날 정도다. 그람디자인의 작품들과 함께한 기간이 수년 흘렸다. 시간은 기억과 닮아서 선택적으로 다가온다. 한편 조경 공간에서 시간은 재빠르게 지나가기도, 한없이 느리게 지나가기도 한다. 나도 그와 친구들(정원사친구들)이 만들어낸 공간 안에서 기억을 공유해왔다.
새겨진 기억은 수없는 갈래로 나뉘고 알 수 없는 간극으로 남아 회상하게 한다. 이끼부터 휘어진 버들가지까지 무성해지면 공간은 한 편의 이야기가 된다. 시간이 형태를 잘게 쪼개져 포개어진 듯 놓여, 같지만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낸다. 공간이 만들어낸 기억도 하나의 장소가 되어 어른이 된 자신을 거울처럼 비춘다. 그와 정원사친구들이 만들어낸 작품 안에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억지로 짜낸 구성이 아니라 사람을 고려하면서 만들어낸 구성이다. 누가 무엇을 볼 것인지 생각할 뿐 아니라 무엇을 경험할지를 고민하는 것 같다.
* 환경과조경 417호(2023년 1월호) 수록본 일부
유청오는 경관과 사람을 카메라에 담는 데 힘쓰고 있는 본지 전속 사진작가다. 2014년 7월호부터 『환경과조경』에 ‘유청오의 이 한컷’을 연재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