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준 ([email prot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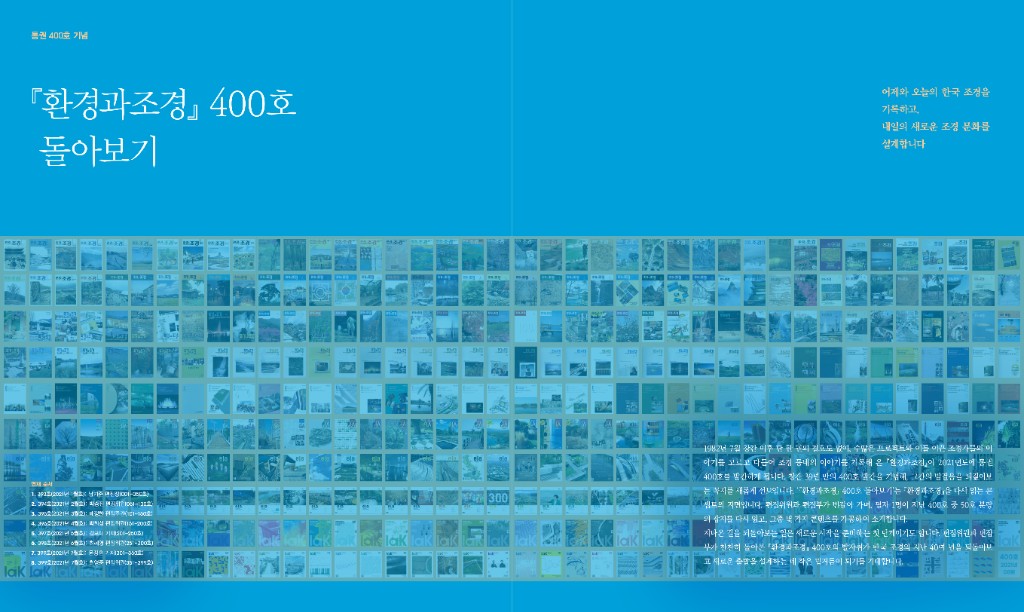
『환경과조경』은 나에게 특별한 잡지다. 성경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손에 쥔 책일 것이고, 심지어 나이도 같다. 요즘엔 조경을 스마트폰으로도 배울 수 있지만, 조경을 책으로만 배울 수 있었던 시기를 (아마도) 마지막으로 겪은 세대이기에 더 의미가 크다. 입대 후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다 나온 일병 휴가 때, 스스로도 믿기지 않지만 처음으로 찾은 잡지가 『GQ』나 『맥심』이 아닌 『환경과조경』과 『토포스(Topos)』였다. 20년 묵은 불평이지만, 조경학개론 수업조차 조경이 무엇인지 절대 쉽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었다. 조경이 무엇인지 가시적인 감을 잡아준 첫 길잡이는 『환경과조경』이었다. 그 후에도 매달 수록된 이미지와 텍스트가 전해주던 뉘앙스가 내가 느끼는 한국 조경의 온도와 색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10년간 머무르면서도 『환경과조경』을 한국 예능이나 드라마만큼 자주 돌려봤다. 한국 조경에 대한 향수와 관심, 때로는 동경과 선망이자 비판과 아쉬움을 모두 원격으로 바라보게 해준 채널이었다.
해외리포터로 시작해 이제 편집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종종 두렵디두려운 원고 요청이 오면 졸고를 올리긴 했으나, 지난달 최혜영 편집위원의 고백처럼 나 또한 그리 성실한 애독자가 되지는 못했음을 고백한다. 그런데 변을 한마디 붙이자면 종이 잡지는 3분도 안 걸려 눈으로 스캔하듯 훑어본 적이 있어도, 적어도 환경과조경 홈페이지(lak.co.kr)는 다른 포털 사이트 방문 빈도 못지않게 하루 세 번 이상은 접속한 지 오래다.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그냥 넘긴 적도 없다. 사실 이것은 변명 삼을 일도 아닌, 동시대 종이 잡지의 현주소이자 어쩌면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임을 누구나 동감할 것이다. ‘400호 돌아보기’라는 이번 기획도 아마 『환경과조경』이 조경 분야에서 보여준 고유한 매력과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예전과 다른 위치일 수밖에 없는 『환경과조경』의 미래를 그려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리라 믿는다.
400권을 50권씩 끊어놓은 분절 주기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돌아보기의 첫 호인 351권이 발간된 2017년 7월경을 돌이켜본다. 고 박원순 시장의 긴 임기 중 7년 만에,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뜻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된 때다. 351호는 서울로 7017에 대한 꽤나 묵직한 문제제기로 시작한다. 서울로의 정치적 수단화와 절차적 문제는 잠시 덮고 당시 원고를 되짚어본다. 비난 일색의 상황에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글을 읽기 시작했지만, 약 2년 안에 광속으로 설계와 시공을 진행했던 설계 팀과 진행 부서의 내막과 고충을 듣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다.다 이유가 있고, 다 계획이 있는 법. 흥미로웠고 지금도 이따금 생각하는 논점은 서울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서울로는 정작 무엇인가?’ 연결 통로? 목적지? 육교? 식물원? 도시숲? 높이도 여건도 맥락도 판이하게 다른 뉴욕 하이라인의 벤치마킹을 강요한 결과로 서울로 7017는 유별난 점박장하며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다. 서울로 7017는 구도심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전에 없던 경험을 주는 공중 보행로이자 오랜 시간 안정화된 도시 조직의 상부 층위에서 새로운 개발 계획을 따라 진화해가는 서울만의 길, 서울만의 보행 네트워크다.
이 시기에는 서울로 7017을 비롯하여 광화문광장, 용산공원 등 랜드마크의 위상을 갖는 오픈스페이스의 조성 및 재조성에 대한 논의를 이끄는 시도가 있었다. 367호의 “광화문광장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조경가들에게”(배정한, 에디토리얼, 2018년 11월호)와 “새 광화문광장에 관한 풍문들”(최정민, 2019년 3월호), “광화문광장에 대한 논의, 이제 시작이다”(박상현, 2019년 3월호) 등의 다양한 비평과 설계공모 당선작 및 참여작을 실은 371호의 목차만 훑어보아도 뜨거운 비평 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다.
당시의 또 다른 특징은 환경과조경이 ‘2016 서울정원박람회’의 주관사로 선정되었고, 각종 정
원박람회가 조경계의 중추적인 행사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다. 정원 연출이 가장 화려한 시점이 봄의 끝자락이나 가을의 시작점이다 보니, 정원박람회의 시기가 고정되어 매해 11월은 코로나 이전까지 서울정원박람회를 꾸준히 담는 데 할애했다. 355호의 칼럼에 쇼가든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우려와 의견이 담겨있는데, 꾸준히 긍정적인 진화를 해오고 있다고 본다. ‘2017 서울정원박람회’가 여의도공원으로 그 무대를 옮기고 쇼가든의 존치가 일반화되면서 작가정원과 근린공원의 공생이 본격화됐다. 2018년에는 ‘피크닉’이란 주제로 공원과의 더 적극적인 동거를 달성하며 여의도공원을 방문하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되어 주었다. ‘2019 서울정원박람회’는 도시의 한복판으로 침투하여 도시재생의 도구로서 정원 조성과 주민 참여를 실험하고 황화코스모스의 오렌지색을 각인시켰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도 적잖은 호응을 이끌어낸 394호의 서울국제정원박람회SIGS에 이르기까지, 『환경과조경』이 정원에 대한 콘텐츠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면에 소개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후략)
* 환경과조경 399호(2021년 7월호) 수록본 일부
최영준은 『환경과조경』과 나이가 같은 조경가다. 『환경과조경』 통해 조경을 이해하게 되었고 오랜 팬이다. 지금은 종이 잡지보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경을 섭취하기도 한다. 서울 근교에서 랩디에이치(Lab D+H) 서울 사무실을 운영하며, 한국과 중국의 다채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성과물을 통해 조경설계를 매번 다르게 보려고 애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