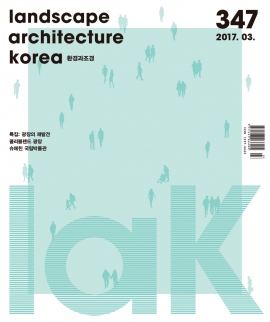“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도시의 풍경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영화의 후반부,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타키가 입사 면접 때 두서없이 더듬거리던 내용을 정리하면 아마 이런 내용일 게다. ‘사라지다’, ‘풍경’, ‘기억’, 영화의 주제를 요약하는 대사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때였다. 자습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칠판에 크게 ‘조경’이라는 한자를 쓰셨다. 만들 조造, 경치 경景, 유망한 분야라고 소개한 이 두 글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될지 그 분은 몰랐겠지. 그 순간, 수학과 미술을 좋아하던 한 여학생은 주저 없이 ‘풍경 만드는 일’을 평생 하리라 마음먹었다.
풍경을 만드는 근사한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손으로 그리던 일을 기계가 대신 해주게 되었지만 시간은 늘 부족하다. 얼버무리듯 하나씩 마무리해 갈 뿐이다. 다음엔 잘해야지 다짐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풍경을 만드는 일 따윈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매번 다른 사람과 만나고, 다른 조건으로 새로 시작해야 한다. 매일 공부해도 모르는 것 투성이다.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따뜻한 풍경은 대체 언제 만들 수 있을까. 영화 ‘너의 이름은’은 근사한 풍경이 이미 우리 일상에 있다고 말해주는 영화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길 건너 가로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쯤 자세히 보라고 말해주는 영화다. ...(중략)...
서영애는 조경을 전공했고, 일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다. 최근에 본 두 한국 영화, ‘죽여주는 여자’와 ‘미씽: 사라진 여자’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노인 빈곤, 소외 계층, 이주 여성 인권, 모성애와 워킹맘 등 쉽지 않은 현실의 민낯을 대하고 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영화는 때론 판타지로, 때론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통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깨어있도록 만든다.
* 환경과조경 347호(2017년 3월호) 수록본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