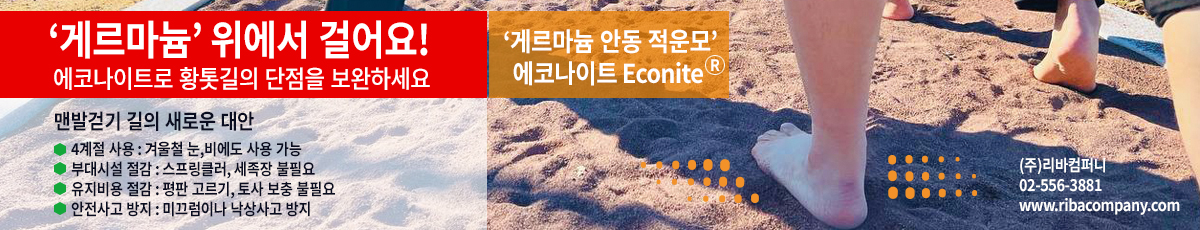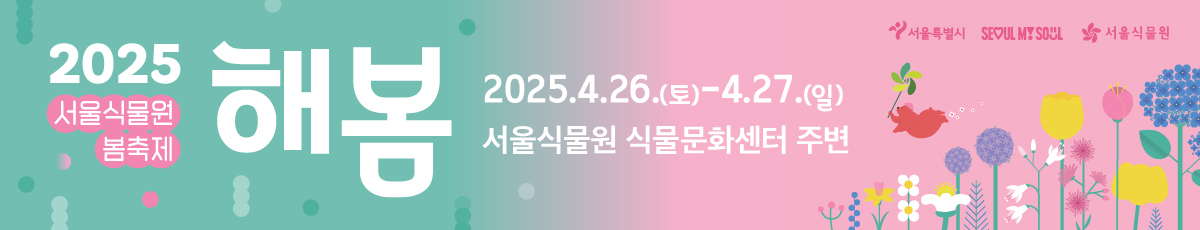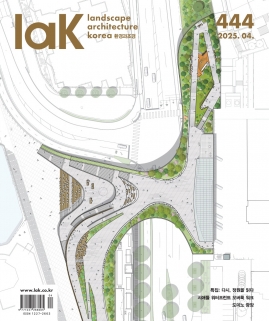『환경과조경』 2014년 4월호를 펼치면 이번 호 특집과 유사한 제목을 단 기획 지면, ‘다시, 정원을 말하다’를 만날 수 있다.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획 의도는 똑같다. 이례적인 정원 열풍의 이면을 되짚어 보자는 것. 바뀐 게 있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그 열풍의 강도가 더 커졌다는 점이다. 이제는 정원 ‘열풍’ 앞에 붙일 수식어로 ‘대중적’과 ‘사회적’뿐 아니라 ‘국가적’을 골라도 전혀 과장된 느낌을 주지 않는다. 도시의 수장고에 곱게 모셔두었던 정원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정원 현상, 정말 뜨겁다.
정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에 대한 관심, 비인간 생명체와의 정서적 교감, 돌봄과 가꿈의 실천을 담아내는 것을 넘어 트렌디한 이미지 상품으로까지 소비되면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 곳곳의 도시가 경쟁적으로 정원박람회를 열고 있다. 서른 곳 이상의 지자체는 ‘정원도시’를 선언했다. 서울시는 “어딜가든 서울가든”이라는 구호까지 내걸고 정원을 공원, 선형 녹지, 입체 녹지, 둘레길, 하천변, 도시재생지 모두를 포괄하는 우산 개념으로 삼고 있다. 모든 게 정원이어서 정원이 아무것도 아닌, 정원의 시대.
정원을 국가의 법과 제도로 지정하고 계획하는 유례없는 사업도 펼쳐지고 있다. 산림청이 지원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이 여러 지자체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정원 프로젝트를 지역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삼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정원이 도시의 기반 공간으로 주목받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원은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장소이고, 사색과 휴식의 장이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잘 디자인된 정원은 지역의 정체성을 담는 문화적 장소로 진화할 수 있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인프라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열된 최근의 정원 현상을 반성적으로 되짚어 보면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는 전시 행정의 난맥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정원 개념이 지나치게 표피적으로 소비되는 양상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일부 정원박람회와 정원도시 프로젝트는 정원 문화 형성보다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브랜딩 전략에 가깝다. 단기간에 화려한 경관을 꾸미는 데 치중하면서 지역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원이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포퓰리즘 공간 정치의 단골 메뉴로 동원되는 사례, 무분별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조경가―와 이른바 ‘정원 작가’―들이 정원이라는 이름의 녹색 면죄부를 발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호 특집 ‘다시, 정원을 읽다’는 정원 현상의 이면을 살펴 정원과 동시대 조경 사이의 관계를 다시 검토하고 조율해 보고자 하는 작은 시도다. 편집부와 함께 지면을 기획한 박희성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는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정원 정책과 정원 사업이 장차 유효한 성과를 내기 위해 풀어야 할 난제들을 점검한다. 황주영 박사(조경사 연구자)는 정원 열풍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혼란한 정원 개념을 재검토하고, 돌봄의 정원과 모두가 누리는 정원의 의미를 전한다. 권진욱 교수(영남대학교)는 정원박람회가 모방과 자기 복제에서 벗어나 고유의 정원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재혁 소장(오픈니스 스튜디오)은 조경계의 전면에 부상한 정원이 조경 설계에 가져온 변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한다. 정홍가 소장(쌈지조경)은 지역 공동체의 형성과 협력을 이끄는 사회적 공간으로 정원을 작동하게 하는 정원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 참여형 정원 문화의 방향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조혜령 소장(조경하다열음)은 정원이 그린워싱 이미지로 소비되는 정원 시대의 난맥을 짚는다. 이번 특집에 참여한 필자들은 오는 4월 18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릴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 세미나에서 같은 주제로 발제하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특집만으로 정원 열풍의 잠재력과 난점을 밀도 있게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마침 번역 출간된 『정원의 기쁨과 슬픔: 인간이 꿈꾸는 가장 완벽한 낙원에 대하여』(어크로스, 2025)를 함께 읽어보시길 권한다. 이 책은 『외로운 도시』로 널리 알려진 작가 올리비아 랭Olivia Laing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이사한 집에서 정원 만들기를 탐닉하며 희망의 에덴을 가꿔나간 기록이자, 배제와 공존이 교차하고 추방과 해방이 공존하는 모순의 정원 개념에 대한 세밀한 탐구이기도 하다. 원제는 ‘시간을 거스르는 정원: 공동의 낙원을 찾아서(The Garden Against Time: In Search of a Common Paradise)'다. 책의 마지막 문장을 옮긴다. “모두의 정원이라는 그 이단적인 꿈.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씨앗을 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