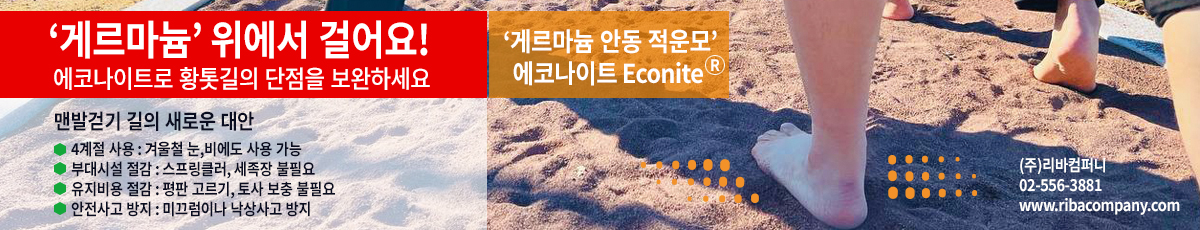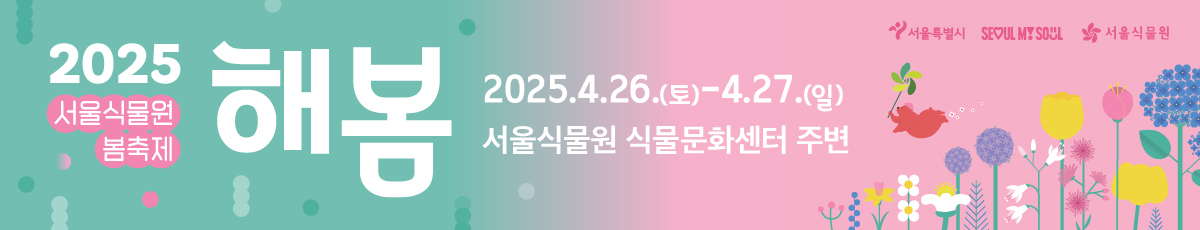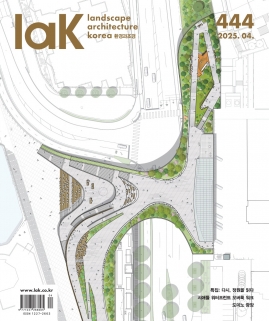신 유토피아를 위한 정원박람회
정원박람회에 대해 AI 검색 엔진은 이렇게 대답한다. “정원박람회는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내놓게 된 이유에 궁금증을 가지며 추론을 시작했다.
먼저 우리는 왜 도시, 정원, 박람회를 관계 지을까. 물론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공간적 배경을 도시만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때의 도시는 인간의 삶과 생활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활동의 장을 의미하는 구체성을 내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다음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도시의 경관에서 근거를 찾아보자. 16세기 초 토마스 모어(Thomas More)가 이야기한 가상의 섬나라 유토피아의 목판 지도가 떠오른다. 유토피아(utopia)는 ‘ou(없다)+toppos(대지)’의 조합으로 설명된다.(각주 1) 이곳은 유토푸스(utopos)가 세운 나라이며 유토푸스는 ‘아무 지위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말 그대로 경제, 정치, 종교 등의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모어의 목판 지도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움은 이상향을 추구하는 유토피아의 경관이다. 도시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에 따르면, “도시의 모습과 유토피아의 모습은 오랫동안 서로 뒤섞여 왔다.”(각주 2) 유토피아들은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 형태로 묘사됐다. 유토피아의 도시는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은유이며 자연은 동경에 대한 지표로서 문화적 보편성을 표현하고 있다.
모어로부터 시작된 관념적 유토피아의 의미는 아일랜드 문인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를 통해 현실로 귀환된다. 그는 “유토피아를 포함하지 않은 세계 지도는 쳐다볼 가치조차 없다. 유토피아는 인류가 언제나 도달하고 싶어 하는 단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각주 3) 즉 오스카 와일드의 유토피아에 대한 경관이 바람wish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진보하는 유토피아를 위한 희망 경관(hope landscape)을 추구하는 것이며, 우주선 지구호(각주 4)의 탑승자들은 그 목적과 실행을 위한 매체로 정원박람회를 사용하는 것이다.
정원박람회의 시작과 박람회 의미에 대한 재고
박람회는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과 미래상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라는 의미를 가진다.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5에서 주요 단어를 추출해 보면, 인류의 노력, 성취된 발전의 모습, 미래에 대한 전망, 인류 계몽, 경제 및 사회적 발전, 세계인의 축제 등이 주요 골격을 이룬다. 정원박람회는 여기에 정원을 더해 이해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유독 최초라는 사건과 사물에 집착하는 것은 원류로부터 근원을 파악하고 변화된 흐름과 경향을 파악하며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정원박람회의 역사적 기원을 보면 정원박람회가 세계의 만국박람회보다 앞선다. 인류는 이미 부족 또는 왕조 국가 때부터 정원을 통해 부와 권력을 상징하고 전시한 것이다.(각주 6) 오늘날과 유사한 정원박람회의 효시로 벨기에(1809년), 영국(1827년), 독일(1869년) 등에서 개최된 행사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중 아르데코(Art Deco)라는 사조를 낳은 1925년 파리 국제장식산업미술박람회에서 박람회 역사상 처음으로 정원을 주제로 한 전시 공간이 등장했다. 일련의 주제 정원이 조성되었다는 점은 요즘 한국의 정원박람회가 지향하는 목적에 견주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최초의 정원박람회는 2010년 시흥시 옥구공원에서 개최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다. 물론 1991년 고양꽃박람회를 최초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명칭과 목적에 비추어 보자면 시흥시가 먼저다. 무려 15년 전이지만, 당시 정원박람회의 슬로건과 목적은 충분히 정련되어 있었다.
‘도시, 정원을 꿈꾸다’라는 슬로건으로 단순한 정원박람회가 아니라 ‘문화’를 정원에 더하고자 했고, 최신 정원 디자인의 경향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를 통해 만드는 도시 공공 공간 가꿈 문화와 커뮤니티 디자인을 시도했다. 관련 기사(“2010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환경과조경』 2010년 11월호)는 이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주민 참여로 완성된 공공 정원, 기업의 나눔 문화 실천의 장, 지역 축제를 통한 공원 리모델링 등을 꼽았다.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된 정원박람회는 약 15개인데, 각 정원박람회의 취지와 목적이 10년 전에 비해 어떤 변화와 발전적 차별성이 있었는지 회고해 본다. 혹시 우리도 합스부르크 왕가의 유전병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 환경과조경 444호(2025년 4월호) 수록본 일부
**각주 정리
1. www.britannica.com/topic/Utopia-by-More
2.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외 역, 『희망의 공간』, 한울, 2001.
3. 오스카 와일드, 박명숙 역, 『오스카리아나』, 민음사, 2016.
4. 벅민스터 풀러, 마리 오 역, 『우주선 지구호 사용설명서』, 앨피, 2007.
5. 기획재정부(www.moef.go.kr/sisa/dictionary)
6. 이양주 외,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발전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21.
권진욱은 영남대학교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조경 학위를 취득했고, 프랑스 낭시국립건축학교에서 DESS 학위, 파리-발드센느 국립건축학교에서 DPLG 학위를 취득한 프랑스 공인 건축사다. 계원예술대학교에서 정원과 관련한 과목들을 가르쳤고, 현재 영남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설계와 디자인 이론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한 디자인의 영역은 통섭적이며 총체적 시각으로 상호 교감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 순응적 디자인 해법으로부터 유연성을 담은 인간의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