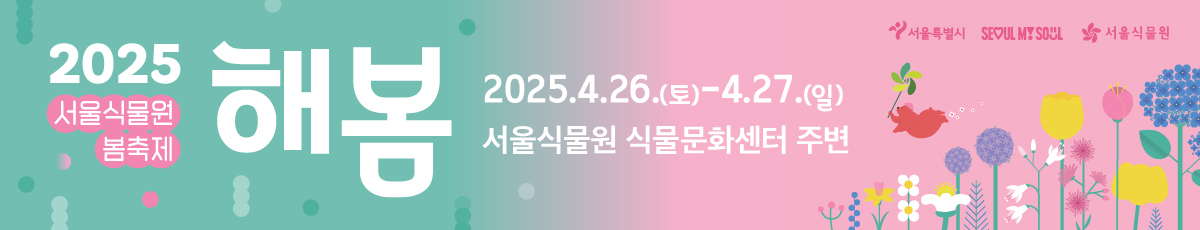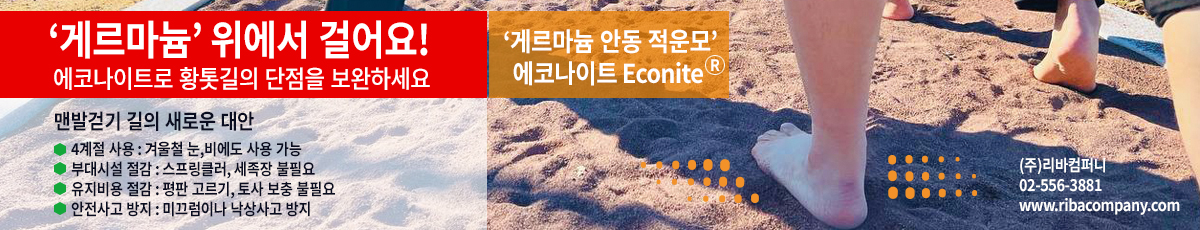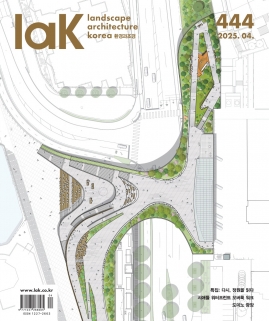한국에서 정원 붐이 일어난 지도 10년 이상이 지났다. 지난해 서울시 조경 부서 명칭이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정원도시국으로 바뀌는 등 ‘정원’이라는 키워드가 조경계 전면에 부상한 만큼 정원 붐이 조경 설계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짧은 지면에서 이 주제를 넓고 깊게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어 관심 있게 바라본 세 가지 현상에 대한 나름의 관점을 소개한다. 우선 정원 붐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결과 동시대 조경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원 붐이 조경 설계 업계에 끼친 구체적 영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행하는 자연주의 정원 설계 패러다임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정원의 부활과 조경 생태계의 변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원 붐을 잘 이해하려면 조경 설계의 사조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자인적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 초는 건축과 조경 모두 모더니즘의 시대로 기존의 양식주의가 부정되고 기능성과 기하학적 단순미가 강조됐다. 이 시대 조경가들(각주 1)의 작품을 보면 기하학적인 질서가 공간을 지배하고 재료의 양식적 표현은 극도로 절제된 것을 볼 수 있다. 1977년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가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언어』를 통해 포스트모던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포스트모던의 흐름이 시작됐다.(각주 2) 이 시기의 조경가들(각주 3)의 작품은 기하학적 질서에서 탈피하고 기능보다는 장소성, 문화적 맥락, 감성적 조형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포스트모던의 흐름 속에서 디자이너들은 기존에는 양식주의로 치부하던 수공예적 디테일에 다시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첼시 플라워쇼가 1980년대 이르러 본격적으로 부흥하고, 1990년대에 쇼몽 가든쇼가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시대적 변화가 있었다. 이 시점부터 정원 작가들(각주 4)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정원 작품에서 다양한 수공예적 디테일을 선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양보다는 한발 늦게,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정원박람회에서 정원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각주 5) 국내외 정원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섬세한 식재 표현과 수공예적 정원 연출 기법을 선보여 왔으며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전통적으로 조경가의 업역이라 여겨졌던 일상적 외부 공간 설계와 관련된 프로젝트까지 정원 작가들이 수행하며(각주 6) 조경 생태계에도 자연스럽게 변화의 움직임이 생겼다. 2010년 이후 정원박람회의 부흥과 함께 오래된 수목원 리노베이션, 신규 수목원 조성, 민간 정원 등 정원 관련 프로젝트들이 조경계 전반에 양적으로 확산됐다.(각주 7) 또한 국내외 우수한 정원들을 경험한 대중이 많아지고 정원과 식물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며, 조경가 역시 자연스럽게 식재 설계에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조경가 중 일부는 식재 설계 역량을 키우고자 정원 분야에 진출해서 정원 작가로서 활동하기도 한다. 연차가 짧은 젊은 조경가 중 역량 강화를 위해 설계사무소를 잠시 떠나 민간 식물원의 정원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뒤 조경 설계 분야에 재취업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이처럼 스스로 식재에 대한 소양을 키우는 조경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적 의미의 조경가8로서 본연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식재 설계에 전문성이 있는 정원 작가나 원예가와 협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흐름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이런 협업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크기변환]jae 1.JPG](http://www.lak.co.kr/data/ebook_content/editor/20250401152434_fszxhflw.jpg)
* 환경과조경 444호(2025년 4월호) 수록본 일부
**각주 정리
1. 대표적으로 개럿 에크보(Garrett Eckbo)나 댄 카일리(Dan Kiley)와 같은 모더니즘 조경가들이 활동했다.
2. 쿠마 켄고, 『약한건축』, 디자인하우스, 2010, p.111.
3. 포스트모던 시대를 연 대표적인 조경가로 찰스 젠크스, 캐서린 구스타프슨(Kathryn Gustafson), 마사 슈워츠(Marha Schwartz)가 있다.
4. 1990년대 존 브룩스(John Brookes), 베스 샤토(Beth Chatto), 핏 아우돌프(Piet Oudolf)와 같은 정원 작가들이 등장했다. 2000년대에는 톰 스튜어트 스미스(Tom Stuart-Smith), 앤디 스터전(Andy Sturgeon) 같은 작가들이 활약했다.
5. 대표적 정원 작가인 황지해는 첼시 플라워쇼에서 ‘해우소’(2011) 아티즌 가든 부문 금메달, ‘침묵의 시간: 비무장지대 금지된 정원’(2012)으로 쇼가든 부문 금메달을 수상했다.
6.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정원드림 프로젝트, 생활밀착형 숲(정원)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정원 작가에게 일상 공간에 정원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했다.
7. 포천 국립수목원, 수원수목원 같은 오래된 수목원 리노베이션과 함께 서울수목원, 세종수목원, 백두대간수목원 같은 신규 국립수목원 조성 프로젝트가 이어졌다. 산림청은 생활밀착형 정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최근 화성시는 보타닉가든 화성 사업의 일환으로 동부권 공공정원화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이처럼 정원이 주제가 되는 설계 프로젝트가 전례 없이 늘고 있다.
최재혁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조경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KnL환경디자인스튜디오에서 정원 및 조경 설계 실무를 익혔다. 2017년 오픈니스 스튜디오(Openness Studio)를 개소해 생태적 관점을 바탕으로 정원, 공공예술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정원 및 공원 설계 수업에 출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