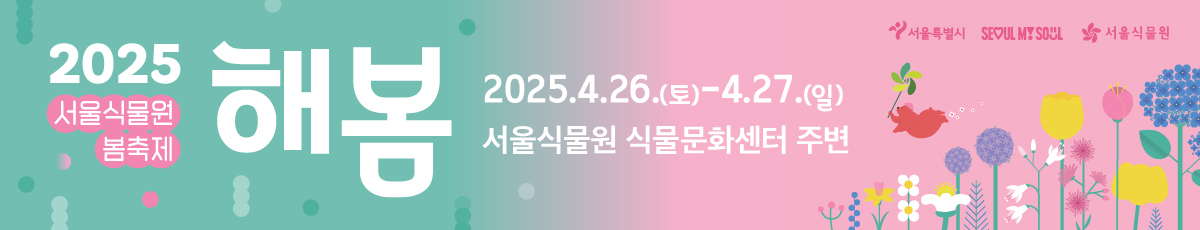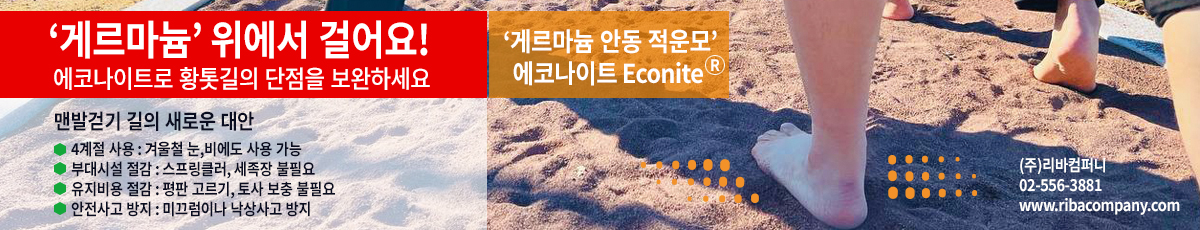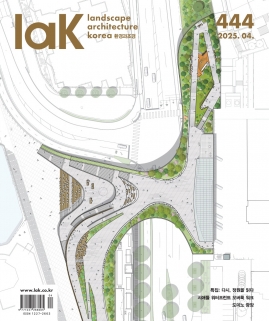정원 소비 시대의 역설
정원은 오랫동안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구체화되는 공간으로서 시대 정신이 반영되기도 하며 일상과 상상력에 영감을 주는 장소로 등장하기도 했다. 때로는 실용적이고 때로는 깊은 성찰을 위한 상징과 철학적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치유와 회복의 성소적 공간으로서 정원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최근 정원은 도시 마케팅, 부동산 개발, ESG 사업, 정치적 홍보 도구로 활용되는 등 친환경 이미지 구축의 수단으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전통적 정원의 개념과 충돌하는 몇 가지 역설적 지점을 만든다. 빠르게 조성되고 소비되는 이미지 공간으로서 정원이 기업과 지자체의 그린워싱(greenwashing) 도구로 전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원의 확대가 곧 환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비를 위한 정원을 만들고 있을 뿐인지, 정원의 시대에 우리는 진정 정원을 흠뻑 즐기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정원 사업의 확산으로 우리는 충분한 고민의 시간 없이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급격한 전환을 경험하고있다. 급조된 프로젝트와 무분별한 정책 속에서 정원의 생태적‧문화적 의미를 잃고 환경적 공해로 변질될 위험의 경계에 서 있는 건 아닌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장면 #1. 도시 마케팅과 정치적 풍경으로서 정원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2013년 제1회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정원’에 대한 언급은 연평균 8.05%, ‘정원도시’는 15.03%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정원도시에 대한 언급이 75.66% 증가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원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1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정원도시를 미래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와 차별성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순천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69개 지자체가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를 포함한 8개 지자체는 정원도시 정책을 위한 담당 부서를 신설하거나 부서 명칭을 변경 또는 변경 추진하고 있다.
정원도시를 향한 열망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개념의 오남용은 정원의 본질적 가치를 왜곡하는 ‘휘발되는 정원 괴물’을 낳을 수밖에 없다. 너 나 할 것 없이 정원도시 유행을 따라잡기 위해 장기 비전이 부재한 채로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한 과열된 발주 경쟁을 낳는다. 정책과 기준의 부재와 취약함은 유행에 따라 급조된 사업으로 세상에 나와 우후죽순 확산된다.
‘이벤트형 조경’을 통해 빠르게 소비되고 소멸하는 정원은 미적 향상에 그치기 쉬우며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과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다. 몇 개의 정원, 몇 명의 시민정원사 양성, 몇 회째 진행된 정원박람회 등 숫자가 알려주는 정원도시의 척도는 단기적 행정 성과로 기록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유산 쌓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정원도시 열풍은 전국 지자체의 경쟁을 부추기며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크기변환]hrc 01.jpg](http://www.lak.co.kr/data/ebook_content/editor/20250401151416_ciitowyk.jpg)
* 환경과조경 444호(2025년 4월호) 수록본 일부
**각주 정리
1. 김용국·김영현·조한솔·최영운·김신성, 『현대 정원도시의 다원적 기능 구현을 위한 계획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2024, p.2.
조혜령은 경희대학교, 그린위치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원예와 조경을 공부했다. 정원이 갖는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믿으며 이론과 실무의 경계를 탐색하는 조경가로, 조경하다열음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