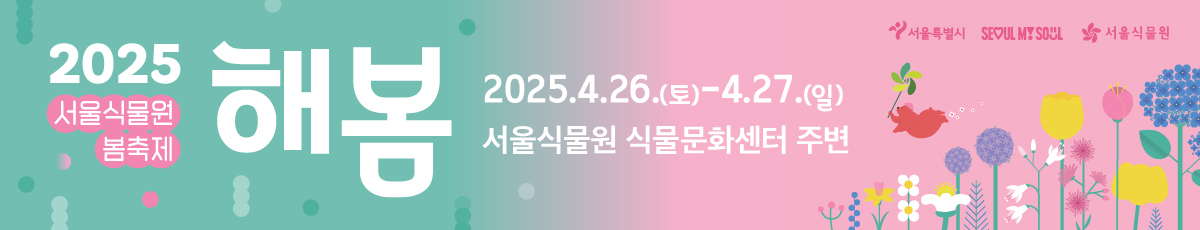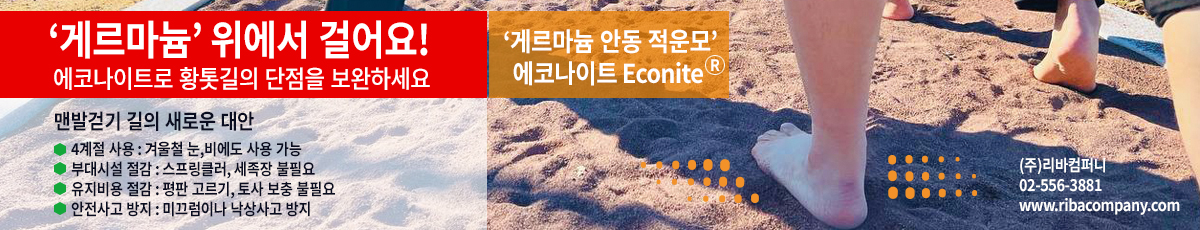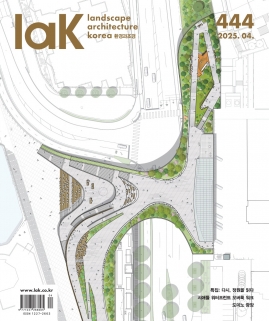먼 우주에서 본 나의 모습을 상상한다.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을 테다. 시점의 높이를 점점 낮춘다. 대기권에 진입해 구름을 통과하고, 고층 빌딩의 옥상 높이까지 내려오면 종이에 쿡 찍은 작은 점처럼 보일 거다. 생명 활동을 하니 ‘지구 생명체’로 분류된다. 자세히 관찰할수록 나는 여러 이름을 얻는다. 포유류, 인간, 아시아인, 한국인, 선거권자, 여성, 장녀, 노동자. 수없이 많은 단어의 나열 끝에야 내 이름 세 글자가 놓인다. 요즘에는 나를 이르는 또 다른 이름들을 생각하는 일이 잦다. 내가 개인이 아닌 어떤 집단의 일부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아시아인이 죽으면, 노동자가 죽으면, 여성이 죽으면, 내 일부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든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피 한 방울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만큼씩 헛헛하고 공허해진다. 이 공허함은 무력감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영화 ‘미키 17’의 주인공에게도 미키 반스라는 이름이 있다. 하지만 아무도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않는다. 미키 뒤에 넘버링을 붙이거나 익스펜더블이라 부른다. 익스펜더블(expendable)의 의미는 ‘소모용’. 이토록 무례한 형용사를 붙인 이유는 미키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키가 죽으면 유기체 프린터가 미리 스캔해둔 신체 정보를 활용해 새 몸을 프린트하고 저장해둔 그의 기억을 뇌에 삽입해 미키를 부활시킨다. 불로불사를 이룬 권력자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익스펜더블은 ‘케네스 마샬’이라는 막대한 부를 지닌 정치인―선거에서 두 번이나 낙선했다―이 인류가 새롭게 머물 니플헤임이라는 행성을 개척하기 위해 모집한 직업군 중 하나다. 익스펜더블은 온갖 위험한 일을 도맡는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행성에 인체에 해로운 바이러스가 있지는 않은지, 새로 개발한 백신의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온갖 실험의 피험자가 된다. 익스펜더블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 채 계약한 미키는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이 일을 계속한다. 잡히면 제 신체를 가지고 즐거운 살인 쇼를 벌일 사채업자를 피해 지구를 떠나야만 했고, 미키는 익스펜더블이 아니면 개척단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미키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가 살아나면 대수롭지 않게 새로운 숫자를 미키 뒤에 붙여 부른다. 노동자가 죽어도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또 다른 노동자를 들이는 것처럼, 미키는 끊임없이 죽고 살아나 익스펜더블의 자리를 채운다.
사실 예고편을 봤을 때는 노동자의 인권과 파시즘의 문제를 지적할 뿐 아니라 복제인간에 대한 논의를 펼칠 거라 예상했다. 신체와 기억을 복사한 것만으로 같은 사람을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실제로 여러 미키는 특징이 조금씩 다르고, 특히 미키 17과 미키 18은 완전히 다른 인물처럼 보일 정도로 성향 차이가 분명하다. 하지만 영화는 끝끝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던지지 않는다. 의아해하는 내게 실마리를 준 건 친구 L이었다. “이 사회가 양산형 제품처럼 다루는 노동자들이 결국 퍼스널리티가 다른 개개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 복제인간 이슈가 중점이 아니라 국가가 생산하고 버리는 노동자 1, 노동자 2가결국 하나의 개개인이라는 걸 외치는 느낌. 크리퍼도 모두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이름이 있었잖아.” 감독이 의도한 답이 아니더라도 내게는 충분했다.
미키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되고서야 미키 반스라는 이름과 존중받을 권리를 되찾는다. “불멸의 존재로 거듭났으나 필멸의 존재가 되어서야 존엄성이 생기는 아이러니다.”(각주 1) 본래 익스펜더블, 노동자, 채무자, 하층민과 같은 단어들은 죽을 수 없다. 개개인이 각기 다른 인격으로 다뤄질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게 된다. 이번호 ‘다시, 정원을 읽다’를 편집하며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정원들을 생각했다. 정원의 정체성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무분별하게, 전시적인 정치적 산물과 브랜딩 전략으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정원은 개개의 이름을 가진 가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을까. “모든 게 정원이어서 정원이 아무것도 아닌, 정원의 시대”(12쪽)를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번 특집이 ‘미키 17’를 보는 내내 날 불편하게 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었던 질문처럼 가닿기를 바란다.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각주 정리
1. 장혜령,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사랑 이야기’가 담아낸 것”, 『오마이뉴스』 2025년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