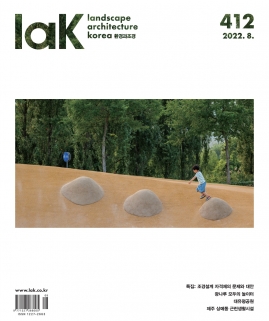한국과 미국의 조경사 제도 비교를 통해 현재 한국 조경설계 자격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 좀 더 체계적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한국과 미국 두 곳에서의 조경설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이슈를 간략히 소개한다.
뭐라고 불리는가? 이름의 문제
한국에는 ‘조경사’가 없고 조경기사와 조경기술사가 있다. 둘 다 영어로 번역하면 엔지니어(engineer)이고, 단어의 뒤에 분야를 수식하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붙는다. 본질적으로 조경 분야의 전문가를 ‘엔지니어’로 규정한다. 한자로 보아도 비슷하다. 기술사는 뭐고 기사는 뭐인지 의문이 들었는데 영어로 번역하니 오히려 명쾌하다. 하나는 ‘프로(pro)’고 다른 하나는 아니란다.
현재 ASLA(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ure, 미국조경가협회)는 자격증이 있는 조경 전문가에 대한 명칭을 ‘프로페셔널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로 통일하기를 권장하고 있다.2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는 랜드스케이프 디자이너(Landscape Designer)와 비교하여, 이미 자격증이 있어 아키텍트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사람3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본질적으로 조경사를 조경하는 설계사, 아키텍트인데 랜드스케이프를 하는 설계사(혹은 건축사)로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 모두 ‘자격증을 딴, 공인된, 등록된’ 보다는 ‘전문가(professional)’로 규정한 점은 비슷한 반면, 엔지니어냐 설계가냐가 다르다. 어느 쪽도 딱히 정답 같지 않다. 설계하는 전문가와 설계 이외의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도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르고, 조경 내 모든 분야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자격증이 조경설계사무소를 설립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일단 ‘설계사’라는 의미가 전문가의 명칭에도 담겨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게다가 한국에서 대부분의 조경학과는 공과대학(school of engineering) 소속도 아니다. 기사 시험을 보거나 취직해서 엔지니어링협회의 경력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까지 스스로를 엔지니어라고 인식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을 엔지니어라 부르거나 엔지니어링 전문가로 관리하게 된 현 상황은, 단순히 제도상의 편의에서 발생한 문제가 당사자들(조경가)의 게으름으로 인해 오랜 시간 굳어지며 만들어진게 아닐까.
조경기사와 조경기술사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조경 전문가 등 일부 주요 전문가를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은 비단 명칭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누가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보느냐만 살펴도 그 문제는 명확히 드러난다.
누가 딸 수 있는가? 자격의 문제4
한국과 미국의 자격증 획득 또는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개념이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보니, 표로 정리해도 일대일 비교가 쉽지는 않다. 두 나라의 다른 제도에 따른 결과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조경기술사가 되기까지 한국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걸 알 수 있다.5 특히 표 3처럼 4년 만에 기술사를 취득하려면 기사 자격을 실무 시작 전에 딴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졸업 이후 6년이 최소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해 훨씬 ‘세월’의 문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조경기술사 시험 합격률은 약 5%로 미국 조경사 시험 합격률 약 13%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6 조경기술사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많은 경우 6년보다 훨씬 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7
‘너무 쉽게 딸 수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은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쉽게 딸 수 없는 이유가 체계적이고 철저한 검증 때문이어야지, 응시 자격 획득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응시 자격 부여의 논리가 일관적이지 않아서라면 더욱 그렇다. 한국에는 미국 조경학과 또는 한국 건축학과처럼 체계적인 인증제가 없어 정해진 기준 없이 조경학과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시험 응시자격에서 요구하는 관련 학과 인정 기준이 학과의 ‘명칭’ 따위라는 것만 보더라도 제도의 허술함을 알 수 있다. 이 허술함 속에 학력과 경력, 시험 등 요건을 갖추는 순서는 딱딱하게 정해져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실무 경험도 없는 유사 분야 기술사가 시험만 잘 보면 조경기술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제도의 큰 허점이다.
얼마나 되기 어렵냐는 기준 하나로 제도의 문제점을 판단할 수는 없기에, 어떤 시험을 보고 뽑는 것인가,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가, 무엇보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조경기술사의 자격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궁금해진다.
* 환경과조경 412호(2022년 8월호) 수록본 일부
각주 정리
1. 공식 번역이 조경사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으나. 본 특집 기사에서 ‘조경사’를 다루고 있으므로 조경사라 한다. 조경사라는 이름이 과연 조경 분야 외부에서도 오해 없이 잘 통용되고 인식될지는 미지수다. 뜻의 정확성만이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내 명함에 적힌 ‘미국조경사’라는 작은 글씨를 대충 본 친구 한 명은, “미국경조사?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했고, 조경사라고 바로 읽고도 내가 뭘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듯했다.
2. LLA(Licensed Landscape Architect), RLA(Registered Landscape Architect) 등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이 있었으며, 다른 법규와의 혼돈이 가장 적고 유사 분야의 자격 호칭과 통일한다는 의미로 PLA로 결정했다. 여전히 주에 따라서 면허(licensure)와 등록(registration)을 별개로 보기도 한다.
3.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라고 부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4. 한국 자격증의 경우, 응시 자격을 알아보는 데만 해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큐넷(Q-net)의 정보는 불완전하고, 최근 몇 년간 작성된 개인 블로그의 정보와 상호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반면, 미국 조경 자격증 정보는 공인된 단일 채널(CLARB, 미국조경자격증관리위원회)을 통해 명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일일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마다 다른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 지도가 나와 있고, 알고 싶은 주를 클릭하면 준비 과정부터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5. 조경기사는 사실 기사 자격증을 갖고 경력 관리를 통해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특급이 되어야 기술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특급이 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공공 입찰시 참여기술인력 점수에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독립된 ‘자격증’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표 2와 표 3에서 한국의 조경기술사와 미국의 조경사 제도를 비교했다.
6. 이 합격률은 2021년에 시행된 시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적으로 공표된 2021년의 1, 2차(한국) 또는 1, 2, 3, 4섹션(미국) 모두를 통과하는 합격률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개된 정보는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각 단계를 모두 통과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했다. 두 나라의 시험 출제 관리 기관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비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7.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조경기술사와 조경사를 획득한 시점에서 평균 몇 년의 실무 경력을 가졌는지 자격증 신청을 위해서는 학력, 시험, 경력 세 분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력 조건이 채워지기 전에도 주에 따라 시험을 먼저 통과할 수 있다.
순서에 무관하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www.clarb.org)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시험이나 자격증 최종 검토 절차, 공식 명칭 등이 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출처: www.clarb.org)
이해인은 조경설계사무소 HLD 소장이다. 디자인을 통한 주장과 혁신이라는 철학 아래, 공간적 문제와 도전 과제에 대한 핵심적 개입 제공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