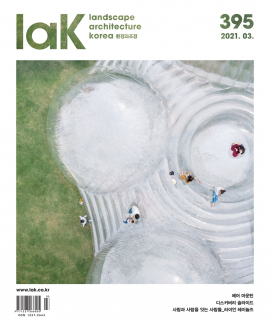출퇴근길 지하철 계단 오르기가 유일한 운동인 내게도 한창 뛰놀던 시절이 있었다. 친구들과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시도 때도 없이 동네를 쏘다니던 무적의 ‘초딩’ 시절. 토요일이면 4교시가 끝나기 무섭게 근처 시장으로 뛰어가 ‘방방’을 탔고, 학원 수업 전후 친구들과 모여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과 도둑, 얼음땡 같은 추격전을 벌였다. 주차장, 복도와 계단, 놀이터… 놀이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그때의 나는 어디서든 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만 학교 운동장만큼은 내게 그다지 유쾌한 장소가 아니었다. 종종 굴욕감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단지 키가 크다는 이유로 등 떠밀려 이어달리기 주자가 됐다가 역전을 당한 쓰라린(?) 기억이 있고, 무엇보다 나는 공 앞에서 몸이 자동으로 굳는 아이였다. 문제는 당시 초딩들 사이에서 피구가 엄청나게 유행해서 반 애들은 체육 시간만 되면 피구를 하겠다고 선생님을 졸라댔다는 점이다. 공에 맞는 것은 물론 누군가를 공으로 맞추기는 더 싫었지만, 단체 생활이 중요했던 그땐 조용히 흰 라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영화 ‘우리들’(2016)을 보자마자 내 안의 스위치 같은 게 켜진 건 당연한 반응이었다. 운동장을 배경으로 아이들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곳에서 초등학교 4학년 선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경직된 채로 서 있다. 피구 경기가 열리는 체육 시간,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씩 팀원을 고르는 편 가르기에서 선은 마지막에 남는 한 명이다. 공을 능숙하게 다루는 데도 날렵하게 몸을 피하는 데도 재주가 없어서 경기가 시작되기 무섭게 가장 먼저 공을 맞고 아웃된다. 운이 좋아 공에 맞지 않아도 “금 밟았다”는 지적을 받아 라인 밖으로 쫓겨난다. 선은 바쁜 엄마를 대신해 동생을 야무지게 돌보는 싹싹한 딸이지만 반에서는 늘 변두리를 맴돈다. 반면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 보라는 반에서 선을 적당히 배제하며 자신의 영역을 공고히 다진다. 영화는 선이 소외되는 이유를 분명히 짚어내진 않는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아이들 간 계급이 나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지만, 사실 따돌림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여름방학 첫날, 선은 같은 반으로 전학 온 지아를 우연히 만나 각별한 사이가 된다. 하지만 보라가 학원에서 지아를 만나면서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지아와 다시 친해지기 위해 선은 갖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으레 그렇듯) 어정쩡한 제스처는 더 큰 갈등과 오해를 불러온다.
부모라는 호칭이 더 어울리는 나이가 된 마당에 나는 선과 지아에 거의 일체화되다시피 해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내게도 새 학기를 앞두고 친한 친구와 다른 반이 될까 마음 졸였던 기억, 좋아하는 친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노력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 극 중 아이들은 일상을 뒤흔드는 위기에도 쉽게 울음을 터뜨리거나 선생이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모습이 안쓰럽고 대견하면서도 무섭도록 사실적이다. 어른들에겐 어른들의 문제가 있고 아이들에겐 아이들의 문제가 있듯, 두 세계는 전혀 다른 문법이 적용되는 생태계임을 아이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우리들’이 ‘Us우리들’이 아닌 ‘The World of Us우리들의 세계’로 번역된 점은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윤가은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왜 어린이만 주인공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왜 어른만 주인공으로 찍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이들도 삶의 주체인데요. 오히려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는 흔하지 않아서 귀하죠. 전 어제 일보다 20년 전 일이 더 생생히 생각납니다. 어쩌면 현재의 일은 어린 시절 겪은 일들의 반복과 변주에 불과할지 몰라요.”1
영화의 마지막 장면, 카메라 앵글은 다시 운동장의 아이들을 비춘다. 극적인 화해는 없다. 다만 한 아이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용기를 보여줄 뿐이다. 학교 혹은 동네 어딘가에 있던 열한 살의 나, 그리고 지금 그곳에 있을 열한 살들을 생각하니 아득해졌다. 그때의 나만 알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다. 어른이 된 나는 오늘을 보내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영영 알 수 없을 것이다.
각주 1. 백승찬, “윤가은 감독의 첫 장편영화 ‘우리들’…위선 따위 없어 더 사실적인 아이들의 정글”, 「경향신문」 2016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