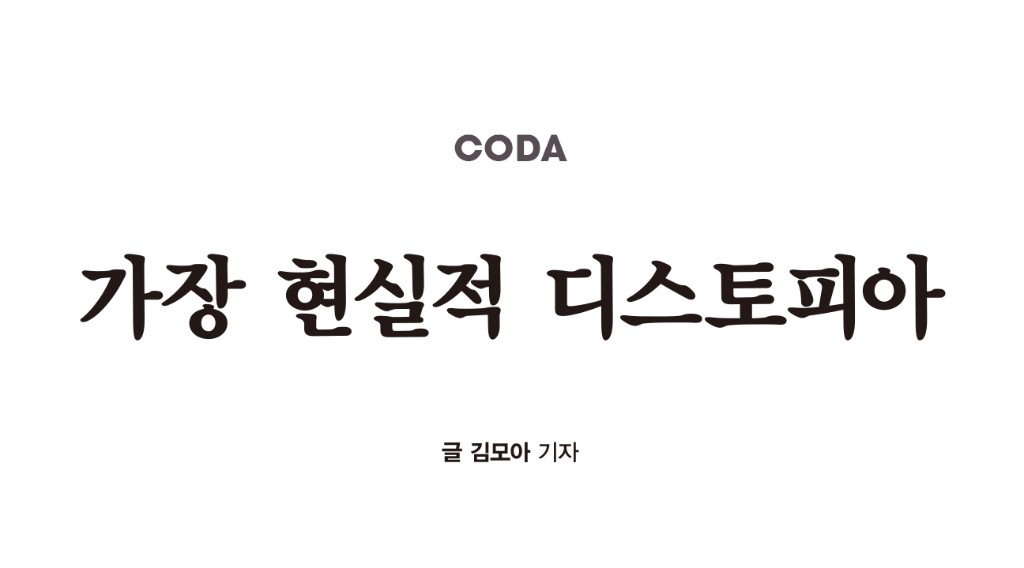
멍하니 달고나 커피에 올릴 크림을 휘젓고 있을 때만 해도 몰랐다. 집에 갇혀 지내는 생활이 이렇게 길어질 줄이야. 넉 달 가까이 자(타)발적으로 사회와 거리를 두다 보니 뜬금없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됐다.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집순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놈의 집구석이 지긋지긋하다. 하필이면 또 꽃놀이 가기 딱 좋은 날씨다. 내 아까운 봄! 이쯤 되니 정말 2020년을 무효로 하면 좋겠다는 허튼 생각도 든다. 나이도 한 살 깎아주면 더 좋고.
갑갑함을 참고 꾸역꾸역 칩거 생활을 이어나간 건, 일상의 흐름이 더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점점 줄어드는 신규 감염자 수를 볼 때면 한 것도 없이 괜히 뿌듯해졌다. 그러던 중 인터넷 기사에서 마주친 문장이 준 충격이 여태 생생하다. “이제 코로나 발생 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겁주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착잡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정말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만났던 디스토피아의 모습이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때문인지 예전보다는 자주, 좀비 떼가 달려드는 이야기보다 끔찍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더 무섭게 느낀다. 특히 그 시기가 지금과 가까울수록 더. 딱 적당한 예시가 떠올랐다. 러셀 T. 데이비스(Russell T. Davies)의 ‘이어즈 앤드 이어즈(Years & Years)’.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와 ‘닥터 후(Doctor Who)’로 이름을 알린 러셀은 인류를 향한 애정을 담은 작품을 선보여 왔다. 이어즈 앤드 이어즈는 브렉시트 후 영국의 15년을 그린 블랙 코미디 드라마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비정함, 그로 말미암은 비극을 거침없이 그린다. 극 속 지구의 북극에는 빙하가 없다. 나비는 멸종됐고, 조금씩 상승하는 해수면은 육지와 삶터를 삼키고, 극심한 기후 변화는 90일에 달하는 장마를 일상으로 만들었다. “세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빨라지며 미쳐 가는데 우린 멈추지도 생각하지도 배우지도 않고 다가올 재앙으로 질주하기만 해요. 이다음은 뭘까요?” 정치활동가가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다. 슬프게도 질문에 귀 기울이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은 점점 망해가는 지구에서 각양각색의 끔찍한 모습을 자랑하며 삶을 잇는다. 심지어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가 중국의 인공 섬에 핵폭탄을 날려도 일상이 계속된다. 단 몇 년 만에 수만 명의 사상자도, 방사능 피폭도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해프닝이 되어 버렸다.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하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보다는 당장 우리 집 앞에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걷는 걸 불편하게 만드는 인도 위의 차를 사라지게 할 방법에 더 마음을 쏟는다. AI와 기계의 발달은 아주 손쉽게 사람들을 일자리 밖으로 몰아내고 난민, 성 소수자, 장애인, 싱글맘, 유색 인종을 향한 차별은 점차 심화된다. 이럴 바에야 대형 지렁이가 나타나 지구를 ‘리셋’(이웃 지면 “목소리를 드릴게요” 참조)해 버리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즈음, 러셀은 다시 한 번 인류를 향한 낙관을 던진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앉아서 남 탓을 해. 경제 탓을 하고 유럽 탓을 하고 야당 탓을 하고 날씨 탓을 하며 광대한 역사의 흐름을 탓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핑계를 대지. 우린 너무 무기력하고 작고 보잘 것 없다고 말이야. 그래도 우리 잘못이지. 왜 그런 줄 아니? … 거리 시위는 했니? 항의서는 썼어? … 안 했지. 씨근덕대기만 하고 참고 살았어. … 그러니까 우리 탓이 맞아. 우리가 만든 세상이야.” 항상 비극 속에서 해답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온 러셀이 하려던 말은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만 들 수도 있다고.
코로나로 세계 곳곳이 혼돈에 휩싸였는데 생태계는 도리어 평화를 되찾은 듯 보인다. 퓨마와 여우, 곰 등 야생 동물들이 텅 빈 도심을 유유자적 거닐고, 관광객이 사라진 해변에 다시 찾아온 플랑크톤은 바다를 형광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게다가 당장 마스크 너머로 느껴지는 공기가 너무 신선하다. 폐쇄된 아쿠아리움 내부를 구경하며 자유 시간을 즐기는 펭귄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알면서도 모른척 해온 것들이 너무 많다. 특집 지면을 매만지며 “조경의 기술과 지력으로 기후 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여러 위기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받는 타격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번 호 14쪽)을 믿는다는 김정윤 소장의 말이 오래 기억에 남은 이유다. 더 이상 자연환경이라는 단어는 조경을 꾸며주는 낭만적 수식어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