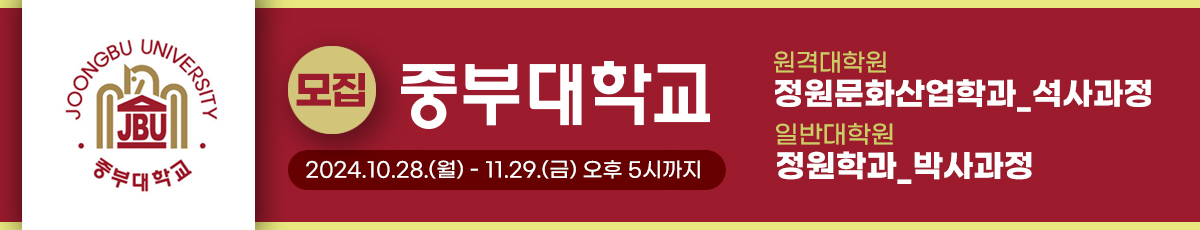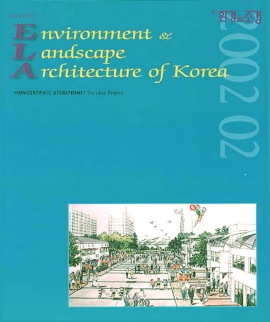이 도시는 바로크식 도시이다. 전제왕권 스타일의 바로크 건물로 지워진 도시이다. 바로크는 유행처럼 번져 나갔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추구하는 바로크식 도시가 되었고, 파리, 런던도 마찬가지이다.
뻬쩨르브르그는 바로크를 파리, 런던 등 유럽 주요도시에서 가져왔다. 브라질의 행정수도 역시 원시림을 개발하여 만든 인스탄트 바로크 도시가 아닌가? 뻬쩨르브르그는 이 시기의 신도시이다. 모스크바로부터 무려 7백여 킬로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신도시를 만든 것이다. "유럽으로 난 창문"으로 우리에게 레닌그라드로 알려졌던 도시. 이 도시가 1703년 5월에 세워지고 정식으로 러시아의 수도가 될 때까지 9년을 기다려야 했다. 왜냐하면 로마노프왕조가 대법원과 연방정부청사를 이 곳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뾰뜨르(1672-1725)는 선진문화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서유럽으로 떠난다. 쿠데타 소식을 접하고 겁이나 1년 6개월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그는 이끼가 가득 찬 습지와 진흙탕에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하나 하나 실천에 옮긴다. 발트해를 거머쥐고 유럽을 자유롭게 왕래하고자 하는 그의 염원은 유럽에서 내로라 하는 큰 도시를 만드는 길이라는 의지를 불태우게 하였다. 이 길만이 러시아가 서유럽에 대한 콤프렉스를 벗어 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스웨덴이 발트해를 떡 버티고 있는 바람에 유럽통로가 봉쇄되자 그는 스웨덴과 북방전쟁을 일으켜 승리하게 된다. 승전은 국민들을 도시건설에 동원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었다. 우선 뾰뜨르는 네바강 하구에 외침에 대한 든든한 방어의 수단으로 요새 구축을 서두른다. 요새를 필두로 하여 도시는 서서히 그 거대한 위용을 들어내기 시작한다.
뾰뜨르대제는 유럽 선진도시의 계획방식과 건축양식을 골고루 받아들여 도시를 계획하되, 건축물은 모두 돌로 만들라고 명령한다. 이 당시 뽀뜨르대제는 테크로크랏을 비롯한 수 만 명의 농민을 전국에서 차출하여 운하를 구축하고 다리를 놓고 건물을 짓는다. 마치 황량한 사막에 도시를 세우는 것처럼… 1703년에 단추를 낀 사업이 한 세기에 걸쳐 진행된 것이다. 18세기에 이렇게 거창하고 화려한 신도시가 만들어 진 것은 유럽의 도시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대역사인 것이다.
▲ 저녁노을과 햇살이 깔리는 네바강의 풍경 진흙탕과 밀림이 전부였던 습지대가 도시적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동원된 국민들(주로 농민)은 중노동, 그리고 배고픔과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했다. 도시건설 현장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되었다. 마치 전장에서 죄 없는 병사들이 쓰러지듯이… 이 도시건설에 묻힌 많은 희생자들 때문에 이 도시의 별명 같은 이름 "사람의 뼈로 이루어진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다. 서유럽과 북유럽 사람들은 짧은 기간에 이토록 유럽형의 아름다운 도시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경외의 찬사를 보내는 한편 적지 않은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도시가 형성되자 유럽에서는 뻬쩨르브르그를 유럽의 일원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도시 하나가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은 것이다. 북방전쟁의 승리에다 유럽형 도시의 건설로서 유럽을 오가는 길목인 발트해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다. 백야를 지나 잠시 어두워 지더니만 이내 아침해가 둥그러니 솟아 오른다. 구두끈을 고쳐메고, 손가방을 챙기고 길을 나선다. 나직하고 완강한,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온다. 아침해를 두팔로 끌어 안으며 어제와는 다른 길을 간다. 또 다른 곳에 우리의 발자국을 찍으러...
네프스키 거리를 간다. 이 도로는 역시 뻬쩨르브르그의 상징가로이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뻬쩨르브르그의 길은 모두 네프스키로 통한다. 이 도로는 역사성, 상징성, 그리고 중심성을 지니고 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상가, 은행, 공공건물, 그리고 도로 이면에는 주택등이 포진하고 있다. 18세기와 19세기 문호 도스도예프스키, 고골리, 푸시킨 등이 이 도로를 무대로 글을 쓰고, 이데아를 논하고, 시상을 떠올렸다. 이 길을 통해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 길에서 시민들이 외치는 혁명적 요구가 러시아 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퍼져 나갔다. 뻬쩨르브르그의 길을 모두가 넓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로들은 사람보다는 대제를 위하고, 권위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대로 중심의 이 도시는 중세도시의 모습을 간직한 대부분의 유럽도시들과는 엄연한 차별성을 지닌다. 중세형 유럽도시에는 큰 길이 없다. 똑바른 길도 드물다. 기하학적 질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어느 중세형 도시의 도로는 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고, 방향성도 모호하다. 구불구불한 길은 도시 어느 곳에서라도 중심광장으로 사람들을 안내해 준다. 그러면 성당이나 시청사는 마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타나게 마련이다.
원 제 무 Won, Jaimu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뻬쩨르브르그는 바로크를 파리, 런던 등 유럽 주요도시에서 가져왔다. 브라질의 행정수도 역시 원시림을 개발하여 만든 인스탄트 바로크 도시가 아닌가? 뻬쩨르브르그는 이 시기의 신도시이다. 모스크바로부터 무려 7백여 킬로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신도시를 만든 것이다. "유럽으로 난 창문"으로 우리에게 레닌그라드로 알려졌던 도시. 이 도시가 1703년 5월에 세워지고 정식으로 러시아의 수도가 될 때까지 9년을 기다려야 했다. 왜냐하면 로마노프왕조가 대법원과 연방정부청사를 이 곳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뾰뜨르(1672-1725)는 선진문화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서유럽으로 떠난다. 쿠데타 소식을 접하고 겁이나 1년 6개월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그는 이끼가 가득 찬 습지와 진흙탕에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하나 하나 실천에 옮긴다. 발트해를 거머쥐고 유럽을 자유롭게 왕래하고자 하는 그의 염원은 유럽에서 내로라 하는 큰 도시를 만드는 길이라는 의지를 불태우게 하였다. 이 길만이 러시아가 서유럽에 대한 콤프렉스를 벗어 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스웨덴이 발트해를 떡 버티고 있는 바람에 유럽통로가 봉쇄되자 그는 스웨덴과 북방전쟁을 일으켜 승리하게 된다. 승전은 국민들을 도시건설에 동원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었다. 우선 뾰뜨르는 네바강 하구에 외침에 대한 든든한 방어의 수단으로 요새 구축을 서두른다. 요새를 필두로 하여 도시는 서서히 그 거대한 위용을 들어내기 시작한다.
뾰뜨르대제는 유럽 선진도시의 계획방식과 건축양식을 골고루 받아들여 도시를 계획하되, 건축물은 모두 돌로 만들라고 명령한다. 이 당시 뽀뜨르대제는 테크로크랏을 비롯한 수 만 명의 농민을 전국에서 차출하여 운하를 구축하고 다리를 놓고 건물을 짓는다. 마치 황량한 사막에 도시를 세우는 것처럼… 1703년에 단추를 낀 사업이 한 세기에 걸쳐 진행된 것이다. 18세기에 이렇게 거창하고 화려한 신도시가 만들어 진 것은 유럽의 도시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대역사인 것이다.
▲ 저녁노을과 햇살이 깔리는 네바강의 풍경 진흙탕과 밀림이 전부였던 습지대가 도시적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동원된 국민들(주로 농민)은 중노동, 그리고 배고픔과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했다. 도시건설 현장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되었다. 마치 전장에서 죄 없는 병사들이 쓰러지듯이… 이 도시건설에 묻힌 많은 희생자들 때문에 이 도시의 별명 같은 이름 "사람의 뼈로 이루어진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다. 서유럽과 북유럽 사람들은 짧은 기간에 이토록 유럽형의 아름다운 도시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경외의 찬사를 보내는 한편 적지 않은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도시가 형성되자 유럽에서는 뻬쩨르브르그를 유럽의 일원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도시 하나가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은 것이다. 북방전쟁의 승리에다 유럽형 도시의 건설로서 유럽을 오가는 길목인 발트해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다. 백야를 지나 잠시 어두워 지더니만 이내 아침해가 둥그러니 솟아 오른다. 구두끈을 고쳐메고, 손가방을 챙기고 길을 나선다. 나직하고 완강한,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온다. 아침해를 두팔로 끌어 안으며 어제와는 다른 길을 간다. 또 다른 곳에 우리의 발자국을 찍으러...
네프스키 거리를 간다. 이 도로는 역시 뻬쩨르브르그의 상징가로이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뻬쩨르브르그의 길은 모두 네프스키로 통한다. 이 도로는 역사성, 상징성, 그리고 중심성을 지니고 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상가, 은행, 공공건물, 그리고 도로 이면에는 주택등이 포진하고 있다. 18세기와 19세기 문호 도스도예프스키, 고골리, 푸시킨 등이 이 도로를 무대로 글을 쓰고, 이데아를 논하고, 시상을 떠올렸다. 이 길을 통해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 길에서 시민들이 외치는 혁명적 요구가 러시아 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퍼져 나갔다. 뻬쩨르브르그의 길을 모두가 넓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로들은 사람보다는 대제를 위하고, 권위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대로 중심의 이 도시는 중세도시의 모습을 간직한 대부분의 유럽도시들과는 엄연한 차별성을 지닌다. 중세형 유럽도시에는 큰 길이 없다. 똑바른 길도 드물다. 기하학적 질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어느 중세형 도시의 도로는 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고, 방향성도 모호하다. 구불구불한 길은 도시 어느 곳에서라도 중심광장으로 사람들을 안내해 준다. 그러면 성당이나 시청사는 마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타나게 마련이다.
원 제 무 Won, Jaimu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댓글(0)
최근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