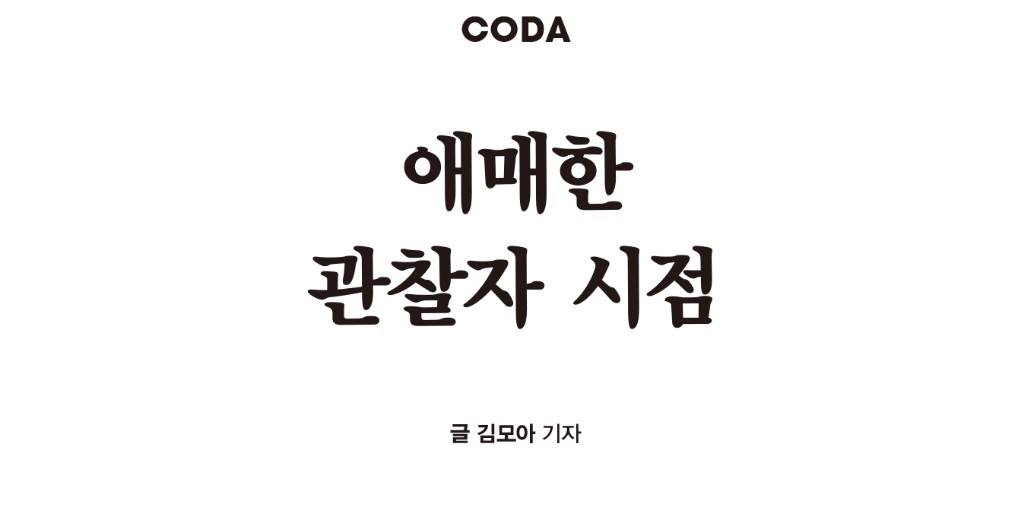 학교나 직장은 집에서 먼 곳으로 다닐 것. 넘쳐나는 시간을 대학교 주변 카페를 탐방하며 까먹던 새내기 시절, 재미 삼아 들린 사주 카페에서 뜻밖의 조언을 들었다. 모든 세상사에 달관한 듯한 눈빛의 역학자는 내 사주에 역마살이 끼어 있다며 집에서 먼 곳으로 나다닐수록 일이 잘 풀릴 거라 이야기했다.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길 수 있는 충고를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는 이유는 내가 30여 년을 한 동네 주변을 맴돌며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를 몇 번 했지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통학 시간이 걸어서 30분을 넘겨본 적이 없다. 한때 인턴으로 오갔던 평촌의 연구소가 집에서 가장 먼 일상 공간이었다.
학교나 직장은 집에서 먼 곳으로 다닐 것. 넘쳐나는 시간을 대학교 주변 카페를 탐방하며 까먹던 새내기 시절, 재미 삼아 들린 사주 카페에서 뜻밖의 조언을 들었다. 모든 세상사에 달관한 듯한 눈빛의 역학자는 내 사주에 역마살이 끼어 있다며 집에서 먼 곳으로 나다닐수록 일이 잘 풀릴 거라 이야기했다.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길 수 있는 충고를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는 이유는 내가 30여 년을 한 동네 주변을 맴돌며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를 몇 번 했지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통학 시간이 걸어서 30분을 넘겨본 적이 없다. 한때 인턴으로 오갔던 평촌의 연구소가 집에서 가장 먼 일상 공간이었다.
덕분에 동네의 변화를 낱낱이 목격하며 자랐는데, 모교가 될 줄 몰랐던 동네의 대학교도 관찰 대상 중 하나였다. 초등학생 시절 나는 주말이면 캠퍼스 뒤편의 산에 올라 배드민턴을 치거나 중앙로에서 롤러블레이드를 탔고, 여름방학에는 학생회관 앞 잔디밭에서 대학 풍물 동아리가 진행하는 장구 배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캠퍼스를 동네 공원처럼 누비고 다닌 탓에, 신입생 주제에 얼마 전 학교로 돌아온 복학생이라도 되는 양 변해버린 학교를 아쉬워하곤 했다. 뒷산 앞 잔디 언덕을 덮은 캐스케이드와 스탠드, 장구를 배웠던 잔디밭을 밀어내고 들어선 농구 코트가 그랬다. 특히 자그마한 잔디 언덕과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캐스케이드는 왕릉 같은 역사 유적지를 연상시켜 매우 기이했다. 그 후에도 작은 변화들이 캠퍼스를 야금야금 바꾸어 나갔다. 밀려드는 과제만으로도 벅찬 학기를 보내던 나는 그 변화가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한 채 달라지는 캠퍼스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의문을 품게 된 건 어느 여름, 입구 리노베이션 공사를 목전에 둔 때였다. 우리 학교 정문은 좁고 볼품없기로 유명했는데, 정문 가까이 대학 본관으로 쓰였던 오래된 건물이 있고 그 건물만큼 나이를 먹은 큰 나무들이 모여 자라고 있었다. 작지만 알찬 숲은 정수리로 내리꽂히는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등굣길이었는데, 학교는 정문다운 정문을 위해 그 숲을 매끈한 광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자세한 속사정을 알 수 있었던 건 이를 막기 위해 벌어진 서명 운동 때문이었다. 나무를 베지 않고도 정문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조감도에 그려진 작은 녹지에서는 존치될 예정인 큰 나무가 살 수 없다는 점이 주요 골자였다. 전공 교수님도 그 나무들의 가치를 강조하며 서명을 독려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명에 참여했는지 알 수 없지만,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몇 개월 뒤 여느 학교에 있을 법한 회백색 판석으로 마감된 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광장의 완만한 경사가 보드를 타기에 적당하다는 말이 돌며 보더들이 모여들자 독특한 풍경이 연출됐다. 햇볕이 따가운 날이면 광장은 허옇게 빛나며 열기를 반사했고, 커다란 독일가문비는 수액 링거를 맞으면서도 시들시들 마르다가 어느 날 아침 사라졌다. 그 광장을 지날 때면 가끔 묘한 감정이 피어났다. 학교의 주인이지만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참여할 자격을 갖지 못한 관찰자가 된 기분. 그렇다고 무언가를 실천하기엔 겁도 많고 행동력도 없는 내가 참 한심하게 느껴졌다.
재개발을 앞둔 을지로를 생각하면 그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지난 겨울 방문한 세운상가에서 내려다본 을지로에는 근대에 지어진 적벽돌 건물, 그에 덧댄 슬레이트 지붕과 외부 계단이 형성한 독특한 풍경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처절하지 않게 만든 건 개미굴처럼 꼬불꼬불하게 얽힌 골목길에서 바쁘게 짐을 나르며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고쳐 쓰기보다 새로 짓기를 좋아하는 도시재생 정책에 밀려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 오랜 시간 촘촘하게 짜인 산업 생태계에 기대어 일해 온 관련 업종 종사자나 예술가는 어디로 가야 할까. 재개발 반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관찰자가 아닌 을지로의 주인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번에도 애매한 관찰자 자리에 선 나는 아쉬움을 담은 짧은 글으로 그들에게 보내는 응원을 대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