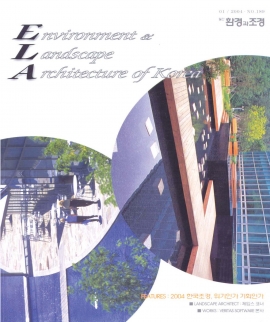- 조경비평의 현재적 위치 찾기 -
2003 그곳에 가다
2002년 개장한 선유도공원은 ‘애초부터 비평을 의식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선유도를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했다. 예상 밖이었다는 배정한의 평처럼 선유도공원은 우리공원사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왔다. 감각과 기억, 발견이라는 관점의 조경진의 비평은 이미 우리 조경이 장소의 구성에서 장소의 발견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선유도공원에 대한 비평과 해설, 건설지까지 출판이 된 마당에 필자는 어찌하여 이번 비평공모에 다시 선유도공원을 문제삼은 것일까. 그것은 선유도공원이 조경진의 지적처럼 open text로서 다각도의 비평을 요구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 시청 앞 광장과 서울 숲 등 최근 설계공모에서 보여지는 설계의 경향이 선유도공원의 그것과 연관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몇몇 한계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이곳이 그리하여 필자에게는 중요한 작업으로 여전히 의미가 있다. Duisburg-Nord Landscape Park를 벤치 마킹한 것이었다는 점이 가슴에 남기는 하지만, 서구 관념의 직수입과 적용이라는 다분히 오래된 국내 설계의 방법을 볼 때 오히려 적극적인 도입과 발전이 더 의미를 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하여 선유도공원이 주는 의미들을 다시 살펴보고 재음미의 과정을 통해 선유도공원이 주는 새로운 발견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것으로 조경비평의 현재적 역할을 생각해보겠다.
선유도+선유도공원
양화대교를 건너 들어선 선유도공원은 처음, 녹이 슨 공원명패로부터 다가왔다. 낡고 뭔가 특이하다는 느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두려움으로 변하였다. 입구의 명패에서 느꼈던 일종의 가벼운 충격이 공원을 걸으면서 반복적으로 되살아나 이곳을 두려움으로 정리해 주었던 것이다. 감각을 자극해 오는 다양한 경관들이 어찌하여 필자에게는 두렵게 느껴졌는지 이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보여주기가 강요하는 반성과 사고 전환의 느낌이었다.
그러나 처음 방문한 공원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는 없었다. 움직임과 생명을 느끼기에 공원은 죽어있는 물체들이 주는 감각이 너무 강했다. 그것이 감각의 지배인지 멜랑콜리인지 처음엔 알 수 없었다.
공원 곳곳에 놓인 안내판이 녹이 슬어가는 철판으로 세워져 있었고, 철거하다 만 듯한 콘크리트는 그 험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물성의 표출은 강한 상징성과 의미로 인해 숨이 막히게 했다. 그것이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첫 방문의 기억
선유도공원과 관련된 출판물에는 기억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억은 대체 무엇일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강 너머의 정수장에 대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란 무엇이 있을까. 선유도의 기억이란 것은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그것이다. 허나 이곳에 대한 대중적인 기억이란 것은 별로 많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선유도 근처에 사는, 접근가능한 사람들만의 기억이 아니라는 셈이 된다. 선유정수장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의 기억이 이 지점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때에 서울의 도시화라는 총체적인 역사가 개입되게 된다. 다시 말해 선유정수장에 대한 기억은 한국현대사의 기억과 그대로 맞물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에게도 기억의 장소로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이촌향도와 더불어 영등포 공단에 다닥다닥 밀집되기 시작한 벌집들의 기억이 여기에서 작용한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생필품, 상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선유도의 위치, 그것이 여기서의 기억과 겹쳐지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공돌이, 공순이’로 불린 지난 시대의 생산의 역동성은 하나둘 화려한 이미지로 덮여 지워져가고 있다. 감추어졌던 기억과 역사가 선유도공원에서의 기억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이다.
처음 선유도에서 받은 인상은 아마도 이것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리라. 이 거대한 시설물이 보여주는 것은, 후면에 감추어졌던 기구들이 한꺼풀의 치장도 없이 본래 위치를 벗어나 전시되면서 장소의 본래 쓰임을 생각게 한다는 것이다. 너무도 적나라하게, 마치 배를 열어 내장을 드러내듯 ‘죽은’(가동이 멈추었으므로) 기관들을 아무렇지 않게 전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자유로움과 풍요가 지난 세대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채 감각적 풍요로움만을 좇는 현상에 대한 반성이요 제동으로 보인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편리하게만 살아온 내게 그것은 충격을 넘어 두려움이었던 것이다.
이런 느낌은 잘린 관에 다가서면서 더욱 강해졌다. 마치 저 시커먼 구멍들이 절단되어 버린 혈관이나 되는 양, 시커멓게 드러난 굵은 관들은 그대로 무서운 수렁으로 다가왔다. 첫 방문에서 시간의 정원에 들어서지 못하고 주저와 망설임 끝에 결국 내려서지 못한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특히 전시관 내의 기계들에서는 마치 심장에 들어앉아 죽어버린 대동맥을 마주하고 있는 듯 했다. 감각은 상상을 낳았고, 상상은 다시 감각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각적 충격은 두세 번의 방문을 통해 나아졌고 선유도공원이 보여주는 설계의 전략 탐색도 가능해졌다. 감각이 먼저 의미를 압도하였던 첫 방문의 기억은 이후 여러 번의 방문을 통해 감각에의 내성을 갖게 했고 비평적 시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안 명 준 Ahn, Myung Jun · 서울대 대학원 조경학과
댓글(0)
최근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