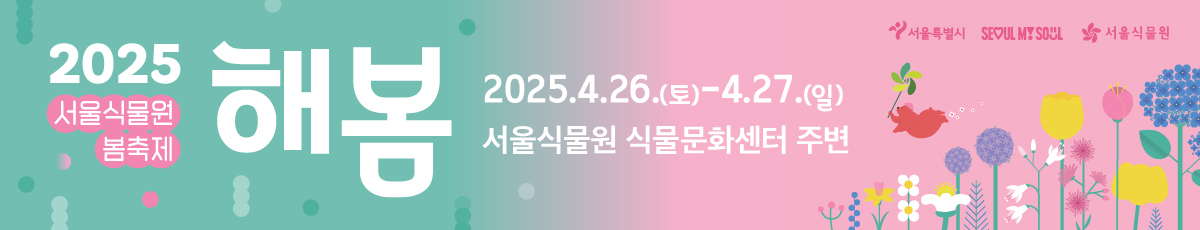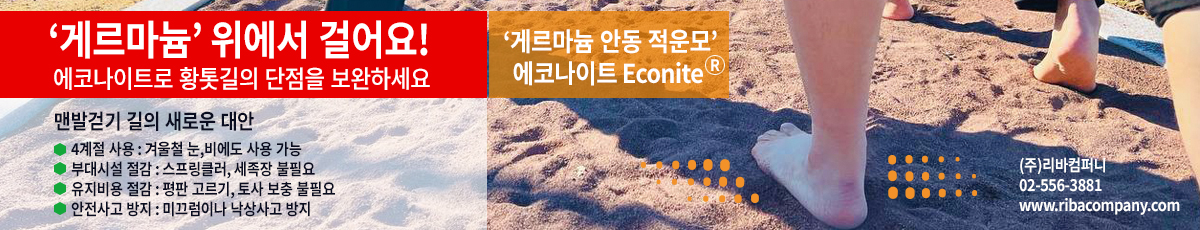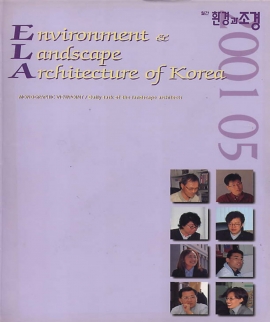우리시대의 설계언어 : 프랑스(20)
- 프랑스의 경관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2) 마지막회
박 정 욱 Park, Jung Wook · land plus art 연구소장, 파리 소르본느대학 박사
- 해체주의 조경비평에 언어적 논리를 빌어오고 막연하게 회화적으로만 해석되어 왔던 조경을 언어학적으로 다시 조율할 때 과연 어떤 논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기호학의 입장은 기표와 기의로 조경을 해석하는데 이는 결국 언어학의 문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통한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언어의 논리를 계속 적용하다보니 지나치게 구조와 체계에 집착하여 궁극적으로 통합된 거대한 구조에 의한 기계적 시스템으로 조경을 파악하기 쉽다는 것이다. 항상 논리는 구조의 환상 속에 젖어있다. 설계를 할 때 어떤 논리를 세우다 보면 결국 억지로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조의 환상 속에 작업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구조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조경은 건축적이 되고 조경 자체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베르나르 츄미가 라빌레트 공원에서 제시했던 안이 신선했던 것은 건축을 해체하면서 조경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축 안에 흡수되려 했던 조경의 영역을 오히려 건축과 다른 논리에서 시작함으로써 조경이 건축을 깨고 나오도록 설계했다는데 있다. 해체주의가 건축 분야에서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논리가 궁극적으로 구조를 지향하는 건축에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이고 해체주의 작품으로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건축 설계가 아니라 조경 설계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경이 본질적으로 해체와 통하는 영역임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프랑스의 경관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2) 마지막회
박 정 욱 Park, Jung Wook · land plus art 연구소장, 파리 소르본느대학 박사
- 해체주의 조경비평에 언어적 논리를 빌어오고 막연하게 회화적으로만 해석되어 왔던 조경을 언어학적으로 다시 조율할 때 과연 어떤 논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기호학의 입장은 기표와 기의로 조경을 해석하는데 이는 결국 언어학의 문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통한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언어의 논리를 계속 적용하다보니 지나치게 구조와 체계에 집착하여 궁극적으로 통합된 거대한 구조에 의한 기계적 시스템으로 조경을 파악하기 쉽다는 것이다. 항상 논리는 구조의 환상 속에 젖어있다. 설계를 할 때 어떤 논리를 세우다 보면 결국 억지로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조의 환상 속에 작업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구조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조경은 건축적이 되고 조경 자체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베르나르 츄미가 라빌레트 공원에서 제시했던 안이 신선했던 것은 건축을 해체하면서 조경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축 안에 흡수되려 했던 조경의 영역을 오히려 건축과 다른 논리에서 시작함으로써 조경이 건축을 깨고 나오도록 설계했다는데 있다. 해체주의가 건축 분야에서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논리가 궁극적으로 구조를 지향하는 건축에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이고 해체주의 작품으로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건축 설계가 아니라 조경 설계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경이 본질적으로 해체와 통하는 영역임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댓글(0)
최근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