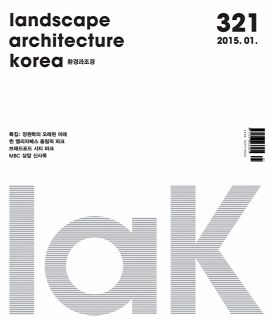단독 주택에 산 지 만 5년이 되어간다. 주변엔 논과 도라지 밭, 조경수 농장, 미군부대가 자리하고 있던 공터와 나지막한 산, 그리고 고만고만한 주택 몇십 채만이 자리하고 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주는 관리사무소도 없고, 놀이터도 어린이집도 없다. 슈퍼, 세탁소, 부동산, 학원 등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상가 건물도 없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반경 내에 무엇인가를 살 수 있는 곳이래야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는 구멍가게뿐이다. 앵글로 만들어진 진열대 안쪽에 있던 물건을 꺼낼라치면, 수건으로 먼지를 털어주신다. 물건을 들여 놓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마트와는 달라도 한참 다른 곳이다. 그렇다고 그 먼지의 두께가 덕지덕지 들러붙은 정도는 아니다. 가볍게 후후 불면 날아갈 정도이니, 아주 시골은 아니란 이야기다. 아, 그러고 보니 몇 달 전에는 치킨 집이 하나 오픈했다. 장사가 될까 싶었는데, 여전히 늦은 귀가 시간에도 불을 밝히고 있다. 왠지 모르게 다행이다 싶다.
주말 아침이면 동네 이장님의 방송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주로 경로당에서 무슨 모임이 있으니 참석하라는 멘트다. 아파트 거실 벽에 달린 스피커를 통해 관리사무소의 안내 방송만 듣다가, 단독 주택으로 이사한 후 처음으로 허공을 가르며 들려오는 “아~ 아~ ○○○ 4리에서 알려드립니다”란 메아리를 들었을 때의 생경함은 지금도 쉽게 잊히지 않는다. “역시 ‘읍’은 뭔가 달라!”라고 중얼거렸던 것도 같다.
그렇다. 행정구역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읍’이다. 하지만 아주 시골은 아니다.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만 가면, 아내와 내가 농담 삼아 ‘읍내’라고 부르는 곳에 제법 규모 있는 마트를 비롯해서 웬만한 것들은 모두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묘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걸어서 가기에는 약간 망설여지는 거리다. 한 15분 정도 걸리려나? 그보다 조금 더 걸릴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자가용으로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지만, 그 풍경은 사뭇 다르다.
5분을 경계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없는 것투성이다. 하지만, 이곳에만 있는 것들도 있다. 겨울이면 20분 가까이 눈을 치워야 하는 마당과 집 앞 도로(이걸 도로라고 표현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다. 교행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차 한 대만 지나다닐 수 있는 시멘트 포장길이다)가 있고,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허리를 굽히게 만드는 잔디밭(사실 잔디‘밭’이라고 하기에는 옹색한 면적이다)도 있다. 이 잔디란 녀석은 제 때 깎아주지 않아 늘 아내의 핀잔을 달고 살게 만드는 원흉이다. 정원 책을 만들며 부르짖던(?) ‘정원 일의 즐거움’을 직접 만끽할 때가 되었다며, 아내는 내 손에 기어이 제초가위를 들려 등을 떼민다.
물론 나의 극렬한 저항이 성공할 때가 많아, 그 횟수는 일 년에 채 몇 번 되지 않는다. “정글을 가꾸는 게 취미인가 봐요” 지나가는 말로 그녀가 툭 내뱉으면, 나는 “굉장히 생태적이지 않아요”라고 딴청을 핀다. 그래도 여름과 늦가을 사이, 두세 번 혹은 서너 번 잔디와 사투를 벌이고 나면 기분은 썩 괜찮다. 다음에 다시 단독 주택에 살게 되면 잔디밭이 아니라 클로버 밭을 꼭 만들겠다고 농담 아닌 진담처럼 말하곤 하지만 말이다.
참, 잔디밭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집과 세트로 딸려 있던 녀석이다. 제대로 정원을 가꾸게 되면 반드시 배제시키리라 다짐했던 3종 세트(잔디밭, 철쭉, 회양목) 중에 무려 두 가지가, 이사 왔을 당시에 (정원이 아닌) 마당의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었다. 엄살을 피웠지만, 단독 주택에서의 삶은 대체로 만족스럽다. 층간 소음에서 해방된 점도 그렇고, 2층 집이어서 구조가 입체적인 것도 마음에 든다. 여전히 불편한 점은 존재하지만….
원래는 회사의 사무실 이전 소식을 다루려고 했는데, 딴소리만 잔뜩 늘어놓았다. 방배동으로 이사와 며칠을 다녀보니, 문득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 온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집에서도 치우던 눈을 파주 사옥에서도 치워야 했고, 잔디밭은 없었지만 해마다 가을이 되면 적지 않은 양의 낙엽을 치워야 했다. 게다가 낙엽이란 녀석은 해마다 그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파주 사옥이 막 지어졌을 때, ‘이게 언제 자라서 벽면을 가득 채울까’하며 안쓰럽게 쳐다봤던 담쟁이덩굴은 이제 두려울 정도로 낙엽을 생산해내는 낙엽자판기가 되었다. 한 마디로 파주 사옥은 직장 판 단독 주택인 셈이었다.
창문만 열면 8차선 대로가 펼쳐지는 ‘따뜻한’ 방배동 사무실에서, 파주 시대를 개인적으로 정리해보다가 ‘지금 살고 있는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과는 그만큼 차원이 다른 이사일 테니까.
마지막으로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 단순하지만 시선을 끄는 절제된 구도와 여백이 적절히 어우러진 담백함이 제 맛이었던 ‘유청오의 이 한 컷’이 이번 호에는 전혀 다른 성격과 소재의 사진으로 채워지게 되었으니 말이다. 2006년 2월부터 시작된 짧지 않았던 ‘파주 시대’를 마감하는 소회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독자 여러분께는 송구스러울 뿐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진 촬영에 공들인 유청오 작가에 대한 고마움은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그와의 촬영은 유쾌했다. 앵글 속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초보 모델들의 긴장감을 무장 해제시키는 그의 능수능란한 조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추억할만한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새빨간 넥타이를 매고 왔건만 지나치게 우측으로 몸을 튼탓에 전혀 빨간색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 사실을 일러주지 않은 점은 무척 서운하지만 말이다. 참, 김정은 편집팀장도 붉디붉은 치마를 차려 입고 왔는데, 외투에 가려 사진에서는 전혀 레드 컬러가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왜 시뻘건 넥타이를, 김정은 팀장은 왜 곱디고운 붉은 치마를 입고 왔던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