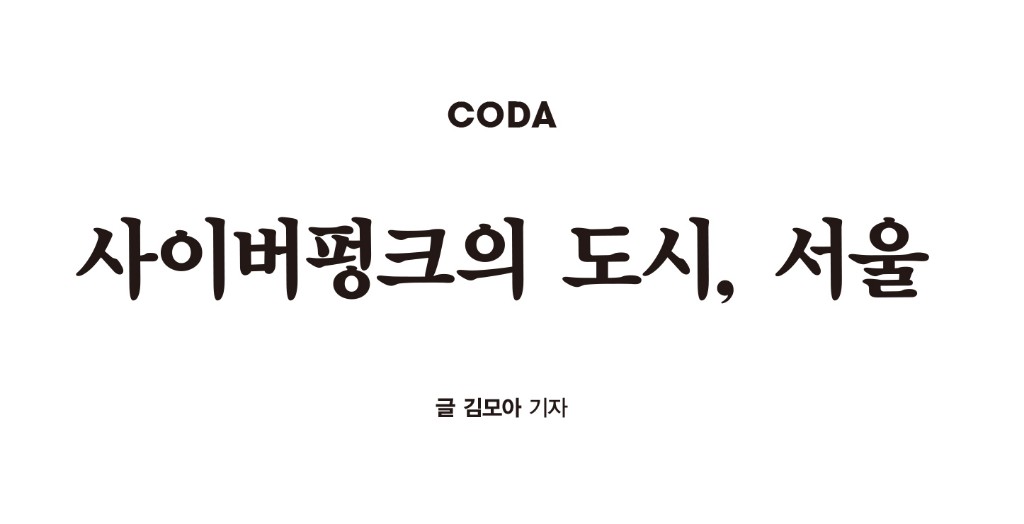
줄곧 땅속을 달리던 출근길 지하철이 단 한 번 지상에 오르는 순간이 있다. 온종일 사람으로 북적이는 건대입구를 지나 뚝섬유원지에 돌입한 지하철은 어두컴컴한 지하 대신 한강 위 청담대교를 달린다. 길어야 5분, 해를 마주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꽤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과 책에서 시선을 떼고 창밖을 바라본다. 아침 햇빛에 반짝이는 한강과 탁 트인 전망, 발밑을 울리는 지하철의 경쾌한 리듬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 없다. 그런데 요즘은 그 풍경을 감상하는 일이 마냥 즐겁지는 않다. 지하철에는 마스크로 중무장한 사람이 가득하고, 한강 저편 고층 빌딩의 등허리는 미세 먼지로 부옇다. 빌딩들의 형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로도 하늘이 잿빛인 날에는 꼭 디스토피아를 그린 SF 영화를 보는 착각이 인다.
밤낮없이 어두운 하늘은 디스토피아 도시를 묘사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다. 하늘을 뒤덮을 기세로 복잡하게 얽힌 전깃줄, 그 아래 지저분하고 비좁은 골목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는 덤이다. 그리고 그 어두움과 대조되는 현란한 네온사인은 소비와 향락에 물든 도시의 단면이다. 비가 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빗물에 젖어 반질반질해진 아스팔트 도로가 반사하는 도시의 불빛은 현기증을 일으킨다. 그런데 어쩐지 이 모습이 낯설지 않다. 한때 서울의 중심지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쇠퇴한 번화가 대부분이 이러한 모습이다.
대표적 예가 종로다. 실제로 구글에서 사이버펑크(cyberpunk)1를 검색하면 종로 밤거리의 사진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사진의 주인이 한국에 관광차 들른 외국인인 경우도 많다. 이들은 어떤 요소에 매혹되어 이토록 많은 사진을 남겼을까. 마우스 휠을 돌리며 집요히 사진을 뜯어보다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높이 솟은 건물 밖으로 앞다투어 튀어나온,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최대한 크고 화려하게 디자인된 간판이 그 주인공이다. 한국은 홍콩, 일본과 더불어 간판이 많기로 유명하다. 눈길을 끌기 위한 높은 채도의 간판, 가독성에만 집중해 투박한 서체를 크게 박아 넣은 간판, 눈을 아프게 하는 LED 간판과 네온사인은 디스토피아 도시 경관의 주범이다. 간판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주변 상점과의 경쟁이 낳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이 못생긴 간판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 취급을 받게 됐고, 2007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한 대상이 됐다.
학부생 시절, 곧잘 놀러 가던 대학가에 간판정비사업 안내 현수막이 걸렸다. 익숙해진 거리의 풍경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서울시가 내세운 유럽 유명 관광지의 멋들어진 사진을 보니 내심 기대도 됐다. 일 년여 뒤 정비를 마친 대학가의 모습은 한층 단정해졌다. 그뿐이었다. 몇 안 되는 색상, 형태, 서체로 통일된 간판들이 조금은 촌스럽게 보이기도 했다. 분명 전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디자인되었는데 어딘가 어설퍼 보이는 모습이 기이하기까지 했다.
이 괴상한 풍경이 취재를 위해 방문한 청계천의 모습과 겹쳐졌다. 정부에서 지정한 서체를 사용해 똑같은 돌출 문자 방식으로 디자인된 간판들은 마치 아파트 문마다 달려 있는 호수 표시판을 연상시킨다. 업종에 따라 픽토그램을 넣어 시인성을 향상하려 했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 과연 사람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상가를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한꺼번에 교체된 새 간판들이 기존의 노후한 건물에 녹아들지 못해 이질감까지 느껴진다. 간판 정비 전의 청계천이 어수선하고 너저분하지만 정감이 느껴지는 상가였다면, 정비 후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공간이다.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디자인 지침이 아름답지 않을 뿐 아니라 재미없는 도시 경관을 만들고 있다. 쉴 새 없이 번쩍이는 못생긴 간판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서울은 사이버펑크와 디스토피아의 도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