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 [재료와 디테일] 바닥 포장 설계, 패턴을 위한 패턴?
- 한동안 수원에 있는 공기업의 일을 하면서 그 사옥에 자주 드나들었다.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어느날 그 사옥의 현관에서 전시 중이던 공동 주택 공모전 출품작을 보게 되었다. 600세대 규모의 주택 단지였는 데 전시된 출품작은 서로 다른 개념을 이용해 각각의공간을 표현하고 있었다. 작품들을 보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네 개의 출품작이 모두 같은 형식으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길의 모양과 색상을 표현하고 있었다. 길이 흘러가는 방식이며 선형을 표현하는 패턴과 색상이 너무 똑같아서 신기한 마음으로 한참을 구경했다. 몇 달 뒤 우리에게도 그런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찾아왔다. 프로젝트를 맡은 기쁨은 잠시였다. 공동 주택 설계 경험이 없어 프로젝트가 익숙하지 않은 데 다가 특정한 형식의 그림을 요구하는 건축팀과의 마찰 때문에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야 했다. 왜 이렇게 패턴을 요구하고 심지어 강요까지 하는지. 패턴이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 방식 중 하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 이유는 작업을 진행하며 인터넷을 통해 공모전 자료를 찾아본 후에야 알수 있었다. 찾아본 공모전 자료의 열에 아홉은 서로 닮은 평면 그래픽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보는 이를 강렬하게 빨아들이는 그래픽이 있는가 하면, 유유히 흘러가는 형상도 있었다. 하지만 그 표현과 형식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마 공모전의 특성상 혼자 튀면 수상 후보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어서 과한 표현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다른 작품을 따라 하고 싶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았다. 길을 잘 보이게 해서 공간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내 눈에는 공간의 볼륨을 조작하는 눈속임의 장치로 여겨질 뿐이다. 과연 주거 단지에서 길의 포장 패턴이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2차원 공간을 조작하고 그 위에 세워질 부피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해야 하는 조경의 속성상 바닥 처리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일이다. 바닥 포장은 녹지와 녹지 사이에 만들어져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의 기반이다. 또한 차량과 건물 사이에 만들어져 완충 작용을 하며 도시의 생활을 담기도 한다.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양이 필요하다. 이대영은 여기저기 살피고 유심히 바라보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작고 검소하며 평범한 조경설계를 추구하고 있다. 영남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우대기술단과 씨토포스(CTOPOS)에서 조경의 기초를 배웠다. 조경설계사무소 스튜디오엘(STUDIO L)을 시작하고 작은 작업들을 하고 있다. www.studio89.co.kr

- [공간공감] 제주 주택
- 이번 ‘공간 공감’ 답사는 제주의 어느 식당에서 일정을 짠 특별한 케이스다. 새벽 비행기로 제주에 도착한 직후 아침상을 마주한 채 각자 답사하고 싶은 곳을 추천하며 한 곳씩 답사 루트를 짜나갔다. 그렇게 해서 1박 2일 동안 둘러볼 대상지로 정한 곳은 총 8곳(‘공간 공감’에서 모두 다룰 예정은 아니다. 아마 한 곳 정도만 더 소개될 것이다), 그 중 주택이 3곳이었다. 덕분에 평소 프로젝트를 같이하며 알고 지내던 한 건축가의 제주 주택을 찾게 되었다.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도저히 찾아가기 힘든 곳이기에 그 주택 답사는 더욱 특별했다. 진입 도로에서 약 10m 이상의 고저차가 있는 산자락의 귤 밭에 지어진 ‘리틀 화이트’라는 이름의 주택은, 다섯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나름 공동 주택 단지다. 10여 년 전 건축가의 부친이 제주에 정착하기 위해 구입했던 땅에 아들이 건축을 완성했다. 포르투갈의어느 해변에서 마주한 하얀 박스 형태의 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과 제주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귤 창고를 설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한다. 경사진 땅의 구조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집의 일부를 띄워서 설계했고, 그 덕에 기존의 귤 밭을 자연스럽게 정원으로 삼고 있다. 다섯 가구의 집을 모두 둘러보는 과정은 마치 산자락을 걸어 올라가는 느낌을 준다. 공간을 채우기보다는 덜어내는 작업이 읽히는 곳이다. 제주에 올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과연 여러 가지 요소가 갖춰진 넓은 집과 풍성한 조경수로 장식된 정원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 까’라는 물음이 이 주택을 보며 다시 한 번 떠올랐다. _ 이홍선 제주의 지형은 사뭇 한국의 다른 곳과 구별된다. 토양은 검고 돌은 거칠다. 그래서 유독 유채나 감귤이 선명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제주에서 만난 ‘리틀 화이트’ 주택은 지금까지도 잔상이 제법 오롯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제주 지형의 원래 모습에다가 밝고 모던한 주택의 매스를 대비시켜 도드라지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 연재를 위해 factory L의 이홍선 소장, KnL 환경디자인 스튜디오의김용택 소장, 디자인 스튜디오 loci의 박승진 소장 그리고 서울대학교정욱주 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김아연 교수 등 다섯 명의 조경가가 의기투합하여 작은 모임을 구성했다. 이들은 새로운 대상지 선정을 위해 무심코 지나치던 작은 공간들을 세밀한 렌즈로 다시 들여다보며, 2014년1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유쾌한 답사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 [CODA] 뉴스의 시대
- 이번 ‘코다’ 제목은 알랭 드 보통의 책에서 따왔다. 책의 부제목은 ‘뉴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다. “온갖 이례적인 사건들을 이처럼 단호히 추적함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교묘히 눈길을 회피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뉴스 자신, 그리고 뉴스가 우리 삶에서 점하고 있는 지배적인 위치다. ‘인류의 절반이 매일 뉴스에 넋이 나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 결코 접할 수 없는 헤드라인이다. 그 밖의 놀랍고 주목할 만하거나 부패하고 충격적인 일들은 무엇이든 드러내려고 안달하면서 말이다.”1 뭐, 이런 대목이 흥미롭긴 하지만, 이 책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환경과조경’사는 박명권 발행인 체제로 바뀌면서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다.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파주출판도시를 떠나 지금은 방배동에 자리하고 있다. 회사명과 영문 제호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Environment & Landscape Architecture of Korea(약칭 ela)’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Landscape Architecture Korea(약칭 laK)’로 표기하고 있다(『환경과조경』 리뉴얼에 대해서는 소개한 바 있기에, 여기서는 부연을 생략한다). 『조경생태시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계간에서 월간으로 발간 주기가 당겨졌고, 무엇보다 잡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제호가 달라졌다. 이제는 월간 『에코스케이프』라는 타이틀로 독자를 만나고 있다. 또, 콘텐츠도 디자인도 지속적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단행본 출판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식구가 늘어났다. 1987년도에 설립한 ‘도서출판 조경’ 이외에 ‘도서출판 한숲’이란 브랜드가 2013년 하반기에 탄생한 것이다. 이후 『신의 정원 조선왕릉』, 『영국 정원에서 길을 찾다』, 『잃어버린 낙원, 원명원』, 『꽃보다 아름다운 잎』, 『스튜디오 201, 다르게 디자인하기』 등의 단행본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유청오 작가가 전속 사진가로 합류한 것도 작지만 큰 변화다. 이외에도 내용과 형식면에서, 또 제작 시스템과 관련해서 달라진 부분들이 적지 않다(달라졌다는 의미이지, 좋아졌다는 자찬은 아니다. 오해 없으시길). 그중에서 특히 라펜트와의 분리를 빼놓을 수 없다. 아직도 ‘환경과조경’과 ‘라펜트’를 같은 회사로 알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이제는 회사도 대표자도 구성원도 사무실도 다르다. 같은 사무실을 쓰던 시절에도 잡지 제작 인력과 라펜트 담당 인력이 구분되어 있었기에, 분리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환경과조경’과 ‘라펜트’가 한솥밥을 먹던 시기에 유지되던 콘텐츠 분리 원칙으로 인해 『환경과조경』과 『에코스케이프』의 뉴스 매체로서의 역할이 현저히 줄었다. 당시의 콘텐츠 배분 원칙 중 하나는 뉴스를 라펜트에 집중적으로 싣기로 했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환경과조경』은 작품 위주의 설계 콘텐츠와 조경 담론을, 『조경생태시공』은 환경복원, 조경 시공, 조경 자재 등의 콘텐츠를 맡는 식으로 내용 분담이 이루어졌다. 라펜트는 일간 단위의 온라인 매체였기에 뉴스를 전담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현재 두 종의 정기간행물과 두 개의 출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과조경’사의 지향점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조경 문화 발전소를 꿈꾸는 환경과조경!” 그런데 2014년 이전에는 “한국 조경 정보의 구심점”이란 모토를 가장 크고 굵게 강조했었다. 그렇다면 지향점도 달라진 것일까? 공식 블로그(http://la-korea.co.kr)에는 이런 문구가 한 줄 덧붙여져 있다. “어제와 오늘의 한국 조경을 기록하고, 내일의 새로운 조경 문화를 설계합니다.” 얼마나 그럴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 조경의 기록 = 조경 정보의 구심점’, ‘내일의 조경 문화 설계 = 조경 문화 발전소’로 읽히길 내심 기대하며 쓴 모토다. 또 그런 역할을 하리라 다짐도 하면서(물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보다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말이다). 실제로, 중요 완공 작품을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해 소개하고, 설계공모 수상작을 가급적 상세히 수록하고, 동시대 설계가들의 단상과 담론을 공유하고, 조경과 도시를 바탕으로 한 이슈와 키워드를 특집으로 다루고,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에코스케이프』를 통해 환경 복원, 조경 시공과 관련된 중요 프로젝트와 이슈를 조명하고, 전문가의 노하우와 정보를 연재로 소개하고, 새로운 조경 공법과 자재를 수록하고, 정원 관련 콘텐츠를 다루고, 관련 도서도 꾸준히 발간하고 있으니 적지 않은 정보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전과 비교할 때, 확실히 뉴스는 부족하다.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참 멀리도 돌아왔다. “작년 하반기부터 『에코스케이프』의 뉴스 지면 강화를 꾀하고 있으니, 따뜻하고 따끔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말이다. 물론, 누군가의 진단처럼 지금이 ‘뉴스의 시대’인지 ‘뉴스 포화의 시대’인지 ‘정보 과잉의 시대’인지에 대한 점검도 분명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정보가 많다고, 뉴스가 많다고 시간과 시선을 내어줄 독자들은 더 이상 없을 테니까. 나 역시 그러하니까. 알랭 드 보통이 지은 책의 부제목처럼 ‘뉴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뉴스에 대해 매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새롭기만 하다고 해서 뉴스인 시대는 이미 저물었으니까. 더 이상 뉴스만 정보인 시대도 아니니까. “무엇이든 드러내려고 안달하”2기보다는 보다 정제된 콘텐츠를 아름답고 적절하게 제공해야 하는 시기이니까.

- [편집자의 서재] 세계의 끝 여자친구
- 잡지에 실릴 작품 이미지를 고르는 작업은 언제나 두통을 몰고 온다. 이제 제법 익숙해 질 때도 되었건만, 이미지의 우선 순위와 레이아웃을 구상하는 작업은 여전히 어렵다. 한 번집중력을 잃고 무언가에 홀리기 시작하면 결정 장애의 블랙홀에 빠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 사진은 이런 점 때문에, 그 사진은 그런 점 때문에 좋아 보였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모든 사진이 부적합해 보인다. 1차적으로는 프로젝트의 주변 맥락과 설계 의도, 디자인 해법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부족한 탓이겠지만, 몇 가지 핑계를 댈 만한 변명거리도 있다. 보통, 사진의 화질이나 구도가 좋지 않은 경우, 컷 수가 너무 적은 경우, 사진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엔 머릿속에서 레이아웃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작업한 캇베이크 해안 프로젝트는 평소와는 다른 이유로 메인 컷을 고르는 데 애를 먹었다. 캇베이크 해안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남서부, 북해 연안에 위치한 인구 4만 1,000명의 소도시, 캇베이크의 사구 경관을 복원했다. 캇베이크는 1848년 해수욕장을 개장한 오랜 휴양 도시이지만 시선을 사로잡는 건축물도, 화려하고 이국적인 식생도, 특별한 레포츠 시설도 없는 조용한 마을이다. 마을 분위기에 어울리게 프로젝트도 차분하고 소박했다. 제방을 덮은 사구 언덕이 프로젝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메인 컷으로 넣어보았는데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하니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심심해 보였다. ‘메인 컷은 시선을 사로잡는 ‘쌈박한’ 이미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고정관념 아닌 고정관념이 있던 터라 고민이 많이 됐다. 몇 번의 회의와 이미지 교체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선정한 메인 컷에는 억세고 질겨 보이는 사구 식생이 뒤덮은 언덕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인다. 쓸쓸해 보이기도, 다정해 보이기도 하는 두 사람의 모습과 네덜란드 북해 연안의 허허로운 풍경에서 연상되는 소설이 있었다. 『세계의 끝 여자친구』. 남자의 경우엔 호불호가 갈렸지만, 대학 시절, 국문학과 여학생치고 김연수의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 애는 없었다. 2013년도쯤인가 한 출판사의 기획으로 김연수의 낭독회가 학교 소극장에서 열렸는데 신청한 사람의 90% 이상이 여자였을 정도다. ‘아직까지 김연수 소설을 안 읽었냐’는 주위 친구들의 성화를 못 이겨 읽는 체 했지만, 나는 사실 ‘세계의 끝 여자친구’와 같은 제목의 소설은 너무 단 디저트처럼 왠지 껄끄럽고 낯간지러웠다. 그러다 21살 여름, 나 역시 결국 김연수의 광팬이 되었다. ‘세계의 끝’은 아니지만 친구의 집에 놀러간다는 핑계를 대고 좋아하는 선배를 보러 태풍을 뚫고 한반도 남쪽 끝까지 내려갔던 여름방학의 일이었다. 그렇게 단단히 제대로 눈에 콩깍지가 씌자 그렇게도 질색을 하던 연애소설과 유행가가 전에 없이 애틋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혼자만의 속앓이로 끝난 내 짝사랑의 말로처럼, 사실 『세계의 끝 여자친구』는 제목에서 풍기는 분위기처럼 로맨틱하거나 달콤한 소설은 아니었다. 심지어 소설에서 등장한 ‘세계의 끝’은 내가 기대했던 ‘아득한 저 너머’는커녕, 메타세쿼이아 한 그루가 서있는 동네 호수 건너편이다. 소설의 플롯은 강렬하기보다는 잔잔하다. 요약하면, 도서관 게시판에 붙어 있는 시 ‘세계의 끝 여자친구’를 우연히 읽고 ‘함께 시를 읽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된 ‘나’가 모임에서 만난 ‘희선 씨’를 통해 시를 쓴 시인의 이루어질 수 없던 사랑이야기를 듣고 시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시인이 부치지 못한 편지를 전달하게 된다는 내용이 전부다. 그렇지만 이 소소하고 평범한 사랑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끝’을 걸어가는 연인의 모습을 본 듯한 기분이 든다. 아주 사소한 계기, 평범한 일상의 단초가 그 이면의 배경·맥락과 만나 거대하고 깊은 삶의 서사로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게시판에 시를 소개하곤 했던 한 사서의 부지런함이 단초가 되어 시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고, 모임의 회원이 소개한 시를 읽은 ‘나’가 호기심에 책 한 권을 찾아보게 되며, 덕분에 시인의 과거와 사랑 이야기를 알게 된 ‘나’를 통해 시인의 편지가 옛 여자친구에게 전해지는 일련의 과정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섬세하게 진행된다. 작가는 평범한 일상에서 우연과 우연이 만나 필연처럼 전개되는 순간을 예민하게 포착한다. 불가사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삶의 원초적인 비밀을 한 꺼풀 벗겨보는 느낌을 받는다. 소설에서 ‘나’는 이렇게 회상한다. “비록 형편없는 기억력 탓에 중간중간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빠진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인생은 서로 물고 물리는 톱니바퀴 장치와 같으니까. 모든 일에는 흔적이 남게 마련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야 최초의 톱니바퀴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1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심심해 보이기까지 하는 캇베이크 해안의 사구 언덕 사진에도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최초의 톱니바퀴가 숨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쓸쓸해 보이기도, 다정해 보이기도 하는 두 사람은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넘어 ‘세계의 끝’을 향해 걸어가는 연인인지도 모른다. 마을과 바다 사이의 거리가 더 늘어난 덕분에 어쩌면 그들은 전보다 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모른다. 모래에 뿌리를 박고 자라난 억세고 질긴 풀 숲 사이에 누군가 부치지 못한 편지를 묻었을지도 모른다.

- 옷걸이가 만들어 내는 프랙털 패턴
- 지난 1월 8일, ‘2016 시티 오브 드림 파빌리온2016 City of Dreams Pavilion’ 디자인 공모전(이하 파빌리온 공모전)의 수상작으로 폴리오Folio의 ‘행거 반Hanger Barn’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거버너스 아일랜드Governors Island에 설치되어 올해 6월부터 전시될 예정이다. 파빌리온 공모전은 다양한 예술 행사를 주최하는 비영리단체인 피그먼트 NYCFIGMENT NYC와 뉴욕 건축가 협회AIANY(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New York), 뉴욕 신진 건축가ENYA (Emerging New York Architects), 뉴욕 구조 엔지니어 연합SEAoNY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of New York)의 주최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100여 개의 팀 중 총 4개 팀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행거 반’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작품은 멀티플리Multiply의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 크리스탈 콜라도Crystal Collado와 카라 부야노비치Kara Vujanovich의 ‘누크 앤 그래니 스퀘어Nooks and Granny Squares’, 니콜라스 브루시아Nicholas Bruscia, 크리스토퍼 로마노Christopher Romano와 알레산드로 트라베르소 앤 마티나 몬자르디노Alessandro Traverso and Martina Mongiardino의 ‘프뉴 파빌리온Pneu Pavilion’이다. 심사에는 메간 추시드Megan Chusid(구겐하임 미술관 부소장), 리지 호지즈Lizzie Hodges(가이 노덴슨 앤 어소시에이트(Guy Nordenson and Associates)), 벤자민 존스Benjamin Jones(아티스트), 앤 리젤바흐Anne Rieselbach(뉴욕 건축가 연맹 프로그램 책임자), 웨스턴 워커Weston Walker(스튜디오 강 아키텍트 디자인(Studio Gang Architects) 총책임자), 에카테리나 자비아로바Ekaterina Zavyalova(2014 시티 오브 드림 파빌리온 수상자)가 참여했다. 또한 알렉산더 레비Alexander Levi(SLO 아키텍처(SLO Architecture) 회장)가 디자인 멘토로서 수상자를 도와 활동할 예정이다. 요람에서 요람으로 파빌리온 공모전은 미래 세계가 직면하게 될 천연자원과 경제적 문제를 다루고자 계획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가와 디자인 커뮤니티에게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모전은 일반적인 공모전과 다른 기준으로 출품작을 평가한다. 작품에 필요한 자재와 그 자재의 조달 방법, 전시가 종료된 후에 작품의 해체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폐기물 처리 방법, 작품의 재활용 계획 여부 등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요소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작품에 필요한 모든 구조물은 지지대 없이 설치돼야 하며 작품의 일부가 땅속으로 6인치 이상 들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작품이 설치됐던 지면은 전시가 끝난 후에 작품 설치 전 상태로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 작품에 사용할 자재도 신중히 골라야 한다. ‘요람에서 요람으로C2C(cradle to cradle)—제품이나 원료를 사용한 후 폐기하여 ‘무덤’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탄생을 위한 ‘요람’으로 되돌리자는 개념—’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전시가 끝난 후, 작품은 반드시 재활용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행거 반 실험적이고 독특한 작업이 가능한 파빌리온 공모전에는 매년 젊은 건축가들의 참가가 늘어나고 있다. 폴리오 디자인 그룹의 이영수와 허보석 소장도 이들 중 하나다. 게다가 평소에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파빌리온 공모전에 참가하게 됐다. 폴리오의 행거 반은 드라이클리닝 시설이나 옷장 속 등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철사 옷걸이를 이용해 제작됐다. 작품이 설치될 거버너스 아일랜드에는 종종 폭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면 신속하게 해체해서 옮길 수 있는 모듈화 된 작품이 필요했다. 납작한 이등변 삼각형의 철사 옷걸이는 모듈화에 필요한 패턴을 만들기에 적합했고, 매년 드라이클리닝 시설에서 많은 옷걸이가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는 파빌리온 공모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재료였다. 옷걸이를 케이블 타일로 묶어 프랙털fractal 패턴의 모듈을 만들었고, 기본 모듈을 변형시켜 두 개의 모듈을 추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 개의 모듈을 사용해 행거 반이 완성된다. 심사위원이자 최근 5년간 거버너스 아일랜드에 설치됐던 피그먼트 트리하우스 FIGMENT Treehouse의 디자이너인 벤자민 존스는 “폴리오의 작품은 완전히 비구조적인 것을 구조적인 것으로 바꾸어 놨다”며 작품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기도 했다. 행거 반은 두 개의 반barn과 하나의 중정으로 구성된다. 두 개의 반에서는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반 사이에 위치한 중정이 특성이 다른 두 개의 반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프랙털 패턴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로 겹쳐져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 바닥에 늘어진 그림자가 변하는 모습 또한 흥미를 유발한다. 사람들은 이 파빌리온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며 색다른 뉴욕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 기간이 끝나고 철거된 행거 반은 해체와 추가 작업을 통해 조명이나 그린 월 등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작품은 공공 공간이나 카페 등 여러 장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폴리오는 6월 3일 거버너스 아일랜드에 행거 반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전초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거 반에 필요한 옷걸이는 총 2만 1,450개로 뉴욕의 드라이클리닝 시설에서 옷걸이를 기부 받고 있다. 현재는 다섯 개 시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차차 시설의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2016년 5월 쯤 작품에 필요한 옷걸이가 모두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캐치 미 이프 유 캔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여름에는 사용되지 않는 스키 리조트의 슬랄롬 게이트slalom gate를 이용해 설계된 파빌리온이다. 이 파빌리온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환기한다. 하늘거리는 캐노피 아래에 펼쳐진 옥수수 밭에서 사람들은 밀어를 나누거나 숨바꼭질을 하거나 낮잠을즐길 수 있다. 또한 구불구불하게 조성된 길에서 슬랄롬slalom—스키 경사로에 슬랄롬 게이트를 설치하고 회전 기술을 발휘하여 이를 통과해 내려오는 경기—과 유사한 놀이를 즐길 수도있다. 이 파빌리온에 필요한 슬랄롬 게이트는 뉴욕 시외곽에 위치한 스키 리조트에서 빌려온 뒤, 전시 기간이 끝나면 다음 스키 시즌을 위해 리조트에 다시 반납할 예정이다. 누크 앤 그래니 스퀘어 누크 앤 그래니 스퀘어는 반구 모양의 커다란 돔 두 개와 작은 돔 하나로 구성된다. 커다란 돔은 파빌리온의주 공간으로 돔이 만들어내는 그늘에서 공연과 소규모 모임을 즐길 수 있다. 누크는 4명 정도의 사람이 즐기기에 적당한 작은 돔으로 아늑하고 사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돔의 표면은 마치 코바늘로 뜨개질을 해 만들어진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비닐봉지를 재활용 해 만든 패널로 구성됐다. 얼기설기 엮인 패널 사이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구멍을 통해 거버너스 아일랜드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낮에는 햇빛, 밤에 는 달빛이 구멍을 통해 돔 안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낸다. 프뉴 파빌리온 프뉴 파빌리온은 차량에 내장됐던 튜브를 재활용해 만들어진다. 공기를 채워 넣어 부드러운 곡선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튜브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연상시킨다. 이는 주변의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튜브의 무게가 매우 가벼워 아주 얇은 케이블을 사용해서 파빌리온을 구축할 트러스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파빌리온은 양측의 높이가 다르게 설계되어 지붕이 살짝 기울어져 있다. 이 기울어진 지붕 아래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파빌리온을 이루고 있는 재료들은 완전히 분리가 가능해 전시가 끝난 후 재활용 된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파빌리온 공모전은 많은 사람들을 거버너스 아일랜드로 끌어들여 섬을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1년 중 여름에만 대중에게 개방되는 거버너스 아일랜드에서는 파빌리온 공모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 아트 프로그램, 이벤트, 강의 등이펼쳐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은 즐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버너스 아일랜드의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올해 거버너스 아일랜드는 5월 28일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 창조경제 거점공간으로 태어나는 부산역 광장
- 부산역 광장이 다시 태어난다. 지난 2015년 12월 21일, 부산시는 ‘부산역 창조경제거점공간 조성’ 국제 설계공모의 당선작으로 일본 건축설계사무소 니켄세케이Nikken Sekkei LTD와 간삼건축의 ‘100 스퀘어100 Square’를 선정했다. ‘부산역 창조경제거점공간 조성’ 국제 설계공모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국가 경제기반형 공모에 선정된 첫 사업이다. 부산시는 부산역 광장 일대에 창조계층의 활동을 집적·융합함으로써 IT, 창업, 지식 등 창조경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창조경제 거점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원도심, 부산역, 북항 개발 지역을 연결하고 역사 광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난 10월 1일 작품 제출을 마감한 1차 아이디어 공모에서 1등으로 뽑힌 3팀에게 상금 600만 원과 2차 설계공모 초청권이 주어졌다. 이어서 2차로 시행한 국제 설계공모에서는 1등 팀(니켄세케이+간삼건축)에게 실시설계권을, 2등 팀(김세용+원양건축사사무소)에게 3,600만 원을, 3등 팀(PASDFeldmeier+Wrede.+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2,400만 원을 수여했다. 당선작 ‘100 스퀘어’는 기존 부산역과 조화를 이루며 광장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원도심과 부산역, 북항 재개발 지역의 연결을 간결하게 처리했다. 심사위원단은 창조 라운지에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계획해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구성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공간 단위 모듈을 제안해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100 스퀘어 당선작 ‘100 스퀘어’는 부산 근현대사 100년간의 기억과 시민들이 꿈꾸는 100년 후 미래를 잇고 공간적, 문화적 융합의 장이 되는 광장을 제시한다. 청년, 전문가, 지식인 등 창조 계층이 아이디어를 내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광장에 조성해 부산 시민, 방문자, 크리에이터가 서로 소통하게 한다. 또한 광장을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 도시재생의 시발점으로 삼는다. 머물고 싶은 광장, 즐기고 싶은 광장 - 공간의 정비 현재 복잡한 차량 동선과 시설물의 혼재로 인해 광장은 공공 휴게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00 스퀘어는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공간적, 시각적으로 분리해 광장 본연의 환경을 확보한다. 아울러 크리에이티브 시설과 광장을 일체화해서 대지가 가진 개방감을 최대한 살리고 쾌적한 녹지 공간을 제공한다. 도시적 스케일의 대규모 광장 및 스탠드형공원과 휴먼 스케일의 휴식 및 소통의 공간이 공존하는 광장에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이 펼쳐진다. 모이고 확산되는 입체적 허브 공간 - 동선의 연계 대지 전후면 도로와 철로에 의한 공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3층 높이의 데크로 향후 개발 구역들을 광역적으로 연계한다. 부산역 광장을 구심점으로 삼아 ‘부산역-북항-조차 시설지’ 개발 구역을 연결한다. 크리에이티브 센터의 옥상 정원은 3층 데크와 1층 광장을 잇는 입체형 슬로프로 구성하여 크리에이티브 센터가 입체 동선의 허브 역할을 하게 한다. 이로써 사용자들이 느끼는 공간적, 동선적 단절감을 최소화한다. 또한 기존의 지하 연결 통로를 활용하여 기존 지하상가의 일부를 부산의 지역 문화 메모리얼 갤러리와 연계해 개발함으로써 시민과 방문자들에게 원도심의 역사적, 문화적 콘텐츠를 보여 주는 지역 문화의 핵심 공간 역할을 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기존 역사의 1층 상업 존이 활성화되도록 부산 역사-크리에이티브 센터-광장-선큰-지하로의 각 레벨에서 층별 동선의 입체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업-창작-교류-전시의 구역별 기능이 동선과 함께 하나의 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한다. 커뮤니케이션이 만드는 새로운 문화 - 문화의 연계 광장 공간을 최대한 확장하고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자 광장과 시설을 일체화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했다. 크리에이티브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외부에서도 보이도록 함으로써 크리에이터와 방문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한다. 아울러 탑 라이트 큐브 하부의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아케이드 갤러리 및 광장에 접하는 크리에이티브 테라스는 광장과 크리에이티브 센터를 시각적으로 연결함과 동시에, 내부공간의 환경을 개선하고 자칫 단조로워 질 수 있는 광장 및 내부 공간에 활력을 준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센터 내부에서는 방문객과 크리에이터의 소통 공간, 크리에이터 간의 교류 공간, 집중 창조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계획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공간을 연출함으로써 사용자 간의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창출한다. 디자인 아이덴티티 & 부산의 프라이드 - 부산다움의 발현 원도심을 대표하는 산복도로 경사지 마을의 휴먼 스케일에서 오는 따뜻함과, 신도심 북항에서 느껴지는 역동적이고 도회적인 감성은 상반되는 이미지가 공존하는 부산을 대표하는 이미지다. ‘100 스퀘어’는 공간의 조합과 분산이 용이하도록 휴먼 스케일의 최소 단위 시설을 입체적으로 조합해 원도심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도시 스케일의 연결과 확장을 유기적으로 디자인했다. 또한 단열, 자연 채광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친환경 패시브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100 스퀘어’는 효율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고려한 아날로그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감성과 첨단이 공존하는 ‘부산다움’의 프라이드를 보여준다. 부산역 광장과 원도심의 미래 부산시는 원도심 일원을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하는 데 필요한 국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그랜드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북항 재개발 구역 및 부산역 일원을 중심으로 항만 및 부산역의 역세권, 산복도로의 노후 주택 밀집 지역, 초량동 상업지역 등 초량동 일대 3.12km2의 원도심 일원을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국비 250억 원, 시비 250억 원, 총 500억 원이 투입된다. 북항 재개발 지역과 원도심의 연결 기능을 담당하는 부산역 광장 일대는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사업’의 핵심 공간이다. 대지 면적 약 20,000m2의 부산역 광장 일대에 총 28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지역 주민, 관련 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작품 설명회를 거친 후,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 사업 구간을 정할 계획이다. 현장 상황, 제도, 기간 등의 제약 조건이 없는지 검토한 후 2월에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한다.

- [떠도는 시선들, 큐레이터 뷰] 베니스 길목에서 만나는 ‘세상의 골목들’
- 두 손을 마주 잡은 듯한 형상의 베니스는 120여 개의 섬, 400여 개의 다리가 엮인 미로와 같은 수상 도시다. 지중해의 절경, 유서 깊은 건축물, 낭만적인 운하의 정취를 북돋는 곤돌라 등 베니스의 매력은 전 세계 여행자들을 불러들이지만, 미술전과 건축전이 격년으로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수많은 예술인들 역시 베니스로 불러들인다. 바로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2015년 5월 9일 ~ 11월 22일)는 아프리카계 큐레이터 오쿠이 엔위저Okwui Enwezor가 총감독을 맡아 ‘모든 세계의 미래All the World’ Futures’를 주제로 전 세계 미술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치학을 전공한 엔위저의 사회ㆍ정치적 관심에 응답하듯 53개국 136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에는 동시대의 분쟁과 사회적 현상을 직시한 작업이 주를 이뤘으며, 국가관 전시 또한 각각의 사회ㆍ정치적 이슈로부터 미래의 전망을 모색했다. 베니스 섬의 가장 끝 부분에 위치한 지아르디니Giardini와 아르세날레Arsenale 두 장소에서는 총감독이 기획한 본 전시와 각 나라별로 기획한 국가관 전시를 개최한다. 현재 89개의 국가관이 있는데, 이곳에 국가관을 두지 못한 30여 개 나라는 베니스 곳곳에 흩어져 건축 공간을 활용한 전시를 선보인다. 전시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저명한 작가들의 작품은 큰 화두가 되고, 각 국가관의 전시도 자본력에 힘입어 여러 매체가 경쟁적으로 다루곤 한다. 사실 짧은 일정으로 베니스를 방문한 미술인들은 이 두 장소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벅차다. 시종일관 스펙터클한 수백여 개의 작품을 하루이틀 만에 모두 보려 한다면,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넘쳐나는 정보에 머리가 멍해지곤 한다. 마치 국제적 이슈가 가득한 신문을 연이어 읽는 듯하다. 행사가 모두 끝난 시점, 2017년의 비엔날레 감독이 발표되고 올해의 건축 비엔날레가 곧 드러날이 시점에 필자는 골목길에서 묵묵히 울려 퍼지던 작은 국가관들과 전시들을 이번 지면을 빌려 소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 연재가 동시대 예술과 도시성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비엔날레 전시를 통해 베니스 도시 깊숙이,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를 여행하듯, 세계 곳곳에서 온 목소리를 들어보자. 건축과 현대 미술 사이의 황홀한 대화 : 창조의 소리전, 션 스컬리전, 단색화전 베니스에 있으면 어느 건물 하나 역사적이지 않은 게 없다. 수백 년, 어떤 건축물은 천년 이상 되기도 했으니 도시 전체가 박물관과 같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런 진귀한 건축물이 가득하지만 사실 관광객에게 개방된 유적지와 박물관, 전시실, 공공건물을 제외하고는 개별 건축 공간을 경험하기란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전 세계에서 온 여행 인파까지 북적거리니 공간의 사색에 고요히 잠기기란 더욱이 어렵다. 건축 공간에 매료된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색의 골목길을 즐기고 싶다면,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 동안 진행되는 병행 전시와 도시 속 국가관 전시들을 최대한 활용하라 조언하고 싶다. 숨겨진 현대 미술 전시를 발견하는 묘미와 더불어 평상시에는 개방되지 않는 사적인 공간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골목 곳곳을 누비며 비밀스런 저택의 풍경을 탐닉하는 즐거움을 덤으로 안게 된다. 처음 소개할 전시는 1603년에 지어진 팔라초 피사니Palazzo Pisani에서 열린 뮤지션 브라이언 이노Brian Eno와 화가 비지 베일리Beezy Bailey의 전시 ‘창조의 소리The Sound of Creation’다. 이 건축물은 현재 베네데토 마르첼로Benedetto Marcello 음악 학교로, 내부공간에 들어서면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지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이곳 내부의 주 계단을 활용해, 베일리의 그림을 보며 이노의 음악을 헤드셋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청각과 시각이 결합된 특별한 협업 전시다. 그림은 음악의 이미지를 풍부히 연상시키고, 음악은 미술의 시각 작용을 더 깊숙이 자극한다. “우리는 음악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눈으로만 이미지를 보지 않는다.” 기획의 변처럼 공간에 울리는 소리가 잠재된 기억들을 현재로 생생히 불러들인다. 두 작가의 시각적 소리, 청각적 그림은 건축물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과 만나 더욱 풍성해진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한 홀에는 작년 국가관 황금상을 받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앙골라관의 ‘여행길에서On Ways of Travelling’가 동시대 앙골라 작가들의 사회적 의식을 소개했다. 심소미는 독립 큐레이터이며 미술과 건축 관련 글을 쓰고 있다. ‘신지도제작자’(송원아트센터, 2015), ‘모바일홈 프로젝트’(송원아트센터, 2014), ‘Hidden Dimension’(갤러리 스케이프, 2013) 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했다. 갤러리 스케이프 책임큐레이터, 갤러리킹 공동디렉터,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2015년 동북아시아 도시 리서치(예술경영지원센터 후원)를 진행했으며, 2016년 난지창작스튜디오 연구자 레지던시에 입주해 활동 중이다.

- [시네마 스케이프] 유스
- 공모 제출을 며칠 앞두고 설계실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돈다. 초콜릿으로 당을 보충하고 커피를 거푸 마셔보지만 체력은 급속히 떨어진다. 대세에 큰 지장이 없는데도 수치지도와 항공지도 중 어떤 것을 베이스로 할지 토론을 거듭하고, 같은 다이어그램을 수십 번도 더 바꿔본다. 미세한 선 두께 하나, 눈에 띄지도 않을 토씨 하나 바꾸고 박수를 치는 지경에 이르면 누군가의 입에서 변태(?)라는 표현이 저절로 나온다. ‘예전엔 말이야. 이 그림자를 다 연필 가루로 갈아서 만들었어. 글자 스티커를 일일이 손으로 따 붙이고 동선은 띠 테이프로 표현했지.’ 마우스로 설계를 배운 세대들에게는 한국전쟁 때 이야기로나 들릴 법한 무용담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선배들에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내가 왕년에’로 시작하는 모험담이었는데, 이제 내가 후배들에게 읊고 있다. 나이 들었다는 증거다. 나이 들면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다. 경험의 사례가 많아지는 것 외에 나이 들어서 나아지는 건 별로 없다. 무엇이 사람을 늙게 하는가. 무엇이 젊은 걸까. 시간 외에 다른 변수는 정말 없는 걸까.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다는 노래 가사처럼 젊음은 그 당시엔 알지 못한다. 그저 서툴고 불안하기만 했다. 영화 ‘유스Youth’는 늙음을 보여 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젊음을 이야기한다. 유스의 주인공은 두 노인이다. 은퇴한 지휘자 프레드는 비서 역할을 하는 딸과 함께 스위스 호텔에 투숙 중이다. 건강 검진을 겸하며 휴양 중인 프레드는 영국 여왕의 특별 행사에서 그의 대표곡인 ‘심플 송’을 연주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만 거절한다. 서영애는 ‘영화 속 경관’을 주제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한겨레 영화 평론 전문 과정을 수료했다. 조경을 제목으로일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으며 영화를 삶의 또 다른 챕터로 여긴다. 영화는 경관과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관계 맺는지 보여주며 인문학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텍스트라 믿고 있다.

- [100 장면으로 재구성한 조경사] 이집트 유전자 찾기
- #75 나일 강에서 빌라 데스테까지 1549년 이탈리아의 티볼리.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의 전설적인 이상향, 빌라 아드리아나1를 지었던 곳. 그 빌라의 폐허를 뒤지고 다니는 인물이 있었다. 피로 리고리오Pirro Ligorio(1514~1583)라는 이름의 화가이자 건축가, 고미술 전문가였다. 당시 그는 유적지의 돌무더기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고고학자로서 새로운 경력을 쌓는 중이었다. 데스테Ippolito II. d’ste(1509~1572) 추기경이 그에게 명을 내린 것이다. 데스테 추기경은 티볼리의 총독이 되어 새로 부임해 왔다. 기왕티볼리에 부임한 이상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살 곳을 찾아보니 성벽에 높이 자리 잡은 성 프란시스코 수도원의 위치가 좋아 보였다. 언덕 위에서 계곡을 내려다보는 형상이었다. 주변 경관이 수려했고 동쪽으로 아이에네 강이 감싸 돌고 있었다. 추기경은 이 수도원을 자신의 거처로 정하고 주변의 농가를 모두 사들였다. 이들을 철거한 뒤 거대한 정원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 리고리오에게 설계의 총책임을 맡기고 빌라 아드리아나 유적지를 샅샅이 탐사하라고 지시했다. 리고리오에게는 고대의 건축과 예술을 연구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였으므로 발굴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물론 발견된 조각상들을 퍼가는 것도 임무 중의 하나였으나 건축물의 잔재, 조형물, 시설 등을 꼼꼼히 그려 스크랩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에 영감을 얻어 ‘빌라 데스테Villa d’ste’를 설계했다. 이탈리아 정원 중 최고의 걸작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리고리오의 눈앞에 드러난 유적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 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영원한 발굴 현장이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드리아나 빌라 유적지 항공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중요한 ‘물의 축’들을 리고리오도 본 것은 틀림없다. 지하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었던 수로도 탐험했을 것이다. 빌라 데스테는 두말할 것 없이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명소로 꼽을 수 있는 곳이다. 정원의 기본 틀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지만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분수가 장관을 이루며 웅장한 콘서트를 연주하는 물의 오케스트라 정원이다. 특히 백 개의 분수가 나란히 정렬된 길은 너무나 유명하다. 전체 공간 구조를 보면 사면, 즉 테라스 정원과 평지 정원으로산뜻하게 이분 된다. 언덕 위의 건물 정면에서 종축을 따라 다섯 단의 테라스를 내려가면 평지에 도달하는데 여기서 바로 횡축과 만나게 된다. 이 횡축은 긴 연못 세 개가 연속된 ‘물의 축’이다. 동쪽으로는 거대한 물 오르간과 넵튠 분수가, 서쪽으로는 엑세드라Exedra라고 하는 장식벽이 축을 마감한다.2 아콰에둑투스와 지하 수로망을 만들고 아이에 네 강의 물을 끌어와 초당 1,200리터의 물 공급이 가능했다고 한다.3 횡축 아래쪽의 평지 정원은 본래 설계되었던 것과 지금 모습이 전혀 다르다. 당시엔 좌우로 복잡한 미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중앙에서 트렐리스 두 개가 교차했다. 현재 방문객들은 건물 뒤로 입장하여 정원으로 ‘내려’가게 되어있으나 본래는 정원 쪽에서, 즉 종축이 끝나는 곳에서 입장하여 건물을 향해 ‘올라’가도록 유도되었다.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다. 우선 정원 게이트를 통해 입장하면 바로 터널과 같은 트렐리스로 들어간다. 컴컴한 터널 속을 걷는 동안 갑자기 우레 같은 대포 소리, 총소리가 들려와 간이 서늘해진다. 그러다 잠잠해지면서 아름다운 새들의 합창이 들리는가 하면 다음 순간엔 파이프 오르간이 장중하게 울리고 어디선가 높은 트럼펫 소리가 공기를 가른다. 물을 이용하여 각종 음향 효과를 냈던 것인데 터널의 어둠 속을 걷던 방문객들은 소리의 원천을 모르니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그러다 터널 중간 지점에서 길이 좌우로 갈린다. 갈림길을 따라 좌우로 가면 깊은 미로로 연결되어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그러나 좌우의 유혹을 물리치고 직진하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며 밝은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 이때 아마 모두 ‘아!’ 하고 탄성을 질렀을 것이다. 어둠과 위협 속에서 헤매다 마침내 낙원에 도착한 것이다(에티엔 뒤페라크의 빌라 데스테 조감도 참조). 빌라 데스테는 일종의 ‘도상圖像 정원’이다. 상징과 부호가 가득 담겨 있는 그림처럼 뜻을 해독해야 하는 정원이다. 분수, 조형물, 시설물 등이 바로 상징과 부호 역할을 한다. 해석하기에 따라 우주의 심각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표면적으로 보면 숨은그림찾기나 퀴즈 같은 일종의 지식 게임이다. 세 가지 주제가 도입되었다. 첫째는 ‘자연과 예술의 관계’, 둘째는 ‘지역의 아름다움’이며, 셋째는 ‘헤라클레스와 헤스페리데스 정원’이다.4 자연과 예술의 관계는 우선 정원 그 자체에서 읽어낼 수 있지만 백 개의 분수에도 가득 숨어있다. 이 분수는 두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단의 분수는 모두 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나 상단의 형상들은 제각각이다.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에 나오는 형상들이다. 당시의 방문객들은 이들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에 얽힌 사연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체면이 섰을 것이다. 다음주제, 즉 지역의 아름다움은 티볼리 분수라거나 로마 분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웅 헤라클레스의 차례다. 데스테 가문 역시 조상이 헤라클레스라고 우겼던 사람들이었다. 정원 도처에 황금 사과 모티브가 숨겨져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정원 체험 콘셉트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두운 지하 세계를 통과한 뒤 마침내 도달한 낙원. 이것이 헤스페리데스 정원이 아니고 무엇일까. 그런 의미에서 트렐리스와 미로가 없어진 것과 동선이 달라진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그러나 숨은그림찾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년 전부터 이집트 학자들 사이에 ‘빌라 데스테에서 이집트 유전자 찾기’ 게임이 시작되었다. 이 게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다시 빌라 아드리아나로 되돌아가야 한다. 빌라 아드리아나가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빌라 데스테가 여기서 영감을 얻었으니 이집트의 유전자도 함께 묻어갔을 것이라는 짐작은 그리 황당한 것이 아니다. 빌라 아드리아나의 카노푸스Canopus라는 파노라마 연회장을 기억할 것이다. 카노푸스는 나일 강 하구에 있는 운하 도시다. 여기서 일단 이집트와 만나게 된다. 그런데 어째서 하드리아누스는 로마 황제이 면서 이집트 도시를 자기 정원에 형상화했던 것일까. 그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로마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왕조를 무너뜨린 뒤 이집트는 로마 황제의 직속 통치령이 되었다. 로마 황제들은 자동으로 파라오가 되었고 이집트는 그들의 ‘사유지’나 다름없었다. 또한 이집트 정복과 함께 로마에 이집트 바람이 크게 불었다. 한시적인 돌풍이 아니라 근 오백 년간 지속된 기후 변화 현상이었다. 무엇보다도 평민들이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을 ‘종합 신’으로 받아들여 이시스 컬트가 크게 융성했다.5하드리아누스는 오랫동안 이집트를 여행한 적이 있었다. 그때 아들처럼 아끼던 안티노오스Antinous라는 미소년이 동행했는데 카노푸스 근처의 나일 강에서 익사하고 말았다. 이를 슬퍼한 황제는 안티노오스의 이름을 딴 도시를 설립하고 그가 오시리스 신이 되었다고 선언했다.6 집으로 돌아와 티볼리의 빌라에 이제는 신이 된 안티노오스의 신전을 세우고 카노푸스 연회장을 지었다. 빌라에 연회장이 여러 개 있었으나 이 카노푸스는 아마도 안티노오스를 조용히 애도 하는 사적 연회에 이용되었을 것이다. 빌라 데스테에서 카노푸스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횡으로 연계되는 물의 축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다. 여기에 리고리오는 강한 종축을 교차시켰을 뿐이다. 이런 종축은 하드리아누스 시대에는 없던 것이다. 르네상스 전성기에 시작되었으며 후에 바로크에서 완성된다. 고정희는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손수 가꾼 아름다운 정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느 순간 그 정원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유년의경험이 인연이 되었는지 조경을 평생의 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를 비롯 총 네 권의 정원·식물 책을 펴냈고,칼 푀르스터와 그의 외동딸 마리안네가 쓴 책을 동시에 번역 출간하기도 했다. 베를린 공과대학교 조경학과에서 ‘20세기 유럽 조경사’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베를린에 거주하며 ‘써드스페이스 베를린 환경아카데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조경의 경제학] 조경가의 경제학적 스타일 1
- 조경가의 스타일 당신은 조경가다. 사람들이 휴식하고 사색하고 땅과 교감할 수 있는 정원을 디자인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다. 어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끝낸 터라 오늘은 좀 한가하다. 의자를 젖히고 뒤로 기대본다. 작업실 책장 높은 곳에 언제부터 인지 모르게 꽂혀 있는 낡은 그림책에 눈이 간다. 느긋함을 좀 더 즐기기 위해 먼지를 털어내며 펼쳐본다. 책에는 유명한 정원들이 소개되어 있다. 정원마다 특색이 있어서 굳이 단락을 나누지 않아도 시대나 작가가 다름을 짐작할 수 있다. 학창 시절 그 이름들을 외우던 기억이 난다. 그러다 문득 진지한 질문이 하나 떠오른다. ‘사람들은 나의 작품을 어떻게 알아볼까? 작가로서 나의 스타일은 무엇인가’예술에서 ‘양식style’은 크고 진지한 이야깃거리다. 양식은 작가 개인, 시대나 민족, 범주로서의 장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미학적 개념이다. 특히 시대나 민족에 따라 다른 문화와 예술 형식의 관계를 다루는 ‘역사적 양식’은 예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조경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조경사는 대체로 양식사로서의 정원사다. 그래서 조경학을 전공한 사람은 양식이라고 하면 절대 왕정 시대 프랑스의 기하학적 정원이나 18세기 영국의 풍경화식 정원 같은 전형을 먼저 떠올린다. 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스타일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것이 패션이든 영화든 (심지어 예술이 아닌) 사람의 성격이든 일관되게 관찰되는 형식이 있어서 한 종류로 묶을 수만 있으면 스타일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묶든 뭐라고 부르든 그건 내 맘이다. ‘그 남자는 잘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왕자 스타일이야. 내가 전에 사귄 오빠도 같은 스타일이었잖아. 늦기 전에 어서 헤어져.’ 전혀 어색하지 않은 훌륭한 문장이다. 당신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스타일을 생각한다. 미학 이론처럼 심각하지 않더라도 일상용어보다는 좀 더 무게 있는 방식으로. 우선 작품에서 자주 발견되는 형태에 주목해 본다. 시각적 특징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차별화된 체험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스타일을 정의하다니, 너무 식상하지 않은가’ 이번에는 부지를 해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에 주목해 본다. 세계적인 조경가들이 난해한 이미지와 다이어그램으로 자신의 작업방식을 표현한 것을 떠올리면서. ‘하지만 어지간히 유명하지 않고서야 누가 나의 디자인 과정에 관심을 가지겠는가’ 그 외에 생태적 건강성에 대한 태도, 정원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철학 등 여러 측면을 배회한 끝에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조경가의 스타일을 정의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당신이 그 중 어느 하나에 주목한다고 해도 나머지의 의미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형태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생태주의자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참신한 방법론이 적용된 작품이 과연 정원이라불릴 수 있는지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작가의 생애와 작품의 의도에 자상하게 주목하는 전기傳記적 비평은 문학에서도 주류의 자리를 내준 지 오래다. 오늘날 비평은 창작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물며 정원이라는 실물을 생산하는 조경에서야.조경가의 스타일이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해서 조경이 특이한 예술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정은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에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다만 조경은 토지라는 자원을 사용하고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를 만든다는 점에서 환경이나 사회적 측면을 깊게 고려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니 경제적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과 차이를 갖는 조경이라는 예술의 특징이다. 이 글에서는 시장균형을 다루는 경제 모형을 통해 조경가의 경제학적 스타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경가가 추구하는바’와 그것이 초래하는 ‘시장균형의 변화’가 중요한 관심사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접근 방법은 전혀 미학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살펴볼 경제학적 메커니즘으로부터 조경가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민성훈은 1994년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조경설계 서안에서2년간 일했다. 그 후 경영학(석사)과 부동산학(박사)을 공부하고 개발, 금융, 투자 등 부동산 분야에서 일했다. 2012년 수원대학교로 직장을 옮기기 전까지 가장 오래 가졌던 직업은 부동산 펀드매니저다.

- [그들이 설계하는 법] 생산
- 지난 두 번의 연재를 통해 설계에 대한 나의 테제 몇가지를 공유했다. ‘문제제기’와 ‘과정’에 이어 마지막으로 ‘생산’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단상을 풀어놓는다. 생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설계의 가장 즉각적인 행위다.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고방식이자 작업으로, 머리와 손 그리고 도구의 친밀한 연장 관계 속에서 구현된다.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사적이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능동적인 공간 생산 방법이다. 이를 개인의 기술, 감각, 경륜의 결과로 설명하면 설계를 너무 사적인 행위로 한정하게 된다. 설계는 공간의 사용을 통해 지식 담론을 탐색, 항해, 생산하는 행위다. 비평가나 학자가 글쓰기를 통해 담론을 생산하듯 설계가는 공간 재현을 매체로 담론을 구축한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이어그램, 도면, 스케치, 이미지, 그래픽, 모형, 등 각양각색의 재현 매체와 이 매체와 관련된 담론은능동적 공간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조금은 더 즉각적인 생산의 단상을 짚어본다. 보르헤스의 지도 첫 설계 수업에서 교내 건물 실측과 도면 그리기 과제가 주어졌다. 처음 접하는 스튜디오 문화였고, 2주 안에 캠퍼스 내에 위치한 르 코르뷔지에의 카펜터 센터Carpenter Center를 실측하고 도면화 해야 하는 과제였다. 어마어마한 작업량에 매달리면서 왜 현존하는 건물을 그대로 베끼는 작업을 해야 하는지 의아해 했다. 졸업하고 난 후 한참 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의 “과학의 정밀성에 대하여On Exactitude in Science”1라는 짧은 단편을 읽고서야 이 과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축소·재현된 지도에 만족하지 못한 제국의 뛰어난지도 제작자들은 전국을 일대일로 상세히 복제한 지도를 제작한다. 하지만 지도 제작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후세는 이 지도가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이 지도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다. 이 이야기는 현실의 일대일 복제의 부질없음을 말한다. 축소를통한 선택적 편집과 재현은 현실의 복제보다 더 강력한 매개체이며 지도와 같은 레프리젠테이션 또한 동의된 코드와 언어적 구조 속에서 재현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따라서 보르헤스의 지도는 설계에 있어 세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공간은 항상 레프리젠테이션, 즉 재현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간의 재현은 스케일을 매개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셋째, 재현은 능동적 편집의 문제라는 점이다. 현실화되기 전까지 상상과 이미지로 존재하는 공간은 도면이나 모델 등으로 축소되어 소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케일은 선택적 편집의 능동적 도구가 된다. 현실과 재현 사이의 차이는 문제가 아닌 기회다. 설계는 실제와 레프리젠테이션 사이에 존재하는 스케일의 갈등을 선택적 축약, 의도적 지난 두 번의 연재를 통해 설계에 대한 나의 테제 몇 가지를 공유했다. ‘문제제기’와 ‘과정’에 이어 마지막으로 ‘생산’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단상을 풀어놓는다. 생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설계의 가장 즉각적인 행위다.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고방식이자 작업으로, 머리와 손 그리고 도구의 친밀한 연장 관계 속에서 구현된다.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사적이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능동적인 공간 생산 방법이다. 이를 개인의 기술, 감각, 경륜의 결과로 설명하면 설계를 너무 사적인 행위로 한정하게 된다. 설계는 공간의 사용을 통해 지식 담론을 탐색, 항해, 생산하는 행위다. 비평가나 학자가 글쓰기를 통해 담론을 생산하듯 설계가는 공간 재현을 매체로 담론을 구축한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이어그램, 도면, 스케치, 이미지, 그래픽, 모형, 등 각양각색의 재현 매체와 이 매체와 관련된 담론은 능동적 공간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조금은 더 즉각적인 생산의 단상을 짚어본다. 보르헤스의 지도 첫 설계 수업에서 교내 건물 실측과 도면 그리기 과제가 주어졌다. 처음 접하는 스튜디오 문화였고, 2주 안에 캠퍼스 내에 위치한 르 코르뷔지에의 카펜터 센터Carpenter Center를 실측하고 도면화 해야 하는 과제였다. 어마어마한 작업량에 매달리면서 왜 현존하는 건물을 그대로 베끼는 작업을 해야 하는지 의아해 했다. 졸업하고 난 후 한참 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의 “과학의 정밀성에 대하여On Exactitude in Science”1라는 짧은 단편을 읽고서야 이 과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축소·재현된 지도에 만족하지 못한 제국의 뛰어난 지도 제작자들은 전국을 일대일로 상세히 복제한 지도를 제작한다. 하지만 지도 제작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후세는 이 지도가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결국이 지도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다. 이 이야기는 현실의 일대일 복제의 부질없음을 말한다. 축소를 통한 선택적 편집과 재현은 현실의 복제보다 더 강력한 매개체이며 지도와 같은 레프리젠테이션 또한 동의된 코드와 언어적 구조 속에서 재현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따라서 보르헤스의 지도는 설계에 있어 세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공간은 항상 레프리젠테이션, 즉 재현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간의 재현은 스케일을 매개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셋째, 재현은 능동적 편집의 문제라는 점이다. 현실화되기 전까지 상상과 이미지로 존재하는 공간은 도면이나 모델 등으로 축소되어 소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케일은 선택적편집의 능동적 도구가 된다. 현실과 재현 사이의 차이는 문제가 아닌 기회다. 설계는 실제와 레프리젠테이션 사이에 존재하는 스케일의 갈등을 선택적 축약, 의도적 편집 등의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 변형시킬 수 있는 능동적 생산 행위다. 컴퓨터 3D 모델링 프로그램과 캐드의 등장으로 디지털상에서 실제 스케일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레프리젠테이션이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3D 모델링에도 목적에 따른 선택적 편집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3D 모델은 대부분 2D 도면으로 축소, 전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3D 모델링으로 정교한 모델을 만들었지만 이를 제대로 렌더링, 편집, 출력을 하지 못해 작업이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는 시뮬레이션이 목적이 아니라 레프리젠테이션이 목적임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보르헤스의 경고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머니샷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 설계공모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디자인 방향과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미팅이 있었다. 패널의 마지막 이미지인 조감도가 나오자 파트너는 “머니샷money shot을 위해 멋있어 보이도록 세로포맷으로 디자인을 조정합시다”라고 말했다. 사용 공간에 대한 고려 대신 레프리젠테이션의 효과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생각하는 데 충격을 받은 내가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웃으며 모든 잡지 표지는 세로 포맷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기억은 나를 항상 불편하게 한다. 설계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프로젝트가 구상하는 공간의 미적, 경험적, 사용 공간에 대한 고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설계는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해야 하는 행위다. 실제로 지어져 사용자가 경험하는 물리적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구상하는 공간의 재현만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그 재현 매개체 자체가 설계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공간의 생산Production of Space』에서 공간을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 그리고 재현의 공간 representational spaces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2 공간이란 실제와 재현 사이의 다양한 개념으로 존재하며 설계는 그 다양한 가능성을 활용한다. 재현을 통한 공간의 파생과 배포는 공간적 실천과 함께 설계의 중요한 생산 과정이다. 파트너와의 미팅 당시에는 마케팅 효과를 위해 디자인 콘셉트를 희생하는 게 저속하다고 생각했지만, 되돌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다. 물론 사용자를 위한 완성된 공간 생산에 전념하는 것이 설계가의 윤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행위력을 지닌 설계의 확장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재현과 재현한 공간의 다양한 능력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설계는 순수하고도 교활한 행위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설계안은 결국 설계공모에 당선되었고 문제의 머니샷은 실제 공원이 현실화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국제적 잡지와 여러 책의 표지를 장식했다. 어반 스레드(Urban Thread),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설계 국제공모(2015) 세운상가에 대한 많은 재개발 의욕이 있었다. 1979년부터 네 차례 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지만 상점 소유자와의 자금 문제로 실시되지 못했다. 그 후 이명박의 청계천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던 2004년, 세운상가 국제 지명 설계공모가 실시되면서 세운상가를 대신할 녹지축 공원과 이를 둘러싼 고층 첨단 산업 단지 개발이 시작될 듯 했다. 하지만 2005년 초, 청계천 관련 비리 의혹으로 세운상가 사업이 중지되었고 결국 오세훈 시장에게로 넘겨졌다. 그 후 종묘 앞 건물 높이 규제 완화로 인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보류와 상점 소유자와 임대 상인과의 마찰이 있었다. 2009년 초, 세운상가 1구역의 현대상가가 헐리면서 드디어 전 구역의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듯 했지만, 국제 금융 대란의 타격으로 사업이 폐지됐다. 2015년 박원순 시장 아래, 다시 재개된 세운상가 설계공모는 이전과는 다르게 기존 건물을 보존하면서 공중 도보 데크 설치와 순차적인 공공 공간의 개조, 보완, 리프로그래밍을 통한 재정비를 제안한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임대인과 상인 사이의 이해 관계와 보상 문제 그리고 주변 지역의 고층, 고밀도 재개발과 기존 도시 조직 재개편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세운상가는 매 정권마다 도시 성장 기계로의 변신을 명목으로 이리저리 끌려 다녔다. 따라서 이번 설계공모를 빌미로 낙후되고 기술은 뒤떨어졌지만, 그동안 존속되어 온 독특한 상권의 자의적인 업데이트와 새로운 기술력을 가진 중소 상점의 입주를 도와줄 수 있는 소프트 인프라구축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시나리오
- 성수동은 최근 ‘뜨는 동네’로 각광받는 동시에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고스란히 앓고 있는 문제의 현장이다. 10년 전 서울숲이 들어설 때 이미 성수동의 변화는 예견되었다. 서울숲 주변에는 갤러리아포레를 시작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줄줄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숲 북쪽으로는 사회적 기업, 비영리재단, 소셜 벤처 등이 모여들면서 이 일대가 핫 플레이스로 조명되고 있다. 한편 1950년대부터 형성된 낙후된 공장과 수제화 관련 매장이 혼재하는 성수동 2가는 문화예술인들이 개성 있는 작업실과 갤러리, 공방을 만들면서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의 여러 특색 있는 동네가 그러하듯 임대료 상승으로 동네의 변화를 이끌었던 이들이 쫓겨 나가는 현상도 빠르게 반복되고 있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을 맺는 등 지역 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성수동의 미래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망도 많다. 이제 성수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본지는 서울숲 조성 이후 성수동의 변화를 짚어보기 위해 도시계획 및 부동산 전문가인 서울대학교의 김경민 교수와 서울숲을 중심으로 도시 공원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이한아 사무처장을 만났다. 두 인터뷰이의 시각을 통해 공원과 젠트리피케이션의 함수를 느슨하게 살펴보고 성수동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_ 편집자 주'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Q. 최근 유행처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A. 한국의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기보다는 상업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주거지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빈곤한 동네에서 극단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며 젠트리피케이션의 핵심이다. 두 번째는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옴으로써 (소비 공간이 고급화된) 소매상 지구retail district로 바뀌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면 1970~1980년대에 진행된 재개발을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그것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만 문제시 하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 자체를 좁게 보는 것이며 관련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사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회자되는 인사동, 신촌, 홍대앞, 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 해방촌, 세운상가 가운데, 해방촌을 빼면 나머지는 모두 쇠퇴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압구정동처럼 고급 주거·상업 지역은 아니어도 건강한 동네라는 의미다. 유럽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단어의 일반적 의미는 슬럼이나 다름없던 동네가 중산층의 주거지로 바뀌거나 소매상 지구로 바뀌는 현상이다. 즉 주거지의 용도는 유지되면서 환경이나 거주자가 변하는 것이다. 반면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우는 용도가 바뀐다. 주택이나 기존의 문화예술인이 썼던 오피스가 소매상점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도시에서는 이 두 가지 젠트리피케이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예를 들어 서촌에서는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지역 주민도 쫓겨나고 상인도 쫓겨났다. 즉 한국의 경우 건강한 동네에서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이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업화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상업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긍정적인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동네의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도시계획가들도 일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시되는 지역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종착역은 대규모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지역의 특색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만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바라본다면 문제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과 지역 커뮤니티의 관계 Q. 지난 1~2년 사이 서울숲 인근에 사회적 기업, 비영리재단, 소셜 벤처 등이 모여들면서 이 일대는 소위 뜨는 동네가 되었다. 그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곳에 모인 사회적기업이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A.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은) 당연히 지금의 위치로 들어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가의 아파트가 갤러리아포레 아닌가.1 갤러리아포레 주변은 서울숲이라는 대형 녹지, 한강으로의 조망, 편리한 교통 등 고급 주거지로 부상할 만한 조건을 갖춘 동네다. 이 지역이 모두 개발되면 현재 사회적 기업들이 밀집한 곳은 고급 주거 단지의 배후지로써 상업화의 물결이 들이닥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곳이 소매상 지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인 루트임팩트2가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그 기간을 단축했을 뿐이다.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카우앤독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그러한 활동은 지역 자체를 바꾸게 되고, 이들은 원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젠트리파이어가 되어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했다. 사회적기업을 돕겠다는 의도는 선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Q. 서울숲길 인근이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A. 지역 커뮤니티를 바꾸고자 한다면, 공장 지대인 대림창고 부근이나 가리봉동으로 갔어야 했다. 거기서 혁신을 주도하면서 기존의 산업 및 공업과 연계한 활동을 하면 된다. 사회적 기업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옆에서 혁신을 일으켜야지 주거지에서 활동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 종합 곡예를 하는 예술가,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 소위 ‘작가’ 또는 ‘예술가’로 불리거나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이들을 한두 가지 유형으로 묶어둘 수는 없겠지만, 그 내용과 형식이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정치적 함의를 가지든 그렇지 않든, 감각에 따른 것이든 이성이나 감성에 따른 것이든, 내 한몸 고사하면서 창작 욕구를 풀어내고자 하는 것만은 아마도 그들 공통의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여기에 더해 예술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고, 훌륭한 작가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명성을 쫓는 일을 떠나 예술, 철학, 사회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혹자가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일들에 맞서겠다는 투쟁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도 있을 것이고, 한편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팔리는 ‘비싼’ 작가가 되어 럭셔리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원동력이 무엇이든 대체로 애초부터 확실한 경제적 성공이나 안정을 담보로 하지는 않는 예술가의 노력은, 바로 그런 이유로 ‘굶어 죽을지언정 빵보다는 장미를 택한다’거나 ‘그림 때문에 귀를 자른다’는 둥 딱히 반드시 예술성과 결부되지 않았어도 되었을 사례를 통해 보편화의 오류를 거쳐 신화화되거나, 반대로(그러나 같은 이유로) 부르조아나 한량들의 시간 때우기, 또는 엘리티시즘, 더 나아가서는 한낱 어린아이의 미성숙함 쯤으로 치부되고는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회의 일원으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기타 등등’으로 존재하며 쓸모없는 잉여인간으로 부유하던 예술가들이 돌연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사람들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 같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값을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우리가 사실은 버티기 위해 종합곡예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여기가 맹지인데, 자네 친구들 좀 불러서 건축 실험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하나 지어서 레지던시같은 것도 좀 하고. (밤이면 늑대들이 울부짖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섬이라 조용히 작업 구상하기에도 좋을 거야.”또는, “미술 해요? 어머 잘 됐다, 그림 그리고 싶으면우리 동네 와요. 벽화 좀 그려 줘. 사람들한테 그림 알려지고 그러면 좋잖아? 나는 지금 빚까지 내어가면서(물론 그가 소유한 집이 있는 동네에) 마을 만들기 하고 있는거야.” 진나래는 미술과 사회학의 겉을 핥으며 문화 예술계 언저리에서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게으르게 활동하고 있다. 진실과 허구, 기억과 상상,존재와 (비)존재 사이를 흐리고 편집과 쓰기를 통해 실재와 허상 사이‘이야기-네트워크-존재’를 형성하는 일을 하고자 하며, 사회와 예술, 도시와 판타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는 메이커스 문화나 신연금술, 인공지능 등 기술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지점들에 매료되어 엿보기를하고 있다. 2012년 ‘일시 합의 기업ETC(Enterprise of Temporary Consensus)’를 공동 설립하여 활동하였으며, 2015년 ‘잠복자들’로 인천 동구 지역의 공폐가 밀집 지역을 조사한 바 있다. www.jinnarae.com

- 젠트리피케이션, 쫓겨나는 사람들을 위한 블루스
- 지난 1월 28일 용산구의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나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정 결의 대회를 열었다. ‘한국 공인중개사 용산구 지회장’과 ‘용산구청장’의 명의로 6개 항목의 ‘자정 결의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건물주에게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과다한 중개수수료의 요구’ 등을 금지하고,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안정적인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행정구에서 지난 몇 달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이제 학계를 넘어 업계를 거쳐 관계에까지 도달한현상으로 보인다. 방금 어렵다는 말을 쓴 이유는 아직도 이 단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인데, 어쩌면 이런 판단도 그릇된 것인지 모르겠다. 젠트리gentry라는 계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 역시도 대학교 시절 ‘경제사’ 수업에서 몇 줄 읽은 게 전부다. 사실, 이제 그런 역사적 맥락을 뒤져보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뜨는 동네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현재 한국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대략 ‘동네가 뜬다 → 임대료가 상승한다 → 임차인들이 쫓겨난다’로 요약된다.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자리에는 본격적으로 투자 혹은 투기를 수행하는 임차인이 들어오는 과정이 뒤따른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영세한 구멍가게 자리에 대기업 편의점 체인이 들어서고, 아담한 동네 카페가 화려한 프랜차이즈 카페로 바뀌는 것이다. 한 주간지 기사가 “뜨는 동네의 역설”1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런 과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준다. 추상적으로 들릴까봐 몇 가지 예만 언급하겠다. 앞에서 언급했던 용산구와 성동구 이전에 종로구의 인사동과 삼청동, 마포구의 홍대앞과 상수동, 강남구의 가로수길과 세로수길 등이 2000년대까지 뜨는 동네, 혹은 ‘핫 플레이스’의 대표적 장소였다. 세 곳의 성격은 각각 다르지만 2010년대 중반인 현재 이곳을 찾으면 여가와 소비를 위한 대규모 상권으로 변모되어 십 수 년 전만해도 이곳에 예술가를 비롯하여 이른바 창의적 유형의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마치 거짓말처럼 들린다. 즉, 현재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뜨는 동네’가 다른 무언가로 변환되는 순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의 자정 결의안이 ‘자백’한 대로, 동네가 어느 정도 ‘뜬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업체가 건물주를 ‘들쑤시고’ 건물주는 이때다 하고 ‘갑질’에 나서면서 새로운 업체가 하나둘씩 투자를 하면 동네 전체의 성격이 본격적 상권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 때깔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전의 세입자가 쫓겨나는 현실이 존재한다. 그 세입자들은 대체로 원주민(소상인)이거나 예술가다. 그 현실은 이렇게 건조한 문체의 글로 적는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힘겹고 눈물 나는 과정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본토에서는 이렇게 ‘쫓겨나는’ 현상을 ‘displacement’라고 부른다. 전치나 축출 등의 번역어가 신통치 않다면, 사전을 뒤져서 ‘제자리에서 쫓겨난 이동’이라는 뜻을 확인해 두자. 즉, 전치는 젠트리피케이션 동전의 이면이다. 따라서 ‘전치 없는 젠트리피케이션도 있는가’ 등의 질문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곳에서 전치 당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전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길고도 난해한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리한다면, ‘뜨는 동네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핵심이다. 그러니 아직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그럴싸한 어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없애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럴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건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은 ‘뜨는 동네’에서 ‘뜬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뜨는 동네는 왜 그리고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신현준은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및 국제문화연구학과 HK교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문화 산업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후 정치경제학과 문화 연구를 접속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대중문화, 국제 이주, 도시 공간이 주요 관심 분야다. 2006~2007년에는 싱가포르 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방문연구원, 2008~2009년에는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교 방문교수, 2015년에는 듀크 대학교의 방문연구원으로 각각 재직한 바 있고, 국제 저널인 『Inter-Asia CulturalStudies』의 편집위원, 『Popular Music』의 국제고문위원을 역임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팝의 고고학 1960/1970』(2005, 공저), 『귀환혹은 순환: 아주 특별하고 불평등한 동포들』(2013, 공저), 『가요, 케이팝 그리고 그 너머』(2013) 등이 있다.

-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디즈니랜드
- 나는 현재 서촌 통의동에 거주하고 있다. 집과 사무실이 한 건물 안에 있는 직주근접의 삶이다. 이러한 삶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의 졸저인 『당신의 서울은 어디입니까』와 『무지개떡 건축』에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건물은 개인 소유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내가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무실을 비롯한 몇 개의 작은 회사에게 임대하고 있다. 즉, 나는 지주이며, 건물주이며, 임대인이다. 나에게 원고 청탁을 한 배경에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미리 밝혀 둔다. 소유 지분의 상당 부분은 당연히 대출로 해결했으며 그 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노력 중이다. 서촌으로 이사 온 지 햇수로 14년째가 되었다. 따라서 완전히 ‘굴러온 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박힌 돌’도 아니다. ‘이웃사촌’이라는 표현은 낯간지러워서 못쓰겠다. 필요할 때 만나서 서로 상의하거나 힘을 합치는 정도다. 이사 온 직후 도시가스 간선 설치 문제를 두고 이웃적선동과 해묵은 갈등이 불거졌을 때 그랬고, 눈을 치우거나 골목길 주차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그리 한다. (주차와 관련해서 대놓고 싸운 경험 또한 물론 있다.) 몇 년 전 인근의 작은 공원이 사라지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는 사회적 명분이 뚜렷했기 때문인지 이웃들 못지않게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결국 없던 일로 만들었다. 긴밀하게 참여해 온 지역 단위의 움직임은 ‘오픈하우스 서촌’이나 보안여관이 주최하는 벼룩시장 정도다. 자율 방범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소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이웃 및 경찰들과 순찰을 돈다. 결론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이전에 아파트 단지에 살았을 때와 그리 다르지 않다. 어차피 도시에서의 삶은 여러 변수들로 구성되는 인간관계의 맵핑mapping에 의해 결정된다. 공간적 인접성, 오래된 역사, 골목길과 같은 물리적 요소 등은 그 변수의 일부일 뿐이다. 직업적으로는 스스로를 ‘동네 건축가’라고 불러왔다. 동네에 대해서 주민으로서의 입장을 넘어서는 건축적, 역사적 차원의 관심이 있다. 그리고 서촌 및 북촌, 광화문 일대를 대상으로 다수의 작업을 수행해 왔다. 지금은 작업 범위가 넓어졌지만 건축가로서의 나의 경력이나 건축적 사고의 많은 부분은 이 지역에서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동네의 여러 문제에 매우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노라고 할 정도는 아니기에 그런 점에서 ‘동네 건축가 1.0’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개념도 앞으로 좀 더 진화하기를 바란다.여기까지가 주로 사실의 기술이라면, 이제부터는 의견을 제시한다. 오늘날 서촌의 화두는 단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그리고 디즈니랜드화disneyfication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동일시할 성격은 아니다. 디즈니랜드화하지않고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반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우, 이것은 시장 경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일종의 부작용이므로 사회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시장 경제 자체를 부정하며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하며, 이 글의 주제나 사회적 통념과 거리가 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제도적 개입이다. 시장 경제 자체는 인정하되, 법과 제도 및 행정력을 통해 그 부작용의 해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무리 민주적인 사회라도 각종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적 개입은 존재하며, 그것은 종종 놀랄 정도로 강력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파리 시가 얼마 전에 발표한 구도심 내 주거용 건물의 매매에 대한 제한 규정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각종 건축 심의에서 제시되는 내용들도 그러하다. 2016년 현재 서촌 일대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 행위에 대한 강제적 제약은 법리적으로는 심지어 위헌 가능성도 제기될 정도다. 하지만 사유 재산권에 대한 이러한 공공적 개입 자체를 원론적으로 부정하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임대차와 관련된 합리적인 법률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보다 일선 행정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것은 역설적으로 흥미롭다. 마침 몇몇 지자체가 앞장서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 그 좋은 예다. 건축가황두진은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서촌으로 이주한 이후 구도심에서의 경험을 배경으로 자신의 건축적 생각을 키워 왔다. 이 과정에서 현대 건축가지만 한옥 작업을 병행하게 되었다. 대표작으로는‘가회헌’, ‘춘원당 한방병원 및 박물관’, ‘캐슬 오브 스카이워커스’, ‘원앤원 빌딩’ 등이 있다. 활발한 저술 활동을 통해 『당신의 서울은 어디입니까?』(2005, 해냄), 『한옥이 돌아왔다』(2006, 공간사), 『무지개떡 건축』(2015, 메디치미디어) 등을 펴냈다. 서울시 건축상, 대한민국 한옥 대상,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문화 유산상등을 수상했다.

- 젠트리피케이션의 유행을 다시 생각하다
- 최근 1년 사이 한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학술적·대중적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주제로 한 각종 정책적·학술적 논의(도시정책 포럼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 가능한가’ 등)에서부터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이라 불리는 지역의 자생적 젠트리피케이션 포럼(테이크아웃드로잉 ‘한남포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젠트리피케이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6년 1월 한 달 사이에만 약 300여 건의 신문 보도가 이뤄질 정도로 대중 매체의 관심이 이러한 논의의 확산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구에서 1960년대 초 루스 글라스Ruth Glass에 의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용어가 만들어진 이후 지난 50년 동안 다양한 경험 연구와 이론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다뤄질 정도로 용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1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이라 불리는 도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학술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거의 매일 언론 보도로 일반인들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소개’되고 ‘주입’되다시피 하고 있다. 글라스가 정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은 “중간 계급이 도심과 도심 주변 지역의 저소득층 주거지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수리하여 이주해옴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을 대체하는 과정”으로, 50년간 서구에서 진행된 젠트리피케이션 논의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를 이뤘다.2 그러나 현재 한국 언론에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명명되는 도시 현상은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상승하는 임대료로 인해 소상공인(세입자를 중심으로)이 떠나는 사회 변화를 일컫는다. 즉, 한국 미디어 속 젠트리피케이션은 주거 젠트리피케이션residential gentrification이 아니라 서구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commercial gentrification, 또는 관광 젠트리피케이션tourism genrification과 유사하다. 서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져 온 것과 비교하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한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다. 그러나 주거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3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 지역 또는 상업 건물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의미하는 단어로, 부티크피케이션boutiqueification이나 소매 젠트리피케이션retail gentrification으로 불리기도 한다.4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뤄짐에 따라 새로 유입된 중간 계급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상업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기존 소비공간에 큰 변화를 야기했다. 이선영은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지리학과에서 ‘뉴빌드 젠트리피케이션과 젠트리피케이션 반대 운동(New-Build Gentrification and AntigentrificationMovements in Seoul, South Korea)’ 이란 주제로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아시아 지역의 도시 개발과 주민 운동에 관해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는 공간이자 사회적 관계 그 자체로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연구하고 있다.

- Diverse Perspectives on Gentrification
- 최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 cation’이란 단어가 유행처럼 쓰이고 있다. 언론 매체는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지자체도 이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2월 젠트리피케이션을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원주민을 지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상황이 심각한 6개 지역(대학로, 인사동, 신촌ㆍ홍대ㆍ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을선도적으로 지원해 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젠트리피케이션의 유행을 다시 생각하다 _ 이선영 •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디즈니랜드 _ 황두진 • 젠트리피케이션, 쫓겨나는 사람들을 위한 블루스 _ 신현준 • 종합 곡예를 하는 예술가,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_ 진나래 •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시나리오 _ 김경민·이한아

- [공간공감] 제주 도립미술관
- 제주도의 아름답고 멋진 풍광에 비해 관광객을 맞이하는 수많은 시설의 수준은 그다지 미덥지 못하다. 특히 곳곳에 난립해 있는 사설 뮤지엄과 테마 공간들은 더더욱 열악하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립미술관의 등장은 신선한 뉴스였다. 넓은 대지에, 전면의 수 공간이 가지는 정갈함도 여타의 관광지와는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건축적인 수 공간이 가지는 힘은 대지의 성격을 강하게 규정한다. 그래서일까? 건축물과 한몸을 이룬 이 공간이 대지 전체를 엮어내기보다는 앞뒤로 분절시킨다는 느낌이 강하다. 미술관에서의 옥외공간은 자연스럽게 전시 공간의 일부분일 뿐 아니라 전시물 그 자체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 관계가 참 애매하다. 어떤 내러티브를 가진 듯도 하지만, 마치엄마의 밥 먹으라는 성화에 못 이겨 잘 그리던 미술 숙제를 도중에 놓아버린 느낌이랄까? 가능성에 비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건축과 대지, 작품과 경관이 어쩌면 환상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약간의 보완 작업을 가미하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곳이다. _ 박승진 항공 사진으로 제주도립미술관을 확인해 보고 나서야 현장에서 본 식재와 포장이 조금이나마 이해되었다. 2D 화면에 펼쳐진 미술관의 레이아웃은 ‘큰 축과 선으로 감아주고’, ‘다양한 조형들이 과감하게 오버랩되면서 분절된 새로운 형태들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구사된 익숙한 플랜이었다. 그러나 겨울이었다고는 해도,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설계자의 의도와는 꽤 차이가 있어 보였다. 이 거리감은 시공 과정에서 세밀함을 챙기지 못한 탓일까? 기본 설계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약한 탓일까? 이 연재를 위해 factory L의 이홍선 소장, KnL 환경디자인 스튜디오의김용택 소장, 디자인 스튜디오 loci의 박승진 소장 그리고 서울대학교정욱주 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김아연 교수 등 다섯 명의 조경가가 의기투합하여 작은 모임을 구성했다. 이들은 새로운 대상지 선정을 위해 무심코 지나치던 작은 공간들을 세밀한 렌즈로 다시 들여다보며, 2014년1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유쾌한 답사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 씨마크 호텔
- 태백산맥의 관문으로 불리는 대관령의 산줄기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푸른 바다와 만나는 곳이 강릉이다. 동해와 맞붙은 경포호를 따라 달리다보면 소나무 숲 위로 우뚝 솟은 흰색 건물이 보인다. 1971년 개관한 ‘호텔 현대 경포대’를 철거하고 신축해 2015년 6월 문을 연 씨마크 호텔이다. 뒤로는 대관령의 굽이굽이가 병풍처럼 펼쳐지고 해송과 어우러진 평화로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호텔은 다가오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과 늘어가는 강릉의 리조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씨마크 호텔의 설계는 백색을 트레이드마크로 하는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Richard Meier가 맡았다. 제임스 코너 필드 오퍼레이션스James CornerField Operations(이하 JCFO)는 리차드 마이어 앤 파트너스Richard Meier & Partners Architects(이하 RMP)와 함께 이 호텔의 초기 구상부터 기본설계Concept & SchematicDesign, Design Development까지 진행하며 조경설계를 풀어나갔다. 이후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조경설계 서안과 디자인 스튜디오 loci가 조경 기본설계안을 수정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했다. 등대beacon와 수평선horizon, 설계 개념의 두 가지 대안콘셉트를 만들어가는 단계에서 RMP와 JCFO는 부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두 가지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두 대안을 통해 건축과 프로그램이 주변 지형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안을 찾고자 두 회사의 긴밀한 협업이 진행되었다. 기본 구상에 관해 JCFO의 조경가 안동혁은 건축과 조경,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라는 기본적인 역할 분담은 있었지만 (특히 초기 디자인 과정 중에는 더욱) 서로의 조언에 열린 자세로 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RMP의 건축 매스 스터디mass study 진행 과정과 대안 모색에 JCFO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한편, JCFO가 전체 부지의 지형조작, 차량 진입로를 비롯한 동선 재배치, 주변 컨텍스트와 맞물린 프로그램 배치를 진행할 때 RMP는 이러한 제안이 건축 구상scheme에 더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JCFO와 RMP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는 씨마크 호텔 이전부터 몇몇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며 쌓아 온 신뢰와 잘 구축된 협업 시스템의 산물이다. (클라이언트와 팀 내부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양 사의 위치가 워낙 가깝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실제 이 프로젝트 진행 당시 JCFO와 RMP 사무실은 뉴욕의 같은 건물 10층과 6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 거의 매일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디자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기본 구상 단계에서 RMP는 ‘등대beacon’ 안과 ‘수평선horizon’ 안, 두 가지 디자인을 제시했다. JCFO 또한 컨텍스트와 건축물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이에 따른 지형의 조작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렸다. 안동혁은 “‘등대’ 안에서는 수직적으로 솟은 강릉의 새 랜드마크인 타워형 건축물에 상응하는 곧은 직선형의 진입로와 이에 상반되는 유기적이고 대담한 구조의 수변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반면 ‘수평선' 안에서는 주변 경관을 포용하는 매스에 맞추어 기존 지형을 따라 구불구불한 진입로를 계획하고 수변 프로그램 역시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이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초기의 밑그림에 관해 설명했다. 수차례의 협의와 토의 끝에 ‘수평선’안을 바탕으로 하고 ‘등대’ 안에서 흥미 있는 요소들을 차용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의 가닥이 잡혔고, JCFO는 전반적인 디자인의 구성과 형태를 잡는 기본구상Schematic Design, 재료 선정과 디테일 디자인, 그리고 실제 부지 상황 및 국내 법규 등에 맞춰 설계를 조정하는 기본설계Design Development를 이후 약 반년 가까이 진행했다. 조경 계획 및 기본설계(원설계) 제임스 코너 필드 오퍼레이션스(James Corner Field Operations) 조경 기본설계(재설계) 및 실시설계, 디자인 감리 조경설계 서안(주) + 디자인 스튜디오 loci 단지계획 및 건축설계 리차드 마이어 앤 파트너스(Richard Meier & Partners Architects LLP) 건축설계(주)현대종합설계 한옥설계(주)황두진건축사사무소 조경시공총괄현대건설(주) 조경시공감리(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식재시공(주)장원조경, 부림조경 시설물시공(주)동영조경 한옥동 조경시공부림조경 발주현대중공업(주) 위치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406번길 2 대지면적약 47,000m2 설계기간2011 ~ 2012(JCFO), 2012. 10. ~ 2014. 2.(조경설계 서안 +디자인 스튜디오 loci) 시공기간2014. 4. ~ 2015. 5.

- 커먼 유니티
- 커먼 유니티Common-Unity는 공공 지원 주택을 위한 공공 공간 재생 프로젝트로서 멕시코시티Mexico City의 16개 행정구 중 하나인 아스카포살코Azcapotzalco의 과밀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약 7,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대상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분절된 주거 단위였다. 오랜 세월에 걸쳐 입주민들이 만들어 온 벽, 담장, 장애물 등이 공공공간에의 접근을 어렵게 했고 지역 사회는 공공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적 사용에 의해 공공 공간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공공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공공공간 자체가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입주민들이 개인적 모임이나 파티를 위해 공공공간에 반복적으로 임시 차양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를 통해 개인적 공간을 (공공 공간으로까지) 확장시키는 셈이다. 우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살려내고자 했으며 주민의 여가 및 사교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지붕 있는 공간을 설계하게 되었다. 우리의 목표는 ‘단절된 아파트 유닛’을 ‘서로 연결된 커먼 유닛’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었다. 커뮤니티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와 더불어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프로젝트에 차용된 전략은 입주민이 만든 장벽을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장벽들을 관통하고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분절된 유닛 사이에 통일성unity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각기 다른 용도(칠판, 등반용 인공 암벽, 난간, 그물망)를 지원하기 위해 지붕을 갖춘 4개의 모듈을 시공 및 설치했는데, 이를 통해 네 곳의 공공영역을 재생하고자 했다. 또한 다양한 포장 도로를 디자인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투수성을 갖추도록 했다. Project DesignRozana Montiel | Estudio de Arquitectura Associated ArchitectAlin V. Wallach ProgramPublic Space Rehabilitation CollaboratorsAlejandro Aparicio, Cecilia Brañas,Diana León, Valery Michalon, Luis Galán ClientINFONAVIT(National Trust for Workers Housing Institute) LocationSan Pablo Xalpa Housing Unit, Azcapotzalco,Mexico City, Mexico Rehabilitated Area5,000m2 Roofed Area480m2 Budget180USD/m2 Completion2015 PhotographsSandra Pereznieto 로자나 몬티엘 건축 스튜디오(Rozana Montiel|Estudio de Arquitectura)는 로자나 몬티엘이 이끄는 설계 스튜디오로 건축과 주변 맥락,건축 설계, 공간과 도시 생활의 예술적 재개념화 등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사회적 관계성을 복구하기 위해 공공 공간에서 연구와 실험을실시하고 있다. 로자나 몬티엘 건축 스튜디오는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와주변 맥락에 기초하여 각 작업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건축 담론을제안한다.

- 캇베이크 해안
- 해안 방어 및 수도 사업은 네덜란드인의 전문적 지식이 빛을 발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북해와 인접한 해안에 방파제, 이동식 댐, 수문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방파제 사업인 델타 워크Delta Works를 시행한 네덜란드에서는 바닷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사구를 통해 대부분의해안선을 방비하고 있다. 행정부의 기반 시설 및 환경부 내에서 물 관련 기반 시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인 ‘수자원공사Rijkswaterstaat’는 네덜란드의 해안 방어선을 개선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부서는 해안가를 따라 자리 잡고 있는 이른바 ‘약한 고리들weak links’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여러 지역에서 사구와 제방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50년간 내륙 지방이 범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캇베이크의 해안가가 이러한 ‘약한 고리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과 추가적인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캇베이크 및 그 인근지역을 앞으로 50년 간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해안 보강공사가 이루어졌다. OKRA는 아카디스Arcadis, 캇베이크 시정부, 그리고 라인란트 수자원 위원회와 협업을 바탕으로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난 5년간 해당 지역의 해안선을 매력적이고 안전하게 보강하기 위한 작업에 힘을 보태왔다. 델타 워크의 개발과는 달리 캇베이크의 경우, 해안 지역을 여가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관광 산업, 관광지, 리조트 등은 이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견인차이며, 해안 방어선 구축을 위한 계획을 논의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였다. 캇베이크 해안을 강화하면서 우리가 의도했던 것은 이 지역의 마을 및 리조트들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고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Project DesignOKRA CollaboratorsArcadis, RHDHV, Katwijk, Water Board ofRhineland ClientMunicipality of Katwijk, the Water Board of Rhineland LocationKatwijk, South Holland, The Netherlands Area20ha Duration2008~2015 Implementation2013~2015 PhotographsOKRA, OnSitePhotography OKRA는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설계사무소로 조경과 도시, 지역 계획을 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긴장감 있는 디테일과 예술적 감흥이 짙은 콘셉트를 통해, 역사와 문화의 결이 두텁고 인구 밀도가 높은 유럽 도시에서 강렬한 어바니즘을 제시해왔다. OKRA는 도시에 현존하는 맥락과 미학을 존중하며, 다양한 시간적 리듬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도시의 장소를 디자인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 그린로드 워크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 주 에 위 치한 그린로드Green Road는 면적 100,000m2에 달하는 대규모 군사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때 동쪽에서 가해지는 공격을 막아 레크Lek 강을 보호하는 요새로 이용됐다. 이를 위해 1918년 많은 방벽과 참호 시설이 조성됐고, 대지 전체에 분포한 다양한 크기의 군사용 방어 시설들이 독특한 경관을 형성했다. 전쟁이 끝나고 쓸모가 없어진 참호와 벙커는 1945년부터 철거되기 시작했고 2010년까지 그 작업이 계속됐다. 대부분의 시설이 제거되자 그린로드 일대에는 쐐기풀, 버드나무와 잡풀이 무성히 자라났다. 이로 인해 그린로드는 본래의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됐다. 네덜란드 산림청Dutch Forestry Commission과 라니란트위원회Commissie Linieland의 의뢰로 그린로드는 군사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아픈 역사가 기록된 땅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Landscape ArchitectREDscape ClientStaatsbosbeheer, Commissie Linieland, Dutch ForestryCommission Design2010 Construction2015 LocationUtrecht, The Netherlands Area100,000m2 PhotographsAndres Mulder, Philip van Roosmalen 암스테르담과 더블린(Dublin)에 사무소를 둔레드스케이프(REDscape)는 공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조경 설계사무소다. 분석과 설계를 통해 공간에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레드스케이프는 핵심 디자이너로 이루어진 팀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네트워크 사무소다.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분야를 섭렵하고 있는 레드스케이프의 작업 특성을 잘 설명해 준다.www.redscape.nl

- 굿즈 라인
- 굿즈 라인The Goods Line은 19세기 중반에 설치된 철로로 주로 양모, 고기, 밀을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데 이용됐다. 이 철로는 덜위치 힐Dulwich Hill에서 출발해 큰 레일 야드인 로젤Rozelle과 달링 하버Darling Harbour를 경유하여 시드니 센트럴Sydney Central 역까지 이어진다. 1984년 달링 하버에서 출발한 기차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열차 운행이 종료됐다. 열차 운행이 종료된 후에도 때때로 증기 기관차가 파워하우스 뮤지엄Powerhouse Museum과 달링 하버 사이 구간을 오고 가며 물품을 운송했다. 이 오래된 레일의 일부분은 시드니 라이트 레일Sydney Light Railway로 다시 사용되기도 했다. 뉴사우스웨일스NSW(New South Wales) 주정부가 계획하고 시드니 항만 연안 공사SHFA(Sydney Harbour Foreshore Authority)가 제안한 굿즈 라인 프로젝트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얼티모Ultimo에 달링 하버의 곳곳에 접근할 수 있는 연결로와 풍부한 녹지를 제공한다. 굿즈 라인은 시드니의 주요 철도역인 센트럴 역에서 출발해 센트럴 역 아래의 데번셔 터널Devonshire Tunnel, 차이나타운, 시드니의 여가와 유흥 지역인 달링 하버를연결한다. 뿐만 아니라 굿즈 라인은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설계한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UTS(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의 닥터 차우착윙 빌딩Dr Chau ChakWing Building과 ABC 공영 방송사의 사옥, 시드니 주립대학교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등 다양한 문화 및 교육, 미디어 시설로 뻗어 나간다. 현재 총 500m의 구간 중 조지 스트리트에서 시작해 닥터 차우착윙 빌딩에 이르는 북쪽 지역이 완공됐다. 얼티모 로드Ultimo Road를 건너 센트럴 역까지 이어지는 남쪽 구간도 심의를 거쳐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센트럴 역 아래의 데번셔 터널에서 시작된 굿즈 라인은 얼티모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해리스 스트리트Harris Street와 평행하게 뻗어 나가 파워하우스 뮤지엄까지 이어진다. 이 독특한 고가 공원은 버려진 철길을 초목이 무성한 생명력 넘치는 도시의 중추로 변모시켰다. 기존의 도로보다 4m 높게 조성된 공원에는 보행로와 더불어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8,000여 명의 인근전문학교 학생과 지역 주민, 방문객들은 시드니 달링하버의 관광지에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굿즈 라인 아래의 도로에서 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와 계단이 곳곳에 조성되었다. 이 계단은 그 크기와 높이를 확장해 야외 관람석이나 벤치의 역할을 하며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공원의 양측에 불규칙하게 자리한 보조 공간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런 디자인은 사람들이 길을 단순히 통과해 버리지 않고 잠시 머물며 벤치 등의 시설물을 활용하도록 만든다. Landscape Architect(Project Design Lead)ASPECT Studios Architect(Design Partner)CHROFI Civil, Structural, Hydraulic, and Electrical EngineersACOR Interpretive DesignDeuce Design Heritage ConsultantGML Planning ConsultantJBA Lighting DesignerLighting Art + Science Research for Precast ConcreteAR-MA Head ContractorGartner Rose ClientSydney Harbour Foreshore Authority LocationUltimo, Sydney, New South Wales, Australia Length273m (North section) Area6,995m2 (North section) Year2015 PhotographsFlorian Groehn, Simon Whitbread ASPECT 스튜디오(ASPECT Studios)는 조경, 건축, 도시설계, 최첨단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환경 그래픽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를 만드는 조경가 그룹이다. 호주의 시드니, 멜버른, 애들레이드와 중국의 상하이에 총 6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2000년 설립된CHROFI는 주택에서 도시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역동적인 건축 설계사무소다. 설립 기념작인 TKTS 타임 스퀘어(TKTS Times Square)는 혁신적인 설계로 널리 인정받았다.이외에도 르네 데 상(Lune de Sang), 스탬포드 온 맥코리(Stamfordon Macquarie), 맨리 2015 마스터플랜(Manly 2015 Masterplan)등의 대표작이 있다.

- [칼럼] 젠트리피케이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시 험하다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뜨겁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현상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18세기에 산업혁명과 함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800년대에 고작 5퍼센트에 불과했던 도시화율은 2000년대에 50퍼센트를 넘어섰다. 그에 따라 21세기는 인류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본격적인 ‘도시세대Urban Age’에 접어들었고, 인류의 미래가 도시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차원의 난제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도시세대는 새로운 도전과 마주했다. 젠트리피케이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학자 루스 글라스Ruth Glass는 1951년에 런던대학UCL에 도시연구센터를 설립해 도시사회학적 관점에서 도시를 연구했다. 사회학자, 지리학자, 역사학자, 도시계획가와 협력해 급격하게 변하는 런던의 상황을 관찰했고, 이를 정리해 1964년에 『런던:변화의 양상London: Aspects of Change』을 출간했다. 특히 그녀는 인구 변화의 특성에 주목했고, 중산층과 부유층이 저소득층 거주 지역 일대를 점유해 고급화하면서 기존 거주자들이 쫓겨나고 지역의 성격도 완전히 변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진단했다. 글라스의 선구적 연구를 확대 해석하면, 넓은 의미에서 거대 자본이 소자본을 밀어내고 그 결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은 로마 시대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즉 젠트리피케이션은 역사적,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매우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압축 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규정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고, 뉴타운과 재개발이 대세였던 시기에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함으로써 극단적인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이 뿌리내렸다. 그렇다면 새로운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젠트리피케이션이 급부상했을까?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서촌, 홍대, 삼청동과 같이 쇠퇴했던 지역이 문화예술인, 주민 그리고 공동체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외부 자본이 유입되었고, 정작 변화를 만든 주역들은 급상승한 땅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 또한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 차원에서 추진된 활성화 사업의 혜택이 정작 지역을 지켜온 주민과 상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즉 쇠퇴한 지역이 개선되었지만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이 마땅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했고, 이것이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의 한 단면임을 비로소 감지한 것이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활화산처럼 타올랐고, 일련의 대책도 등장하고 있다. 초기의 시행착오를 감안하더라도 젠트리피케이션의 본질과 다양성을 간파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첫째, 젠트리피케이션을 ‘보편적 기준’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나? 도시의 발전 방식, 피해 대상(주거세입자 혹은 상가 세입자), 주민 구성 비율, 원주민이나 세입자를 위한 제도, 부동산 관리 제도, 대자본의 유입 방식,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 방식 등 젠트리피케이션은 철저하게 지역의 여건 및 제도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한다. 다시 말해 젠트리피케이션은 발생에서 진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지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므로 이에 대한 진단과 해법 또한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마련되어야 한다. 보편적 기준에 편승한 두루뭉술한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따름이다. 둘째,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자연발생적이다.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일정 수준의 공적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낳는 천민자본주의적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마치‘악惡’으로 규정하고 방지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역으로 도시의 건강한 성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쇠퇴 지역의 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계층간 혼합 등 분명한 순기능도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무조건적인 방지가 아닌적절한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하고,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포용하는 세밀하고 높은 차원의 도시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현재까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완벽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와중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지닌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된 일단의 주민, 상인, 예술인을 보호하는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갖추자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진행 중이므로 현재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분명한 선제 조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핵심은 ‘공존의 가치’를 굳건히 뿌리내리는 것이다. 도시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의 진화 과정에서 등장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구조적 허점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관심의 크기에 비해 명쾌한 해법이 등장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따라서 구조적 허점을 메우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 성숙한 자본주의와 천민자본주의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와 저급한 민주주의의 차이는 공존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량에 달렸다. 부자와 일반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 혹은 차선을 도출하는 방식을 훈련하고 익숙해져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지라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편한 규제이자 갈등을 키우는 불씨일 수밖에 없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불완전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더욱 퇴보할 수 있고, 반대로 성숙할 수도 있다. 김정후는 런던대학(UCL) 지리학과 펠로 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런던과 서울에서 제이에이치케이 도시건축정책연구소를 운영하며 도시, 건축,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구를 진행 중이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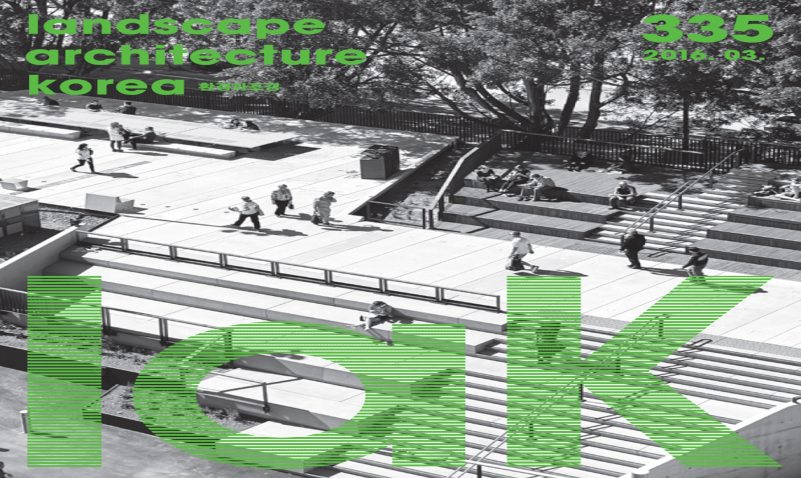
- [에디토리얼] 뜨는 동네 클리셰
- 몇 해 전 낙성대의 좁은 골목 한구석에 애처롭게 문을 연 한 와인바에 동료 교수들이나 지인들을 몰고 가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꼭 가로수길에 온 것 같은데? 서울대 근처에도 이런 데가 있었어” 물론 없었다. 그런데 ‘그런 데’가 하나둘씩 생겨나더니 무미건조하다 못해 황망하기까지 하던 동네가 거듭나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핫 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서울대입구역부터 낙성대 사이의 좁은 골목이 ‘샤로수길’로 불리더니 급기야 구청이 나서서 안내판까지 설치했다. 안내판에는 “서울대 정문의 ‘샤’와 ‘가로수길’을 패러디”한 것이며 “개성 있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거리”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붙어 있다. 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했다는 건지쉽게 알 수 없지만, 자생적 도시재생과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라는 평가도 나돈다. ‘개성 있는 가게들’은 주로 1980년대에 얼렁뚱땅 형성된 무질서한 주택가의 건물 1층에 들어선다. 볼품없는 파사드를 통유리로 시원하게 바꾸거나 거친 질감의 목재를 덧대거나 노출콘크리트를 흉내 낸패널을 덧붙인다. 일부러 깨트려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한 벽돌도 단골 재료다. 일본 선술집의 격자형문짝을 달거나 휘장을 늘어놓기도 한다. 뭔가 있어보이는, 아티스트의 숨결이 느껴지는 간판이나 ‘응답하라 1988’풍의 ‘레트로 룩’ 간판이 달린다. 국민음료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과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카페, 국민 외식 파스타를 종류별로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그 수를 세기 힘들다. 음식점과 술집과 카페가 결합되었다는 비스트로, 수제 맥주집, 수제 햄버거집, 크로스오버 막걸리 카페가 아줌마 홈웨어를 파는 오래된 옷가게, 낡은 세탁소, 허름한 철물점과 동거한다. 미국식 브런치와 프랑스식 홍합 요리를 파는 식당이 있고, 태국 수도의 이름을 내건 야시장도 있다. 아르헨티나의 과실주와 칠레의 국민 술을 파는 남미 음식점도 들어섰다. 모두 맛집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명소라고 한다. 다른 ‘길’들에 비해선 아직 미미하지만 아티스트나 건축가, 문화 기획자 같은 이른바 ‘창조계급’의 작업실도 꽤 있다는 소문이다. 여성 의류 편집숍들도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샤로수길의 중간쯤에서는 핫한 여성의 취향을 저격하는 ‘브라질리언 왁싱’ 숍까지 만날 수 있다. 현란한 맛집 블로그들을 잠깐 검색해 보면, 사장들은 대부분 명문 대학을 나온 이삼십대다. 아티스트 출신도 있다. 안정적인 직업에 염증을 느끼고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창업의 변 일색이다. 유학을 통해, 하다못해 워킹홀리데이나 해외 신혼여행을 통해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다는 점도 공통분모다. 단언할 순 없지만 모종의 기획 세력이 활동한다는 풍문도 있다. 그러나 ‘개성있는 가게들’의 입지 여건, 건물, 업종, 업주 모두가그렇게 개성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전형이나 획일 같은 단어가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힙한 문화를 즐기는 개성 있는 사람인 양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셀카와 음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자랑스럽게 포스팅하는 이곳의 소비자들은 과연 개성 있는 사람들일지 궁금하다. 신사동 가로수길, 홍대앞, 합정동, 연남동, 북촌, 서촌, 이태원 경리단길과 우사단길, 해방촌, 성수동처럼 이미 뜬 ‘길’들에는 비할 바못되겠지만, 샤로수길도 곧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권리금이 두 배로 오르고 임대료도 매년 20퍼센트씩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호의 특집은 전문적인 학술 용어를 넘어 일상적인 부동산 용어로까지 쓰이고 있지만 적합한 번역어를 찾지 못할 정도로 애매하고 복잡한, 문제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다각적 양상을 짚어주신 이선영, 황두진, 신현준, 진나래, 김경민, 이한아 선생의 다양한 시선은 한국적 특수성을 띈 채 진행되고 있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과 도시재생의 이면을 목격하게 해 준다. ‘어느 동네가 뜨면 얼마 후 임대료가 상승하여 결국 동네를 띄운 임차인이 쫓겨나는’ 과정에서 ‘뜨는 동네’의 물리적 디자이너인 도시·건축·조경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반성적으로 검토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그동안 별다른 여과 없이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에 수용된 문화·예술 콘텐츠의 미학적 성향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뜨는 동네의 대부분은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골목)길이다. 건물들도 비교적 오래되었거나 오래되어 보인다. 감각 있는 디자이너의 손을 거친 인테리어와 가구도 오래된 것의 매혹을 더한다. 동네건 건물이건 가구건 원래 그곳에 있던 오래된 것을 남기고 다시 살린 경우도 있지만 새로 만들거나 가져온 ‘억지 빈티지’나 ‘가짜 레트로retrospective 룩’도 적지 않다. 급속한 개발 시대를 통과하며 사라져간 옛 것에 대한 존중과 회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 전반의 복고 열풍이 도시 공간을 통해 미학화되어 소비되고 있다는 해석도 공존한다. 복고 문화의 기저에는 경기 불황, 힘든 현실, 오래된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가 맞물려 있다는 진단을 흔히 접할 수 있다. 물론 ‘뜨는 동네’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는 이유는 복고가 유행할 때마다 지적되는 ‘퇴행적 추억 팔이’ 그 이상일 것이다. 그러나 뜨는 동네의 복고 미학을 관통하는 노스탤지어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지적하듯, 현재로부터 과거로의 정신적 도피라는 의혹이 짙다. 새봄을 앞두고 있어선지 여기저기서 불러낸다. 약속 장소는 죄다 ‘길’들이다. 몇 년 전엔 그 ‘길’들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면 뭔가 문화적인 창조계급이 된듯한 우월감이 들고 내가 미학적 인간Homo aestheticus일 수도 있겠다는 우쭐한 마음도 생겼다. 그런데 이젠 좀 지겹다. 일제강점기의 집장사 한옥내부를 낡은 벽돌로 포장한 공간에 앉아 억지 빈티지 테이블에 올라온 핫한 셰프의 한국식 파스타를 먹으며 와인을 홀짝이면 영문 편지의 ‘당신의 진실한 벗으로부터sincerely yours’처럼 틀에 박힌 느낌이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정교하게 기획된 미학적 매뉴얼에 따라 지갑이 열리는 기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