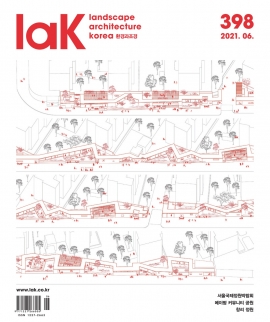태어난 곳은 서울과 산자락 하나를 공유하는 경기도 어디쯤. 보통 뜻하지 못하게 가난을 맞닥뜨리면 더 외곽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라는데, 부모님은 특이하게도 서울 북쪽에 어중간하게 놓인 동네로 기어드는 쪽을 택했다. 그렇게 내 최초의 기억은 다세대 주택과 단독 주택이 뒤섞인 동네 한구석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여태 서울의 귀퉁이를 떠돌고 있다. 메가시티 같은 그럴듯한 수식어가 어울리는 시민은 못됐다. ‘서울 촌놈’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 딱 나를 위한 단어라고 생각했다. 집과 학교 근처만 뱅뱅 맴돌아 경험이 얄팍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번도 도시를 떠나본 적 없는 나는 시골 풍경을 마주하면 한참 눈을 떼지 못한다. 뿌리를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기도 한다. 왜 그럴까. 이유를 궁금해하다 보니 어릴 적 기억에 가닿았다.
할머니는 괴상한 마을에 살았다. 꽤 번화한 도시 가까이에 있지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에 칭칭 감겨 있어서 촌이라는 말이 어울렸다. 버스는 두 시간에 한 번 오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면 차를 타고 이십 여분을 달려야 했다. 아궁이에 불을 때지 않으면 부엌 바닥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지만, 고구마밭에서 포대 자루로 썰매 타기에 바빴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미닫이식의 중문을 열면 우리 집보다 큰 마당이 보이고, 넉넉하게 비워둔 외양간에서 통통하게 살찐 송아지가 울었다.
마당 밖에는 시야를 닫는 높은 건물이 없었다. 좁은 방과 고불고불한 골목길이 익숙했던 나에게 할머니의 마을은 남부럽지 않은 여행지였다. 크고 높고 넉넉했다. 이상하게도 그 안에 서면 눈 앞에 펼쳐지는 모든 풍경이 모두의 것처럼 느껴졌다. 막 모내기를 마친 논이나 고춧대가 자라고 있는 밭에 분명 주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다. 굽이치는 고랑과 이랑, 힘없는 줄기를 받쳐주는 지지대를 따라 일렬로 선 작물 모두 사람의 손이 닿은 흔적인데도 자연의 일부 같았다. 아마 논밭의 식물들이 뒤편의 작은 숲과 똑같이 햇빛을 받고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 풍경은 계절의 흐름을, 또 자연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존재를 깨닫게 한다. 갖은 노력을 다해도 야속한 장맛비는 이제 막 잎을 틔운 작물의 허리를 꺾고, 자비 없이 바닥으로 내리꽂히는 뙤약볕은 잎끝을 태운다. 그럴 때면 땅은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 또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잎 하나 줄기 하나 최선의 모습으로 관리한 것처럼 보이는 정원보다 한 전시장에 깔린 카펫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이유도 같았다. 지난 5월 22일, 제1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이 개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귀국보고전을 열지 않은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요 작품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전시장의 한복판에 낯익은 풍경 하나가 낮게 누워 있다. 김아연 교수(서울시립대학교)의 ‘블랙 메도우Black Meadow: 사라지는 자연과 생명의 이야기’다. 이 카펫은 비엔날레의 주제인 ‘이주, 디아스포라의 확산, 기후변화의 충격, 사회적·기술적 변화의 속도’를 논의하는 공간적 바탕으로, 먼 훗날 기후변화로 인해 생명이 사라진(Black) 초지(Meadow)를 은유한다. 금강 변에서 채취한 갈대꽃과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쓰는 사탕수수 두 종으로 만들어진 카펫은, 사실 빗자루 천여 개를 해체하고 다시 조합해 만들어졌다. 이미 한참 전에 생명을 잃은 식물로 만든 풍경인데도 블랙메도우는 나를 순식간에 어딘지도 모르는 강가로 데려간다. 숨죽이면 강물 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이 불면 나도 갈대와 함께 스러져버리고 싶은 풍경 속으로.
슬프게도 블랙메도우는 오롯이 상상에 기대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청소기의 등장으로 갈대 빗자루는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고, 풍성한 갈대밭을 자랑하는 금강하굿둑은 생태계 교란으로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 이런 풍경은 칼로 도려낸 듯 말끔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함께 얽혀 있는 작은 새와 동물 더불어 식물들까지 함께 데리고 떠나 강 주변의 풍경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좋아하는 단어가 사라지는 꿈을 꿨다”(오은, ‘아찔’)는 시 구절이 떠올랐다. 어느 날 잠에서 깨니 집도, 땅도 없는 내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었던 풍경이 사라졌다면 어떤 기분일까. 시 속 화자가 보고 있던 “거울 속 할 말이 없는 표정”이 어느새 나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