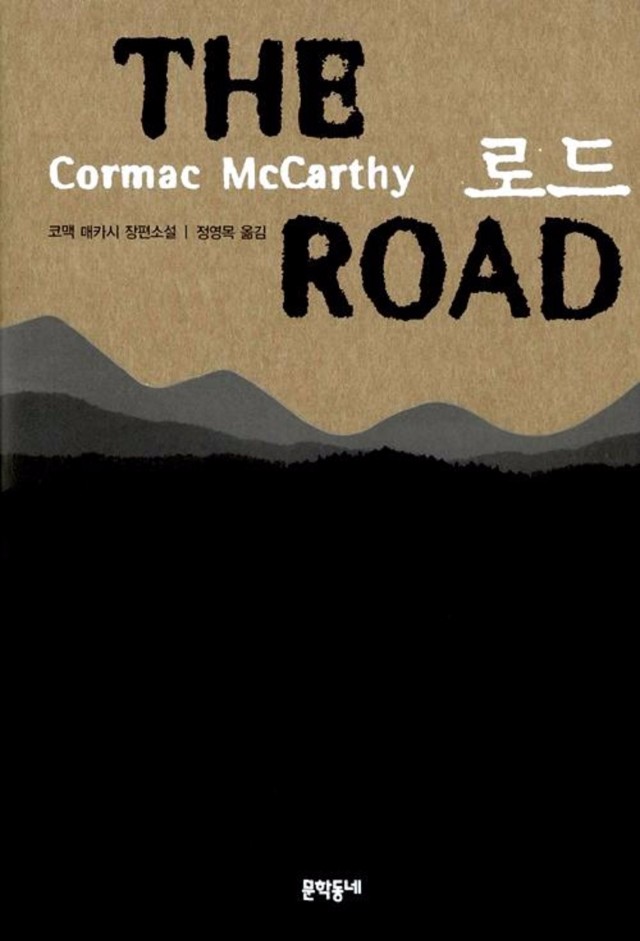
때때로 배경은 인물의 표정이나 대사보다 많은 것을 전달한다. 주인공의 눈물 대신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가로등 불빛만이 유일한 조명인 골목길은 스릴러 영화의 단골 소재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 풍경은 청춘의 상징으로 곧잘 사용된다. 영화 ‘러브레터’에서 여주인공이 잘 지내냐는 외침을 던지는 장소가 짙푸른 수목이 우거진 산이었다면, 설산의 풍경을 배경으로 두었을 때만큼의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밭은 영화의 분위기와 상대에게 닿을 수 없는 물음을 더욱 먹먹하고 아련하게 그린다.
『로드The Road』의 배경은 잿빛이다. 잿빛은 파괴된 도시의 모습과 희망이 없는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모든 것이 전부 불에 타버린 도시에는 색이 없다. 부서진 아스팔트, 바람에 날리는 재, 금이 간 건물, 신발에 끈끈하게 달라붙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 등 명도나 질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회색빛이다. 일반적으로 희망이나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도 이 책 속에서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할 뿐이다. 숯덩이처럼 타버려 하늘을 향해 뻗은 날 선 나뭇가지가 메마른 느낌을 더하고, 검은 상록수 숲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 같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한다. 유일하게 색을 지닌 것은 조리된 고기의 단면에 맺힌 핏물이나 고장 난 자판기에서 발견한 코카콜라 캔(붉은 물체 중 가장 선명하게 묘사되는데, 책의 저자인 코맥 매카시는 과거 코카콜라의 지원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등의 먹을거리와 계속해서 도시를 태우고 있는 불길과 소년의 마음속에 있다는 ‘불’이다. 모든 생명체를 비롯해 문명, 인간성까지 파괴된 세계에서 생명력 또는 희망을 품은 것만 색을 지니고 있다. 한 남자와 그의 아들의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흑백의 여정 사이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색들은 어둠에 지친 마음을 달래준다.
회색빛 세계에 『로드』의 불친절한 전개 방식은 막막함을 더한다. 일반적인 재난, 지구 종말을 다룬 작품과는 달리 이 책은 세계가 불타버린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수준의 설명은커녕, 언제부터 세계가 타기 시작했는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남자와 소년은 당연하다는 듯이 파괴된 도시 위를 걷고 있었다. 둘의 관계나 이름 하나 나오지 않지만, 둘의 대화에서 ‘아빠’라는 호칭이 오가는 것으로 부자 관계라는 것을 짐작할 뿐이다. 여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이야기에는 어떤 극적인 요소도 없다. 먹을 것을 찾고, 잠자리를 찾고, 바닷가로 향하는 길을 찾는 일이 반복되며 시간은 흐른다. 수식어구 하나 없는 문장으로 표현된 풍경과 담담한 대화를 통해 이들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이 답답해진다. 그 긴 시간을 “한 해가 저물어 갔다. 몇 월인지는 알 수 없었다”라는 두 문장만으로 표현하는 대목에서는 어떤 공포감마저 느껴진다. 영화 ‘그래비티’에서 스톤 박사가 어디가 끝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우주에 홀로 남겨졌을 때처럼. “제가 죽으면 어떡하실 거에요?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싶어. 나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요? 응. 너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알았어요.” 부자의 담담한 대화에는 부성애와 더불어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녹아있다. 식량을 약탈하려는 사람이나 인육을 먹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공포와는 다른 종류다.
긍정적인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이들의 여정은 계속된다. 그저 길이 있기 때문에 걷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두운 현실 때문에 소년의 가슴 속 희망을 상징하는 ‘불’이 더욱 귀하게 느껴진다.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해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작은 아이 기억나요, 아빠?”, “그 아이 괜찮을까요?”, “길을 잃었던 걸까요?”, “길을 잃었던 걸까봐 걱정이 돼요”라며 지나쳐온 아이를 걱정하는 아이의 대사가 밝게 빛난다.
소설 초반부, 남자는 우연히 자신이 살았던 집을 방문하게 된다. 집 안의 가구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과거를 추억하는 모습에 나 역시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를 떠올렸다. 같은 동네 안에서 서너 번 이사를 다녔던 탓에 집보다는 골목에 쌓인 추억이 많은데, 체계적인 계획 없이 만들어져 삐뚤빼뚤한 형태로 조성된 골목길은 숨바꼭질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골목은 말끔한 선을 따라 재정비되었고, 몸을 숨길 수 있었던 낮은 벽돌담은 범죄 예방을 위해 허물어졌다. 때때로 옛 동네를 지나갈 때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보다 주택에 사는 내가 더 많은 추억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얼마나 건방진 것이었나 생각하게 된다. 아파트를 허무는 일이 주택을 허무는 일보다는 어려우니, 추억을 되새김할 수 있는 시간도 길 테니 말이다. 이번 달의 특집인 광교신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어디에 추억을 쌓게 될까.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펼쳐져 있는 사라질 염려가 없는 호수공원이 문득 부러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