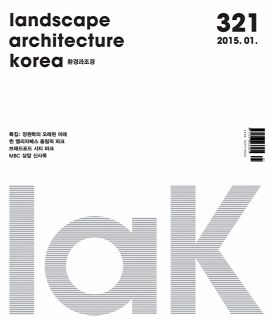프롤로그
칠흑같이 새까만 밤, 물과 뭍의 경계를 따라 펼쳐지는 빛의 향연을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마다 나는 경이로움을 느낀다.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은 아마도 도시 중심에 해당할 것이다. 빛은 부챗살 모양의 궤적을 따라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희미해진다. 한참 후 날이 밝고 비행기가 착륙할 무렵, 어느 틈에 놀라울 만큼 다채로운 도시 풍경이 눈높이 아래에 펼쳐진다. 두근두근. 반짝이는 고층 빌딩이 우뚝 서 있는 업무 지구, 매끄러운 표면의 콘크리트와 거친 조적조 벽면의 질감이 섞여 있는 주거 단지, 쭉쭉 뻗은 고속도로를 따라 놓인 쇼핑몰과 구불거리는 가로를 바라보며 나의 궁금함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진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누가 이런 모습의 도시를 만들었을까? 발을 내디딜 이곳은 나에게, 혹은 더 큰 사회 구성원들에게 과연 좋은 도시일까?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이러한 질문이 실은 도시설계라는 분야가 성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느덧 도시는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가 되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전 인류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은 인구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사는 도시 토박이의 천국이다. 그래서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좋은 도시 환경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교육받고 삶을 즐길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도시를 기획하고,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개발된 지역을 관리하는 전문 분야가 도시계획(urban planning)이다. 그렇다면 도시
설계는 무엇일까? 도시계획의 여러 단계 중 도시의 물리적 형태를 다루는 창조적이고 행위 지향적이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는 단계가 도시설계(urban design)라 정의할 수 있다.1 설계는 물리적 환경을 다루지만, 형태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분야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도시설계는 도시계획, 건축, 조경, 교통, 토목 계획 분야와, 조경 설계는 도시설계, 사회학, 생태학, 수문학, 토질공학 같은 분야와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분야 간 경계와 업역의 차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혹은 파악할 필요가 별로 없는—경우도 많다. 더욱이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도시 정책이나 개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루는 일도 도시설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러한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좋은 도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의 도시설계는 아직 현대 사회에서 흡족할 만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설계가는 늘 눈앞의 과제를 해결하기 바쁘고 자본과 정치 논리 앞에서 종종 무기력하다. 때로는 추상적인 공공성이나 이상적인 미학을 궤변처럼 늘어놓는다는 비아냥거림을 감수해야 한다. 마이클 소킨(Michael Sorkin)과 같은 비평가는 “(현재의 도시설계는) 형태적, 기능적, 사회적 요구에 대해 독창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채 …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2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부지 개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무기력함과 함께 도시설계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해 보자.
2014년 9월 삼성동 한전 부지에 대한 입찰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 기업은 10조 원이 넘는 입찰액을 써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에 대해 기업의 100년 비전을 담은 뚝심이라는 평가와 함께, 토지 감정가의 세 배가 넘는 과도하고 실패한 배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심의 대부분은 과연 10조라는 입찰가가 적절했는지, 경쟁사는 얼마를 써냈는 지, 그리고 이 기업 총수는 왜 이런 천문학적 비용 지출을 감행했는지에 머물렀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훨씬 더 큰 질문이 남아 있다. 왜, 언제부터 우리는 좋은 도시 환경을 고민하기에 앞서 남의 땅값을 걱정하기 시작했을까? 왜 한전 부지 빅딜에 대한 관심 이전에 ‘코엑스-한전-탄천-잠실운동장’을 망라하는 강남 지역 도시설계 청사진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지 않을까?
대규모 도심지에 잘못된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의 뼈아픈 부작용을 이미 수차례 학습했음에도, 오늘날 한전 부지 주변의 이해 당사자도, 매일 삼성동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도, 주말에 잠실운동장과 탄천 산책로를 즐기는 시민도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배팅 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거꾸로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전 부지라는 땅의 중요성과 예상되는 설계안에 비추어 볼 때 이 기업이 과연 개발권을 가질 자격과 역량이 있는가(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3
이러한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기존 도시 문제를 찾아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는, 혹은 복수의 해결안을 조정하는 것이 도시설계의 사회적 책무다. 이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과연 어떤 도시가 더 좋은 도시인가? 이는 어떤 물리적 형태의 도시 환경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게 이용될 것인가라는 판단과 선택의 문제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소수의 사람이 공유하는 미학, 때로는 대중의 공감대와 사회적 감수성도 포함된다. 좀 더 크게 보면 도시 개발의 크고 작은 시행착오와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도 좋은 도시를 판단할 수 있는 잠재적 기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집단적 슬로건이나 개인적 취향과 뒤범벅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연재의 기획 의도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도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함께 뉴어바니즘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론과 스마트한 성장론에 이르기까지 범람하는 도시론(urbanism)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 도시는 어느 때보다도 빈곤한 도시론에 아찔하게 기대어 서 있다. 좋은 도시를 정의할 때 비교적 널리 알려진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이러한 기준은 어디까지 보편적일까?
김세훈은 197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하버드 대학교 GSD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박사 학위(DDes)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에서 도시설계 이론과 스튜디오 수업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신흥도시 개발 모델』, 『도시형태변화분석방법론노트』, 『도시와 물길(A City and Its Stream)』 등이 있으며,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의 도시 연구와 설계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