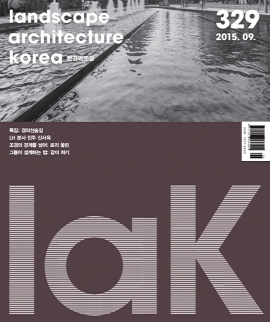대단한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이번호 코다에는 스포일러가 있다. 한창 개봉 중인 영화 이야기는 아니니 괜한 걱정은 붙들어 매두시길.
1. 공원을 보다. ‘당신의 공원은 어디입니까’란 물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네 컷의 사진이다. 잡지에 사용한 적도 있고, 단행본에 참고 이미지로 쓰기도 했다.
사진의 주인공은 공원이다. 뭐 대단히 유명한 곳은 아니다. 분당 까치마을에 있는 ‘벌말공원’이란 자그마하고 평범한 공원이다. 실제로 공원으로 이용(?)해 본 기억도 거의 없다. 그저 무심히, 묵묵히 지나쳐 갔을 뿐이다. 거의 매일. 집에서 사무실로 출근하려면 그곳을 거쳐 가야 했으니까. 그런 곳을 카메라에 담은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집에서 바로 내려다보이는 유일한 녹색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일 년 동안 꾸준히 한 공간의 사계절을 기록해보리라 마음먹고 나서 떠오른 첫 번째 공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열두 달짜리 나만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 시간대를 달리해 가며,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특히 빗발이 흩날리거나 소복이 눈이 쌓인 날이면 어김없이 카메라를 집어 들었다. 당시는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되지 않은 때여서, 슬라이드 필름 값을 아끼겠다고 한 번에 열 컷 이상은 찍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앵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맨 처음에 촬영한 사진을 인화한 후 드럼 스캔을 받고 그걸 출력해서 카메라 가방에 넣어 놓고는 매번 들여다보며 셔터를 눌렀다. 바닥에 나만 아는 촬영 포인트도 표시해놓고, 줌렌즈의 줌 기능도 고정시켰다. 그렇게 해서 건진 ‘벌말공원의 사계’를 담은 네 컷의 사진을 재탕, 삼탕 우려먹었다. ‘이용’하지 않고 바라보거나 지나간 공원이지만, 여러 갈래의 출근길 동선 중에서 벌말공원을 경유하는 코스를 잡은 건 최단 거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공원이 있어서였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아주 가까이에 있는….
2. 공원을 읽다. 네 컷의 사진에 이어 떠오른 건 두 권의 책이다. 조경비평 봄 멤버들과 함께 쓴 『공원을 읽다』(나무도시, 2010)와 환경과조경 편집부가 엮은 『한국의 공원 - PARK_SCAPE』(도서출판 조경, 2006). 『한국의 공원』에는 선유도공원부터 포항환호해맞이공원까지 총 서른 곳의 국내 공원을 수록했다. 특히 절반 이상의 공원은 사진을 새로 촬영했다. 그 덕에 집에서 가깝지도 않은 선유도공원, 올림픽공원, 하늘공원, 평화의공원을 그 해에만 서너 번 방문했고, 일산호수공원, 길동자연생태공원, 여의도공원, 파리공원, 서울숲,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분당중앙공원, 서대문독립공원, 용산가족공원, 울산대공원도 한 번 이상 찾았다. 순전히 촬영을 목적으로…. 그렇게 많은 공원을 자주 방문한 경우는 그 해가 유일했다. 당시 잡지원고에 종종 등장하던 파리공원도 솔직히 그 때 처음 가보았다. 다음 해에 국내조경 작품을 소개하는 글을 쓸 일이 생겼는데, 이때의 답사가 무척 유용했다. 공원 중에서는 선유도공원, 하늘공원, 올림픽공원, 일산호수공원, 평화의공원을 그 글에 소개했다. 특히 선유도공원, 하늘공원, 올림픽공원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서울숲은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서서울호수공원과 북서울꿈의숲은 완공전이었다.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공원 리스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공원』이 답사의 추억으로 남은 책이라면, 『공원을 읽다』는 그야말로 독서의 즐거움으로 기억되는 책이다. ‘근대, 극장, 정치, 정원, 놀이공원, 산, 물, 네트워크, 노인, 밤문화, 안전, 도시’ 등 12가지 키워드로 공원을 들여다 본 기획이었는 데, ‘노인, 밤문화, 안전’처럼 의외의(?) 키워드가 등장해 교정 보는 내내 흥미진진 했다. 특히 이경근의 ‘도시의 산, 한국의 공원’은 자신 있게 주변에 일독을 권했다. 『한국의 공원』이 주요 공원의 현장 답사를 이끌었다면, 『공원을 읽다』는 공원에 대한 다양한 담론 탐색을 이끈 셈이다.
3. 공원에 가다. 출근길에 지나쳐 간 공원을 빼고, 가장 많이 찾은 공원은 일산호수공원이다. 아마 방문 기록 2위는 마로니에공원이나 분당중앙공원이 아닐까 싶다. 마로니에공원은 목적지는 아니었다. 대학로 주변에서 데이트를 꽤 많이 한 덕분에 그 공원을 종으로 횡으로 참 많이도 지나다녔고, 그늘이 좋아 쉬어 간 적도 많다. 순전히 공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 빈도로만 따지면 일산호수공원, 분당중앙공원 순이다. 일산과 분당에서 몇 년씩 살았으니까. 근데 신도시 두 곳에서 산기간은 비슷한데, 공원을 방문한 횟수는 제법 차이가 난다. 여가 시간을 보내는 패턴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말이다. (특히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주말 방콕을 즐기는 건 똑같다. 다만 분당에 살 때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거나 아주 어렸고, 공원도 차를 타고 15분 이상 이동해야 했다. 일산으로 이사한 후 아이는 신나게 뛰어 놀 나이가 되었고, 현관문을 열고 단지를 빠져 나와 6차선 도로만 건너면 바로 공원이었다. 일산을 떠나 파주로 이사한 후에도 파주에 있는 공원이 아니라, 일산호수공원을 찾았다. 아이가 혼자 힘으로 자전거를 타게 된 이후에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놀았고, 공원에서 진행되는 행사도 몇 차례 구경했다. 요즘처럼 무더운 한여름에는 해질 무렵 노래하는 분수대 주변에서 치맥을 즐기기도 했다. 일상과 공원이 가장 밀접했던 한 때였다.
스포일러라고 하기도 뭣하지만, 10월호 특집으로 ‘당신의 공원은 어디입니까’를 준비하고 있다. 그냥 이 질문 하나만 던지고, 7명의 에디터가 각자 떠오른 생각을 지극히 주관적으로 써보기로 했다. 누구는 직관적으로 떠오른 공원을 소개하겠지만, 누군가는 이 질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나의 공원은 어디에도 없다’며 왜 그러한지를 따질 것이다. 공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나 장면을 소환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느슨하게 공원의 일상과 쓰임과 필요와 의미를 엉기성기 재구성해 볼까 한다. 그나저나 큰일이다. 이번 달 코다에 ‘나의 공원’ 이야기를 다해버렸으니, 다음 달 특집에는 뭘 써야 하지?